〈반지의 제왕〉 영화파 vs 『반지의 제왕』 소설파.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가? 어느 쪽에 더 이끌리는지 답하기 위해 영화를 재생하고 책장을 넘기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이야기와 또 한 번 사랑에 빠지고, 애초에 답을 찾고 싶었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는 자연스레 잊게 된다. 매력적인 캐릭터, 독특한 설정, 결말까지 내달리는 몰입력을 가진 문학 작품들이 부지런히 드라마화·영화화되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계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즐길 마음가짐 하나뿐이다. |
‘원작 소설 결말’.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 제목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이런 연관 검색어가 자동으로 나타난다. 아마도 이제 막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원작과 영화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한 듯하다. 소설을 비롯해 웹툰, 웹 소설, 에세이 등 IP(지식 재산권) 기반의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원작과 영화, 두 비교군을 저울에 올려두는 일은 흔해졌다. 어떤 이들은 ‘원작 소설을 얼마나 잘 구현했느냐?’를 기준으로 영화를 평가하기도 하니, 2차 콘텐츠를 향한 관객 반응이 원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문득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원작 기반의 영화를 감상하는 법은 이미 정해진 것일까? 원작이라는 명확한 기준선을 두고 채점표를 하나씩 체크해 나가며 봐야 하는 것일까?
영화 〈터널〉은 소재원 작가의 소설 『터널』을 각색해 제작했다. 평범한 회사원 정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터널이 무너지면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다. 영화는 터널의 아득한 어둠, 쾨쾨한 콘크리트 잔재, 끝을 알 수 없는 외로움 등 재난 피해자가 마주한 여느 어려움을 잘 표현했고, 터널 밖에서 애쓰는 구조원과 정수 가족의 지난한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이 영화는 무너진 공간의 분진을 표현하기 위해 콩가루, 숯가루, 베이킹 소다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 입자나 분진 분포를 섬세하게 표현함으로써 관객들 또한 주인공과 함께 터널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으며 몰입도를 높인다.
 영화 <터널> 포스터
영화 <터널> 포스터
하지만 영화 〈터널〉은 원작 소설과 상이한 결말에 닿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구조원 덕에 결국 정수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바깥세상에서 자신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동차에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원작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따지고 보면 영화 버전의 결말은 원작에 비해 다소 낙천적이고 순진무구해 보인다. 구조원들이 부지런히 땅을 뚫었지만 설계도 오류로 잘못된 곳에 도착한다거나, 정수 가족을 향한 대중의 눈초리가 조금씩 싸늘해지는 상황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절망적인 결말과 현실 비판적인 사회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던 원작 소설과 달리, 해피 엔딩으로 발을 돌린 영화 〈터널〉은 원작 충성도로 보자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원작을 얼마나 따랐나, 결말이 어떻게 다른가, 원작과 구성이 얼마나 비슷한가 등의 질문 앞에서 영화 〈터널〉은 그대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말 〈터널〉은 무의미할까? 여기서 다시 짚어봐야 할 건 바로 콘텐츠 형식이다. 소설은 철저히 독자의 상상력에 기댄다. 독자가 알아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나가길 바라며 그의 상상을 침범하지 못한다. 하지만 영상은 일방적으로 쏟아진다. 관람을 시작한 관객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상, 바닥에 누워 물을 마시듯 그것을 벌컥벌컥 들이켜야 한다. 영화 관객은 독자의 위치에서보다 상대적으로 감각의 주체성을 잃는다. 주인공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고, 영상 속 세계관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눈앞에 쏟아지는 분진, 주인공의 고통이 담긴 목소리, 시종일관 어두운 스크린까지 터널 붕괴가 마치 관객의 몫인 것처럼 몰아세운 영화는 무게 중심의 균형점을 찾아야 했을 것이다. 독서처럼 간접적 이미지를 상상하는 게 아닌, 실체가 있는 생생한 영상을 보는 것인 만큼 이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게다가 영화 〈터널〉이 개봉했던 2016년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2014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기였다. 재난과 사건·사고, 갑작스러운 인명 피해에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가라앉기 전이었던 만큼, 정수와 함께 터널에 갇힌 듯한 관객들은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 받아들이기도 했다. 결국 이야기는 그 형식이 지닌 특성과 고유성에 따라 연출, 구성, 방향, 결말까지 모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유기적으로 변한다.
 <작은 아씨들> 소니픽처스 코리아 제공
<작은 아씨들> 소니픽처스 코리아 제공
한편 루이자 메이 올컷의 소설 『작은 아씨들』이 영화로 리메이크되었을 때, 사랑스러운 네 자매의 이야기는 원작 소설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원작에서 다루지 않았던 작가로서의 조 마치의 성장담을 조명하고, 시간 이동에 비교적 자유로운 영화의 장점을 살려 과거와 현재를 이리저리 오간다. 조 마치가 신나게 달려가는 오프닝 장면에 크리스마스 느낌을 담아 흐르는 음악 〈리틀 우먼(Little Women)〉은 씩씩한 네 자매가 어려운 상황에도 잃지 않는 명랑함을 잘 보여준다.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독특한 연출을 고민하고, 텍스트의 여백을 음악으로 채우는 것은 분명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다.
영화를 본 뒤 원작 소설을 읽는 경우는 어떨까. 워낙 방대한 이야기에 영화상에서 생략되거나 축약된 부분이 많은 ‘해리포터’ 시리즈는 책을 통해 더 섬세한 상황 묘사와 인물들의 명민한 감정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 말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책 버전을 더 편드는 것은 아니다. 천공을 가르며 눈 덮인 호그와트를 보여주는 버즈 아이 뷰(Bird’s-eye view)나 심장을 찌르는 오프닝 노래는 영화가 아니었다면 영영 만나보지 못할 것들이다. 영화와 원작 소설은 서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각자의 형식만이 건넬 수 있는 재미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안 감독의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의 거칠고 모험적인 묘사는 원작인 얀 마텔의 『파이 이야기』를 따라갈 수 없지만, 형형한 밤바다는 영화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목격하기 힘든 것처럼.
 <라이프 오브 파이> 해리슨앤컴퍼니 제공
<라이프 오브 파이> 해리슨앤컴퍼니 제공
추천기사

이자연
대중문화 탐구인. 그중에도 영상 콘텐츠를 여성주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걸 가장 즐겨 한다. 현재 영화 매거진 『씨네21』에서 일한다. 저서로는 『어제 그거 봤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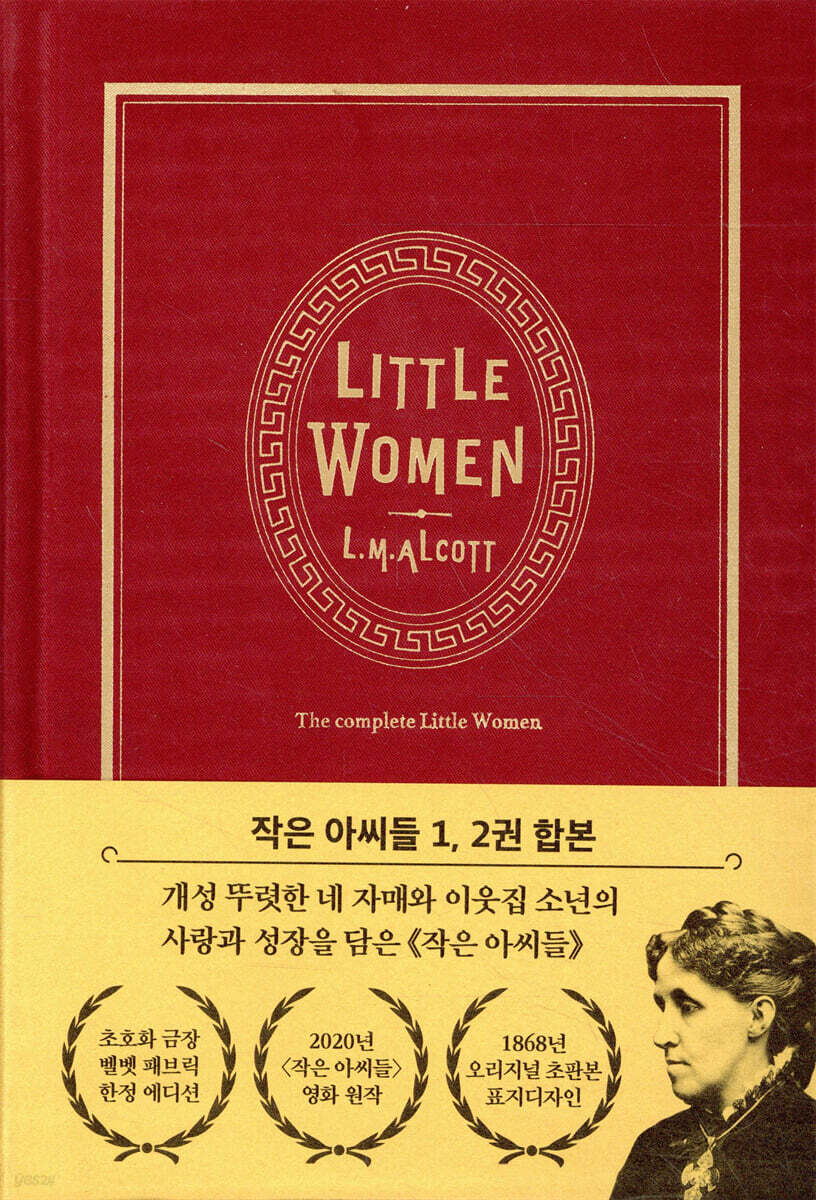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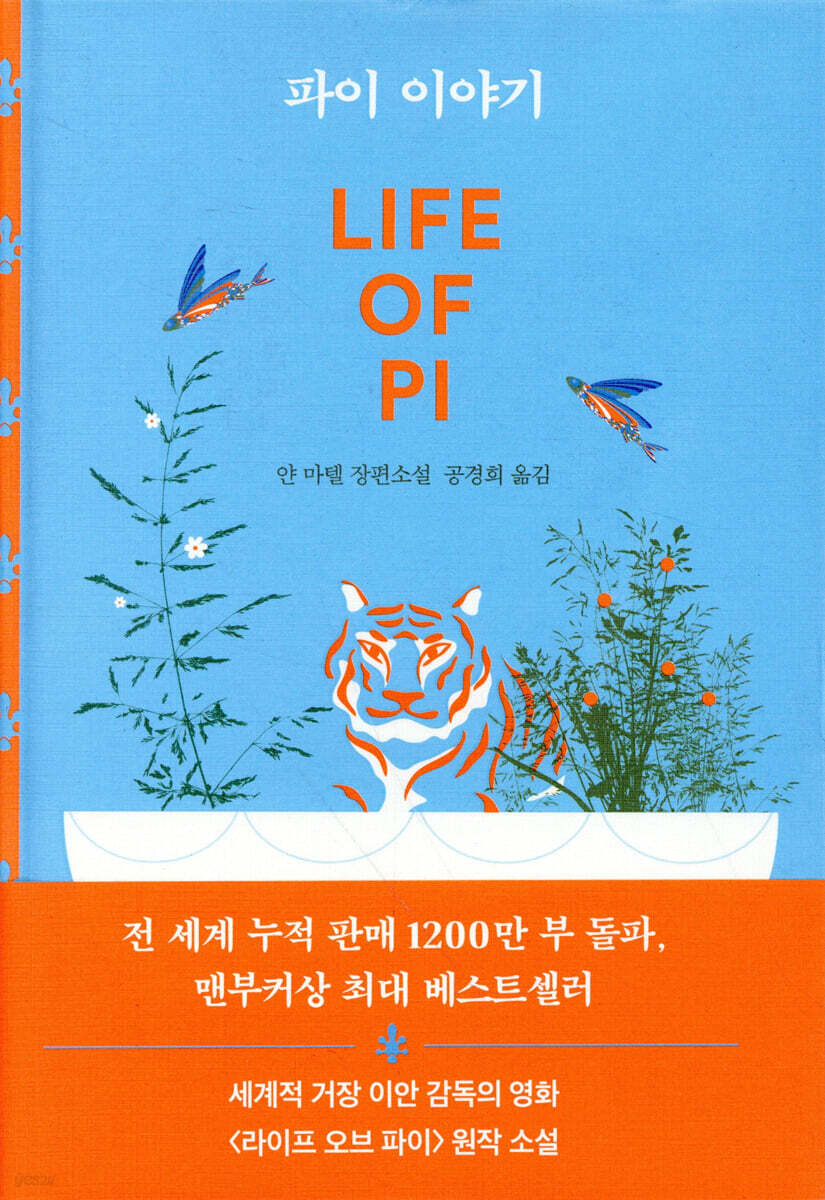
![[영상 특집] 원작 소설은 이것입니다 | 예스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7/7/6/6/7766b7ca63ce0bdb2e72e45ad52154b3.jpg)
![[영상 특집] 결정적 장면에 밑줄 긋기 | 예스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f/d/0/6/fd06e78fc5cc998e55092c151849ca6f.jpg)
![[김지연 칼럼] 별 가루가 흩어질 때 | 예스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5/7/4/0/5740b223cb7fe0755bac186f4fc1b974.jpg)


![[김이삭 칼럼] 문자와 문자를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희곡 번역](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09-d9cb953b.jpg)
![[젊은 작가 특집] 백온유 “언젠가는 공포 소설을 제대로 써보고 싶습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8e240083.png)
![[젊은 작가 특집] 강보라 “못생긴 감정을 숨기고 사는 인물에게 관심이 있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508d14fb.png)
![[리뷰] 회빙환은 도대체 언제까지 유효할까?](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6-8b81486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