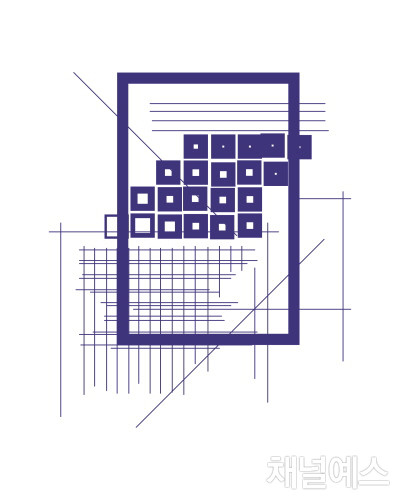
“원고지 20매 정도로 써 주세요.”
글 청탁을 받을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관습적인 존재인지 새삼 깨닫는다. 보통 원고지 매수로 글의 분량을 재는데, 이때 거론되는 원고지는 200자 원고지이니 20매라면 글자 수로 띄어쓰기 포함해서 4천 자다. 어째서 4천 자가 아니라 굳이 원고지 20매일까.
원고지를 마지막으로 쓴 건 대학교 1학년 교양 국어 수업의 과제 때문이었다. 원고지에 맞춤법을 준수해 쓰라는 조건이었다. 그 시절 나는 글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데다 리포트라 하면 컴퓨터에 타이핑해서 프린터로 뽑은 출력물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원고지는 고리타분한 조건으로 여길 뿐이었다.
“굳이 원고지에 쓰지 않아도 맞춤법을 제대로 아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당시 같은 과제를 제출한 바 있는 노바가 거들었다. 하긴 갓 입학해 그저 놀고 싶은 새내기 대학생에게 불만 없는 과제가 있었을까.
리포트 분량을 재는 기준은 A4 용지였다. 원고지나 A4 용지나 글의 분량을 측정하는 단위로 삼기에는 사실 모호한 면이 있다. 20매째 원고지에 대여섯 글자만 썼다면 사실상 19매일까, 엄연히 20매일까. ‘A4 5매를 쓰되 마지막 장은 절반 이상 쓸 것’ 하는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강사도 있었지만 리포트에 쓸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 생맥주를 마시고 싶었던 우리는 초보적인 타이포그래피 지식을 활용해 여백을 많이 주고 글자 크기를 키우는 꼼수를 부렸다. 나중에는 과제 조건에 글자 크기까지 지정되기도 했지만 그럴 땐 자간과 행간을 넓히곤 했다. 그런데도 리포트의 분량을 글자 수로 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혹시 당시에는 워드 프로세서에 글자 수를 표시하는 기능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아무도 그 기능을 몰랐던 걸까? 나 역시 이 글을 쓰고 있는 페이지스에 글자 수를 통계 내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땐 아무 글이나 복사해 워드에 붙인 다음 해당 글자 수만큼 남기고, 그 글을 다시 페이지스에 복사해 대략의 분량을 확인한 다음 쓰곤 했다. 번거로웠다.
“이를테면 여백 상하좌우 20밀리미터, 글자 크기 10포인트, 행간 17포인트로 A4 용지 4매에 5줄 이상 6줄 이하라고 말해주면 안 되나?”
“어떤 편집자가 그러는데 많은 작가가 원고지를 기준으로 글을 쓰는 데 익숙해서 그럴 거래.”
“정말? 뭐, 그렇다 치고,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작가들도 그럴까?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작가들은? 원고지 실물조차 본 적 없는 작가들이 주력 필진으로 활약하는 때가 와도 글 분량을 원고지 매수로 얘기할까?”
이 현상에 신경 쓰자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매일 수십 번씩 확인하는 지메일의 아이콘은 편지봉투 모양이고 우편함 모양을 쓰는 오에스도 있다. 글쓰기 툴의 아이콘으로 인기 있는 아이템은 깃털 펜, 펜촉, 종이 등이며 전자책 앱은 종이책 이미지를 차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뿐이 아니다. 스마트폰의 통화 버튼은 구식 수화기 모양이다. 아직은 종이 편지봉투, 우편함, 만년필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이 도구들이 상징으로 유효할지 모르겠다.
이 문제는 책 표지로도 확장된다. 글쓰기 관련 책의 표지에는 펜, 원고지, 타자기 등의 이미지가 많이 쓰인다. 그 많은 글쓰기 책은 분명 키보드로 타이핑한 글일 텐데도 표지에는 펜, 원고지, 타자기가 등장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비유의 기능이니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꺼려진다.
『논픽션 글쓰기』 표지에 자판을 두드리는 손을 등장시켰는데, 열심히 쓴다는 의미로 양손의 손가락을 여섯 개씩 그렸다. 영화 <패왕별희>에 손가락이 여섯 개인 아이의 ‘남는’ 손가락을 잘라 ‘정상’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 인류는 한때 흑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여성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인식이 ‘정상’이던 시기를 지나 왔다. 당연히, 현재 ‘정상’인 몇몇 개념은 훗날 ‘그럴 때도 있었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세상의 변화가 정부 같은 거대한 힘에서만 나오지는 않을 거야.”
“지당한 말씀. 때로는 일상에 촘촘히 스민 작디작은 소품 같은 선택들이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하지.”
“예전에 유유 책의 페이지 번호를 세로로 배열했었잖아. 그거 지금은 왜 안 해?”
“책의 전통을 수호하는 집단이 암살자를 보냈더라고. 페이지 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바꾸지 않으면 출판사 대표를 제거하겠다기에 요구를 들어줬지. 장난은 다른 데다 쳐도 되니까.”
책은 새로운 지식을 담아내는 그릇이면서도 형태는 관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배포가 좁쌀 만한 나는 사소하게 ‘이상’한 요소를 작업물에 슬쩍 끼워넣는 편이다. 노바가 언급한 페이지 번호는 온통 가로쓰기만 쓰이는 현실이 안타까워 독서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 요소에 세로쓰기를 적용한 것이었다. 때로는 목차가 필요 없는 얇은 그림책에도 페이지 번호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곤 한다.
“책에 페이지 번호가 없어도 되나요?”
왜 반드시 있어야 할까. 아이랑 그림책을 함께 보는 상황을 떠올려봤다. “어제 몇 쪽까지 봤더라?” 대신 “고양이가 페이지 번호를 다 뜯어 먹은 데까지 봤지?” 하는 장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밖에 다른 요소 몇 가지를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하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관습적으로 ‘뾰족한 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쓰다 보면 아이디어란 무릇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식에 자리잡는 것 같다. 뾰족한 수는 가능한 여러 수 가운데 한 가지일 뿐이라고 인식하려면 ‘뾰족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은 시작이리라. 둥근 수가 합당할 때도 있지 않을까?
며칠 전에는 오랜만에 예전 회사 동료들을 만났다. 다들 나한테 팀장님이라고 불렀다. 내가 그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한 때는 2005년이었다. 십여 년이 지났고, 더는 그들의 팀장으로 불릴 이유가 없는데도 관습 탓에 나는 여전히 팀장이다.

이기준(그래픽 디자이너)
에세이 『저, 죄송한데요』를 썼다. 북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젊은 작가 특집] 한여진 "좌절은 나를 백지 앞으로 또 데려갑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dcd0ee33.jpg)
![[젊은 작가 특집] 이희주 "소설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언어를 다뤄보고 싶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11409923.jpg)
![[추천핑] 국경을 넘는 한국 문학](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3-ab42d6e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