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한 몸으로 기차역의 벤치에 앉으며 “아이고고.....”소리를 냈더니 동행인이 말하길, “나이가 들었단 소리지. 젊을 때는 그런 소리 잘 안 내거든.” 이러면서 깔깔 웃는 게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벌써 ‘나이가 들어서’라고 말하는 건 너무 빠르지 않아? 아직 기대수명의 반도 안 살았는데. 괜히 그의 말을 부정하고픈 생각이 불쑥 드는 걸 보면 ‘늙음’보다는 ‘젊음’의 시간에 아직 더 가까이 있다고 우기고 싶은가 보다. 어릴 때는 별 생각없이 지나갔던 어른들의 사소한 행동이 내게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온다. 요즘은 내 나이 때 내 부모의 모습은 어떠하였던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 동물도 예외가 아니다. 나이가 드는 개를 보며 예전에 동네에서 마주치던 늙은 개들을 떠올린다.
2004년 9월 8일에 태어난 반야는 현재 14살이다. ‘반야’는 내 부모와 살고 있는 말티즈의 이름이다. 김성동의 소설 『꿈』 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이기도 하다. 반야가 우리집에 처음 왔을 때 엄마가 『꿈』 을 읽고 있었고, ‘지혜’를 가지라는 뜻에서 즉흥적으로 이름을 반야로 지었다. 이름의 영향일까. 꽤 오랫동안 채식주의견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반야는 고기에 무관심했다. 우리가 닭다리를 뜯던 수육을 삶아 먹던 아무 반응도 없었다. 대신 사람들이 과일을 먹거나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썰때면 반응을 보였다. 반야는 특히 사과를 좋아했다. 사과를 얆게 썰어서 주면 그 작은 입속에서 씹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사각.
반야의 행동을 보면 신기하게도 인간이 도구를 사용해서 먹는 음식과 손으로 먹는 음식에 반응을 달리한다. 도구를 사용하는 식사는 인간의 식사지만, 찐 감자, 찐 고구마, 빵처럼 인간이 손으로 들고 먹는 음식은 개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물론 이는 반야에 대한 사랑으로 눈이 먼 나의 과잉해석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반야의 청견 시절 동네에 늙은 시추가 있었다. 한 쪽 눈은 안구가 없었다. 관절이 안 좋아서 다리는 휘었고 털은 윤기가 없으며 수염도 흰색이며 배와 가슴의 곡선은 두루뭉술하고 여름에 털을 밀어내면 피부에 반점도 많이 보였다. 걸음걸이는 둔하고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 보이는 반응도 활달하지 않았다. 외모 차별과 젊음 선호는 동물에게도 적용된다. 동네에서 산책 다니는 다른 개들 보다 상대적으로 덜 관심받았다.
외모만 변하는 게 아니다. 늙은 개들은 사료에 물을 적셔주지 않으면 제대로 소화를 못시켜 토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쩐지 반야와는 먼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때는 늙음이 지금보다 내 인생에서 더 멀리 있었다. 어느새 우리집의 청견은 노견이 되었고, 중년의 부모는 노인이 되어가고, 나는 내가 기억하는 부모의 중년 모습을 지금의 나와 비교한다. 늙은 개 마음은 역시 같이 늙어가는 엄마가 더 잘 안다. 반야가 이제는 전보다 사람에게 덜 안긴다 했더니 개도 사람처럼 나이 들면 여기 저기 쑤셔서 누가 만지는 게 귀찮을 거라고 한다.
14살이 되었으니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다. 사람으로 치면 여든이 넘었다. 9살 때 한번 수술을 해서 자궁이 없지만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매우 건강하다. 반야는 여전히 잘 먹고 변도 좋다.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풀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서 귀를 휘날리며 뛰고 집에 오면 인형과 논다. 성질이 나면 짖고 문 앞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모습도 한결같다. 잠자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생활 습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확실히 달라진 점이 있다. 반야의 사각거리는 씹는 소리가 이제 전처럼 선명하진 않다. 늙음의 신호였다. 반야의 이빨이 많이 빠졌다. 딱딱한 간식은 빻아서 주고 개 사료에는 물을 약간 적셔준다. 부모님도 이제는 고기를 씹기가 불편해서 생선을 더 즐긴다. 그렇다면 혀는 어떨까. 나는 반야의 미각이 궁금해졌다. 알아낼 도리는 없다. 할머니가 7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소금 칠 음식에 설탕을 치고 맛이 안 난다며 설탕을 계속 쳤던 적이 있다. 눈도 침침한데 혀까지 늙으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음식은 망했다. 늙으면 맛도 잃어버리는 줄 그때는 모르고 할머니가 요즘 왜 이리 정신 없는 행동을 자주 할까, 조금 짜증스러워 했다. 해주는 밥 얻어먹는 주제에. 때로 젊음은 이렇게 무지에 기반하여 늙음을 향해 상처를 준다.
요즘 여기 저기서 꽃 사진을 본다. 땅에서는 싹이 나고 나무에는 꽃이 피는 봄. 북반구의 인간들이 옷의 무게를 줄여가듯 털이 있는 짐승의 관점에서 봄과 여름은 짐승의 털이 가늘어지는 계절이다. 봄은 생동하는 이미지로 가득하다. 그래서 성매매를 ‘매춘’이라 한다. 봄을 판다. 여성-자연에 대한 남성적 지배를 상징하는 언어다. 젊은 여성의 몸은 남성의 입장에서 생동하는 봄으로 여겨진다. 그럼 늙은 여성은? 동화 속에서는 주로 마귀할멈이다. 이가 다 빠진 늙은 여자는 마귀로 재현되어 왔다. 늙은 여성은 현자로 그려지지 않는다. 삶의 시간이 축적되어 이야기를 쌓는 존재로 여겨지기 보다는 예쁜 외모를 ‘잃는’ 존재로 여겨지는 동물과 여성. 인간의 타자이며 남성의 타자다.
반야가 12살 때 아침 산책길에서 17살 미니핀을 만난 적 있다. 17살까지 우리 반야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비결이 뭔가요? 미니핀의 반려인은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우리는 황태를 먹입니다. 황태를 물에 데쳐 소금기를 빼고 먹여요.” 그 날 이후로 강원도 인제를 지나는 길이면 황태를 사다가 먹이곤 했다. 어쩌면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심, 무병장수에 대한 욕심을 개에게도 투영하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욕심인 줄 알지만 사람보다 수명이 짧은 동물과의 헤어짐을 준비하지 못해서다.
여태 함께 살던 개들과 마지막 인사를 한 적이 한번도 없다. 잘 살았지만 잘 헤어지지 못했다. 나가서 놀다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게 사라진 개도 있고, 말썽을 부린다고 엄마가 팔아버린 개도 있다. 예전에 시골에서는 밖에서 놀다가 쥐약 먹고 죽은 개들도 있었다.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 힘을 쏟아 집으로 달려와 가족 앞에 쓰려져 죽었다고 전해들었을 뿐이다. 이번에는 꼭 마지막을 보고 싶다.
길에서 죽은 개를 근처 옥수수밭 옆에 묻어준 적이 있다. 요크셔테리어였다. 토하거나 피를 흘린 흔적도 없었다. 몸이 깨끗하고 목에는 줄도 달려 있었다. 사람의 돌봄을 꾸준히 받던 개였다. 무슨 일로 길에서 죽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가족을 찾을 수도 없고 사체를 그대로 둘 수도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죽은 몸을 만졌다. 뻣뻣하게 굳어있는 몸이 손끝에 전해졌다. 옥수수밭 옆에 흙을 파내고 작은 상자에 넣어 개를 묻었다. 나는 그 요크셔테리어가 옥수수가 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생각했다. 반야는 사과나무 밑에 묻어야겠다고. 그럼 반야가 좋아하는 사과가 될 것이다. 반야를 묻는 순간이 곧 반야를 심는 순간이 될 것이다. 내가 사과나무를 심을 장소를 확보할 때까지는 반야가 살아있어야 한다.

이라영(예술사회학 연구자)
프랑스에서 예술사회학을 공부했다.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며 예술과 정치에 대한 글쓰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 『여자 사람, 여자』(전자책), 『환대받을 권리, 환대할 용기』가 있다.










![[김미래의 만화절경] 서울의 공원과 고스트 월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22-2c09f7a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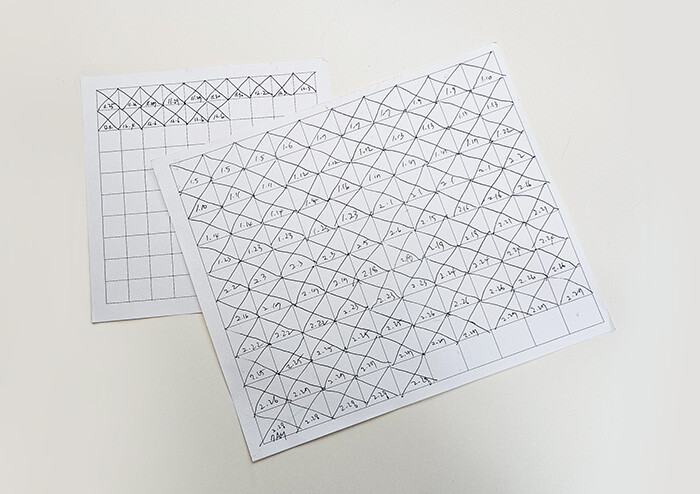

![[송섬별 칼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몽땅 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07-df966cd9.png)
![[송섬별 칼럼] · · · - - - · · ·](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4-efbfaa9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