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상을 펼쳐라, 전어가 간다
노랗게 익어가는 전어를 보면, 가을도 이렇게 익어가는 가 싶다. 우리의 삶도 익어간다. 익은 것은 색과 향이 짙다. 어쩌면 황혼이야 말로 가장 짙은 언어로 삶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니, 짙은 것은 말이 없다. 그저 짙다. 이제는 전어만 보면 술상 마을의 노을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른다.
2013.10.24
포구의 맛
포구에는 여러 형태의 삶이 있다. 포구는 만선으로 돌아온 노선장의 입가에 띤 작은 웃음이며, 그물을 당기는 선원의 주름이다. 시장에 내다팔 하루치 물건을 구매하는 아주머니의 앞치마이며, 주머니 속에 든 바닷물 먹은 서너 장의 지폐다. 새벽부터 생선의 값을 매기며 호루라기를 부는 경매인의 목젖이며, 포구는 위판장을 뒹구는 얼음덩어리다. 끝없이 육지로 코를 박는 뱃머리다. 팽팽하게 때론 느슨하게 배를 지탱하는 밧줄이다. 노동자들이 새벽일을 마치고 마시는 커피에서 오르는 뜨거운 김이며, 아니 그제야 간신히 펴는 그들의 허리, 그 굽고 휘어진 만(灣)의 형태가 곧 포구다.
누군가에게 포구는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하나의 풍경일 것이다. 또 다른 이에게는 낚시터나 캠핑지가 될 것이다. 갈매기에게는 잠시 날개를 접고 쉴 수 있는 쉼터이며, 파도에게는 제 몸을 모래나 바위에 부빌 수 있는 온기 있는 곳이다. 묶여있는 배에게는 연료를 채우고 나사를 조일 수 있는 정비소이며, 출항하는 배에게는 돌아올 곳, 고향이다. 나에게 포구는 떠나온 곳이며, 이내 도달한 곳, 그리하여 머나먼 창공과 광활한 바다가 모이는 작은 지점, 이를테면 어머니의 품 안이다.
포구는 마음의 위안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기도 한다. 충남 태안의 드르니 포구에서 맛본 새콤달콤하고 쫀득쫀득한 쭈구미 무침과 기장 대변 포구의 멸치회 무침, 속초 포구의 아바이 순대, 창원 고현포구의 달꼼 쌉쌀한 미더덕 찜은 그야말로 혀를 춤추게 한다. 식당을 통하지 않고, 어민들의 손길에서 즉석으로 나온 해산물은 더하다. 벚꽃이 필 무렵 망덕 포구 앞 섬진강 하류에서 나는 손바닥만 한 벚굴, 그 깊고 향기로운 굴 즙이 입안을 채울 때면 포구에 그저 드러눕고 싶다. 거제 학동 포구의 숭어는 성미가 급해 그 자리에서 회를 치지 않으면 물러지기 십상이다. 어른의 팔뚝보다 힘이 센 숭어 한 마리의 뼈를 발라내어 굵직하게 살을 썰어두면 몇 병의 막걸리가 달아날 정도다. 그중에서 노랗게 익어가는 이 계절과 어울리는 음식을 하나 뽑으라면, 단연 전어구이다. 내장을 빼지 않은 전어 한 마리를 통째로 숯불 위에 올리곤 소금 간만 첨가하면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생선구이가 완성된다. 비늘이 노랗게 익으면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동네 곳곳을 휘젓는다. 집나간 며느리도 냄새 맡고 돌아온다는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다. 온 정신을 홀리게 할 정도로 구수한 그 맛을 느낀 하동의 술상 포구는 코가 먼저 기억하고 혀가 다시 찾으려 한다.

녹차보다 진한 하동의 매력
그러고 보면 하동은 축복받은 동네인 게 분명하다. 지리산이 품고 있어 사시사철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강이 흐르니 온 계절이 풍요롭다. 위용과 절개와 여유를 동시에 가지는 마을은 흔치않다. 그렇기에 역사와 전통에 따른 문학 작품도 하동을 빼놓을 수 없다. 만주와 일본까지 무대가 펼쳐지는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의 시작은 하동의 평사리 마을이다. 마른 논에 물드는 소리를 좋아한 박경리 작가는 아미산 아래에서 동정호까지 펼쳐진 무딤이들(평사리들)을 매혹적인 소설적 공간으로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화개장터에서 울려 퍼지는 엿장수들의 외침, 끝도 없이 푸름이 펼쳐진 녹차마을, 쌍계사로 이어지는 폭포와 지리산의 천왕봉까지 그 매력은 셀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예닐곱 번이나 하동을 찾았던 나는, 바다가 있다는 생각은 해보질 못했다. 흐르는 섬진강이 언젠가는 바다에 닿겠지만 하류까지 하동이 껴안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금오산의 강줄기와 남해의 바다가 만나는 하동의 술상 포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전어가 잡히는 동네라고 한다.
자정 무렵에 출발해서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진교IC를 지나 새벽 4시 즈음 술상 포구에 도착했다. 어두컴컴한 논밭을 지날 때까진 너무 일찍 왔구나 싶었지만 바다 위를 밝히는 작은 불빛들에 허둥지둥 선창으로 달려 나갔다. 어민들은 둘 셋 짝을 이뤄 출항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 그물을 던지는 건 어떤 기분일까. 어촌계장님의 도움을 받아 한 부부의 배를 얻어 탈 수 있었다.

전어면 좋겠지만, 전어가 아니어도
전어(錢魚)는 옛날 중국의 화폐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돈 錢(전)자가 붙여졌다는 설이 있고, 맛이 워낙 훌륭해서 사는 사람이 돈 생각은 하지 않고 사간다고 전어라고 불렸다고도 한다. 서남해안 일대에서 주로 잡히는 전어는 맛과 향이 좋아 수요량이 엄청났다. 그런 전어가 술상 포구에서 가장 먼저 잡힌다고 하니,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한기인 여름에는 포구마다 일이 많이 없곤 하지만 칠월부터 시월까지의 술상포구는 한 해 중 가장 바쁜 때인 것이다. 그물을 던지고 컴컴한 바다를 바라보던 아주머니는 금오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전어를 부른다고 했다. 금오산의 마애불을 찾아본 적이 있던 터라, 반가운 이름에 귀가 쫑긋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었다. 나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리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는 한 부부의 삶에 수긍이 된 것이다.
선장님은 그물을 넣은 지 십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끌어올렸다. 유속이 세어 자칫하면 그물이 엉킬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한 번 넣은 그물은 금세 걷어 올렸다. 불행히도 전어는 잡히지 않았다. 인간에게는 바다 속을 투영할 능력이 없다. 다만 오랜 경험으로 익힌 감각과 물의 흐름, 유속의 세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실패도 비일비재했다. 부부는 또다시 그물을 올렸지만 여전히 전어를 볼 수는 없었다. 흐물흐물한 미역덩어리가 가끔가다 올라올 뿐이었다. 산등으로 어슴푸레한 빛이 새 나왔다. 부부는 몇 번이고 그물을 넣었다 뺐다. 나는 제법 허무했지만 부부의 얼굴에는 전혀 아쉬운 기색이 없었다. 그렇게 수차례를 진행하자 오히려 바닷물을 걸러내는 빈 그물, 그 그물의 듬성듬성한 공간이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그것은 내가 전혀 감각하지 못한 것이었기에 의심에서 비롯되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배워야 하고 살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진리 같은 것이라 짐작되었다. 부부는 십 분 전에 던져두었던 그물을, 또다시 빈, 그 그물을 말없이 거두고 있었다. 그날, 만선으로 돌아온 배는 없었다.

익어간다 가을도 전어도
어느 생선이 그렇지 않겠냐 만은 술상의 전어는 버릴 것이 없었다. 전어에 소금을 치고 통째로 젓갈을 만들기도 했고, 내장만 따로 빼어 밤젓이라는 쌉싸름한 음식을 만들어냈다. 전어는 횟감으로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구이였다. 술상 마을의 서낭당 아래에는 큰 좌상이 펼쳐져 있어 어느 때곤 동네 어르신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그 아래, 가을을 부르는 전어의 향이 짙게 배였다.
어촌계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하여 전어를 보내왔다. 계장님이 불판에 연탄을 피우고, 전어를 한 박스 선물했다. 안경을 낀 할머니가 서낭당 바로 앞에 있는 밭에서 고추와 상추를 떼 오고 자전거를 끌고 길을 지나던 할아버지가 어디선가 막걸리를 받아왔다. 앞치마를 두른 새댁이 작년에 담았다며 밤젓과 식은 밥을 내어왔고, 몸빼 바지를 입은 할머니들이 하나 둘 불판 주위로 둘러앉았다. 손주와 통화할 거라며 나에게 영어로 말을 붙이던 할아버지와 술상 전어가 최고라며 자랑을 늘여놓던 또 다른 할아버지, 이젠 씹을 힘이 없지만 끝끝내 내 젓가락을 거부하지 않았던 연로하신 할머니와 그 주변으로 둘러앉아 파리를 쫓아주신 할머니들.
노랗게 익어가는 전어를 보면, 가을도 이렇게 익어가는 가 싶다. 우리의 삶도 익어간다. 익은 것은 색과 향이 짙다. 어쩌면 황혼이야 말로 가장 짙은 언어로 삶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니, 짙은 것은 말이 없다. 그저 짙다. 이제는 전어만 보면 술상 마을의 노을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른다. 침이 고이기도 전에 누군가 이렇게 외치는 것만 같다.
술상을 펼쳐라, 전어가 간다.
[관련 기사]
-느리게, 보다 느리게 걷는 섬 증도
-구럼비처럼 낮게 앉았을 때 보이는 강정 마을의 풍경들
-아바이라는 큰 이름 - 강원도 속초 아바이 마을 포구
-섬으로 가는 길, 당신에게 닿는 길
-대변으로부터 날아라, 멸치 - 부산시 기장군 대변포구
포구에는 여러 형태의 삶이 있다. 포구는 만선으로 돌아온 노선장의 입가에 띤 작은 웃음이며, 그물을 당기는 선원의 주름이다. 시장에 내다팔 하루치 물건을 구매하는 아주머니의 앞치마이며, 주머니 속에 든 바닷물 먹은 서너 장의 지폐다. 새벽부터 생선의 값을 매기며 호루라기를 부는 경매인의 목젖이며, 포구는 위판장을 뒹구는 얼음덩어리다. 끝없이 육지로 코를 박는 뱃머리다. 팽팽하게 때론 느슨하게 배를 지탱하는 밧줄이다. 노동자들이 새벽일을 마치고 마시는 커피에서 오르는 뜨거운 김이며, 아니 그제야 간신히 펴는 그들의 허리, 그 굽고 휘어진 만(灣)의 형태가 곧 포구다.
누군가에게 포구는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하나의 풍경일 것이다. 또 다른 이에게는 낚시터나 캠핑지가 될 것이다. 갈매기에게는 잠시 날개를 접고 쉴 수 있는 쉼터이며, 파도에게는 제 몸을 모래나 바위에 부빌 수 있는 온기 있는 곳이다. 묶여있는 배에게는 연료를 채우고 나사를 조일 수 있는 정비소이며, 출항하는 배에게는 돌아올 곳, 고향이다. 나에게 포구는 떠나온 곳이며, 이내 도달한 곳, 그리하여 머나먼 창공과 광활한 바다가 모이는 작은 지점, 이를테면 어머니의 품 안이다.
포구는 마음의 위안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기도 한다. 충남 태안의 드르니 포구에서 맛본 새콤달콤하고 쫀득쫀득한 쭈구미 무침과 기장 대변 포구의 멸치회 무침, 속초 포구의 아바이 순대, 창원 고현포구의 달꼼 쌉쌀한 미더덕 찜은 그야말로 혀를 춤추게 한다. 식당을 통하지 않고, 어민들의 손길에서 즉석으로 나온 해산물은 더하다. 벚꽃이 필 무렵 망덕 포구 앞 섬진강 하류에서 나는 손바닥만 한 벚굴, 그 깊고 향기로운 굴 즙이 입안을 채울 때면 포구에 그저 드러눕고 싶다. 거제 학동 포구의 숭어는 성미가 급해 그 자리에서 회를 치지 않으면 물러지기 십상이다. 어른의 팔뚝보다 힘이 센 숭어 한 마리의 뼈를 발라내어 굵직하게 살을 썰어두면 몇 병의 막걸리가 달아날 정도다. 그중에서 노랗게 익어가는 이 계절과 어울리는 음식을 하나 뽑으라면, 단연 전어구이다. 내장을 빼지 않은 전어 한 마리를 통째로 숯불 위에 올리곤 소금 간만 첨가하면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생선구이가 완성된다. 비늘이 노랗게 익으면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동네 곳곳을 휘젓는다. 집나간 며느리도 냄새 맡고 돌아온다는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다. 온 정신을 홀리게 할 정도로 구수한 그 맛을 느낀 하동의 술상 포구는 코가 먼저 기억하고 혀가 다시 찾으려 한다.

녹차보다 진한 하동의 매력
그러고 보면 하동은 축복받은 동네인 게 분명하다. 지리산이 품고 있어 사시사철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강이 흐르니 온 계절이 풍요롭다. 위용과 절개와 여유를 동시에 가지는 마을은 흔치않다. 그렇기에 역사와 전통에 따른 문학 작품도 하동을 빼놓을 수 없다. 만주와 일본까지 무대가 펼쳐지는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의 시작은 하동의 평사리 마을이다. 마른 논에 물드는 소리를 좋아한 박경리 작가는 아미산 아래에서 동정호까지 펼쳐진 무딤이들(평사리들)을 매혹적인 소설적 공간으로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화개장터에서 울려 퍼지는 엿장수들의 외침, 끝도 없이 푸름이 펼쳐진 녹차마을, 쌍계사로 이어지는 폭포와 지리산의 천왕봉까지 그 매력은 셀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예닐곱 번이나 하동을 찾았던 나는, 바다가 있다는 생각은 해보질 못했다. 흐르는 섬진강이 언젠가는 바다에 닿겠지만 하류까지 하동이 껴안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금오산의 강줄기와 남해의 바다가 만나는 하동의 술상 포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전어가 잡히는 동네라고 한다.
자정 무렵에 출발해서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진교IC를 지나 새벽 4시 즈음 술상 포구에 도착했다. 어두컴컴한 논밭을 지날 때까진 너무 일찍 왔구나 싶었지만 바다 위를 밝히는 작은 불빛들에 허둥지둥 선창으로 달려 나갔다. 어민들은 둘 셋 짝을 이뤄 출항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 그물을 던지는 건 어떤 기분일까. 어촌계장님의 도움을 받아 한 부부의 배를 얻어 탈 수 있었다.

전어면 좋겠지만, 전어가 아니어도
전어(錢魚)는 옛날 중국의 화폐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돈 錢(전)자가 붙여졌다는 설이 있고, 맛이 워낙 훌륭해서 사는 사람이 돈 생각은 하지 않고 사간다고 전어라고 불렸다고도 한다. 서남해안 일대에서 주로 잡히는 전어는 맛과 향이 좋아 수요량이 엄청났다. 그런 전어가 술상 포구에서 가장 먼저 잡힌다고 하니,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한기인 여름에는 포구마다 일이 많이 없곤 하지만 칠월부터 시월까지의 술상포구는 한 해 중 가장 바쁜 때인 것이다. 그물을 던지고 컴컴한 바다를 바라보던 아주머니는 금오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전어를 부른다고 했다. 금오산의 마애불을 찾아본 적이 있던 터라, 반가운 이름에 귀가 쫑긋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었다. 나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리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는 한 부부의 삶에 수긍이 된 것이다.
선장님은 그물을 넣은 지 십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끌어올렸다. 유속이 세어 자칫하면 그물이 엉킬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한 번 넣은 그물은 금세 걷어 올렸다. 불행히도 전어는 잡히지 않았다. 인간에게는 바다 속을 투영할 능력이 없다. 다만 오랜 경험으로 익힌 감각과 물의 흐름, 유속의 세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실패도 비일비재했다. 부부는 또다시 그물을 올렸지만 여전히 전어를 볼 수는 없었다. 흐물흐물한 미역덩어리가 가끔가다 올라올 뿐이었다. 산등으로 어슴푸레한 빛이 새 나왔다. 부부는 몇 번이고 그물을 넣었다 뺐다. 나는 제법 허무했지만 부부의 얼굴에는 전혀 아쉬운 기색이 없었다. 그렇게 수차례를 진행하자 오히려 바닷물을 걸러내는 빈 그물, 그 그물의 듬성듬성한 공간이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그것은 내가 전혀 감각하지 못한 것이었기에 의심에서 비롯되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배워야 하고 살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진리 같은 것이라 짐작되었다. 부부는 십 분 전에 던져두었던 그물을, 또다시 빈, 그 그물을 말없이 거두고 있었다. 그날, 만선으로 돌아온 배는 없었다.

익어간다 가을도 전어도
어느 생선이 그렇지 않겠냐 만은 술상의 전어는 버릴 것이 없었다. 전어에 소금을 치고 통째로 젓갈을 만들기도 했고, 내장만 따로 빼어 밤젓이라는 쌉싸름한 음식을 만들어냈다. 전어는 횟감으로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구이였다. 술상 마을의 서낭당 아래에는 큰 좌상이 펼쳐져 있어 어느 때곤 동네 어르신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그 아래, 가을을 부르는 전어의 향이 짙게 배였다.
어촌계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하여 전어를 보내왔다. 계장님이 불판에 연탄을 피우고, 전어를 한 박스 선물했다. 안경을 낀 할머니가 서낭당 바로 앞에 있는 밭에서 고추와 상추를 떼 오고 자전거를 끌고 길을 지나던 할아버지가 어디선가 막걸리를 받아왔다. 앞치마를 두른 새댁이 작년에 담았다며 밤젓과 식은 밥을 내어왔고, 몸빼 바지를 입은 할머니들이 하나 둘 불판 주위로 둘러앉았다. 손주와 통화할 거라며 나에게 영어로 말을 붙이던 할아버지와 술상 전어가 최고라며 자랑을 늘여놓던 또 다른 할아버지, 이젠 씹을 힘이 없지만 끝끝내 내 젓가락을 거부하지 않았던 연로하신 할머니와 그 주변으로 둘러앉아 파리를 쫓아주신 할머니들.
노랗게 익어가는 전어를 보면, 가을도 이렇게 익어가는 가 싶다. 우리의 삶도 익어간다. 익은 것은 색과 향이 짙다. 어쩌면 황혼이야 말로 가장 짙은 언어로 삶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니, 짙은 것은 말이 없다. 그저 짙다. 이제는 전어만 보면 술상 마을의 노을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른다. 침이 고이기도 전에 누군가 이렇게 외치는 것만 같다.
술상을 펼쳐라, 전어가 간다.
[관련 기사]
-느리게, 보다 느리게 걷는 섬 증도
-구럼비처럼 낮게 앉았을 때 보이는 강정 마을의 풍경들
-아바이라는 큰 이름 - 강원도 속초 아바이 마을 포구
-섬으로 가는 길, 당신에게 닿는 길
-대변으로부터 날아라, 멸치 - 부산시 기장군 대변포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1개의 댓글
추천 기사
추천 상품
필자

오성은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
씨네필
문학청년
어쿠스틱 밴드 'Brujimao'의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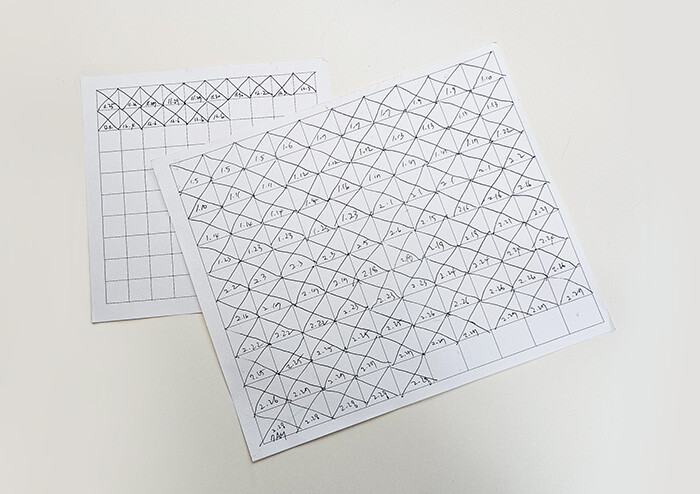
![[큐레이션] 손끝에서 생생하게 읽히는 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25-c94f6761.jpg)
![[큐레이션] 트럼프가 쏘아 올린 관세 전쟁이 궁금하다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13-f020c372.jpg)
![[미술 전시] 2025년 상반기 기대되는 전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31-26f67f3f.jpg)




kso321
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