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에 있었던 일이다. 지하철을 타고 틀니 등 치과 용품을 수도권 병원으로 배달하는 오모(70)씨가 오후 5시쯤 혼잡한 지하철 내부에서 몸이 부딪친 뒤 사과하지 않는다며 77세 김모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이다. 고령의 김씨는 쓰러지면서 왼쪽 넓적다리뼈가 부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8일 만에 숨지고 말았다. 밀려드는 승객으로 몸이 서로 부딪쳤을 뿐인데, 사람 하나가 제 명(命)에 못살고 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경우 속칭 ‘안 봐도 비디오’다. 한쪽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다른 한쪽도 덩달아 목청을 높이고, 한쪽이 “너 대체 몇 살이야?” 외치고, 다른 한쪽은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맞받아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출근길 자동차 접촉사고 때 5분만 지나면 꼭 듣게 되는 대사가 있다. “어따 대고 반말이야?”
박경리의 ‘토지’에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허허허, 입맛없게 그놈의 존대 그만둘 수 없나”, “존대하고 뺨 맞는 일 없다 하더라”. 예의를 다하면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문제는 반말 잘못 쓰다간 봉변은 물론, 심지어 목숨마저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유엔 가입국 193개국 가운데 14세(중2)는 15세(중3)에게 존댓말하고, 15세는 14세에게 무작정 반말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한번 들어보시라. 엇비슷해 보이는 중학생들이 모여 서서 한 녀석은 “선배님 그러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굽신거리고, 맞은편 녀석은 “너는 잘해야 한다”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남 얘기일 때는 우스울 뿐이지만, 제 자식이 밖에서 그 꼴을 보인다 생각하면 울화가 치민다. 지금이 어느 땐데.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이 무슨 해괴한 대화법인가.
존칭 표현은 영어를 비롯한 서양어에도 있지만, 말 그대로 어려운 상대에 대한 ‘조심스러움’의 표현일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서양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가장 어려워 하는 점이 존댓말이다. “밥 먹었냐” “식사 하셨나요” “진지 드셨습니까”가 다르니, 미칠 지경일 것이다.
동아시아 3국으로 국한하더라도, 정작 유교를 만들어낸 중국어에는 존댓말이 거의 없다. 영어의 ‘please’에 해당하는 ‘淸’이나 ‘添麻煩(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같이 예의를 갖추는 말이 있긴 하다. 그러나 우리말에서처럼 존댓말과 반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서양언어와 비슷하다. 오랜 기간 동안 동양문화를 선도해왔던 국가임에도 그러하다.
일본어는 겸양어/존경어/정중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경어법이 유난히 발달해 있다. 우리말의 ‘~입니다’ ‘~합니다’에서 쓰는 ‘~ㅂ니다(~데쓰~です)’ 어법이나 ‘~요(~마쓰~ます)’를 붙이는 게 정중어다. 존경어는 낱말 앞에 ‘お’나 ‘ご’를 넣어 말하는 것으로, ‘출발하다’라는 뜻의 ‘出發する’를 ‘ご出發になる’로 바꾸면 ‘출발하시다’가 되는 식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그렇지 일상 생활에서는 대부분 서로 말을 낮춘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반말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시피,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심지어 ‘압존법(壓尊法)’이라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할 때도 있다. 국립국어원 풀이에 따르면 “문장의 주체가 화자(話者)보다는 높지만 청자(聽者)보다는 낮아,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이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어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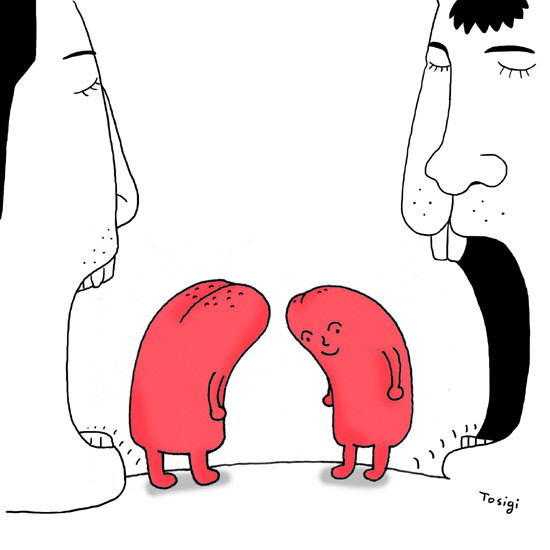
돌아간 박완서 선생도 생전에 말한 바 있다. 집에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아주 젊게 느껴지는 목소리로 “박완서씨 계세요?” 한단다. 요즘 젊은층이 아주 예의가 없다는 취지로 한 말이지만, 정작 전화를 건 당사자는 그 말이 왜 예의에 벗어나는 지 아마 전혀 모를 것이다. 또 논리적으로는 결례가 아니다. “어이, 김씨”의 용례와 달리 ‘~씨’는 서구 ‘Mr.’의 대응어로서 하대(下待)의 뉘앙스는 있지만 아주 중립적이고 공식적인 호칭인 것이다. 그러나 나이 70이 넘은 노작가의 입장에서는 ‘박완서 선생님’이어야 하지 않냐는 속뜻이었을 것이다. 세상의 여러 현상에 대해 대체로 열려 있는 작가조차 이럴 정도이니 이 땅의 갑남을녀(甲男乙女)에게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가 주는 어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의 간극만큼이나 넓다.
나는 이 자리에서 존댓법의 연원에 대해 논할 마음은 전혀 없다. 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대비에도 관심 없다. 나는 오로지 그 과잉스런 존댓말의 폐해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 하나를 들어보겠다.
얼마전 총선 정국에서 소설가 이외수씨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뒤 네티즌의 ‘몰매’를 맞은 적이 있다. 그는 글에서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중에서도 낙후된 접경지역, 철원, 인제, 양구, 화천을 이끌어 갈 새누리당 정치인 한기호 후보를 응원합니다.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습니다. 호탕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라고 했다. 앞서 이씨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공개선언했고, 이전에도 한미 FTA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글 등을 여러 차례 올려 유명 인사 가운데 대표적인 ‘야권 지지자’로 꼽힌다.
그러나 그 글 하나로 난리가 나자 이씨는 “자기네 정당 후보 여러 명 추천해 드렸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다른 정당 후보 딱 한 명 추천해 드리니까 불쾌감 드러내시는 분들. 저는 분명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약이나 활동 검토한 다음 제 소신대로 소개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외수씨는 평생 글로 먹고 산 사람이다. 팔로어가 132만명에 달해 ‘트위터 대통령(트통령)’으로 불리는 파워 트위트리안이기도 하다. 글을 제대로 써야 한다는 얘기다. 그가 두번째로 올린 글 “자기네 정당 후보 여러 명 추천해 드렸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를 보자. ‘자기네’라는 우리말은 대상에 대해 호의적일 때 쓰는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동사는 ‘추천해 드렸는데’와 ‘가만히 계시다가’이다. ‘추천했는데’와 ‘가만히 있다가’라는 표현이 훨씬 자연스러운 맥락이다. 그걸 이씨가 몰랐을까. 그랬을 리 없다. 일부러,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좀더 정확히 짚자면 상대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다. 아니면, 비꼬는 표현으로 썼을 것이다. 담임 교사가 자기 반 아이들에게 “더운 날 게임에 정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가” 식으로 말이다. 어느 쪽이든 정공법(正攻法)을 피한, 대중의 관심을 먹고사는 ‘유명인사’ 이외수의 비굴함이 느껴지는 표현이다.
흔히 이 모든 정황을 유교의 잔재(殘滓)로 본다. 600년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21세기 현대 한국인의 골수에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자의 언행과 사상을 후대인들이 정리한 ‘논어’에는 “학생들은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웃어른을 공경하며(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학이-學而> 정도만 있을 뿐이다. 오히려 공자 자신은 “조정에 나아가 하대부와 말씀할 때는 편안하게 하시고, 상대부와 말씀할 때는 공손하게 하셨다. 임금이 계실 때는 불안한 듯 했으나 위엄이 있으셨다” <향당-鄕黨>에서 보듯 아랫사람에게도 예를 갖췄고, 윗사람에게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말의 존댓법을 거부하면 상당히 신선한, 경우에 따라 매우 충격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다. 서정주의 그 유명한 ‘자화상’(1939)의 도입부를 보라.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만약 이 구절을 우리 경어법에 따라 썼다고 가정해보라. “아버님은 종이셨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으셨다.” 요절한 소설가 김소진이 “아버지는 개장수였다”고 말할 때도 “아버지는 개장수셨다”고 써서는 전혀 본래의 맛이 살지 않을 것이다.
‘올드 보이’(2003)로 프랑스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도 우리말의 경어법을 잘 비틀어 성공한 대표적 사례다. ‘친절한 금자씨’가 낳은, 한국영화사에 길이 남을 이영애의 대사 “너나 잘하세요.” 정말 그렇다. “어, 말이 짧네” 운운하는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너나 잘하세요.
한국 청년에게 고한다. 손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반말하지 말라. 교사는 무슨 권리로 학생들에게 반말하는가. 부장은 무슨 권리로 과장에게 반말하는가. 반말과 막말은 한 끗 차이다. “빨리 처리하시오”와 “빨리 좀 해라”는 듣는 입장에선 천양지차다.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 아니다. 육체의 멍은 때가 되면 사라지지만, 언어 폭력이 낳은 심리적 상처는 죽을 때까지 의식 저변에 깔려 전 생애를 지배한다. 아무런 사회적 필연 관계가 없는 완벽한 타인, 제3자에 의한 악플, 그 쓰레기 같은 언어가 남기는 후유증들을 떠올려보시라. 계량화가 불가능해서 그렇지, 한국인 각자가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가 초래하는 ‘심리적/사회적 손실’의 기회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성문법 못지 않게 엄정한 게 관습법이다. 우리네 존댓말은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철옹성 관습법령이다. 그러니 별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 공대(恭待)하자. 노인이 청년에게, 손님이 룸살롱 아가씨에게, 학생주임이 아들뻘 재학생에게, 사장이 신입사원에게, 검사가 피의자에게, 점주(店主)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엇보다 중2가 중1에게 존댓말을 쓰자. 그러면 저절로 진정한 민주사회가 된다.

이이후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거리를 걸으며
우리가 무심결에 범하는 오류와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인습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때의 세상이 좀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디터의 장바구니] 『파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여자에 관하여』 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07-a24e0ec8.jpg)
![[김해인의 만화 절경] 국어국문만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02-ecdb319f.png)


![[리뷰] 한국인과 일본인이 다른 심리학적 이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c/2/4/b/c24b77b962fe042ba63e840937f77195.jpg)



gda223
2012.07.27
책읽는 낭만푸우
2012.06.05
가호
2012.05.31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