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제가 조금 말이 횡설수설하죠? 제 말이 너무 길었죠? 제가 두서 있게 말을 잘 못해요. 말이 꼬였네요. 제가 말을 조금 더듬어요.” 이 모든 문장이 단 두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일산의 작은 책방에서 열다섯 명이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던 밤. 그 자리는 북토크의 탈을 쓴 작은 수다회였다. ‘너의 작업실’ 책방지기 탱은 책방 행사를 열 때면 모두가 발화자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공지하고, 안전한 소통의 장을 준비한다.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두고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탱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만하고 허술한 탱입니다. 우리, 나이나 직업 같은 거 말고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처음엔 어색한 표정을 짓던 사람들이 서서히 입을 뗀다. “안녕하세요. 저는…” 각자의 억양과 리듬이 공간을 채운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할 때, 글쓰기와 일상 속 고민을 나눌 때, 자기 의견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점검하고 의심하며 지레 사과하곤 했다. 익숙한 모습이었다. 나도 강연에서 말이 조금이라도 꼬이거나 빨라지거나 더듬으면 당황해서 사과하곤 했다. “제가 말이 꼬였죠? 너무 두서가 없었죠? 죄송해요.” 말을 하다 보면 더듬거나 다른 방향으로 샐 수도 있는데, 주눅 들어 사과하는 습관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
초등학교 국어 시간이 떠오른다. 선명한 팔자 주름이 눈에 띄었던 담임선생님은 국어 시간에 지문을 읽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틀리지 않고 읽기’ 미션을 주었다. 지면을 쭉 읽다가 한 글자라도 더듬거나 말이 너무 빨라지면 커트하는 방식이었다. “자, 넌 틀렸으니까 옆에 있는 애가 읽어.” 그럼 옆에 앉은 친구가 틀린 부분 다음부터 열심히 문장을 읽는다. 한 문장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틀려버리면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한 페이지 넘는 지문을 유창하게 읽는 친구에게 선생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놀림 받지 않으려고, 칭찬받고 싶어서 나는 밤마다 다음 지면을 미리 읽었다. 내가 처음으로 한 페이지 넘게 틀리지 않고 읽은 날, 선생님은 말했다. “승은이 너는 커서 나중에 아나운서 해도 되겠다. 말을 잘하네.” 그때 나는 정말 기뻤지만, 그날을 뺀 대부분의 시간은 출발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마음 졸였다. 말을 더듬거나, 말이 빠르거나 느린 친구들은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한 채 얼굴을 붉히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서늘해진다.
넷플릭스에서 〈브리저튼〉 시리즈를 봤을 때, 나는 로맨스 서사보다 남자 주인공의 어린 시절에 눈길이 갔다. 어린 시절 그는 말을 더듬었고, 그의 아버지는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수치스러운 놈이야. 내 아들이 아니야”라며 악담을 퍼붓는다. 소년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를 악물고 말 더듬는 걸 고친다. 그때서야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인정하지만, 아들은 이미 피투성이가 된 상태다. 그 극복 서사를 보면서도 나는 같은 종류의 서늘함을 느꼈다.
책방의 작은 수다회에서 횡설수설해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던 사람 중에는 마음이 있었다. 마지막 소감을 나눌 때, 마음이 책 한 권을 추천했다. “들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조금 더듬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이 책방에도 있는 그림책인데요. 말 더듬는 아이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 책이 정말 좋았어요.” 북토크가 끝난 뒤 나는 마음이 소개한 책을 품에 안고 집에 돌아왔다. 그림책의 이름은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표지에는 평온한 표정의 한 아이가 있다. 아이는 강의 중심에서 물살을 느끼고 있다.
아이의 아침은 돌멩이처럼 고요하고 새처럼 소란하게 시작된다. 말할 수 없어서 고요하고, 내면에서 울리는 낱말 때문에 소란하다. “소나무의 스-가 입안에 뿌리를 내리며 뒤엉켜 버려요. 까마귀의 끄-가 목구멍 안쪽에 딱 달라붙어요. 나는 그저 웅얼거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는 학교에 가면 꼭 맨 뒷자리에 앉는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길 바라면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질문하면 반 친구들이 아이를 본다. 친구들은 자기처럼 말하지 못하는 아이의 말을 구경한다. 붉어지는 얼굴과 겁먹는 얼굴을 구경한다. 선생님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 말하자고 할 때도 아이는 입을 뗄 수 없다. 오로지 집에 가고 싶다고만 생각한다.
학교가 끝나고 슬픈 얼굴이 된 아이를 보고 아빠는 함께 강가로 가자고 한다. 강물 앞에서 아빠는 아이에게 말한다.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아이는 강물을 본다. 굽이치고, 물거품을 일으키고, 소용돌이치고, 부딪치는 강물을 본다. 그 뒤로 울고 싶을 때마다, 말하기 두려울 때마다 생각한다. “그 빠른 물살 너머의 잔잔한 강물도 떠올라요. 그곳에서는 물결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반짝거려요. 내 입도 그렇게 움직여요. 나는 그렇게 말해요. 강물도 더듬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요.” 아이는 학교에 가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그 강가를 소개하겠다고 다짐한다.
책을 읽으며,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사과하던 많은 이들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를 떠올렸다. 우리는 모두 강물처럼 말하는걸. 때론 바위에 부딪히고 때론 빠르게 물결치며 때론 잔잔하게. 어떤 때는 고여 있는 채로.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사과하려는 마음들에게 나는 책에서 배운 말을 선물하고 싶다. 당신은 강물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강물처럼 말해요.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출판사 | 책읽는곰

홍승은(작가)
페미니즘 에세이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 글쓰기 에세이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등을 썼다. 함께 해방될 수 없다면 내 자유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 안다.








![[홍승은의 무해한 말들] 말 잘 듣지 않을 권리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f/b/0/6/fb06f4f814800ec9eb1e5dfe829b3138.jpg)
![[홍승은의 무해한 말들] 숨지 않고 말하기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1/2/e/9/12e96ee8bf9c663ab8f937d280889782.jpg)
![[예스24 가정살림 MD 김현주] 미안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e/3/f/0/e3f0942cfa3f7681d72301c20ec6d31c.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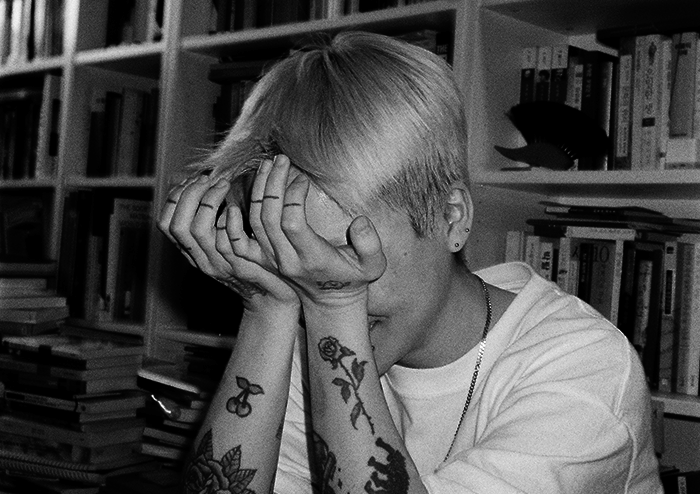
![[Read with me] 김나영 “책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9-f468d247.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대세는 문학, 독서 바람이 분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8/0/c/3/80c31dc718168e3ea14dedae6644324f.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