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아무리 즐거운 대화도 어느 순간에는 끝나고, 이야기를 정리하기 전에 어색함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다. 마지막까지 작별인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인사를 하고 이모티콘을 보내고 대화를 끝내지 못하는 순간.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종종 '예의 바른 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럴 때 먼저 정리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차마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사람이라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연인간의 관계가 하나의 긴 대화창과 같다면,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다. 관계가 끝을 향해 가는 중에 서로에 대한 오해와 미련과 미움들이 정리되어 정념의 값이 0으로 수렴한다면 좋으련만, 많은 경우 헤어짐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비해 오가는 날카로운 한마디 한마디는 감정의 진폭을 더 크게 만들 뿐이다. 상대방은 곧 나의 세계에서 사라질 것이고. 그럴 때 ‘착한 사람’ 보다 ‘대화를 끝내는 사람’이 되기는 더 어렵다. 『세계의 호수』 는 이렇게 ‘착한 사람’ 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대면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영화감독인 주인공 윤기는 오스트리아 대학의 초청을 받아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 빈에 방문한다. 하지만 워크숍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근의 장크트갈렌에 살고 있는 옛 연인 무주에게 메일을 보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메일을 보낸 것이 실수였다고 미안하다는 메일을 재차 보내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무주에게서 온 답장을 받고 윤기는 장크트갈렌으로 향한다. 현지에서 통역을 맡았던 민영씨는 장크트갈렌에 가게 되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세계의 호수’ 에 들러보라고 권하며 아직까지도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윤기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건넨다.
“잘하셨어요, 여행지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용기는 항상 옳아요, 하지만 그 용기는 한번만 내세요. 그곳에서는 뭔가를 결정하면 안돼요.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지.”
“여행지의 사건을 삶으로 끌고 오지 마세요, 복잡해진답니다.”
“알죠, 누구보다 잘 알죠. 지금도 수습 중이거든요.”
무주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윤기는 변해버린 서로의 모습에 어색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해결되지 못한 감정과 헤어짐의 순간들을 다시 직면한다. 아마도 윤기는 ‘더 답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 줄 한마디를 듣기를 바랬을 것이다. 그들의 작별을 이별로 바꾸어 줄.
이 소설의 제목인 ‘세계의 호수’ 는 ‘세 개의 호수’에서 비롯되었다. 흥미롭게도 소설이 담긴 그릇 또한 ‘세 개의 호수’ 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종이책과 오디오북으로 출간되었고, 이제 전자책으로도 서비스가 된다. 200페이지 내외의 중단편이라 할 만한 분량은 단행본 치고는 적은 편이지만 두 시간 정도의 낭독으로 들을 때는 장편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종이책의 편집은 작은 판형에 여유로운 글자 배치로 전자책을 읽었을 때의 느낌과 비슷하다. 어떤 방법으로 이 소설을 접하더라도 당신은 이 투명하고 깊은 호숫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 속에 자신을 비추며 들어보기를 권하는 노래가 직접 가사를 쓴 곡인 것은 왠지 조금 부끄럽지만, 윤덕원 1집의 「비겁맨」을 추천한다. 이별 앞의 자기 연민이 갖는 비겁함을 담은 가사를 쓰면서 생각했던 느낌이나 감정들이 주인공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얼굴이 달아오르기도 했다.
‘이미 다 포기하고 있으면서도 마냥 기다릴 것처럼 굴고 있구나’
‘이제는 돌아설 핑계가 필요한데, 먼저 돌아서는 네가 없네 이 곳엔’
‘내가 나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해주길 바랬지’
‘모든 말을 삼킨 채 돌아서는 사람을, 잔인하다 말하던 비겁한 사람’
같은 가사들은 정말이지 윤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2014년 작품이니까 소설보다 먼저 나왔음에도!)
작가는 작가 노트에서 ‘헤어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없는 세계에서 작은 책상에 앉아 혼자만 펼칠 수 있는 책 한권을 갖는 일이다.’ 라는 말을 남겨놓았다. 소설의 결말부가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 일을 현실에서 거의 기대할 수도 없고 결국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것은 아닐까. 이후의 어떤 되새김도 그들의 현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주어서는 안된다). 헤어짐의 순간과 그들의 삶은 그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비겁했던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자기 연민과 미련을 삼키는 일뿐이다. 당신 앞에서 돌아섰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추천기사
세계의 호수
출판사 | arte(아르테)

윤덕원
뮤지션. 인디계의 국민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1대 리더. 브로콜리너마저의 모든 곡과 가사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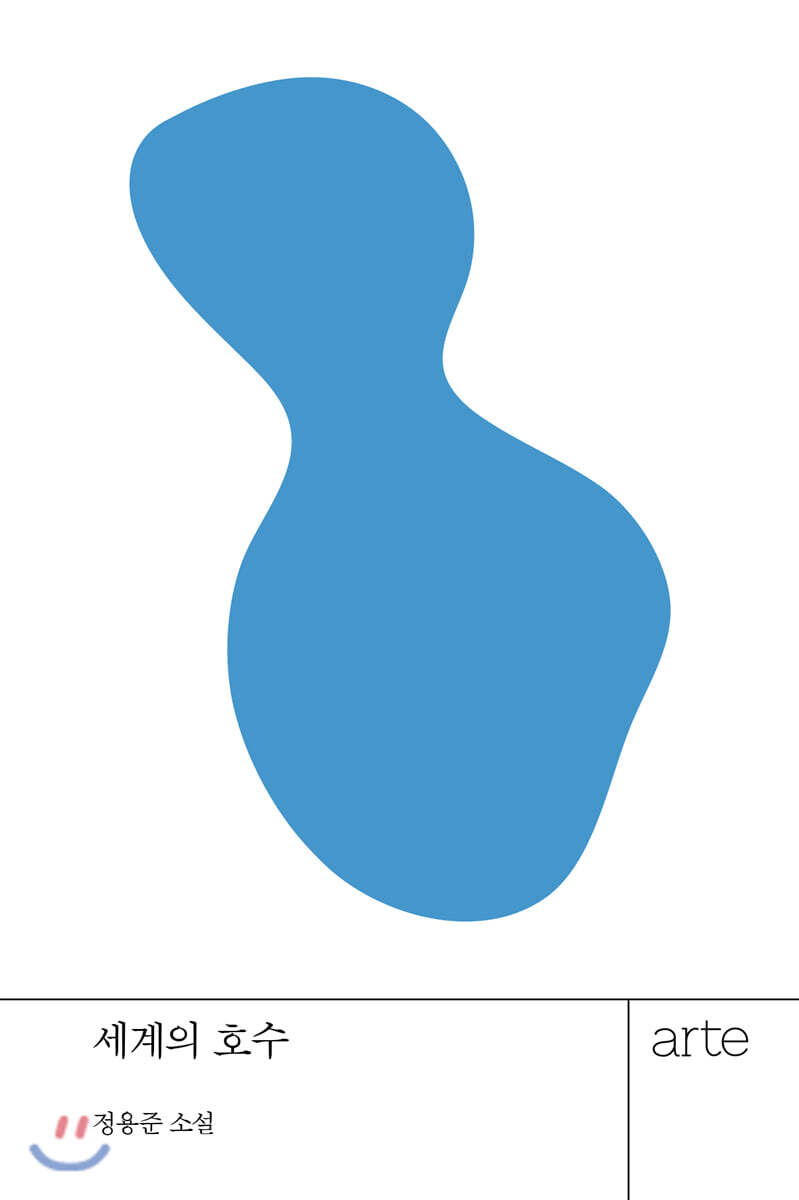





![[인터뷰] 김민정 시인 “오롯이 시인으로만 한 권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꿈”](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23-d6e91747.jpg)
![[리뷰] 당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07-6a50262d.jpg)
![[큐레이션] 눅눅한 계절을 산뜻하게, Chill한 시집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1-51c853bf.jpg)
![[젊은 작가 특집] 김홍 “언젠가 청자에 대해 써보고 싶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5cfc5a28.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