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소설집 두 권을 동시에 내고 인터뷰를 여러 건 했다. 연작소설 『산 자들』 이 좀 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책이라(그런데 함께 출간한 SF 중단편집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 도 재미있습니다), 사흘 동안 민음사로 출근해 편집부 옆 작은 회의실에서 기자들을 만났다. 사진은 민음사 회의실에서도 찍고 계단에서도 찍고 사무실에서도 찍고 옥상에서도 찍었다.
소설을 쓰고 인터뷰를 하면 ‘이 책은 주제가 뭐냐’는 질문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모든 기자들이 묻는다.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요?” 또는 이런 식으로도 묻는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길 바라나요?” 더 돌려 묻는 사람도 있다.
“이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혹은 “어떤 독자가 이 작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많이 틀린 걸까요?”
책을 쓰고 처음 “주제가 뭐냐?” 는 질문을 받았던 건 연작소설 『뤼미에르 피플』 출간 직전이었다.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은 담당 편집자였다. 그 이는 이렇게 물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책이 하려는 얘기가 뭘까요? 짧게.” 그때는 좀 어이가 없었다. ‘아니, 그걸 이제 와서 물으면 어떻게 하나? 여태까지 그러면 이 책 주제도 모르고 편집을 했단 말인가’ 싶어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편집자는 그때 보도자료를 쓰려는 참이었던 것 같다. ‘이 책은 어떤 책’이라는 한 줄짜리 설명이 필요했고, 작가의 의견이 중요했다. 내 등단작인 『표백』은 문학상 당선작이라 나를 대신해 심사위원들이 ‘이 책은 어떤 책’이라는 말을 많이 해주었다. 『뤼미에르 피플』 은 그 뒤로 처음 낸 소설이었다.
한때 나는 작가가 그런 질문에 답하면 안 된다고 믿었다. 작가의 임무는 책 발간으로 끝나는 것이며, 작품의 해석은 독자의 몫이라는 생각이었다.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작가가 살아 있는 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작품 주제가 뭐냐고 묻는다. 움베르토 에코였나, 소설가는 소설을 쓰고 바로 죽어 버리는 게 독자를 위해서는 제일 좋다는 말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나는 그런 질문을 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게 됐다. 우선 독자들과 직접 만나는 순간이 있다. 그런 자리에서 받은 질문에 대해 모두 “난 말하지 않겠다, 당신이 직접 해석하라”고 답변하는 게 무성의함을 넘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와 독자, 작품 사이에서 유지되면 좋을 적절한 긴장 관계도 있겠지만, 그와 다른 층위에서, 한 시공간에서 만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예의도 있는 것 아닐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건 간에 말이다.

소설가 장강명_ ⓒAugustine Park
게다가 나 역시 독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출판계와 문학계를 다룬 논픽션을 쓰면서 문학 담당 기자들이 던지는 질문을 다른 소설가들에게 똑같이 하게 됐다. 이 작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나요? 그때 상대방이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썼는데요”라고 말하면 참으로 민망해진다. 신인 작가 중에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솔직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 그냥 쓸 수 있어서 썼다고. 그 외에는 모르겠다고.
어쩌면 소설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직한 답변이 그것인지도 모른다. 소설을 쓸 때 책의 모든 세부 사항을 장악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주제를 글자로 번역하기만 하면 되는 작가가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다들 그저 꾸역꾸역 써가다가 자신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를 더듬더듬 발견하거나, 다 쓰고 나서 ‘아, 내가 이런 걸 쓰고 싶어했구나’ 하고 깨닫거나, 아니면 책을 내고 난 다음에도 자신이 뭘 썼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 것 아닐까.
어쩌면 소설가가 전하려 했던 주제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그가 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수밖에 없는 건지도 모른다. 애초에 ‘소설의 주제를 요약 정리한다’는 행위 자체가 형용 모순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책을 소개하려는 사람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도자료를 쓰는 편집자도, 신간 소개 기사를 쓰는 문화부 기자도, 그들에게 답을 해야 하는 소설가 자신도.
주제가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난감해하는 우리들이 한없이 순진하고 쓸데없이 심각한 걸까? 모터쇼나 가전쇼에서 무대에 오른 이들이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주제가 뭔지를 말하는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다들 이번 신차의 콘셉트는 가족이라고, 이번 새 휴대전화기는 휴머니티와 연결을 주제로 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제아무리 막장 드라마라도 홈페이지에 가보면 기획 의도가 ‘우리 시대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들 주제가 뭐냐는 질문이 뭐가 중요하냐는 분위기다. 주제? 가족이야. 가족 좋잖아.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 마케팅 포인트를 보라고. 이 차는 트렁크가 엄청 넓어! 가족을 위한 세단이라니까. 어쩌면 직업인의 자세는 바로 그래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새 책의 주제를 묻는 질문 앞에서 나는 준비된 답을 내놓는다. 준비를 안 해도 같은 질문에 계속 답하다 보면 저절로 훈련이 된다. 이번에는 정말이지 분명한 주제의식을 지니고 쓴 글들임에도 말하는 동안 ‘음, 왠지 소설가가 주제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될 거 같은데’ 하고 갈등한다. “〈변신〉의 주제는 인간 소외입니다”라고 말하는 카프카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도스토옙스키가 무신론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악령』 을 썼지만 그 책을 읽고 무신론자가 된 나의 독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오늘도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날아온다. ‘○○대학교 ○○과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교양 수업에서 작가님의 『한국이 싫어서』 로 조별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작품 주제를 짧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이 싫어서장강명 저 | 민음사
개인과 사회의 관계?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를 모색한다. 깊이 있는 주제를 장강명 특유의 비판적이면서도 명쾌한 문장과 독자를 끌어당기는 흥미로운 스토리로 표현했다.

장강명(소설가)
기자 출신 소설가. 『한국이 싫어서』,『산 자들』, 『책 한번 써봅시다』 등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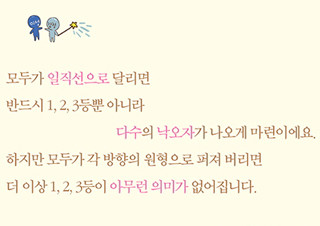




![[서점 직원의 선택] 새해를 함께 시작할 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6-a898fddb.jpg)
![[Do you know? 황석영] 살아있는 한국 현대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4/d/9/8/4d98feddee96d5c0d564cb961340f6b6.jpg)










길이
2021.09.13
앵날
2020.05.08
india1976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