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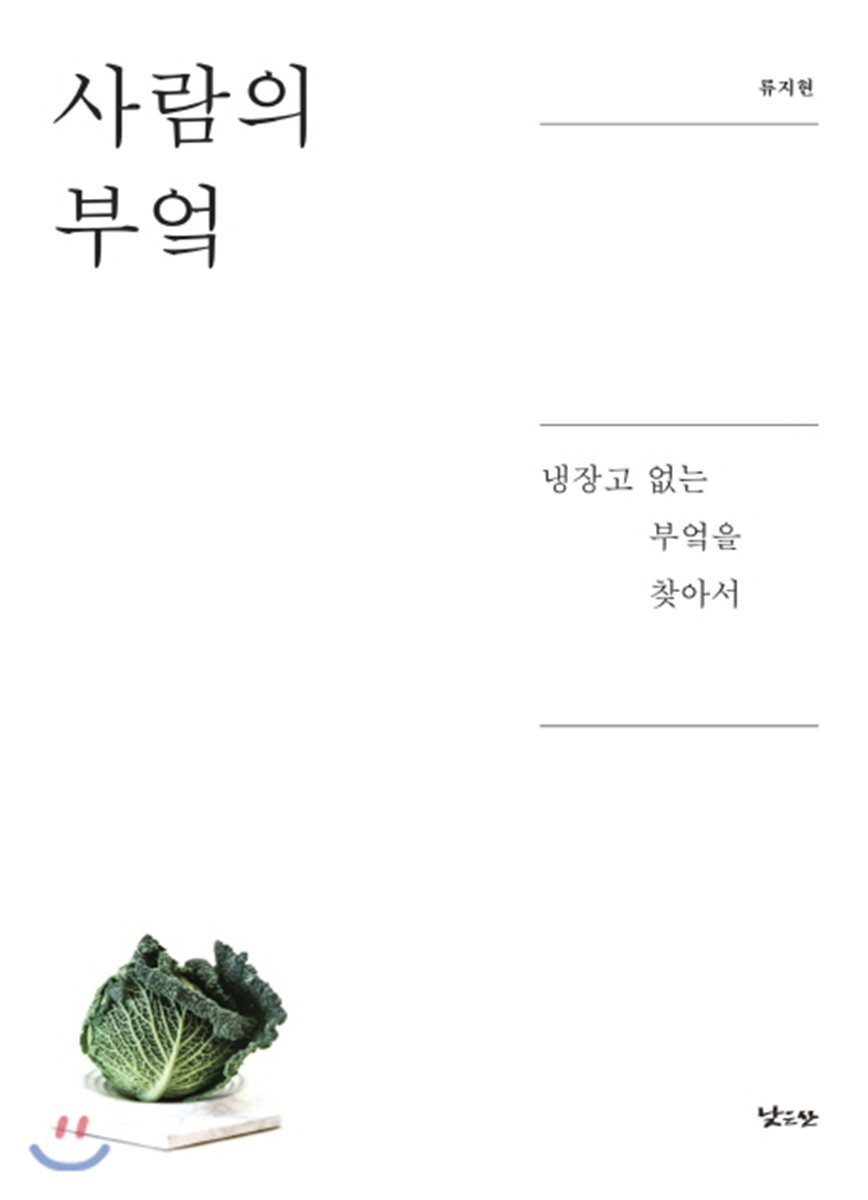 |
 |
10년 넘게 책을 만들어 왔지만, 나는 책이 삶을 변화시킨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혹은 그러므로 책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은 읽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지극히 ‘사적인 출간기’를 요청 받은 만큼 『사람의 부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가 보려 한다.
나는 워킹맘이다. 일, 육아, 살림에 지쳐 외식이 잦은 편이었고, 냉동식품들을 냉장고 가득 채워 놓아야 안심이 되었다. 부엌, 그리고 부엌의 가장 강력한 상징인 냉장고를 새롭게 사유하는 책을 만들면서도 냉장고와 거리를 두는 실천은 별난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다.
좋은 책은 저자의 문장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남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자가 세계 각지 부엌들을 찾아다니느라 원고를 받고 책을 내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렸던 덕인지, 이 책은 가랑비에 옷 젖듯 시나브로 내 삶을 바꿔 놓았다. 수도 없이 저자와 의견을 나누고 원고를 매만지는 사이,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았던 부엌 습관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대형마트에서 신나게 장 봐 온 음식들을 냉장고에 집어넣다가 멈칫했고, 당근을 채소 칸에 넣다가 “아, 얘는 세워 보관하랬는데.” 하며 슬며시 다시 꺼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기도 했다. 감자와 사과는 빛이 차단되면서도 통풍이 잘 되는 뚜껑 달린 바구니에 함께 넣어 보관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작은 주택으로 삶터를 옮기게 되었다. 집 주인이 마당에 심어놓은 과실수들에 열매가 달리고 하나 둘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초여름엔 보리수로 청을 담갔고, 늦가을엔 모과를 따다가 차를 만들었다. 이웃에게 얻은 돼지감자는(그때까지 돼지감자가 어떻게 생긴 줄도 몰랐다.) 마른 프라이팬에 덖어 말렸다. 처음엔 일거리가 늘어난다며 툴툴댔는데 슬슬 재미가 붙었다. 내친김에 냉장고 안에서 무르거나 썩어 있기 일쑤인 생강을 얇게 저며 요리용 생강술을 담갔다. 늘 사 먹던 잼 대신 집에서 아이와 함께 설탕을 적게 넣은 딸기잼을 만들고, 오이를 싼값에 넉넉히 사 피클을 만들어 지인들과 나누었다. 이러한 변화는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저장 음식을 만드는 기쁨과 자신감을 확실하게 선사해주었다. 고백하건대 이 책을 만들기 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을 뿐 더러, 해볼 엄두조차 내보지 않던 일들이다.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냉장고 크기를 반으로 줄인 것이다. 이사할 집 주인이 설치해놓은 빌트인 외문 냉장고를 보는 순간, 가지고 있던 대형 양문 냉장고를 처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수시로 식재료들을 살피고 냉장고를 정리해왔기에 냉장고를 줄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다.
하지만, 막상 이삿날 양문 냉장고에서 외문 냉장고로 음식들을 옮겨 넣다 보니 한숨이 터져 나왔다. 반으로 줄어든 냉장고로 음식들을 이사시키는 일은, 집 평수를 반으로 줄여 이사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냉동고 크기가 반 이상 줄어들어서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음식들은 넣을 수 없었다. 지난가을 친정엄마가 해주신 사골부터 꺼내 먹기 시작했다. 냉장실은 사정이 나은 편이었지만 먹다 남은 음식을 넣을 자리가 없으니 조리한 음식은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먹을 만큼만 사고, 먹을 만큼만 음식을 만들게 됐다.
우리나라처럼 고온다습한 여름을 가진 환경에서 냉장고를 없애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자 류지현 씨가 전하는 메시지도 냉장고를 쓰지 말자는 게 아니다. 태도의 변화다. 이 책이 먹거리에 대한 나의 태도에 변화를 일으켰고, 냉장고를 줄이게 했다. 냉장고가 작아지자 자연스레 습관이 바뀌었다.
하루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지만, 부엌은 일상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그 시간, 그 공간에 관한 성찰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오랜 시간 부엌은 여성의 공간으로 여겨졌고, 여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듯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발견된 지식들 또한 하찮게 취급 받았다. 만약 부엌이 남성의 공간이었다면 어땠을까.
부엌은 다른 어떤 곳보다 창의적이고 재기 넘치는 장소다. 과학적이고도 철학적인 공간이다. 무엇보다 부엌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바로 우리가 먹을 음식이 탄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람의 부엌』은 나에겐 다른 어떤 책보다 유용한 인문서다. 물론 세상엔 교양을 살찌우고 언어에 윤을 내주는 훌륭한 인문서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머리에서 손과 발로 내려가지 않는 독서는 생각은 바꿀지 몰라도 삶을 바꾸진 못한다. 이 책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나의 일상을 바꿨고, 그것이 시작된 자리가 다른 어떤 곳도 아닌 부엌이라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누군가가 이 책은 요약 정리가 안 되더라고 했다. 정말 그렇다. 우리 삶이 일목요연하지 않듯이, 전시용이 아닌 진짜 살림을 하는 부엌이 늘 가지런하고 깔끔할 수는 없듯이, 이 책 또한 그렇다.

강설애 (낮은산 편집자)
만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림을 못 그려서 포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으나 손가락이 짧아 포기, 작가가 되려 했는데 잘 쓰는 인간들 질투만 하다가 포기. 그다지 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거쳐 12년째 책 만드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편집자라는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으니 편집자가 되고 싶었던 적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 일이 가장 즐겁다. 앞으로 또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










![[큐레이션] 음식 덕후의 참고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23-0fe5c71d.png)
![[큐레이션] 노동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05-f1224690.jpg)

![[큐레이션] 요리책도 책이다, 실용적이고 재밌는 레시피북 추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f/d/9/8/fd9893cf8ced7e5d5043247ca6e3021b.png)



해피고럭키
2017.05.12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동안 변화해 간 편집자님의 일상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
동글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