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_ imagetoday
“저... 제가 이틀 전에 보낸 이메일 혹시 보셨나요?”
“참, 깜빡하고 있었네! 지금 확인하고 답 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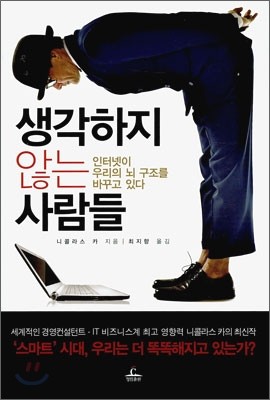 |
 |
정시퇴근의 희망을 안고 쉴 틈 없이 업무를 처리했건만 오늘도 야근 당첨이다. 월말이면 사람들은 이 대리를 ‘앵벌이 버드’라 부른다. 사내 15개 팀에서 이메일로 보내오는 자료를 취합해 정기 보고서를 만드는데, 회신율이 낮아 ‘답 주십사’ 재촉하다보니 생긴 별명이다. 세계적 IT미래학자인 니콜라스 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직장인들은 한 시간 동안 수십 번 메일함을 열어보기도 하는데, 그런 행동은 사고를 분산시키고 기억력을 약화시키며 긴장한 상태로 안절부절 못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업무 도중 도착하는 이메일에 ‘나중에 답해야지’ 미루다 깜빡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메일 보내는 입장에서는 ‘잘 받았다, 언제까지 회신 주겠다’ 정도만이라도 답을 받으면 고마운 일이다. 회신이 없으면 전송은 제대로 된 건지 상대가 읽어본 것인지 답답해지기 시작한다. 빚쟁이처럼 매번 회신을 독촉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제때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왜 답을 해야 하는지
수신인란은 늘 가볍게 하라. 수신인이 많을수록 회신의 의무도 n분의 1로 쪼개지고 서로들 ‘누군가는 답을 하겠지’ 미뤄버린다. 같은 내용을 동시에 여러 명에게 보내면 시간은 절약될지 몰라도 답변의 퀄리티나 속도는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빠른 회신이 필요할수록 누가 읽고 답을 줘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자. 어쩔 수없이 여러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면 수신인란에는 한 명만 남겨 의무감을 몰아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참조란에 넣으면 된다. 습관적으로 회신이 늦을 경우 좀 치사하더라도 상사를 참조에 넣고 제목에서부터 ‘정 대리님, 자료 검토 후 회신 요청드립니다’ 상대를 지목하면 효과적이다.
‘마감 안에 회신 주시면 보고서 초안을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답이 없으면 제 제안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때 회신하면 뭐가 유리한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 힌트를 주면 상대의 머리 속에는 빨간 불이 켜질 것이다.
상대는 뭘 해야 할 지
상대가 언제 어떻게 회신하면 될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써보면 어떨까. 단순한 정보 공유성 메일이라면 ‘검토 후 피드백이나 추가 궁금한 내용을 회신 달라’고 쓰면 되고, 의사결정 사안이라면 ‘언제까지 어떤 결정을 내려주면 나는 이러이러하게 실행해 당신에게 다시 알리겠다’라 알리면 된다. 회의 참여 여부를 묻는 것인지, 특정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지 이메일을 쓴 의도가 앞의 몇 줄만으로도 확실하게 파악된다면 상대도 회신 버튼을 누르기 훨씬 쉬워질 것이다. 제때 답이 없다면 수신인은 지금 ‘그래서 나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지?’ 갸우뚱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답하기 쉽게끔 쓰자
이메일은 결국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게끔 설득하는 행위이다. 그 행동은 하기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수십 장의 파워포인트 파일을 아무 요약 없이 ‘참고하시라’며 던져놓거나, 충분한 맥락 설명 없이 본인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경우, 아무리 읽어도 핵심이 뭔지 알 수 없게 두서 없는 장문의 이메일은 ‘기피 1순위’가 된다.
① 부장님, 첨부파일은 우리 팀 업무 보고 자료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장님, 상무님과의 미팅 시 참고하시라고 하반기 업무 계획(첨부파일)을 작성했습니다. 해외 마케팅 실행안과 딜러 관리 계획이 담겼으며, 당장 의사결정을 받아야 할 사안(콘퍼런스 건)은 3~5페이지에 자세히 작성했습니다. 보충해야 할 부분 말씀해주시면 수정해서 오늘 퇴근 전까지 최종본을 만들어놓겠습니다.
당신이 부장이라면 어떤 이메일에 회신하겠는가? 상대의 수고로움을 덜어줘야 회신버튼을 누르는 손놀림도 가벼워진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회신이 오지 않으면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 요청할 수 밖에. 이때, 상대에게 도움 될만한 정보를 들고 접촉하는 것이 좋다. 참고가 될 만한 다른 팀(사람)의 자료, 지난번 회의 때 나온 아이디어, 자신의 과거 경험 같은 것들 말이다. 당신의 정성에 만사 제치고 회신 버튼을 누르게 될 것이다.

김남인(<회사의언어> 저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조선일보에 입사했다. 사회부에서 각종 사건사고를 취재하는 경찰기자, 교육 이슈를 다루는 교육기자로 일했으며 문화부에서는 서평을 쓰며 많은 책과 함께했다. 다른 의미 있는 일을 찾아 2013년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HR Communication을 담당하다 현재 SK 주식회사에서 브랜드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 과장을 시작으로 차장, 부장을 압축적으로 경험했고 그 사이 한 번의 이직까지 겪으며 다양한 장르와 층위의 ‘내부자의 시선’을 장착할 수 있었다. 기자였다면 들을 수 없었던, 급여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우리’가 일하고 관계 맺고 좌절하고 성취하는 진짜 이야기들을 책『회사의 언어』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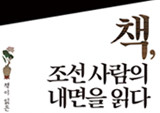

![[인터뷰] 손원평, 젊음의 나라에서 자유로이 탐색하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6-50882152.jpg)
![[구구X리타] 영원이라는 불가능에 도달하기 – 내가 글을 쓰는 이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8-27b9652d.jpg)
![[송섬별 칼럼] · · · - - - · · ·](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4-efbfaa92.png)
![[예스24 취미 발견 프로젝트] 다채롭게 세계를 감각하는 법](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2-e3231ede.jpg)
![[큐레이션] 혼술하며 읽는 시집](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5cb76b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