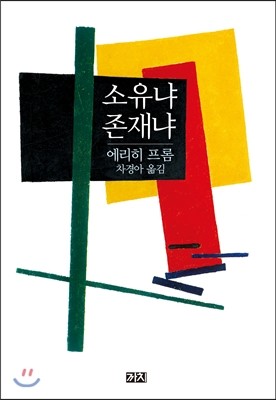
“남편, 오늘 뭐가 바뀌었는지 맞혀 봐.”
요즘 우리 부부는 연애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어제와 오늘 차이점 발견하기 및 못 맞히면 삐치기 혹은 화내기’ 놀이를 결혼 3년차에 접어드는 이제서야 하고 있다. 부부 사이에 불현듯 연애 감정이 샘 솟은 건 아니다. 그랬더라면 정답은 ‘머리 스타일’이나 ‘화장법’ 혹은 ‘옷차림’, 것도 아니면 ‘눈썹 반영구 문신’이나 ‘쌍수 앞트임’ 정도가 되었겠지만 요즘 저 질문에 대한 답은 늘 정해져 있다.
“거실 좀 더 넓어지지 않았니? 오늘 나 또 OO 버렸지롱.”
그렇다. 요즘 아내는 미니멀리즘에 빠져 산다. “영어에서 '최소한도의, 최소의, 극미의'라는 뜻의 '미니멀(minimal)'과 '주의'라는 뜻의 '이즘(ism)'을 결합한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했다.”(출처 : 두산백과사전)고 하는데, 50년이 지난 2010년대 대한민국에서도 저 말이 자주 들린다. 원래는 예술 사조를 일컫는 단어였다고 한다. 요즘은 예술가가 아니라 일반인이 자주 말하는 듯하다. 나는 미니멀리스트라고. 아내도 기회 날 때마다 스스로를 미니멀리스트라고 외치고 다닌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전도한다. 덕분에 지인 여럿도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하고 있다.
미니멀리즘은 다양하게 해석 가능할 텐데, 아내가 말하는 미니멀리즘의 핵심은 ‘버린다’이다. 부언하자면, ‘버리기’에는 남에게 중고로 판다는 행위도 포함된다. 아내와 아내 지인은 카톡방에서 서로 누가 많이 버렸는지 - 혹은 팔았는지 - 를 경쟁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버리기보다는 팔아서 현금 만들기에 더 몰두한다는 인상이 들 때도 있다.
 |
 |
아내는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우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뭐가 됐든, 짐이 줄다 보니 집이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다. 쾌적한 느낌은 좋았으나 제자리에 있는 물건도 잘 못 찾는 나는 손톱깎이나 족집게를 써야 할 때 곤혹스러웠다. 버릴 때마다 아내는 집 구조를 바꾸기 때문이다.
한번은 혹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에서 영향 받은 게 아니냐고 물었다. 왠지 베스트셀러 영향 때문인 걸 인정하는 순간, 나 역시 저성장 사회에서 유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는 대중의 일부였을 뿐이고 미니멀리즘은 마음대로 소비할 수 없는 대다수 서민의 정신승리였어, 하며 아내가 미니멀리즘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웬걸. 그녀는 아니라고 답했다.
 |
 |
책을 읽긴 했으나 본인의 삶은 원래 미니멀리즘을 지향했고, 존경하는 사람은 간디이며,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보다 차라리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 올바른 책이고, 야스퍼스가 명명한 ‘축의 시대’에 나온 탈속적 전통은 자본주의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믿는단다. 고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는 기껏해야 자신의 지향이 옳다는 사실을 입증했을 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하긴, 예외도 있긴 하지만 인간의 삶에 책이 미치는 영향은 찌깨다시지 사시미는 아니기 마련이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아내는 『우리 집엔 아무 것도 없어』와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을 연속으로 읽어나갔다. 나중에 살포시 밝힌 바로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전후로 자신의 삶에 인식론적 단절이 생기긴 했다고.
책에서는 어떻게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라고 조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내는 저만의 방식으로 버려나갔다. 처음부터 과감하게 소파부터 시작했다. 다음은 아일랜드 식탁. 아일랜드 식탁 근처에 놓아둔 의자도 버렸다. 전부 신혼 때 새로 산 가구였다. 다음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 옷과 가방을 버렸다. 자신의 옷만이 아니라 남편 옷, 아이 옷까지 함께 버렸다. 옷 버리는 김에 오래된 이불도 버렸다. 옷과 이불이 사라지니 많은 수납장이 필요가 없어졌다. 수납장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후에도 버리기는 계속되었다. 화장대도 버렸다. 침구 청소기를 버렸고, 전기 포트도 버렸다. 다 읽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은 책도 버리고 듣지 않는 CD도 버렸다. 아이가 잘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 - 내가 보기엔 잘 갖고 노는 듯했음 - 도 버렸다. 지금은 전자레인지를 버리려고 하는 중이다. 아, 여기서 혹시나 안 읽으시겠지만 양가 어머니 아버지가 보실까 봐 덧붙이자면, 버리기보다는 주로 팔았으니 살림 헤픈 부부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
 |
아내가 그렇게 버리고 버리다 보니 남편도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법.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겠어, 불필요한 소비로 지구를 괴롭히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야, 소유하는 행복보다는 소유에서 자유로워지는 즐거움이 더 큰 법이야, 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아내 눈치가 보였다. 이 분위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까지 버릴 기세였으니까.
집안을 둘러 봤다. 아기에게 주려고 산 귀여운 카메라인 펜탁스 Q10을 처분했다. 휴전선 근처에 가서 두루미 찍어보려고 산 시그마 150-500mm 초망원 렌즈, 앞으로도 두루미 대신 비둘기만 찍을 듯해서 팔았다. 다시 보지 않을 법한 책과 CD는 기증했다. 그밖에 안경, 청첩장, 이런 잡동사니를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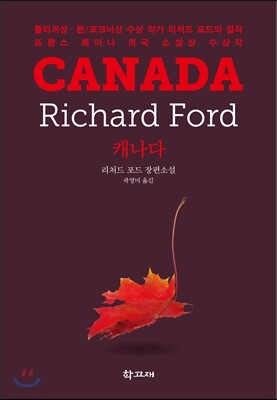 |
 |
그러던 어느 주말. 3인 가족 중 누군가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리처드 포드가 쓴 『캐나다』라는 소설을 읽고 있었다. 부모님이 은행을 털다 교도소로 잡혀 간 뒤, 그들의 아들인 주인공은 캐나다로 넘어간다. 그곳에서 의도하지 않게 살인에 연루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굉장히 잘 읽히는 소설인지라 평소처럼 메추리 알을 낳으려던 그는 예상하지 못하게 큰 알을 낳고 말았다. 박혁거세와 주몽이 동시에 들어가기에도 넉넉한 크기였다. 물을 내릴 때마다 변기 안 물은 범람하는 황허를 닮아갔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이다. 절대적 안정. 그는 당황하지 않고 외친다.
“이유는 묻지 말고 베란다에 있는 뚫어뻥을 갖고 와 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문은 열지 마시고 문 앞에 뚫어뻥을 놔두고 가시면 됩니다.”
“뚫어뻥? 버렸사옵니다만.”
여기서 박혁거세와 주몽을 동시에 낳은 그와 뚫어뻥을 버린 그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사회적 위신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어쩌면 만 2세를 갓 넘은 여아일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말하자면 변기 막혔을 때는 뚫어뻥이 아니라 ‘관통기’가 즉빵이다. 철물점 가서 ‘관통기’ 주세요, 하면 된다.
[추천 기사]
- 디즈니, 보여주고 싶은 세계
- 나의 첫 사회생활 보너스, 중식
- 여러분의 글씨는 안녕하신가요?
- 추천사, 진심이지요?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손민규(인문 PD)
티끌 모아 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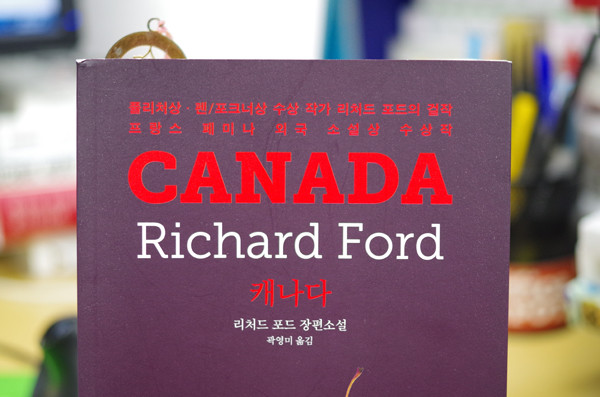
![[더뮤지컬] <위키드> 글린다, 변화와 성장의 이름](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14-cd1dcc0b.jpg)
![[큐레이션] 독주회 맨 앞줄에 앉은 기분을 선사하는 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10-a343a9af.png)

![[비움을 시작합니다] 정서적 ‘비움’을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②](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9-7789ced1.jpg)










평범남
2016.03.22
만2세를 갓넘긴 여아가 그것을 버렷을지도 모르죠 ㅎㅎ
우주시민
201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