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예스>에서 매주 금요일, ‘내일 뭐 읽지?’를 연재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책을 ‘쪼끔’ 더 좋아하는 3명이 매주, 책을 1권씩 추천합니다. 매우 사적인 책 추천이지만, 정말 좋은 책, 재밌는 책, 정말 읽으려고 하는 책만 선별해 소개합니다. 엄숙주의를 싫어하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추천하지만, 닉네임을 걸고 약속 드립니다. 나만 읽긴 아까운 책이라고!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만 고민하지 말고, 때로는 ‘내일 뭐 읽지?’ 생각해보는 건, 어떤가요?

서울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조지 콘도의 ‘파란 드레스를 입은 소녀'
 |
정의를 부탁해
권석천 저 | 동아시아
읽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다. 주변에서 하도 책 칭찬을 많이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슬쩍, "뭐 나까지 관심을 가져야겠어?"하는 반골 기질이 발동한다. (내가 눈길을 줘야 하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 하는) 그러나 아직 베스트셀러 진입은 안 하고 있으니, 숟가락을 하나 슬쩍 얹어 본다. <중앙일보>를 열심히 보진 않지만 간혹 누군가의 공유를 통해 읽었던 칼럼 '권석천의 시시각각'. 25년차 기자가 바라본 사건, 세상에 대한 글이다. 단행본으로 묶여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심 '역시, 어느 출판사가 잡았대?' 반가웠다. 하지만 제목이 『정의를 부탁해』라니. 과하지 않은가? 싶었다. 하나, 아래의 글을 읽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다. 이기는 제 정의다.' 이 지랄 같은 상식을 깨는 건 슈퍼 히어로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같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어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우린 결국 서로에게 정의를 부탁해야 하는 존재이다." 손석희 앵커와 장강명 작가가 이 책의 추천사를 썼다. 손석희는 "내가 팬인 거의 유일한 글쟁이"라고 했고, 장강명은 "권 선배의 글을 흠모한다"고 했다. 나는 권석천 기자를 모르지만 이들의 말에 신뢰가 간다. 책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보인다. "대의와 명분도 중요하지만 그 거대한 수레바퀴에 깔려 신음하는 이들의 아픔까지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그의 뜻이. (꾸러기)
 |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니체 저/김정현 역 | 책세상 | 원제 : Jenseits von Gut und Ba''se.Zur Genealogie der Moral 1886-1887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말로 널리 알려진 사상가다. 그는 전통적인 기독교 이념, 이성에 기반을 둔 계몽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 모두에 반대하며 자신만의 정의를 찾으려 했던 사람이다. 니체의 저작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저서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인데, 그래서인지 이 작품으로 니체를 처음 읽는 독자가 많다. 하지만 '차라투스트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주제가 명확하고 직설적인 문장으로 쓴 『도덕의 계보』가 니체에게 다가가는 데 편하다. 직설적인 만큼, 니체 특유의 독설도 건재하다. 분량도 그리 많지 않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이 책은 선과 악, 우와 열, 죄, 금욕주의 등을 다루면서 니체는 자기 희생 등의 금욕주의적 가치보다 욕구 실현을 위한 용맹함, 강함 등 희랍적 가치를 옹호한다. 금욕주의가 기독교만이 아니라 근대 이전의 불교, 유교 심지어 그리스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니체는 야스퍼스가 명명한 '축의 시대'에 나온 가치 일반을 부정한다 할 수 있다. 즉, 니체가 지닌 문제 의식은 꽤나 보편적인 주제다. 흥미로운 점은, 21세기 지금 자본주의는 욕구를 너무나 긍정하는 나머지 니체가 공격했던 금욕주의 전통이 주류가 아니라 변방으로 밀렸다는 사실일 테다. (드미트리)
 |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밀턴 마이어 저 | 갈라파고스
나는 기본적으로 성선설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인복이 많아 주위 사람들이 모두 선하고 맑은 탓도 있겠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내심 믿고 싶었다. 내가 사랑하는 책, 내가 사랑하는 영화 등 내가 사랑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었으니 더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기록된 역사를 보면 '선善'은 개뿔이란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 정의라는 존재에 물음을 수백 번 던져도 모자라다. 모든 역사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다. 그리고 그 나약함이 낳는 건 결국 '악惡'이다. 가끔씩 인간사를 악인이 이끄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역사의 기록은 잔혹하다. 그러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선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를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동조와 협력이 만들어 낸 나치의 살벌한 풍경을 엿볼 수 있다. 처음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공격했을 때도, 사회주의자를 탄압했을 때도, 유대인을 공격했을 때도 대부분의 평범한 독일인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은 그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나치 치하 아래에서 결국 평범한 독일인들마저도 '너무 늦은 다음'을 경험하게 된다. 명백한 독재 공포 정치 아래에서 그들은 전혀 자유롭지 않았다. 자유롭다고 착각했을 뿐. 어쩌면 2015년 대한민국의 우리도 별다르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폭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나친 냉소적인 이성은 계몽된 허위의식의 역설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아 참! 이 책을 읽을 때, 크리스토퍼 R.브라우닝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 제바스티안 하프너의 『어느 독일인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 더욱 좋다. (땡감)
[추천 기사]
- 공부하기 싫다, 내일 뭐 읽지?
- 회사 그만 두고 싶은데, 내일 뭐 읽지?
- 엄마 생각난다, 내일 뭐 읽지?
- 나도 존중 받고 싶다, 내일 뭐 읽지?

채널예스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엄지혜
eumji0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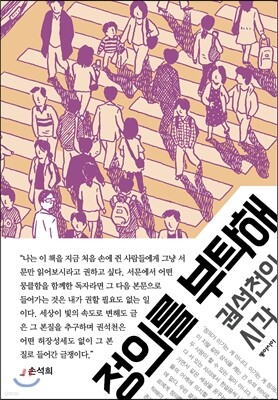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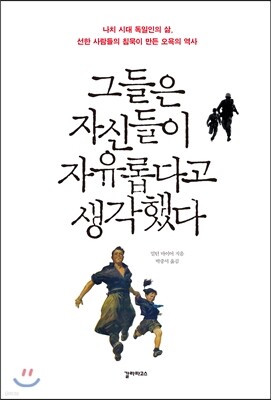
![[김미래의 만화절경] 어제 뭐 먹었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27-5031a641.png)
![[젊은 작가 특집] 청예 “재능이 있다는 말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145281b3.jpg)
![[김승일의 시 수업] 마지막 문장 슬프게 하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14-4fe25cbb.png)
![[Read with me] 더보이즈 주연 “성장하고 싶을 때 책을 읽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19-0fe5295b.jpg)
![[큐레이션] 노동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05-f1224690.jpg)







동공
2015.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