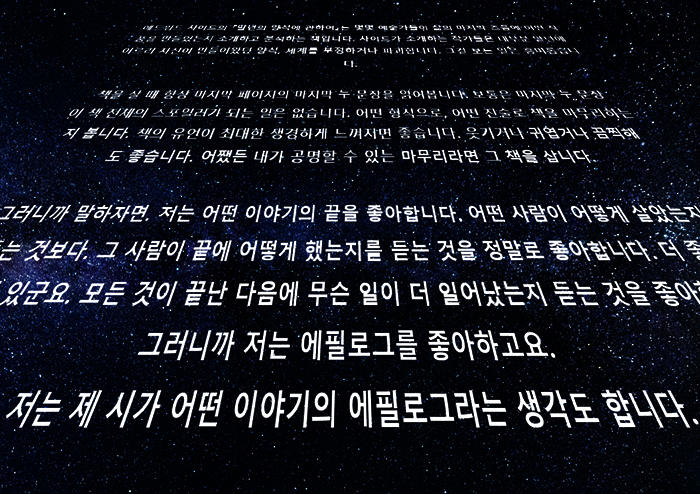
시 합평을 할 때는 항상 써 온 시를 낭독해달라고 부탁한다. 낭독이 끝나면 무조건 질문 하나를 한다. 쓴 시가 만족스러운가요? 만족스럽다면 무엇이 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무엇이 만족스럽지 않은가요? 어제도 물어봤다.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잘 드러난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불만족스러운 건…… 좀 더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 있잖아요. 친구랑 재밌게 대화를 했는데, 이제 할 말이 더 남아 있지 않은데도 대화를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멀뚱멀뚱 어색하게 앉아 있어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답변이었다.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감정이 어느 부분이나 어떤 형식을 통해 잘 드러났는지를 물어보면서 학생을 괴롭히긴 했지만…… 어쨌든 대화가 끝났는데도 대화를 더 나누고 싶은 기분. 나 역시 그 기분 때문에 계속 시를 쓰는지도 모르겠다. 이번에 소개하려고 하는 수업은 학생들에게 바로 그 기분 위에서 출발하자고 꼬시기 위해 만들었던 수업이다.
*
에필로그로서의 시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는 몇몇 예술가들이 삶의 마지막 즈음에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소개하고 분석하는 책입니다. 사이드가 소개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말년에 이르러 자신이 만들어왔던 양식, 세계를 부정하거나 파괴합니다. 그걸 보는 일은 흥미롭습니다.
책을 살 때 항상 마지막 페이지의 마지막 두 문장을 읽어봅니다. 보통은 마지막 두 문장이 책 전체의 스포일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떤 진술로 책을 마무리하는지 봅니다. 책의 유언이 최대한 생경하게 느껴지면 좋습니다. 웃기거나 귀엽거나 끔찍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내가 공명할 수 있는 마무리라면 그 책을 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어떤 이야기의 끝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이 끝에 어떻게 했는지를 듣는 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군요.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더 일어났는지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필로그를 좋아하고요. 저는 제 시가 어떤 이야기의 에필로그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번 수업에서 우리는 어떤 작가들의 말년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특정 작품들의 에필로그를 들여다봅니다. 직접 다른 사람이 쓴 이야기들의 에필로그를 써봅니다. 그런 다음엔 직접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구상하고(구상만 합니다) 그 이야기의 에필로그만 써봅니다. 그리고 그걸 시라고 우겨봅니다. 신약 성경의 에필로그는 무엇일까요? 예수가 승천하고 카메라는 어디를 응시할까요. 어쩌면 세계의 종말, 요한묵시록이 성경의 에필로그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요한묵시록의 에필로그는?
- 2021년 4월 7일에서 6월 9일까지 진행했던 수업
*
글쓰기를 할 때 우리가 처하는 곤경 중 하나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밑밥을 까는 일이 종종 즐겁지 않다는 것이다. 꼭 창작 과정에서만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다. 고전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자주 겪는 일이 있다. 첫 페이지가 심각하게 지루하다는 것이다. 책을 열면 갑자기 항구의 풍경 묘사가 이어지고, 마을에 있는 언덕과 거기 있는 커다란 느릅나무에 대한 설명이 등장한다. 문장이 지나치게 길기도 하고, 이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짜증이 나기도 한다. 이 부분을 읽어야 다음에 벌어질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적인 오프닝이겠지? 그런데 정말이지, 대가라고 불리는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인데도…… 책의 서두는 종종 문장도 엉망이고, 작가도 쓰기 싫은 부분을 억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피곤하다.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일을 겪는다. 하고 싶은 말이나 구현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어서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쓰고 싶은” 부분이 마지막 연에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 부분을 쓰고 싶어서 쓰기 싫은 부분을 억지로 쓰게 된다는 거다. 게다가 그러다 보면 본론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쓰고 싶은 부분에 당도했을 때. 갑자기 그 부분마저도 쓰기 싫어진다. 이미 쓰는 일이 숙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이디어가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업무를 처리하는 기분으로 시를 쓴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쓸 때 재미가 없었던 시가 만족감을 줄 수 있겠는가? 다소 비약해서 말하자면, 독자는 작가가 글을 쓰는 도중에 느꼈던 것을 감각할 수 있다.
수업 <에필로그로서의 시>는 여기서 제안한다. 쓰고 있는 부분이 지루하면 쓰고 싶은 부분으로 가라. <에필로그로서의 시>는 더 나아간다. 쓰고자 했던 부분도 막상 쓰려고 하면 지루하다. 그러면 쓰고자 했던 부분을 썼다고 쳐라.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다음을 출발선으로 생각하라.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시 쓰기는 종종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야만 가능해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압박 속에 있다. 당신이 죽기 일보 직전의 예술가라고 상상해 보자. 당신은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썼다. 인생에 대한 통찰도 전할 만큼 전했다. 그런데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더 훌륭하고 원숙한 말을 해야만 한다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쓰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 말년의 양식은 평생 해왔던 것의 연장선이 아니라, 평생 해왔던 것이 끝났다고 치는 양식이다. 새롭고 낯설고, 원숙함이나 성숙함과는 거리가 먼, 어쩌면 엉망진창이어서 더 자유로운 생의 형태다.
달랑 에필로그만 쓰고 그걸 독립적인 작품으로 여기는 일에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은 작가의 머릿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치 이솝 우화와 같다. 우화가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이야기 속의 여우나 토끼가 왜 여우여야 하고, 토끼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를 자의성이라고 한다. 현대시는 상징보다는 알레고리를 자주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의성이 강조된다. 만약 이야기의 전제 조건이 설명되지 않고 에필로그만 존재한다면, 독자가 받아들이기에 당연히 생경할 것이다. 기호와 기의 사이의 약속도, 사건의 필연적인 근거나 기준도 정보가 없어서 알아내기 힘들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작가만 아는 것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독려하는 것이 내 일이었다.
어차피 독자는 작가만 아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존재다. 시가 흥미롭기만 하다면. 독자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열심히 해석하려고 할 것이다. 해석에 실패하기도 할 것이다. 해석의 실패까지도 여러분의 작품이다. 에필로그로서의 시는 존재 자체가 탈맥락적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 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쓴 시의 속사정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 시는 원래 자의적이다. 우리는 그 위태로움을 즐겨야 한다. 시인도 결코 완전히 동일시할 수 없는 대상. 그러나 실존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쓰려고 한다.
*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김승일
2009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으로 데뷔. 시집으로 『에듀케이션』, 『여기까지 인용하세요』, 『항상 조금 추운 극장』, 산문집으로 『지옥보다 더 아래』가 있다. 2016년 현대시학 작품상. 2024년 박인환 문학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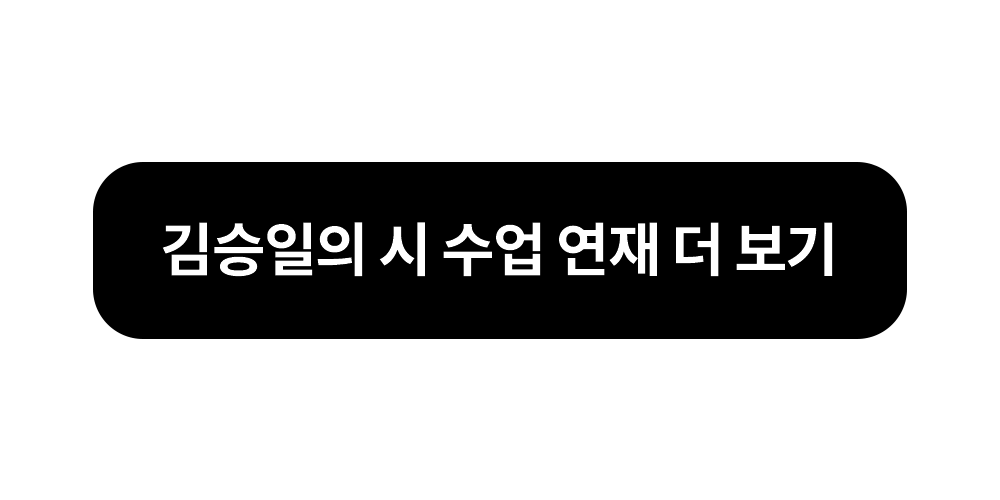
![[김해인의 만화 절경] 슬퍼할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14-c82c4744.jpg)
![[큐레이션] 올록볼록한 책이 흥미로운 이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9-40ddd67d.jpg)
![[하은빈X안담] 응답하기, 그리고 도망가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8-80e77cc6.png)
![[취미 발견 프로젝트] 함께라서 더 행복한 봄의 한복판에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8-2a252fb9.jpg)
![[둘이서] 김사월X이훤 - 세 번째 편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17-fa6889dc.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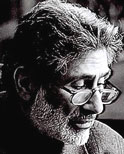


fruit6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