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분에 맞게 적당한 제목을 가진 플레이리스트를 골라 두세 곡을 듣다 보니 갑자기 책을 읽고 싶어진다. 작가가 들려주는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이 이야기에 어울릴 만한 또 다른 음악을 떠올려본다. 다음에 이어서 읽을 책은 플레이리스트 영상에 달린 추천 댓글을 보며 결정한다. 음악이 있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 독서가 있다. |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는 소설가와 찰나의 순간을 언어에 매어두는 시인은 어떤 곡에서 영감을 받을까. 책의 본문 내용을 오롯이 드러낼 표지를 작업하는 북 디자이너는 마감까지 박차를 가하기 위해 어떤 음악을 선곡할까. 여섯 명의 창작자에게 그들이 자신의 일을 끝마치기 위해 도움받은 음악에 대해 물었다.
<북 디자이너 김어진의 선곡>
이슬아 작가의 『날씨와 얼굴』 표지 디자인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다. 두 가지 시안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손으로 그린 책 제목 스케치를 컴퓨터로 옮겨 다시 그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진 조각을 하나씩 뜯어 이어 붙이는 방향이었다. 모두 모니터에서 디지털 작업을 거쳐 완성된 시안이지만, 선과 사진을 하나씩 그리거나 이어 붙이는 과정은 수작업에 가까웠다. 장시간 작업에 심신이 고단해질 때쯤 이슬아 작가의 초고를 읽으며 용기를 내는 동시에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반복되는 작업으로 생긴 긴장과 초고를 읽으며 얻게 되는 위안 사이에서 하루카 나카무라의 음악은 마치 모든 과정을 함께 호흡하는 공기의 온도와 닮아 있었다.
<SF 소설가 이경희의 선곡>
하나의 작품을 작업하는 내내 한 곡의 노래를 몇 번이고 반복해 듣는다. 영화가 끝나고 스태프 롤이 올라가는 순간처럼, 이야기가 끝난 직후의 감정을 노랫말로 구체화한다. 바로 그 결말의 감정을 완성하기 위해 질주하는 거다. 죽은 엄마를 되살리기 위해 시간 여행 하는 자매의 이야기 『그날, 그곳에서』를 쓰는 동안 나는 아이유의 '에잇(Prod.&Feat. SUGA of BTS)'을 들었다.
"우울한 결말 따위는 없어."
부디 주인공들이 이 노래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혁명을 꿈꾸는 초능력자들의 이야기 『모두를 파괴할 힘』을 작업할 적엔 소녀시대의 '힘 내!(Way To Go)'와 '다시 만난 세계(Into The New World)'를 몇 번이고 들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이 다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넣기도 했다. 나는 이 두 곡이 우리 시대의 투쟁을 상징하는 노래라고 믿는다. 정말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엔 가사가 없는 무난한 곡을 찾는 편이다. 가사가 없는 곡들만 모아서 들려주는 유튜브 채널 <로파이 걸(Lofi Girl)>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
<시인 겸 에세이스트 서윤후의 선곡>

즐겨 듣는 노동요 두 곡이 있다. 공교롭게도 두 곡 모두 이 노래를 부른 뮤지션들이 열여덟 살이 되던 해에 발표한 노래라는 걸 깨달았다. 이 우연의 기쁨처럼, 작년엔 바라던 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었다. 서울레코드페어에서 우효의 데뷔 앨범 <소녀감성> LP를 구입한 일. 이 앨범에 수록된 '테디 베어 라이즈(Teddy Bear Rises)'는 내 오랜 노동요다.
"하고 싶은 말은 해야 해. 안 그러면 정말 병이 돼."
그 속삭임으로부터 아직 쓰지 않은 나의 문장이 뒤척이기 시작한다.
"저기 멋진 저녁 노을이 대신 말해 주지 않아요."
그런 가사가 비로소 찾아든 나의 차례를, 순서를 호명하면 나는 말할 수밖에 없는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 때론 휘몰아치는 느낌을 지니고 원고에 돌진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주저 없이 야마구치 모모에의 노래를 듣는다. 그가 부른 '플레이 백 파트2(Play Back part. 2)'에는 전투력 샘솟는 박자, 다부진 기승전결, 모모에 특유의 중저음이 잘 담겨 있다. 노래 속 차량 접촉 사고 상황에서 "바보 취급하지 마. 당신 탓이잖아"라고 쏘아붙이는 대목은 어쩐지 날 무모하고 용감하게 만든다.

<북 디자이너 박연미의 선곡>


북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언젠가부터 음악보다는 그날의 정치, 뉴스 유튜브 방송을 먼저 플레이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알고리즘에 이끌려 데이비드 보위의 2002년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공연 영상을 만나게 되었다. 데이비드 보위의 음악은 꾸준히 들어왔고 네팔 히말라야에 있는 땅 '무스탕'에 반해 <세계테마기행>을 몇 편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알고리즘이 몽트뢰로 연결해 준 것일까? 라이브 음원을 싫어하고 잘 듣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공연 영상만큼은 다르다. 관객의 함성이 음악에 섞이는 것도, 보컬의 애드리브 창법도 용서되면서 요즘 가장 많이 플레이하고 있는 노동요가 되었다. 공연 중간 그가 '뉴 송(new song)'이라 소개하며 부르는 '캑터스(Cactus)'는 이미 내게는 익숙하고, '올드 맨(old man)'이 '올드 송(old song)'을 부른다면서 들려주는 '라이프 온 마스?(Life on Mars?)'는 새롭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의 7월, 오디토리움 스트라빈스키 공연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홀린 듯 문학 잡지 <릿터> 마감을 하고 있다.
<소설가 이서수의 선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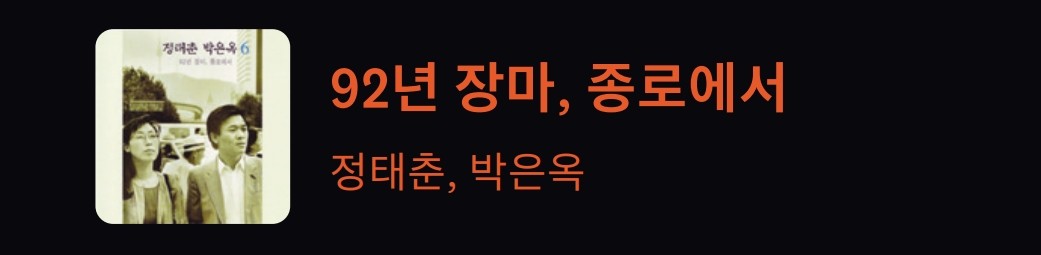

소설을 쓸 때 음악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다. 작년에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 2022』에 실린 단편 소설 「연희동의 밤」은 연희동의 LP 바에서 들었던 노래가 모티프가 되었다. 정태춘, 박은옥의 '92년 장마, 종로에서'라는 곡이다. 30년 전에 발표됐지만 지금 들어도 울림을 주는 곡이다. 평소에 노랫말에 집중하는 편이라서 소설을 쓸 땐 주로 연주곡을 듣고, 작업을 마치고 나면 가사가 좋은 노래를 찾아서 듣는다. 작업 후 가장 많이 들었던 곡은 자우림의 '샤이닝'. '나를 위한 곡'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사 한 줄 한 줄이 마음에 알알이 맺혔다. 요즘엔 김뜻돌과 허회경의 노래를 작업 마감 송으로 듣고 있다. 허심탄회한 자세가 된다.
<소설가 이희주의 선곡>

글을 쓸 때는 노래를 듣지 않는다. 글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걷기를 할 때는 음악을 듣는데, 그걸 노동요라고 한다면, 주로 듣는 건 일본 소년 만화의 오프닝이다. 버추얼 휴먼 '마유미' 계정을 운영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마유미』 작업을 하면서는 <드래곤볼 슈퍼>의 오프닝 '초절☆다이내믹!(超絶 ダイナミック!)'을 많이 들었다. "새로운 스테이지는 신에게 도전하는 장소"라는 가사를 좋아한다. 한국말로 쓰니 좀 민망하다 싶지만, 외국어로 들으면 좋다. 말 자체에 집중하게 되어서 그런가. 듣는 나도 솔직해진다.
내가 야구 선수라면 마운드에 설 때 이 노래를 틀 텐데. 내겐 볼을 칠 기회도 던질 기회도 없다.(그리고 등장하고 싶을 뿐 딱히 야구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단체 운동은 할 때보다 상상할 때가 좋다. 상상 속에서 나는 대체로 3학년 에이스다. '인터하이(일본의 전국 고등학교 종합 체육대회)를 앞두고 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올해는 <슬램덩크>의 에이스인 태섭이도 돌아오고 진지하게 전국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해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긴장되어 한 걸음이라도 더 걷게 되고, 그만큼 체력도 좋아진다. 장편 소설을 쓰다 어려움에 부딪혀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그날, 그곳에서
출판사 | 안전가옥
그날, 그곳에서
출판사 | 안전가옥
모두를 파괴할 힘
출판사 | 다산책방
모두를 파괴할 힘
출판사 | 다산책방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 2022
출판사 | 생각정거장
이효석문학상 수상작품집 2022
출판사 | 생각정거장
날씨와 얼굴
출판사 | 위고
날씨와 얼굴
출판사 | 위고

서해인(에디터)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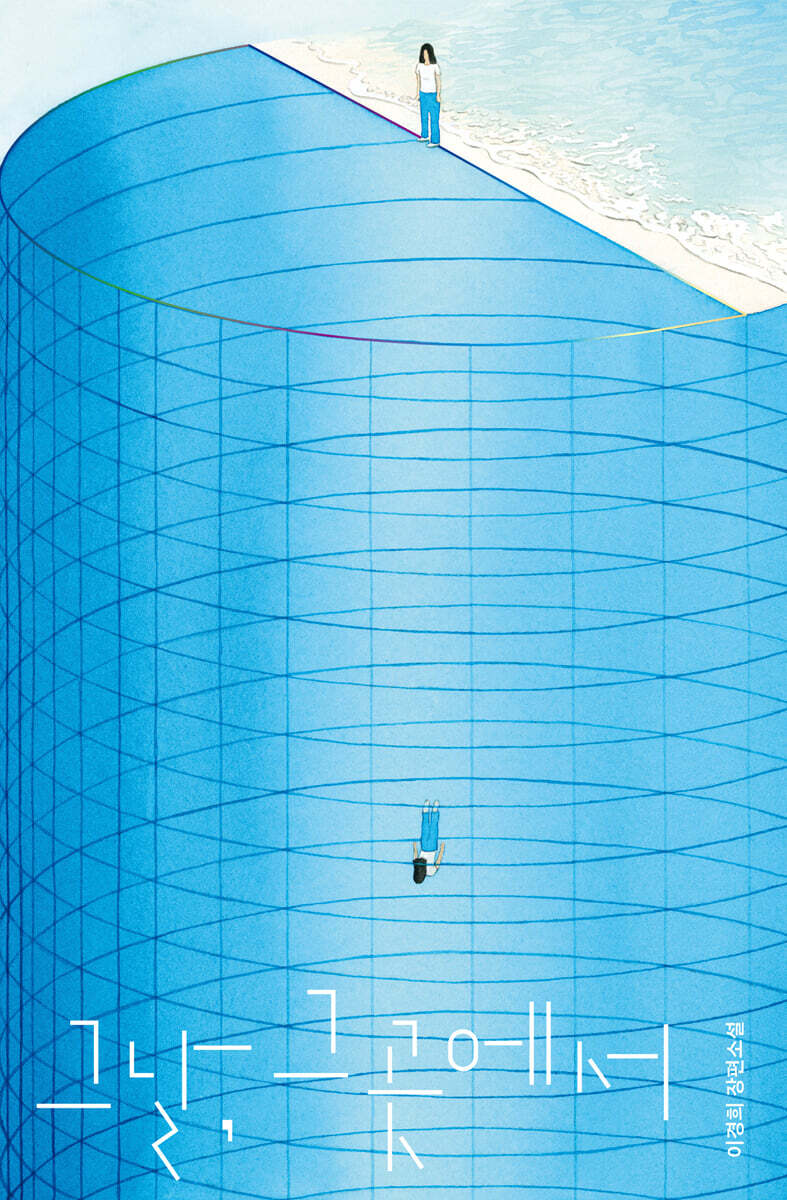


![[취미 발견 프로젝트] 가족과 함께, 달달한 홈베이킹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e/2/8/c/e28c8218951ee8a65ebb83f67d734259.jpg)
![[책을 넘어서] 제대로 보이는 세상, 얼룩소(alookso) - 윤신영, 원은지 에디터 인터뷰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e/7/0/1/e701626705e94e03c03156d5a5374fef.jpg)
![[책을 넘어서] 어렵지만, 계속 가 볼까요? - 김세나 <퍼블리랜서> 대표 인터뷰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f/f/3/7/ff37b76220a6f71324f494ea231d0b78.jpg)



![[더뮤지컬] <홍련> 배시현·박신애, 객석에 가닿은 목소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6-1067d3e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