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을 때면 대개 라디오를 켜고 채널을 클래식 FM에 고정시켜 놓는다.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하는 노래가 하나 있다. 이 곡이 나오면 일단 하던 일을 멈추고 끝까지 듣는다. 라틴어 성가(聖歌) '파니스 앙젤리쿠스'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흔히 번역하지만, 정확한 뜻은 ‘천사의 빵(Angelic Bread)’이다. ‘파니스(Panis)’는 라틴어로 ‘빵’이고, ‘앙젤리쿠스(Angelicus)’는 ‘천사의’ 혹은 ‘천사 같은’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체 축일을 위해 지었다는 이 노래를 나는 대학의 라틴어 수업시간에 배웠다.
 「파니스 앙젤리쿠스(생명의 양식)」를 지은 토마스 아퀴나스
「파니스 앙젤리쿠스(생명의 양식)」를 지은 토마스 아퀴나스
유럽권 소설을 읽으면 기숙학교에 다니는 10대 청소년들이 라틴어 때문에 고전(苦戰)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는 첫 시간에 이미 왜 그렇게 많은 소설가들이 작품에서 라틴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고 말았다. 불어의 격변화도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라틴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단어의 성별은 물론 성별과 격에 따라 어미가 바뀌는데,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헷갈리기 십상이었다. 격변화를 습득하는 것이 초급 라틴어의 핵심이라, 거의 매시간 단어의 성별 및 격에 따른 변환, 번역 및 작문에 대한 과제와 퀴즈가 있었다. 암기에는 꽤 자신 있었지만, 퀴즈에서 만점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금세 의기소침해졌다.
불쌍한 한스 기벤라트! 수업을 듣는 내내 헤르만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 한스를 생각했다. 공부에 치이다 목숨을 잃는 이 가엾은 소년에게 대입 준비 중이던 고등학생 때도 공감한 적이 없는데, 라틴어를 수강하면서 마침내 그를 이해했다. 한스가 라틴어학교에 다녔다는 내용이 희미하게 머릿속에 남아서인지 한스가 라틴어 때문에 고생했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몹쓸 라틴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억이란 어쩌면 그렇게 제멋대로인지! 한스를 괴롭혔던 건 신학교의 엄격한 규율과 숨막히는 분위기였지, 라틴어가 아니었다. 『수레바퀴 아래서』를 다시 읽어보니, 한스는 라틴어를 뛰어나게 잘했고 심지어 좋아했다. 헤세는 한스가 “수학의 세계에서는 미로를 헤매거나 남을 속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 했다.”면서 이렇게 쓴다.
“같은 이유로 한스는 라틴어를 매우 좋아했다. 왜냐하면 그 언어는 뚜렷하고, 확실하며, 좀처럼 의혹의 여지를 남기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고대 로마의 시인, 퀸투스 호라티우스
고대 로마의 시인, 퀸투스 호라티우스
어려워했지만 나 역시 라틴어를 싫어하지 않았다. 내가 알고 있는 영어 및 불어 단어와 비교해 가며 뜻을 추측해 가는 과정이 즐거웠다. 알고 보니 나는 이미 라틴어 단어를 꽤 많이 접했었다. 학교 문장(紋章)에는 ‘veritas lux mea(웨리타스 룩스 메아)’(진리는 나의 빛)라고 적혀 있었고, 미술사 수업 시간엔 서양 옛 그림의 주요 주제인 ‘memento mori(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에 대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다. 그리고 『장미의 이름』의 아름답기 그지없는 마지막 문장.
“stat rosa pristina nomine, nomina nuda tenemus.”
(지난날의 장미는 이제 그 이름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덧없는 이름뿐.)
교재는 고대 로마의 시인 퀸투스 호라티우스의 생애를 만화와 짤막한 이야기로 들려주며 라틴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Quintus est puer Romanus. 퀸투스는 로마의 소년입니다.
Horatia puella Romana est. 호라티아는 로마의 소녀입니다.
퀸투스와 여동생 호라티아를 주인공으로, 영어로 치자면 ‘아이 앰 어 보이’, ‘유 아 어 걸’ 같은 문장들을 먼저 배웠다. 비록 더듬거렸지만,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언어로 소통하고 있노라면 제법 기품 있는 지식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친구들을 놀리며 가장 자주 써먹은 문장은 이거였지만.
Asinus(멍청이)!
수업을 듣고 있자면 도대체 이 쓸데없는 언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궁금해졌다. 인문대생, 그것도 서구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이 대부분일 거라는 내 예상과는 달리 수강생의 구성은 다양했다. 항상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던 화학과 남학생도 생각나고, 꼬박꼬박 수업에 참석하던 공대생도 기억 난다.
그 시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졸업하면 더 이상 쓸 일 없을 것 같은 언어를 붙들고 머리를 싸매었던 것일까? 어떤 힘이 우리를 지식의 세계로 인도하였으며, 그 미지의 세계를 헤매며 끝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도록 만들었던 것일까?
매시간 과제를 꼼꼼하게 고쳐서 돌려주곤 했던 선생님은, ‘Angelus’(천사)의 격변화를 설명하던 날 라틴어와 한국어 가사가 함께 적힌 악보를 나눠주며 「파니스 앙젤리쿠스」를 가르쳐주었다. 그는 짖궂은 학생들의 요청에 큰 망설임 없이 강단에 서서 직접 그 노래를 불렀다.
다소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그러나 진지하게 그는 노래했다. 신(神)의 언어인 라틴어로 그가 주님의 양식을 노래할 때 나는 정신의 고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감각에 강렬하게 사로잡혔다. 교수 자리가 날지 불확실하지만 단지 공부가 좋아 서양 고전 연구를 업으로 삼겠다 결심한 시간강사와, 졸업 후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단지 공부가 좋아 쓸데도 없어 보이는 라틴어 강의를 듣겠다 마음 먹은 학생들……. 지상(地上)의 강의실에서 우리는 천상(天上)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고, 그 언어는 대부분의 수강생들에게 삶의 잉여였지만 분명 ‘위안’이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쓸모’를 요구하지만, 유용한 것만이 반드시 의미 있지는 않으며 실용만이 답은 아니라는 그런, 위로.
세월이 흘러 나는 ‘천상의 양식’과는 동떨어진 ‘지상의 밥벌이’를 위해 일하게 되었다. 당장 입 안에 밥을 넣어주지 않는 인문학 따위는 팔자 좋은 이들의 유희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이 조직의 부품에 불과한 것만 같을 때, 쓸모라곤 없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 위로와 안식을 주는 건, 내가 떠난 지 오래된, 그저 ‘잉여’에 불과하다 여겼던 그 공부의 세계였다. 쓸모없어 보였던 그 라틴어 수업이 내 세계를 확장시켜 주었다. 세상에는 실생활에서 쓰이지 않아도 기억되는 오래된 언어가 있고, 온 힘을 다해 그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면서…….
다시 『수레바퀴 아래서』로 돌아가자면, 한스 기벤라트를 죽인 것은 공부가 아니었다. ‘쓸모’에 대한 세상의 강박이었다. 학교가 그에게 허락한 언어는 틀에 박힌 문법의 세계, 향후의 영달을 위한 실용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다. 친구 하일너와의 관계에 몰두해 성적이 떨어진 한스를 부른 교장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해 주겠느냐고” 물은 후에 이렇게 덧붙인다.
“아무튼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그러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한스처럼 라틴어에서 “간결한 문체를 유지하는 법과 운율의 섬세함”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실용적 목표 없이 단지 ‘교양’으로서의 라틴어를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교양이란 학식과는 다르다. 교양은 비정한 현실 속에서, 더 비정하거나 덜 비정한 세계를 상상하고 그에 틈입할 여지를 준다. 그러한 자유라도 있기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생(生)의 수레바퀴를 유연하게 굴릴 수 있는 것이다.
「파니스 앙젤리쿠스」를 들을 때마다 ‘sursum corda(수르숨 코르다)’라는 라틴어 어구를 떠올린다. ‘마음을 드높이’라는 뜻이다. 가톨릭 미사 전례에서 제단에 빵과 술을 바친 사제는 감사기도를 올린 후에 말한다. “마음을 드높이.” 신자들은 답한다. “주님께 올립니다.” 마음을 끌어올려 신에게 드리는 일은 공부를 통해 정신을 고양시키는 일과도 닮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건 그 어떤 신도 아닌 스스로에게 기꺼이 바치는 제물이라고 여기면서 오래전 라틴어 수업 시간에 배운 문장 하나를 옮겨 적어 본다.
현명한 이는 어떤 것도 마지못해 하거나 분노한 채로 하지 않는다.
Sapiens nihil facit invitus nihil iratus.
 3월 출간 예정
3월 출간 예정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수레바퀴 아래서
출판사 | 민음사
수레바퀴 아래서 - 세계문학전집 050
출판사 | 민음사

곽아람(작가, 기자)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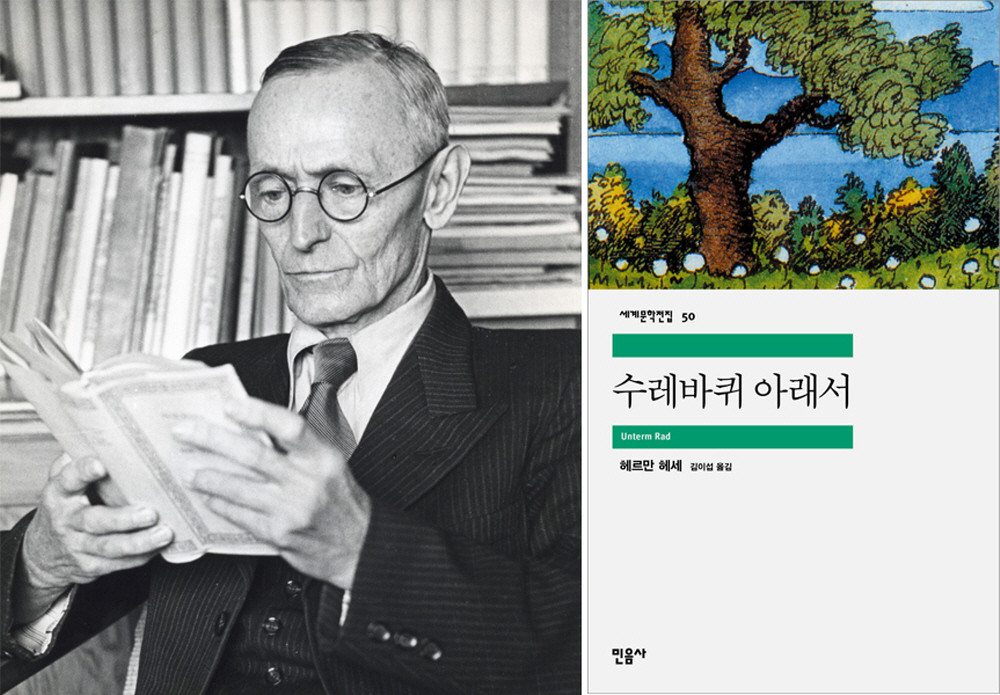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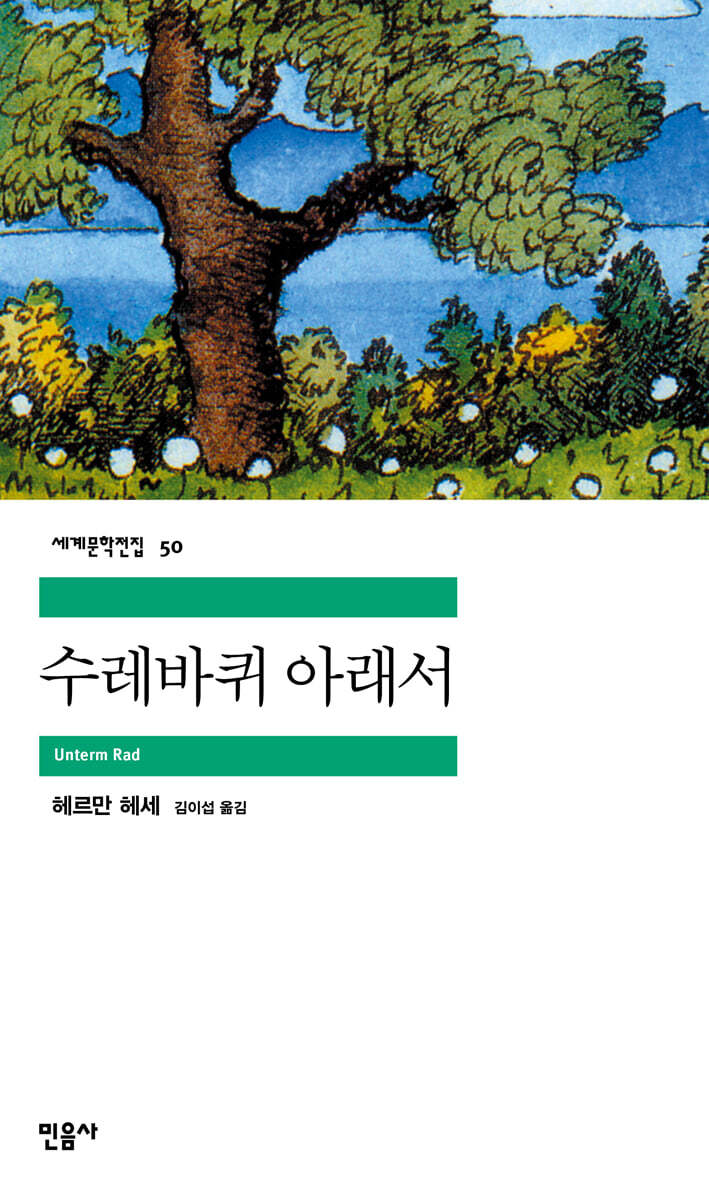




![[이벤트] 2025 채널예스 콘텐츠 연말 결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2/20251204-1aba9759.jpg)

![[더뮤지컬] <생계형 연출가 이기쁨의 생존기> 예상치 못한 질문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27-c8d7850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