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내게도 일어나길 바라는 일들이 있다. 가령 평생 잊지 못할 열정적인 사랑이나 로또 당첨 같은 것.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내 몫이 아니려니 포기하게 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엔 죽기 전에 언젠가는, 하고 바라는 일이기도 하다. 내겐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세계 문학 전집을 쌓아놓고 한 권씩 읽어나가는 일.”
『세계 문학 전집을 읽고 있습니다』의 머리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십 년 넘게 성실하고 능력 있는 단행본 교정교열자로 일하는 동안 『동사의 맛』, 『오후 네 시의 풍경』 등의 책을 펴낸 김정선 작가의 바람이었다.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서울살이를 끝내고 연고도 없는 대전으로 이주를 결심한 후의 일이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부터 염상섭의 『삼대』까지, 그저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책을 읽었다. 작가의 “몸무게를 버텨내느라 좋이 10센티미터는 주저앉았을 소파”와 연필 선인장 ‘연필이’가 정물처럼 놓인 공간에서 책을 읽고 기록하는 동안 세 계절이 흘렀고, 봄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2020년 6월 말부터 다음 해 3월 초까지 읽으신 책이 100권입니다. 평균 3일에 한 권꼴인데, 웬만큼 꾸준하지 않곤 쉽지 않은 작업 같아요.
사실 약간 후회도 합니다. 휴식과 치료를 병행하고 건강을 회복한 뒤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그 시기에 몸과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은 게 갈급증을 촉발한 건지, 여유 부릴 시간이 없겠다는 불안도 있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문학 전문가도 아니고 작품을 해설할 입장도 아니지만, 세계 문학 전집이든, 사상 전집이든, 관심 분야를 쌓아놓고 읽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심어주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시작한 거고요.
계절로 챕터를 구분하셨지만, 일기에 가까운 루틴이 있어 독자 입장에서는 ‘독서 일기’로도 읽힙니다. 한 편 한 편 정리하는 과정을 소개하신다면요?
대전에 사는 50대 한국 남자 김정선은 이렇게 읽었다, 라는 게 전제였어요. 문학이야말로 주관적 독서일 텐데, 그런 걸 배제하고 전문가인 양 어떻게 읽어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선 맘에 드는 소설 속 인용문을 뽑은 뒤, 간단한 일상과 마음 상태를 적고 줄거리를 꼼꼼하게 적었어요. 늘 책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이, 평론가들 글에는 줄거리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모두 읽었거니 하고 쓰는 셈인데, 안 읽은 사람 입장에선 무슨 얘긴지 도무지 알 수 없잖아요. 줄거리가 없으면 내가 그 책을 읽었다는 확인도 안 되는 터라 공들여 정리했어요. 그런 다음 짧은 감상평을 달았고요.
일기의 베이스가 그날의 날씨와 정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책을 고르고 읽고 쓸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 있을까요?
다 기억에 남지만 굳이 고르면, 『테레즈 데케루』, 『댈러웨이 부인』, 『말테의 수기』, 『소리와 분노』가 떠오르네요. 『말테의 수기』는 문장 하나하나가 동병상련을 불러일으켜서 좋았어요. 작가인 릴케 입장에선 어처구니없겠지만, 연고 하나 없는 대전에 내려와 무의미한 작업을 하는 건 아닐까 되묻고 고민하는 내 처지와 소설 내용이 오버랩되면서 위안이 됐거든요. 『댈러웨이 부인』 편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어요. “삶이란 어쩌면 파티를 위해 꽃을 사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제발 사람들 모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소리와 분노』를 쓴 포크너는 그야말로 놀라웠어요. 할리우드에서 시나리오도 썼다는데, 지적인 문장이나 도구 없이, 잘난 체하는 법도 없이 고급스럽게 모더니즘 소설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그랬어요. 오래 살면 이런 것도 느끼는구나 싶었던 건, 예전에 세계 문학 전집을 읽을 때는 잘못 번역한 문장과 비문까지 굉장한 문장으로 알고 사춘기를 보냈다면, 지금은 한국어를 읽고 익힌 사람이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번역 작품을 갖게 됐다는 점이에요.
그러고 보니 『햄릿』을 읽고 쓴 글의 마지막에 “북북서로 미쳤다”는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느라 전전반측하셨다고 썼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인가요?(웃음)
네, 여전히 해답을 못 얻었어요. 부디 이 책을 잘 아는, 혹은 연구자분들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써놓은 거예요.
100권씩 세 권의 책을 목표로 한다고 들었어요. 101번째 책이 궁금하네요.
일단 2권은 60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30편까지 완성했어요. 억지로 쓰려면 쓰겠지만 최소한 1권을 쓸 때의 마음으로 책을 읽고 쓰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현재는 스톱한 상태예요. 지금은 시동을 위해 예열 중이고요. 101번째 책은 카뮈의 『이방인』입니다. 1권에서는 한국 작가 작품을 한 권만 넣었는데, 2권에서는 박태원의 『천변풍경』, 강경애의 『인간문제』 두 편을 넣으려고 해요.
2020년 3월에 펴낸 책 『열 문장 쓰는 법』에 일기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일기 쓰기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를, 자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두에게 하는’ 행위니까요.” 일기 쓰기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리베카 솔닛의 문장을 인용한 건데, 사실 처음 그 문장을 읽었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 ‘글쓰기란 번역이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나만의 기쁨, 슬픔, 의견을 모두가 통용하게 써야 하는 거라 어렵겠구나 싶었고요. 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만 아는 언어나 부호로 쓰는 게 아니라, 쓰고 지우는 행위를 반복하는 건 그 자체가 번역이고 모두와 소통하려는 의지인 셈이죠. 작가들의 일기를 출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작가의 작품보다 묘하고 재미있다는 생각, 출간을 예상하고 쓴 일기일까 하는 의심, 완벽하고 정갈한 문장으로 감정을 표현한 건 프로여서 그런 걸까, 편집자의 개입은 없었을까 등등. 결론 내리면, 일기는 오묘한 매력을 가진 장르라는 거죠.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세계 문학 전집을 읽고 있습니다 1
출판사 | 포도밭출판사

문일완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이혜련(아더스튜디오)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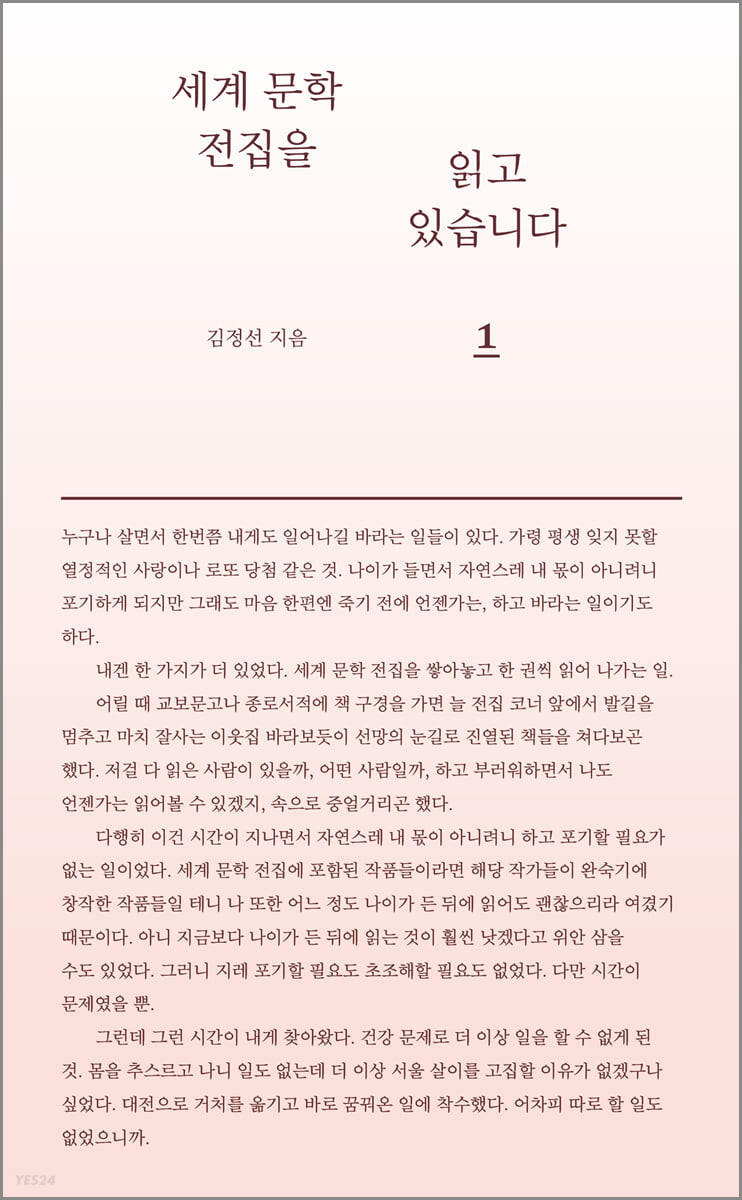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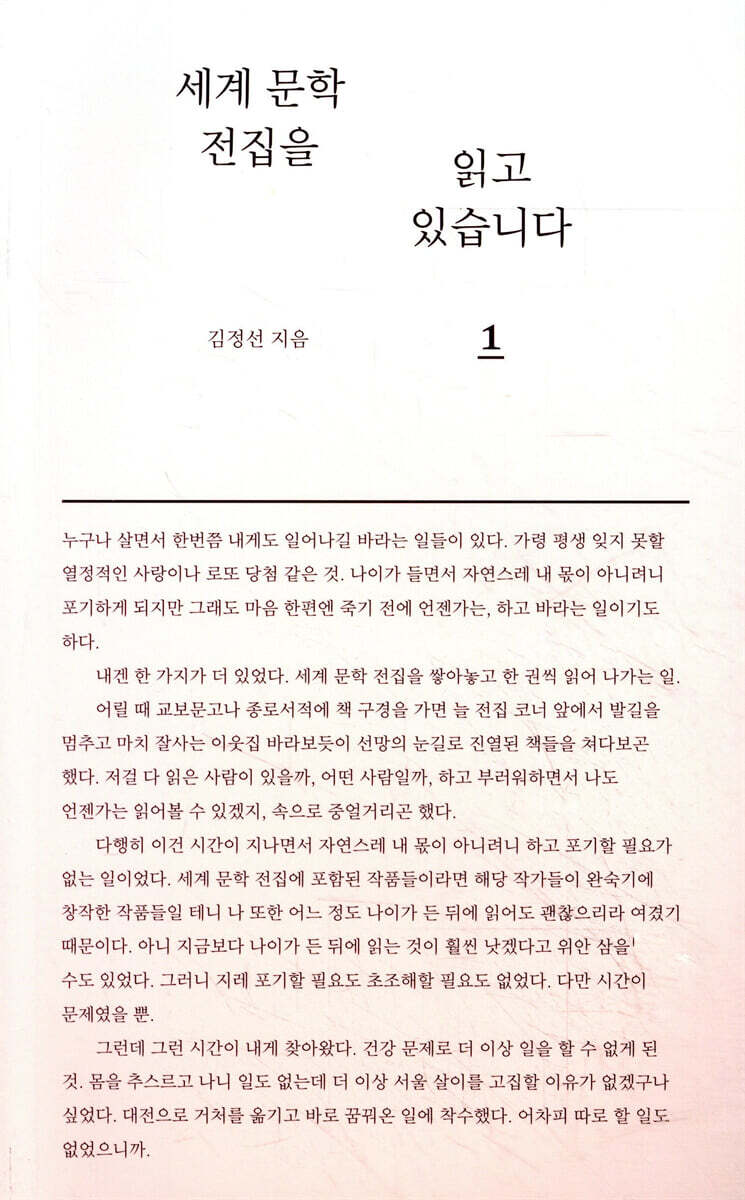
![[일기 특집] 이유미, 여러 개의 일기를 쓰는 여자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c/8/f/e/c8fe2cbf72980dc4af227658df507f14.jpg)
![[일기 특집] 정우열, 개와 함께 사는 일은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7/b/b/2/7bb2e3fed483910f709b78db8d41bf52.jpg)
![[올해의 남의 책] 작가, 편집자, 마케터 24인이 꼽은 올해의 책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2/c/3/8/2c38bd2d47f4737e8da20aa37818a9b2.jpg)

![[김이삭 칼럼] 문자와 문자를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희곡 번역](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09-d9cb953b.jpg)
![[인터뷰] 오은 “산문은 수렴하듯 쓰고, 시는 발산하듯 쓰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11-ea2210ec.jpg)


![[이벤트 종료] 새로워진 채널예스 기대평을 작성해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81642dc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