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우리 아이가 글쓰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때 내 대답은 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두세요”이다. 자녀의 글쓰기를 지도하기 위해 집에서 뭐라도 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 꺼낸 말인데, 교사가 이렇게 말하니 부모들은 처음에 놀란다. 하지만 곧 “그렇지요?” 하면서 차라리 그렇게 말해주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사실 부모들은 이 질문을 하고 나서 뭔가 대책이 나오면 집에서는 지도할 자신이 없고 학원에라도 보내볼까 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학원비가 만만치 않은 데다 그마저도 미덥지 않아 망설이던 찰나, 마침 담임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놓인다.
물론 나는 글쓰기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사이기에 이대로 상담이 끝나는 건 아니다. “교실에서 쓸 기회가 자주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집에서 억지로 가르치거나 논술학원에 보내려고 들면 글쓰기가 더 싫어질 거예요” 하고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말해준다.
그런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쓸 거리가 생기고, 쓸 기회가 많으면 글쓰기 실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까닭은 부모의 질문에 담긴 ‘고민’이 글쓰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가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 요즘 아이들은 너무 일찍부터 연필을 잡고 글씨를 쓰는데, 아직 손힘이 약하다 보니 자기 편한 대로 잡아버리기 일쑤다. 그게 습관이 되면 연필 잡는 방법이 바르지 못해 손이 아파서 연필을 오래 못 잡게 된다.
둘째, 글씨가 너무 못생겨도 쓰기 싫다. 비록 내가 못나게 쓴 거지만 자기 눈에도 알아보기가 어려우면 쓰다가도 뭘 쓰려고 했는지 까먹고 대충 생각나는 대로 써버린다. 그렇게라도 힘들게 쓰고 나면 글씨 때문에 혼나기 일쑤다.
셋째, 자기 말과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글자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맞춤법에 맞게 써야 한다는 강박으로 글자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요즘 1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지양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받아쓰기로 글자를 먼저 배운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써보려고 노력하기보다 그 낱말의 바른 모양새가 떠올라야 쓰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다.
넷째, 어떤 것이 쓸거리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내뱉은 말, 친구와 나눈 이야기, 오늘 아침에 본 것, 말도 안 되는 생각, 감정 등 무엇이든 쓸거리가 될 수 있지만, 아이들 대부분이 그런 소소한 글을 읽어본 적이 없기에 무얼 써야 하는지 몰라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다섯째,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자체를 힘들어한다. 일단 자리에 앉아야 짧은 글이라도 쓰는데, 가만 앉아 있는 게 자기 의지대로 잘 안 된다. 발도 움직여보고, 팔도 휘젓고, 고개도 이리저리 돌려보고, 그것도 안 되면 입이라도 놀려야 한다. 그런데 얌전히 쓰기에만 집중하라고 하니 아이들 입에서 “배 아파요”, “손목 아파요”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여섯째, 집에서 날마다 ‘숙제 같은 일기’를 쓰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숙제 같은 일기’는 말 그대로 숙제일 뿐, 글 쓰는 쾌감을 느끼기 어렵다. 물론 집에서 글을 자주 쓰는 아이가 글을 잘(길게) 쓸 수는 있다. 글자도 바르게 쓰고 띄어쓰기도 잘하고 문장도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런 글은 재미가 없다. 아이들의 일기가 대개 일과 정리로 끝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 여섯 가지만 살펴봐도 내가 왜 부모님들께 글쓰기 지도에 관해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부모에게 집에서 해볼 만한 걸 말해주면 아이에게는 강요만 더해질 뿐이다. 아이가 글쓰기 재미를 느끼기도 전에 ‘글자’와 ‘글’이 싫어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 아이가 글쓰기를 왜 잘했으면 좋겠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한 아이에게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반듯한 글씨? 맞춤법에 맞게 쓴 글? 공책 한 장 채울 만한 분량의 긴 글? 진지하고 차분한 자세? 기발한 생각? 아이답지 않은 놀라운 표현? 생각 키우기? 짐작컨대 부모라면 이런 것을 가장 앞에 둘 것 같지는 않다.
그늘
1학년 이윤서
그늘은 재미있다.
없어졌다 있어졌다 한다.
그늘은 계속 변한다.
오늘은 어디에도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도 없을 수도 있다.
윤서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글씨 쓰는 것을 힘들어하고 글씨도 못생겼다. 그런 윤서가 글만 쓰면 짧은데도 윤서만의 개성이 돋보이고 재미있다. 어떻게 이런 소재를 선택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윤서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5분 만에 후다닥 ‘그늘’을 쓰고 씩씩하게 나가 뛰어놀았다. 아마도 시원한 그늘을 찾아갔으리라. 만약 윤서에게 글자를 반듯하게 고쳐 쓰고, 어디에서 그런 그늘을 봤는지 좀 더 자세히 쓰라 하고, 그림자가 생기는 원리를 설명하고, 글 쓸 때의 자세를 지적했다면 윤서는 이런 멋진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자기 생각을 간결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하자 해놓고 정작 글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글씨와 자세를 탓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른들은 실체가 없는 그늘 같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간다. 그런 걱정은 때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도 걱정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걱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덕분에 심심할 겨를도 없다.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바랐던 첫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잊을 때가 많다. 다양한 그늘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은 그 자리에 잘 있고 잘 자라고 있는데 말이다.
‘나는 왜 우리 아이가 글쓰기를 잘하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답을 찾다 보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글을 잘 쓰고 있는지 발견할지도 모른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오은경(초등학교 교사)
경북 울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이 글쓰기 공책에 쓴 이야기를 혼자만 보기 아까워 문집을 만들고 책으로 묶어주는데, 그럼 부모님들이 글을 쓴 아이들보다 책을 만들어준 나를 더 고맙게 생각해주어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오지은의 가끔은 좋은 일도 있다] 작은 사랑에 빠진 상태였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5/f/f/e/5ffe43bf4a3313dc94e21e17cf6efbdc.jpg)

![[MD 리뷰 대전] 예스24 MD가 10월에 고른 책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0/0/1/c/001c560a07bd411e41a981744e0d6bb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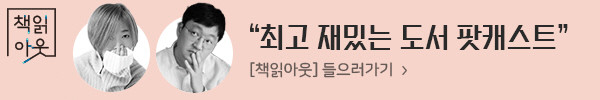
![[에디터의 장바구니] 『빨래』 『비신비』 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21-aa8fb1bb.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11월이라니 갑작스러운데, 2025년 취소해도 돼?](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30-b2d627fe.jpg)
![[젊은 작가 특집] 돌기민 "그때만큼 자유롭게 휘갈기듯 소설을 쓴 적은 없을 겁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53cc095a.png)
![[리뷰]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사랑하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30-e74966d3.jpg)



산머루
2021.10.13
huyric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