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 일기’는 내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정기 연재 일정이다. 에세이의 마감일은 발표되는 달의 전날 10일. 전달에 쓴 글이 다음 달에 게재되는 경험은 신기하고 재미있다. 과거의 내가 몰두해 있던 것, 중요하다고 여긴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니까. 만화 『나 혼자 교환일기』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다. 작가가 스스로와 주고받는 과거의 편지-미래의 답장 순으로 이루어지는 이 만화에서 나가타 카비는 종종 미래의 자신에게 묻는다. 곧 과거가 되어 버릴 현재의 고민과 마음이 미래에도 여전한지, 혹은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저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미래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스스로 돈을 벌고 있나요?” 미래의 나는 안타깝지만 실패했다, 혹은 예상보다 상황이 나아졌다 등의 대답과 함께 새로 생긴 고민을 말하기도 하고 과거에 했던 생각들을 수정하기도 한다.
과거의 내가 쓴 글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오듯, 책과의 만남도 종종 그런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다. 출간된 직후 바로 발견하지 못한 책을 시간이 지나 만나게 되거나, 읽자고 아무리 결심해도 페이지가 들춰지지 않던 책을 갑자기 열어보게 되는 식이다. 그럴 때는 꼭 책들이 움직여 나에게 도착하는 것만 같다. 요 근래 그런 순간을 가장 크게 느낀 곳은 서점 ‘라이프북스’다. 신간 구간을 한데 놓는 큐레이션이 빛을 발하는 곳. 그곳에서는 모든 책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그 책들의 자리는 무척이나 근사하다. 어떤 책이 놓인 곳의 양옆과 위와 아래에 놓인 책들을 모조리 겹쳐 읽어도 한 점도 덜걱거림이 없다고 여겨지는 점에서. 어떤 책을 집어 들면 반드시 그 책의 양옆 위아래에 놓인 책들도 함께 집어 들게 된다는 점에서 말이다. ‘라이프북스’에 가면 항상 함께 놓여 있어서 더 읽고 싶어지는 책들을 한 바구니씩 사 오게 된다.
최근에 ‘라이프북스’에 들러 사 온 책의 목록은 르 코르뷔지에의 『작은 집』과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영원의 건축』, 토니 모리슨의 『보이지 않는 잉크』와 버지니아 울프의 『보통의 독자』다. 이 재미있는 가로세로…… 빙고게임 같은 책 사기…….(투 빙고는 한 것 같다.) 자연스럽게 『보통의 독자』와 『보이지 않는 잉크』를 나란히 읽고, 『작은 집』 과 『영원의 건축』을 함께 읽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서대로 읽었고 그 순서도 물론 정말 좋았는데, 신기하게도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책은 『보통의 독자』와 『영원의 건축』이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제목을 이루는 단어들도 묘하게 잘 어울리네. 이런 부분을 나란히 읽어 가는 일이 좋았다.
우리는 사생활이 있고 끝까지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지만 또 동시에 그만큼 많이 의심하는 것도 없다. 우리는 반대하고 점잔 빼며 꾸짖기 시작하다가 죽는다. (……)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명성, 명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 때문에 하게 될 모든 직무에서 달아나기로 하자. 우리의 변덕스러운 커다란 냄비 위에 매혹적인 우리의 혼란, 뒤범벅이 된 우리의 충동, 끊임없는 우리의 기적 등을 약한 불로 뭉근히 끓이기로 하자.
-버지니아 울프, 『보통의 독자』, 79쪽
우리는 모두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 우리의 성향을 이 힘들과 일치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 우리 내면의 힘을 해방시키지 않고는 절대 활기찬 삶을 살 수 없다. 틀에 박힌 양식은 한정되어 있지만, 세상에는 김무수한 양식이 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힘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위대한 것을 창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진정 이 해결책을 찾으려면 무엇보다 편견을 버려야 한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영원의 건축』, 68~69쪽
문장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치고 이상하게 힘이 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움직인다는 점에서. "놓아주다"라고 쓰면 내 손 안에서 뭔가가 스르르 놓여나는 것 같고, "해방"이라고 적으면 해방되는 것 같은 느낌. "자유롭다"라는 문장을 읽으면 자유로운 것만 같다. 마음이 착각한 건지는 몰라도 일단은 움직여지는 느낌. 문장은 그런 걸 준다. 잘 쓰인 문장만이 그런 걸 준다.
2021/3/8
『영원의 건축』은 내용과 더불어 그 물성도 아름답다. 명랑한 노란색의 커버를 벗기면 고상한 갈색의 표지가 드러나고, 600페이지에 이르는 두꺼운 책인 탓에 읽은 곳을 기록하는 가름끈이 두 개인데, 이들의 색깔은 역시 노란색과 갈색이다. 건축을 다룬 책에서 이런 것을 배우기도 한다. 노란색과 갈색이 엄청나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것! 그리고 이 책이 얼마나 알맞게 나에게 왔는지 알 수 있는 또 한 부분을 발견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하게도) “영원함”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다. “문자 그대로 거의 영원한 것들도 있다. 그것들은 강하고 균형 있고 굳건하게 자신을 보존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거의 불멸의 상태로 존재한다.” 우리가 만드는 문학 에세이가, 그 에세이를 쓰는 작가들이 쓰는 시와 소설이 그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거의 불멸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균형 있고 굳건하게 자신을 보존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는 데에 있다. 잘 쓰인 문학들이 그렇다.
p.s. 아직 도착하지 않은 책도 있다. 정지돈 작가의 소설 『모든 것은 영원했다』를 읽고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를 읽자고 결심했는데 아직 펼쳐 보지도 않았다. 그 책은 언제쯤 나에게 올까…….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김화진
2021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나주에 대하여」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나주에 대하여』, 연작소설 『공룡의 이동 경로』, 장편소설 『동경』, 단편소설 『개를 데리고 다니는 남자』, 『개구리가 되고 싶어』 등이 있다. 『나주에 대하여』로 제47회 오늘의작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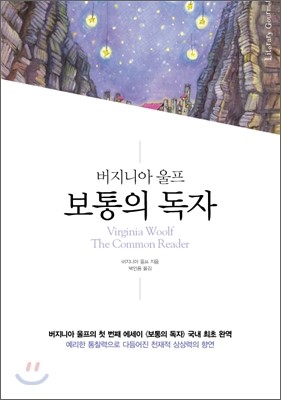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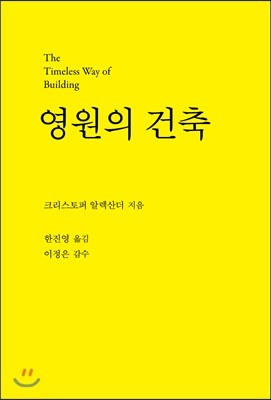
![[김화진의 선택 일기] 문학을 쓰기, 말하기, 남기기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f/c/8/3/fc8399d8258addc6581e06347b4b7e46.jpg)
![[김화진의 선택 일기] 취향과 사귀는 일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a/7/8/a/a78ad7c2cf87efb94fb381be13f90b30.jpg)
![[김화진의 선택 일기] 쓰는 것도 만드는 것도 처음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6/d/a/7/6da7769b62b5fe21db432669fcfcc35f.jpg)



![[추천핑] 국경을 넘는 한국 문학](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3-ab42d6ee.pn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리뷰] 뻔히 아는 이야기를 기다리는 이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7-cbde7cbc.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