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 인턴이나 신입사원에게는 중요한 덕목이지만 억울한 면도 있다. 업계 용어나 맥락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빠르고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건 경력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턴이나 신입사원이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하다.
한 회사 안에서 쓰는 전문 용어와 축약어들을 살펴보면 거의 외국어나 다름없다. 말과 말 사이에 놓인 엄청난 내용들이 묵음 처리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문장을 하나 소개한다.
“죽이는 아이디어 가져 와.”
죽이게 좋은 아이디어를 기획해 오라는 의미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정반대의 뜻을 갖기도 한다. A안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별로인 B안을 하나 더 만들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경우 정말 ‘곧 죽을 운명인’ 아이디어를 칭한다. 따로 놓고 보면 나쁘진 않지만 다른 것과 비교해봤을 때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그런 아이디어. 그걸 왜 만드느냐고?
좋은 아이디어 수십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최종 안에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다. 100가지 아이디어를 전부 다 광고로 만들 순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다 보니 클라이언트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도록 돕는 작전이 필요하다. 덕분에 한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해 죽어야 하는 아이디어를 짜기도 한다. 그래서 광고 회사에서 ‘죽이는 아이디어’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인다.
사실 이 표현은 내가 카피라이터로 일한 지 4, 5년 정도 됐을 무렵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하던 친구가 이 주문을 잘못 알아듣고 진짜 죽이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갔다며 후일담을 전했다. 왜 잘해줘도 난리냐며. 어느새 맥락을 훤히 파악하게 된 나는 친구가 그저 귀여웠다.
나도 인턴 때는 당연히 못 알아들었다. 어느 날은 팀장님이 대뜸 ‘노트’를 갖고 회의실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앞뒤 설명 없이 그 말만 남기고는 도로 휙 들어가 버리셨다. 내가 팀에 합류하기 전부터 진행되던 중요한 프로젝트라 나는 회의실에 못 들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언뜻 봐도 여러 팀이 모인 중요한 자리 같았다.
‘노트? 공책이겠지? 근데 내 노트가 왜 필요하지? 노트 많으실 텐데. 아님 노트북인데 내가 마지막 말을 못 들은 건가?’
아득한 맥락을 읽어내려고 많은 고민을 했다. 나 빼고 다들 회의실에 들어가 있었으니 조언을 구할 선배 하나 주변에 없었다. 이제 와서 회의실 문을 열고 “노트요? 아님 노트북이요?”라고 묻는 건 나 같은 쫄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마침내 노트가 잔뜩 쌓여 있던 팀장님의 책상을 기억해냈다. ‘그래. 노트는 많았어. 아마도 노트북이었을 거야. 무쓸모에 가까운 내 노트북을 회의 때 쓰시려나 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노트북을 내밀었다.
어떻게 됐냐고? ‘말귀 어두운 인턴의 우당탕탕 적응기’로 두고두고 회자당했다. 그렇게까지 웃긴 행동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다른 팀 팀장님까지 나를 놀렸다.
“아~ 네가 그 인턴이구나? 노트 들고 오랬는데, 노트북 들고 온…. 너 X대 출신이지? X대 애들이 감을 빨리 못 잡더라고.”
곁에 있던 선배가 나를 위로했다.
“흘려들어.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언스플래쉬덕분에 그리 큰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니라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여전히 마음으로는 잘못 없는 내 잘못이 부끄러웠지만.
언스플래쉬덕분에 그리 큰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니라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여전히 마음으로는 잘못 없는 내 잘못이 부끄러웠지만.
그 뒤로 비슷한 일화를 하나둘 만들며 인턴 기간을 마쳤다. 내가 아는 것만 한두 개이니, 미처 알지 못하는 우스운 에피소드는 얼마나 많았을지 모르겠다. 그해에는 나를 비롯해 단 한 명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졸업반이 아니었으니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한 그해, 졸업을 미루고 학기를 연장해야 하는 오빠도 있었다.
이듬해 다른 광고 회사에서 한 번 더 인턴을 했다. 낯선 한국어와의 싸움도 다시 시작됐다. 같은 업계라 비슷한 부분이 많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맥락도 있었다.
사건은 첫날부터 벌어졌다. 아직 어느 팀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아 며칠 임시로 함께 지낼 선배들을 소개받고 인사를 드렸다. 고참 선배가 작업 중이던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솔미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그토록 오고 싶던 회사였는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할 수 있다니. 다섯 잔이라도 마시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대답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뒤 다시 물으셨다.
“솔미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속으로 매우 놀랐다. ‘아까 내가 대답을 너무 작은 목소리로 했나?’ ‘혹시 귀가 어두우신가?’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답하리라.
“네! 저도 커피 좋습니다!!!”
또 답이 없으셨다.
내가 뭘 놓쳤는지 한참 지나셔야 알았다.
‘아… 커피 타오라는 말이었구나….’
누가 귀띔해줘서 눈치 챈 게 아니라, 며칠 뒤 불현듯 스스로 깨달았다. 늦어도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거다.
“솔미야, 커피 두 잔 타 올래? 여기서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커피를 타야 하는지 궁금하긴 했겠지만, 의중은 바로 알아챘을 거다. 이런저런 설명 없이 운만 띄우니, 선배의 청력 따위를 의심하는 바보 인턴이 돼버렸지 뭐람.
커피 타오라는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일은 어찌하여 해낼 기미를 보였나 보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나는 정식 사원으로 입사했다. 이듬해 회사에는 사내 카페가 생겼다. 커피 심부름 문화도 자연스레 바뀌었다. 먹고 싶은 사람이 카페로 가서 직접 주문해 먹는 방식으로.
돌이켜보니 인턴인 나도, 선배도 ‘커피 심부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과도기였던 것 같다. 오히려 후배가 커피 심부름하는 것이 당연지사였던 옛 시절이라면 나도 얼른 눈치를 챘을 거다. 혹은 지금처럼 누구에게든 커피 타오라 마라 시키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 시대였다면? 선배 역시 내게 그런 식으로 커피를 청하지 않았을 거라 믿는다.
휘휘 저어 타 먹는 커피 믹스 광고를 볼 때, 나는 그날의 빗나간 대화를 생각한다.
“커피 한 잔 할까?”
“네, 저도 커피 좋습니다!”
어느 날에는 내 발언을 탓하기도 한다. 커피는 어떻게 드시는지, 탕비실에서 제가 타 오면 되는 건지 센스 있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또 어느 날에는 선배의 발언에 책임을 돌린다. 첫날이라 가뜩이나 긴장해 있었는데, 좀 정확히 말해 주시지. 아니, 오히려 커피를 타서 가져다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완벽했을 텐데.
앞으로 누가 나의 행동을 기대하며 애매하게 말한다면? 그렇게 은밀히 나를 평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정확히 되물으리라. 발언 하나라도 불발하기에 아까운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1개월 혹은 3개월이면 끝나버리는 인턴 기간처럼, 가진 발언의 화살이 몇 개 없을 때는 용기 내서 정확히 되묻는 편이 좋다.
혹시 반대 입장에 선다면? 알 듯 말 듯한 한국어 때문에 누군가 망설이는 상황을 목격한다면? 그걸 평가하려 들지 말고 얼른 힌트를 줘야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보다는 ‘이때는 이게 참 헷갈렸지.’라고 기억해야지. 나의 발언이 누군가에게 수수께끼로 남기보단 친절한 힌트가 되길 바란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박솔미(작가)
어려서부터 글이 좋았다. 애틋한 마음은 말보다는 글로 전해야 덜 부끄러웠고, 억울한 일도 말보다는 글로 풀어야 더 속 시원했다. 그렇게 글과 친하게 지내다 2006년, 연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2011년, 제일기획에 입사해 카피라이터가 되었다. 에세이 <오후를 찾아요>를 썼다.






![[박솔미 에세이] 우리의 발언도 소중해서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d/7/3/d/d73d894099e14cfbd6f8a81f3ef651d9.jpg)
![[예스24 경제 경영 MD 강현정 추천] 수익률에 굶주린 주린이들을 도울 책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9/4/1/4/94141e159621b73cb79dd5b95dcf263c.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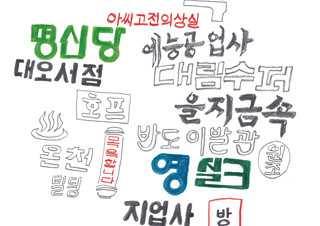

![[에디터의 장바구니] 『파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여자에 관하여』 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07-a24e0ec8.jpg)
![[리뷰] 여성들의 로맨틱한 성장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29-26ddf5f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