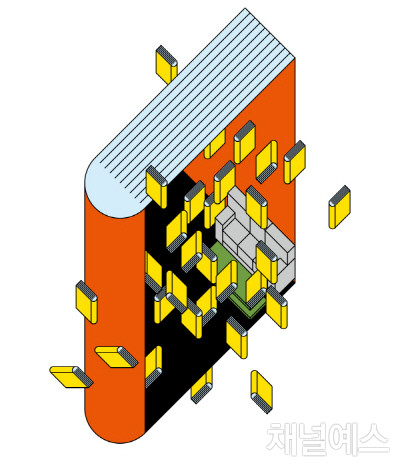
“몇 권쯤 정리했냐?”
“글쎄…… 한 천 삼사백 권?”
“와아, 대단한 걸!”
재활용센터 직원이 철제 책장 한 개를 싣고 떠났다. 뿌듯했다. 책장이 있던 자리에 드러난 맨 벽만으로 거실이 한결 시원해 보였다.
2년 전부터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리라 함은 소장한 책의 도서명, 저자명, 역자명, 출판사명, 출간일, 구매일을 입력해 엑셀 파일로 만들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류 번호를 부여해 나만의 체계를 세운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살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직업 특성상 책이 매달 는다. 작업한 책, 산 책, 받은 책 등 경로 역시 다양하다. 책은 계속 느는데 공간은 정해져 있으니 보관 문제가 생긴다(생겼다). 첫번째 문제는 집이 좁다는 점이다. 비슷한 면적인데도 훨씬 쾌적해 보이는 집들을 대하면서 비결이 궁금했다. 내가 내린 결론은 물건이 적을수록 깔끔해 보인다는 것이다. 새삼 깨달을 여지가 남아 있나 싶은 자명한 사실을 알아내는 데 수 년이 걸렸다. 나는 물건이 별로 없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냉장고도 작은 편이고 그 흔한 전자레인지, 정수기, 텔레비전도 없다. 그런데 어째서 이리도 번잡할까?
책 때문이었다. 책이 최상의 인테리어라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예전에 살던 집에는 거실에 말 그대로 아무 물건도 없었다. 그저 공간이 있을 뿐이었다. 방석조차 없어 주말에 안 나가고 책이라도 읽으려면 딱딱한 맨바닥에서 고행해야 했다. 시각적 쾌감은 컸지만 너무 불편했다. 무소유를 실천해 보려던 생각의 불씨는 곧바로 사그라들어 소파를 들이고 말았다. 아무리 물건을 줄이려 해도 소파처럼 큰 덩어리가 집안에 들어오고 나면 경계심이 무너져 웬만한 물건은 우습게 여겨진다. 그 다음은 빤했다. 금간 수문으로 물이 터져 나오듯 온갖 물건이 난잡하게 자리잡았다.
그러다 몇 해 전 긴 여행을 앞두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됐다. 짐은 늘어났는데 공간이 줄어드니 뭔가를 없애야 했다. 소파는 부동산중개소에서 헐값에 가져갔고 냉장고, 세탁기 등은 고물상에서 수거해갔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수백만 원짜리 제품도 몇 년만 지나면 돈 내고 버려야 하는 거대 쓰레기로 변한다. 덩치 큰 것들을 처분하고 나니 책이 눈에 띄었다. 개별로 보면 우아하지만 무리 지어 있으면 깔려 죽을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
역시 인간은 문제에 봉착해야 비로소 해결책을 찾는 모양이다. 팔 책, 보관할 책을 선별하느라 한 권 한 권 훑어보니 지난 십여 년간 펼치기는커녕 아예 만지지도 않은 책이 수백 권이었다. 당장은 읽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 읽고 싶어질지 몰라 보관하는 책도 꽤 많았다. 재미있게 읽었든 사 두기만 했든 오늘의 나를 길러준 한때의 자양분이었던 터라 내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었다.
트렁크 두 개와 배낭에 나누어 담아 여러 번에 걸쳐 중고서점에 팔았다. 처음 한두 번은 속이 시원했다. 이렇게 버릴 수 있는데 왜 여지껏 품고 살았을까!
“이제라도 눈을 떴으니 다행이지 뭐.”
노바가 책 정리를 도우며 격려했다.
“어리석도다…….”
인간에게 하는 소리인지 나한테 하는 소리인지 헷갈렸다.
“결국 버릴 물건이지만 필요할 때 안 살 수도 없고. 하긴 저녁 되면 어차피 배고파진다고 해서 점심을 거를 순 없지.”
난 못 들은 척 열심히 책을 추렸다.
한편 책 디자인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독서 시간이 현저히 줄었다. 책을 만드느라 읽을 시간이 없다니. 나는 독서 속도가 무지 느린 데다가 어떠한 상이 잡힐 때까지 읽지 않으면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성향이라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일 때문에 읽는 글 말고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한 권을 온전히 읽은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계속 이럴 순 없어. 나를 위한 독서가 필요해’라고 독하게 마음 먹고 읽기 시작해도 스무 페이지 남짓 읽다 보면 어느새 작업 중인 책의 원고 뭉치가 손에 들려 있곤 한다. 가공되지 않은 원고를 읽을 때와 편집을 거쳐 책으로 완성된 글을 읽는 기분은 전혀 다르다. 책으로 읽는 편이 당연히 더 좋다. 나보다 훨씬 치열하게 꼼꼼히 읽어야 하는 편집자들은 독서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궁금하다.
책을 줄이고 싶다는 의지와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두 가지 이유로 책을 사는 양이 현저히 줄었다. 사고 싶은 책 앞에 서서 지금 사면 읽기나 할지, 다른 책을 처분하더라도 들이고 싶을 정도로 갖고 싶은 책인지 등을 따지는 태도가 일상이 되었다.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책을 사는 데 망설인다니, 자괴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단어이리라. ‘책은 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인의 주장에 102퍼센트 동의하지만 실행하는 데는 무수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생각의 흐름을 대략 짚어 보면 이렇다.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사기를 바란다 -> 하지만 아무 책이나 살 수 없다 -> 책 사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면 책 소비가 준다 -> 그렇다고 별 고민 없이 살 수 없다 -> 그러는 나는 사고 싶어할 만한 책을 만들고 있나? -> 질은 차치하고 노고를 들인 상품이니 가치 판단 이전에 구매해야 옳을까? -> 하지만 적선이나 다름없는 구매는 무례하다 -> 내 취향은 아니지만 동의하거나 응원하고 싶은 가치가 깃든 책이라면 읽지 않더라도 사자 -> 그렇게 사다가는 또 다시 책장이 넘칠 텐데 -> 있는 책을 더 버리자 -> 결국 버릴 거라면 애초에 사지 않는 편이 낫지 않나? ->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남이 만든 책도 열심히 사자 -> 만드는 사람만 사고 다른 사람은 사지 않는다면 책이 무슨 소용인가 -> 시야를 넓혀 반성하는 의미로 책이 아닌 다른 물건도 열심히 사자 -> 다른 물건은 책보다 훨씬 비싸다 -> 다른 물건을 사면 책 살 돈이 부족해진다 ->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벌자 -> 일을 더 할수록 읽을 시간이 더 줄어든다 -> 읽을 시간도 없는데 책은 무슨 ->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래선 안 되지 -> ……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모조리 사고 싶은데 아무것도 살 수 없다. 인간의 정신은 모든 가치를 수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실행은 한 가지씩 밖에 할 수 있으니 이 무슨 형벌인지.
“이 자식! 너 꼼수 부렸구나!”
방 문을 열더니 노바가 외쳤다.
“히히히, 들켰네.”
책장 정리는 사실상 실패다. 도저히 솎아내지 못한 책 수백 권을 안 쓰는 방 책상 위에 쌓아 두었다. 어쨌든 책장 한 개는 줄였으니까. 그 방은 다음 이사 때까지 문 닫고 지내면 그만이다.

이기준(그래픽 디자이너)
에세이 『저, 죄송한데요』를 썼다. 북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윤경희 칼럼] 인 메디아스 레스 II (사건의 한가운데서 II)](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18-ac1ea350.jpg)
![[예스24 큐레이션] 책을 담아내는 그릇, 판형](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27-d60538f2.jpg)
![[큐레이션] 손끝에서 생생하게 읽히는 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25-c94f6761.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Read with me] 김나영 “책을 통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9-f468d247.jpg)


찻잎미경
2018.03.31
책. 기증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드나들며 볼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구요. 집 근처에 작은 동네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죠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