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것은 2016년에 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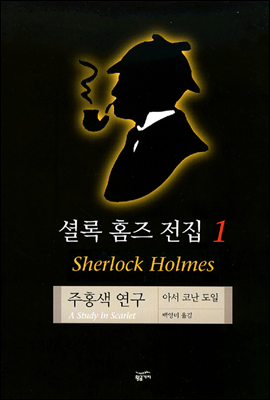 |
 |
1. 11.
『셜록 홈즈: 주황색 연구』를 읽었다. 과연 코난 도일이 부끄러워할 만했다. 실제로 코난 도일은 『셜록 홈즈』를 청소년 소설이라 생각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문장이 직설적이고 단순했다. 간결하다기보다는 단순했다. 게다가, 홈즈의 넘겨짚기 식 추론은 적극적이다 못해 주제넘은 면이 있었는데, 이를 독자들이 좋아했던 것으로 보인다(아, 이런 것이 통하는 구나, 하며 변방작가로서 자책했다!)
 |
 |
이 책의 1부는 다소 산만했으나, 2부는 이야기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본 영화 <헤이트 풀 8>처럼 후반부에 가서 사건의 전말을 과거에서부터 연대기적으로 풀어 놓음으로 인해 독자들로 하여금 이야기에 푹 빠지게 만들었으니, ‘아! 이래서 코난 도일의 책을 읽는구나’ 하며 나의 근시안적 비판에 대해 또 자책했다. 하지만, 이 일기의 목적이 ‘절도’인 만큼, 나는 코넌 도일이 2부에서 보여준 기법을 과감하게 훔치기로 했다. 가급적이면 나의 차기 작품에 이 기법을 활용할 생각이다. 주서사를 전개하다,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시작하여 한참 지난 후 주 서사로 돌아오는 기법! 이것을 훔칠 것이다, 라고 여겼으나, 이미 내 망한 소설 『풍의 역사』에 써 먹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첫 일기가 이상하다.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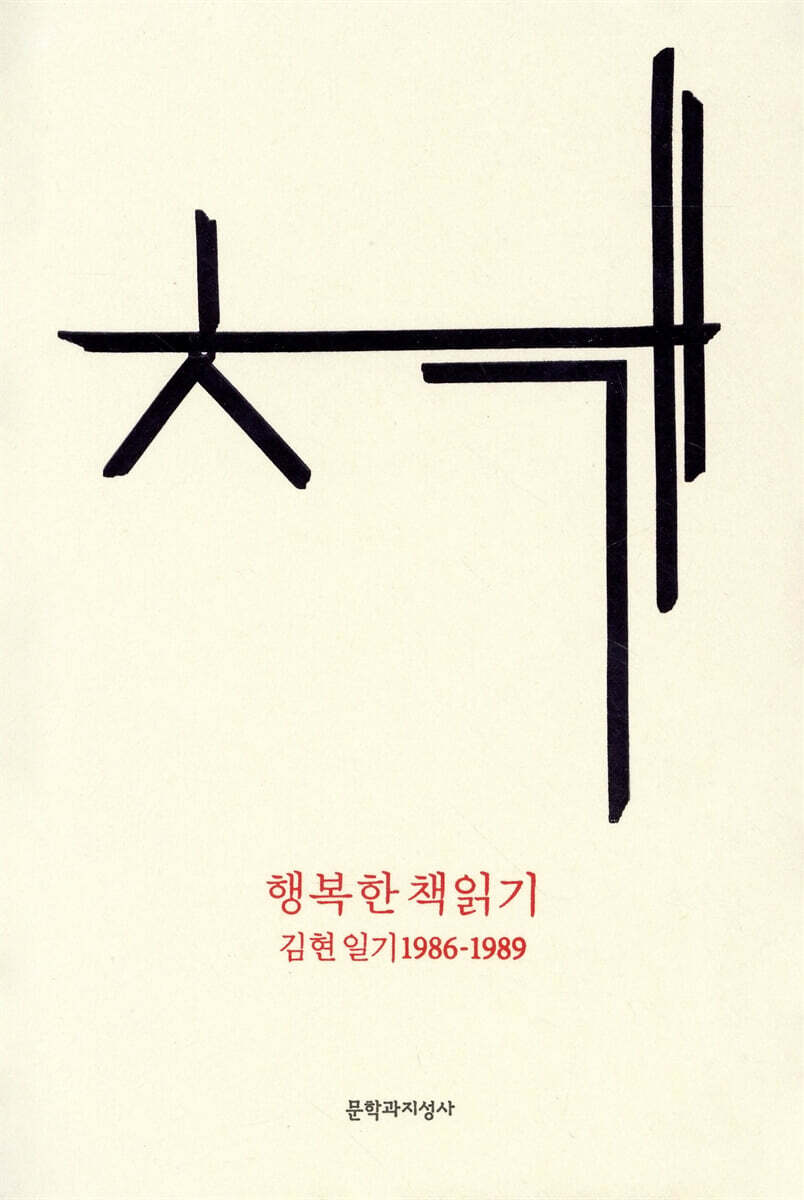 |
 |
허니문을 왔다. 와이키키 해변에서 온 몸에 오일을 바른 후 김현의 『행복한 책읽기』를 읽고 나니, 책장이 기름투성이가 됐다.
조식으로 아내가 일천 칼로리가 넘는 팬 케이크를 주문해서, ‘어쩌자고 이런 걸 시켰느냐?’고 했는데, 한 입 맛본뒤로 계속 먹었다. 구백 칼로리 이상을 내가 먹었다.
방금 가슴이 큰 여자를 보다가, 아내에게 들켰다. 그녀가 “우리 대화 좀 해”라고 했다.
오늘은 더 이상 쓸 수 없다.
1. 20.
SNS에 떠도는 ‘배우 유아인의 필력’이란 글을 읽었는데, 역시 잘 썼다. 얼마나 잘 썼느냐면 장근석보다 잘 썼다. 하여, 유아인의 글을 보며 반성했다. 다른 직군에 종사하는 자의 글이 소설가의 글보다 훌륭하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내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는 작가가 되기 전에 한 작가의 책을 읽으며 감탄했는데, 결국은 잘 생긴 작가의 책만 팔리는 걸 보고 역시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외모’라고 여겼는데, 전략을 전격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는 글을 잘 쓰는 것이 나의 전략이다.
그나저나 매끈한 몸매의 배우가 글을 잘 쓰니, 어째야 이에 응수할 수 있을까. SNS에 ‘작가 최민석의 복근’ 같은 사진이 공유될 만큼 운동을 해야 하는데, 누군가 내 노출 사진을 찍을 일이 없으므로 소설가답게 복근이 있다는 거짓말을 근사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겠다. 방금 전략을 좀 더 글을 잘 쓰기로 수정한 것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독서일기인데 자꾸 이상해진다.
 |
 |
1.31.
유시민의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을 읽었다.
책 제목에 자기 이름을 넣는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어떠할까. 이것은 자신감인가, 출판사의 간청에 응답해주는 너그러움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이, 방금 이 칼럼 제목에 내 이름이 들어가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기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은 문학적 글쓰기가 아닌, 논리적 글쓰기를 훈련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달리 말하자면, 문학적 글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읽었다. 다 아는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흥미로웠다. 작가에 대한 호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작품의 흥미도는 작가의 호감도에 비례한다.
이 책의 셀링 포인트는 ‘유시민’이라는 저자의 명성이다. 글쓰기를 익히고 싶은 독자도 있겠지만, 유시민의 생각과 글을 접하고 싶은 독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 독서는 어찌 보면 며칠 동안 저자와 하는 간접 데이트가 아닌가. 작가가 유명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제목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도, 이 책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러고보니, 제목에 작가 이름을 넣은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 도대체 내 칼럼에 내 이름은 왜 들어가 있는가.
유명해져야 한다는 문학의 중요한 전제조건을 훔쳐 오기로 했다.
헌데, 이것이 과연 절도가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
 |
.
2. 2.
데이비드 실즈의 『문학은 어떻게 내 삶을 구했는가』를 읽었다. 6년 째 작업을 하고 있는 카페의 직원이 ‘이 작가, 미국의 최민석이에요!’ 해서 읽었는데, 무지 재미가 없었다. 유아인에 이어, 이 책이 재미없다는 사실이 내게 좌절감을 선사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키 팬의 슬픔은 자신의 근사한 꿈이 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 양키를 삼성으로 바꿔도, 이 문장의 진실은 유효하다. 덧붙이자면, 엘지 팬의 슬픔은 자신의 근사한 꿈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
데이비드 실즈는 이 책을 콜라주 형식으로 썼다.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썼다는 말이고, 글들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도 된다. 나는 무수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을 훔치기로 했다. 한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다). 이 일기를 벌써부터 콜라주 형식으로 쓰고 있다. 데이비드 실즈는 다음 문장으로 이 책을 끝냈다.
“나는 문학이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길 바라지만, 그 무엇도 인간의 외로움을 달랠 수 없다. 문학은 이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바로 그 때문에 문학은 필요하다.”
젠장, 나랑 정말 안 맞는 작가다. 이런 식상한 말로 책을 끝내다니. 이 책에서 가장 잘 쓰인 글은 바로 역자의 말이다. 마침, 이 책의 번역가가 사준 고급 샌드위치를 먹으며 이 글을 쓰고 있다. 역자에겐 미안할 뿐이다.
이러다가 한 해 25권이 아니라, 50권을 읽을 것 같다.
[추천 기사]
- 에세이 대(對) 소설 <내부자들>
- 내가 사랑한 수다 <한밤의 아이들>
- <셜록> 홈즈의 아버지에 대해
- 수미상관식 삶 <헤이트풀8>
- 나의 인턴 시절 이야기 <인턴>
셜록 홈즈 전집 1
출판사 | 황금가지
풍의 역사
출판사 | 민음사
코너스톤 셜록 홈즈 전집
출판사 | 코너스톤(도서)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출판사 | 생각의길
행복한 책읽기
출판사 | 문학과지성사

최민석(소설가)
단편소설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로 제10회 창비신인소설상(2010년)을 받으며 등단했다. 장편소설 <능력자> 제36회 오늘의 작가상(2012년)을 수상했고, 에세이집 <청춘, 방황, 좌절, 그리고 눈물의 대서사시>를 썼다. 60ㆍ70년대 지방캠퍼스 록밴드 ‘시와 바람’에서 보컬로도 활동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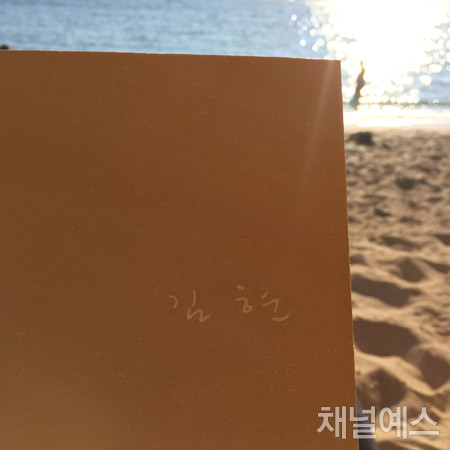
![[추천핑] 어쩔 수 없이 밀려남에 고하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19-727bd620.jpg)
![[구구X리타] 책에 다가가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05-c6ca0efe.png)

![[큐레이션] 인류애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소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21-9bf6400c.png)
![[둘이서] 김사월X이훤 - 두 번째 편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03-4cab7b4b.jpg)








iuiu22
2016.02.25
지성빠르크
2016.02.19
지성빠르크
2016.02.19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