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전인
사진: 전인
극작가에게 있어 자신의 대본이 배우의 입으로 발화되는 순간은 종종 긴 호명(呼名)처럼 느껴진다. 작가가 어미나 조사 따위의 작은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집과 강단의 사이에 놓인 작가적 고집 그 자체에 대한 논의와 무관히,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무한히 개인적이다. 지난봄, 나는 태어나 처음 온전한 이름으로 호명되었다. 내가 모르던, 내게 없던 이름이었다. 오월에 오른 연극 <한 방울의 내가> 공연장에서였다.
연극 <한 방울의 내가>1는 2022년 가을 『릿터』 38호에 발표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일인극이다. 이 소설에 관해 내가 딱히 각별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뜻은 내가 발표한 내 소설 가운데 어느 것도 특별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반했다. 내가 내 글의 완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점수제가 아니라 O/X 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단 ‘O’라는 생각이 들면 그들 중 무엇이 더 낫고 말고를 고민하지 않았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아닌 물방울 하나의 이야기였다. 이를 연극 대본으로 각색하면서 배우는 경지은이라고 생각했다. 경지은이 말해야 하는 말들과 경지은이 움직여야 하는 몸들. 그렇게 생각되었다. 경지은이 함께하기로 결정 난 뒤, 그의 언어를 반영해 희곡을 다시 고쳤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라는 말은 소설에 총 세 번 나오지만 희곡에는 여덟 번 나오는데, 두 글의 분량을 생각하면 차이가 컸다. “그럼, 그럼”이나 “그래, 그래”도 마찬가지였다. 경지은이 여러 무대에서 그런 말을 할 때면, 나는 그게 흐르는 방식보다 고운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느끼곤 했으니까. 대본은 차차 비음에 더해 연구개음과 유음 운율을 많이 가지게 됐고 시처럼 단순해지며 각 글자의 무게가 무거워졌다. 이때부터 대본이 발화되는 순간이 내게도 무거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내 이름처럼 느끼면 안 될 것 같았다. 대본은 작가의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예술이나 직업 정신을 차치하고서도 그랬다. 이 이름은 너무 길고 어려웠다. 끝내 제대로 불리지 못할 터였다.
그리고 그림 형제의 동화 「룸펠슈틸츠헨」을 떠올렸다. 자신의 이름을 맞추는 조건으로 내기를 건 꼬마 요정 혹은 악마 ‘룸펠슈틸츠헨’은 상대가 당연히 자기 이름을 알아내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이야기 말미에 자신의 이름이 정확히 불리자 파멸하고 만다. 물이 주인공인, 주변 인물이 오리며 바람이며 세상인 이 이상한 텍스트는 쉼표 하나까지 올바른 자리에 세밀하게 속했다. 이를 그대로 부를 사람은 없을 터였다. 아마도 나는 파멸에서 안전한 것 같았다.
 사진: 김태리
사진: 김태리
하지만 공연을 앞둔 어느 날, 리허설을 지켜보던 나는 내가 이 말들을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대와 의상을 맡은 윤이람이 제작해 온 오브제가 공간에 설치되고, 작곡과 피아노 연주를 맡은 오정웅이 강이나 오리, 바람의 대사를 연주로 구현했다. 어떤 말들은 하은빈을 거쳐 춤이 되었고, 그 모두를 우지안이 장면들로 가다듬었다. 빛이 있었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대사들이 있었다. 경지은이 까마득히 낯선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때 거기 있던 것들 가운데 내가 이미 알던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아주아주 오래전부터 이 모두를 무척 그리워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19절)
그러니까 어떤 호명은 수행발화(遂行發話)라는 것. 경찰이 ‘당신을 체포합니다’라고 말하면 체포가 성립되듯이, 누가 나를 부르면 그게 내 이름이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말들은 내 이름이었던 적 없었다. 이 말들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이 말들은 말을 둘러싼 모든 것이므로. 마침내 막이 열리고 관객이 입장했다. 소리가 늘어나고 내키는 대로 합쳐졌다. 표음하던 글자들이 일제히 표의를 시작했다. 있어야 할 것들이 여기 다 있었다. 그러니까 그날 공연장에 있던 당신이 울음을 참느라 내쉰 큰 숨이, 배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느라 카펫에 짚은 손바닥이, 안경테가 밀어 올려지며 찰나에 반사한 조명이 다 말이 되고 있었다. 연주자 오정웅이 즉흥적으로 누른 건반에서 시작되어 조율하지 않은 낡은 피아노를 거쳐 막 태어난 이 음들의 덩어리가 전부 말이 됐다. 그래 내 이름의 한 글자였다. 그냥 그 순간에만 잠시 그랬다. 그러니까 호명과 명명이 왈츠를 췄다. 사방에서 이름들이 켜지고 꺼지고 열리고 변주되고 흔들리고 전해지고 환해지고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나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자신을 인지하기 위해 배운 이름이 차차 타인에게만 쓰이게 되듯, 진실로 이 모두를 나는 두 번 다시 부르지 않게 될 터였다. 나는 내게 더는 불리지 않을 사람이었다.
“나에게도 나는 하나의 시작을 부여해야만 하니까”2
 사진: 김태리
사진: 김태리
1장
고요.
무대 한쪽에 단순하고 어슴푸레한 빛이 비친다. 배우가 거기 눕는다.
‘나’는 웅덩이 상태의 물이다. 명징한 음 하나로 음악이 시작된다. 나는 깨어나 자신을 살핀다. 천천히 움직이거나 가만히 누운 채로.
나 이번 생의 나는 웅덩이인 모양이다. 그러나 조금도 실망은 없다. 언제나 바다일 수는 없는 법.
“나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다고 믿고 있거든, 단지 지금까지 오로지 말론만 내가 알아보았던 거야.”4
“눈송이처럼 많은 우주 하나하나마다 다른 결말을 가진 네가 있다고.”5
“말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의 눈물을 찾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찾음으로써 암흑으로부터 헤어나고자 하는 거대하고 이산된 몸”6
“그러면 조용해지겠지, 아주 잠깐은, 한동안은, 아니면 내가 가져봤던 침묵이 펼쳐지는 거야, 오래가는 침묵이”8
백지에 적은 모든 글자가 내 이름처럼 느껴질 때, 이 느낌이 사실이 아님을 주지하려 나는 분투해 왔다. 그러나 2024년 5월의 어느 날, 바람이 노긋하고 장미가 나긋하던 밤, 내게 없던 긴긴 이름을 불러 준 이들이 있었다. 그러자 하나의 내가 자신을 알고 사라졌지만, 나는 제 이름을 듣고 절망에 차 없어져 버린 룸펠슈틸츠헨은 아니었다. 나는 오히려 비로소 여기 있게 되었다고 느꼈다. 저 나의 소멸을 이 나의 생성이 증명할 수 있었다. 객석과 무대가 구분되지 않는 공연장의 모든 문 안과 밖에서 실컷 사라지고 생겨나면서, 나는 틈틈이 고개를 돌려 창밖으로 세상의 암전을 지켜보았다. 거기서도 무언가 끝나거나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1 관련 내용은 안티무민클럽 인스타그램 참고2 사뮈엘 베케트 지음, 전승화 옮김, 『이름 붙일 수 없는 자』, 워크룸프레스, 16p.
3 희곡 <한 방울의 내가> 중.
4 베케트 같은 책, 11p.
5 희곡 <한 방울의 내가> 중.
6 나탈리 레제 지음, 김예령 옮김, 『사뮈엘 베케트의 말없는 삶』, 워크룸프레스, 2014.
7 희곡 <한 방울의 내가> 중.
8 베케트 같은 책, 198p.

현호정(소설가)
『단명소녀 투쟁기』 『고고의 구멍』, 『삼색도』 등을 썼다. 2020년 박지리문학상, 2023년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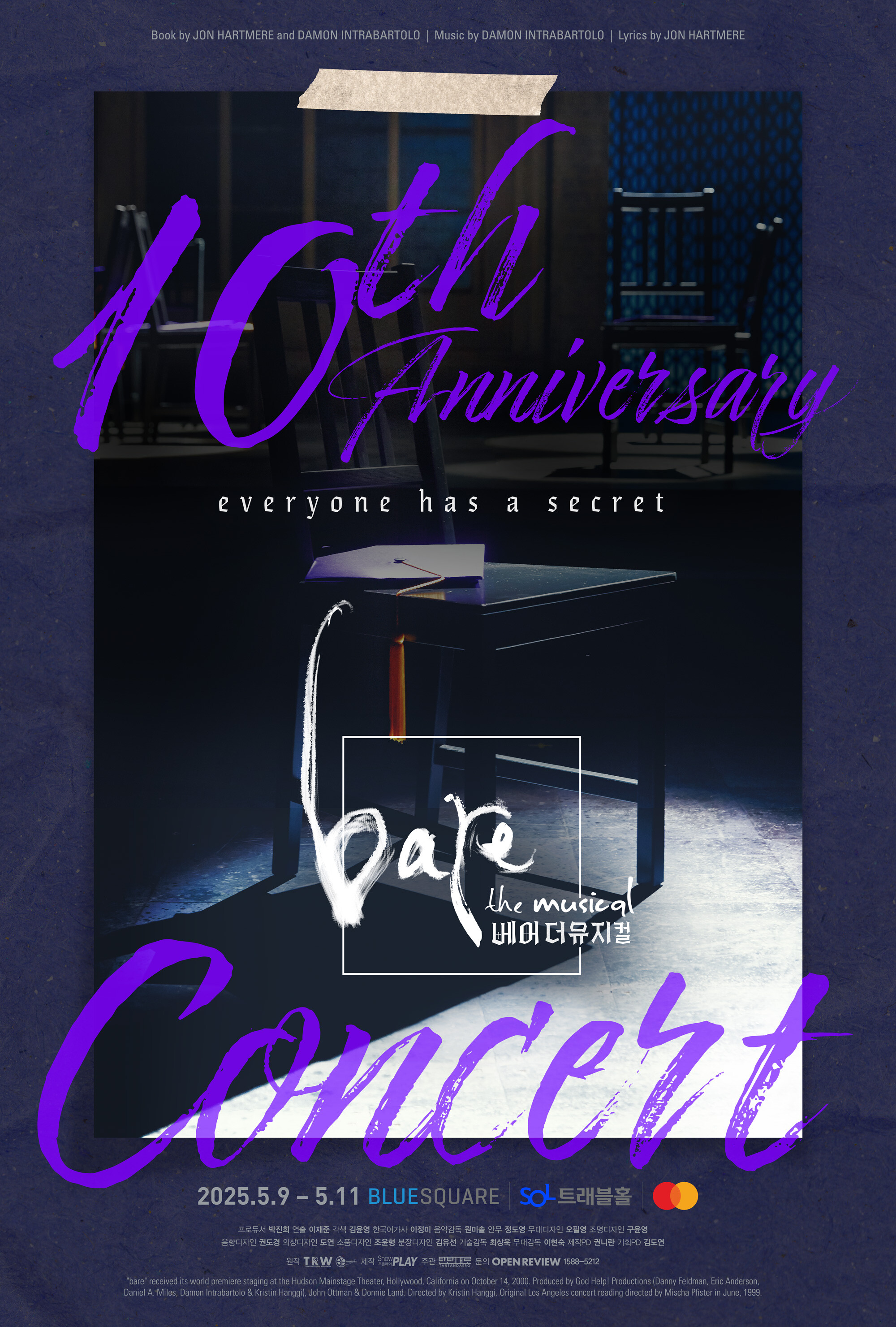
![[더뮤지컬] 신춘수 프로듀서, 매일 새로운 꿈을 꾸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20-65a28292.jpg)
![[현호정의 옛 담 너머] 씨앗과 꽃이 그랬듯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5/c/3/3/5c33c82e7e854f24b41c1afe117d898a.png)
![[현호정의 옛 담 너머] 병이 낫고 나니 봄바람은 가 버렸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d/4/2/5/d4254fdf7639dd84f4da12f3dc3e4d92.jpg)
![[현호정의 옛 담 너머] 나무껍질 샌드위치](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0/7/a/9/07a932d1856d5327db0a1b3eb8e455b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