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융 저자
강병융 저자
세태를 풍자하는 날카로운 시선과 독특한 소재의 활용으로 자신만의 독자층을 탄탄히 쌓아온 소설가 강병융. 그의 이번 산문 『문학이 사라진다니 더 쓰고 싶다』는 한국인에게 낯선 ‘슬로베니아’라는 환경에서 내딛는 발걸음으로부터 뻗어 나가며 전작보다 한층 더 솔직하고 단단해진 사유를 보여준다. 오후의 산책처럼 유쾌한 그의 문장에는 재미뿐만 아니라, 문학과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도 함께 깃들어 있다. 문학의 쓸모를 발굴하는, ‘샤페코엔시’ 같은 문학을 꿈꾸는 소설가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샤페코엔시’가 무엇인지, 그의 이야기가 문학을 어떻게 소생시킬지는 책장을 넘겨봐야 알 일이다. 문학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왕래가 끊겨 못내 그리웠던 옛 친구의 전화 한 통처럼 울리고 있다.
3년 만에 새로운 산문집으로 독자분들의 곁을 찾아주셨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작가님에게 ‘낯섦’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명작가니까 거의 모든 사람에게 낯선 사람이지만 (웃음)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에 사는 대한민국 작가 강병융입니다. 소설과 에세이를 쓰는 산문 작가이고요. 현재 류블랴나대학교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20년 정도는 슬로베니아에서 같은 일을 할 예정입니다. 쿤데라와 홍상수를 애정하고, 오레오와 함께 일리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하며, 멜빵 바지를 자주 입고, 펀코팝(Funko Pop)을 모으는, 주로 자전거나 보드를 타고 출퇴근하는 키가 좀 큰 아저씨이기도 합니다.
현재 슬로베니아에서 거주하시며 글을 쓰고 계시다고요. 슬로베니아라는 나라 자체가 한국인에게 좀 낯설게 느껴질 텐데, 환경이 달라지면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나라의 환경이 선생님 글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남이 쓴 작품 속에서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에게 살기 가장 좋은 곳은 한국이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좋은 곳에서 사는 건 아니죠. 나의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곳, ‘우리’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죠. 슬로베니아는 제게 그런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에 살면서 좋은 것을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제 삶이 더 긍정으로 찰 테니까요. 또 그것이 제 문학에 긍정성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각박해지는 요즘, 문학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긍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목숨만큼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사는 곳, 슬로베니아에서 긍정성을 찾자는 것이 제 삶의 모토이자, 제가 문학을 바라보는 태도 같습니다.
슬로베니아 대학의 교수들에게는 개인 연구실이 없습니다. 보통 4명이 연구실을 같이 쓰지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아요. 같이 있으면 자신에게 더 엄격해지고, 연구하면서 힘든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도울 수 있거든요. 대학 건물과 시설은 한국보다 훨씬 나쁘지만, 역시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고, 식비까지 내주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좋은 건물에서 배고프게 공부하는 것보다 낡은 건물에서 든든한 상태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는 것이 행복하거든요. 편의점이 없어 밤이나 휴일에 무엇을 사기 불편하지만, 투덜거리지 않죠. 저녁과 휴일에는 되도록 많은 사람이 친구 혹은 가족들과 같이 있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낯선 환경을 내게 맞게 해석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이방인의 삶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이 바로 문학의 위기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방인의 삶이 문학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일러준 셈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저의 문학적 스승 중 하나인 셈입니다.
산문집의 제목이 이번에도 심상치 않습니다. 평소 세태를 풍자하는 날카로운 시선과 독특한 소재를 활용하는 소설을 쓰시는 것으로 잘 알려진 작가님이잖아요. 이번 책의 제목에서도 작가님 특유의 반골 기질이 드러나는, ‘청개구리’ 냄새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제목을 지어 주셨는지 설명해주세요.
언젠가, 어디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설가 강병융이 헐크라면, 에세이를 쓰는 강병융은 로버트 브루스 배너 박사라고. 에세이는 늘 사람 냄새가 나게 하려고 노력하죠. 이번 책 제목에서 살짝 '반골'의 내음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학이 사라진다고 하여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하겠다는 다짐 같은 것입니다. 난 여전히 나의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령 CD가 등장했을 때, LP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들 말했죠.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요. 제 말은 그런데도 그냥 LP를 계속 듣겠다는 선언입니다. 여전히 LP의 음질이 좋으니까요. 거기엔 제 추억들도 있고. 다만 LP만 듣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CD도 들을 겁니다. 세상이 더 발전해 CD조차 사라져 디지털 음원이 주류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LP를 듣겠습니다. 물론 디지털 음원 사이트도 구독하면서요. 새로운 것이 생기면 새로운 것을 맛보면 되지, 굳이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버릴 이유는 없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그것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는 한, 어머니는 어디 계시든 존재하시는 것이죠. 내가 문학을 하고 있으면, 문학은 사라지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런 의미가 담긴 제목입니다.
「디지털인지 아날로그인지 모를 추억들」이라는 꼭지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작가님의 추억을 재미있게 풀어주시면서, 우리의 추억들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에 의해 생긴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문학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디지털’의 발전과 문학의 죽음이 상관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문학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문학이 죽은 적이 없으니 다시 살아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늘 앞서서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문학이 ‘국가의 경제’와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항상 힘들다, 어렵다, 빈부의 차가 크다, 수출이 문제다, 과소비가 심하다, 등 나쁜 쪽으로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상당 기간에 대한민국 경제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렇게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 아닐까요?
문학도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라고들 떠들지만, 저는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쓰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단언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쓰고, 더 잘 쓰길 원합니다. 그리고 종이에 새겨진 글을 읽진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읽고 또 읽고 읽습니다. 쓰기와 읽기가 문학의 뿌리라면 지금처럼 문학의 뿌리가 깊고 넓게 자리 잡은 시기가 있었을까요?
이번 산문집에서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꼭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사실, 이번 책을 문학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순 없을 겁니다. 그보다는 제 생활 속 사색에 관한 책이죠. 그런데, 제 생활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문학’이고, 또 단상의 대부분은 결국 문학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이를 “삶과 문학에 관한 가장 겸손한 사설”이라고 표현했는데,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런 까닭에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꼭지는, 저의 이런 생각을 가감 없이 담은, 그리고 가장 짧은, 제일 마지막에 수록된, 「문학이 사라진다고들 하니 더 쓰고 싶어진다 2」입니다. 1도 아니고, 무려 2입니다. 260쪽에 있죠. 하지만 이 꼭지는 앞의 꼭지들을 다 읽은 후 읽어야 마음에 더 와닿을 겁니다.
작가님은 독서를 사랑하는 소설가로 유명하시죠. 독서와 관련한 에세이도 출간하신 경험이 있으시고요. 최근 가장 읽고 싶은 책은 무엇인지, 문학 외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냥 기준 없이 아무거나 막 읽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서재에 있는 책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읽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여기 있는 책을 다 읽을 테니, 뭐 이런 생각으로요. 영화도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A부터 순서대로 빌려 봤어요. 그때는 젊었고, 시간도 많았고, 독서의 속도도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읽은 것 중에 머리와 마음속에 남이 있는 것들을 다시 읽는 것을 좋아해요. 최근엔 밀란 쿤데라를 다시 읽고 있어요. 한 작품, 한 작품 다시 읽으면서 놀라고 감탄하고 또 놀라고 감탄합니다. 언젠가 ‘쿤데라’라는 제목으로 헌정 소설을 쓰고 싶을 정도로요. 조금 더 깊게 쿤데라를 이해하게 된 후,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문학 외의 장르로 잘 알려지지 않고 숨겨진, 자질구레하고 사소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담긴 트리비아(trivia)를 읽는 것을 좋아해요. 예컨대, <All the Songs: The Story Behind Every BEATLES Release>를 읽으면, 비틀즈 가사의 의미도 더 깊게 알 수 있고, 멤버들의 삶과 생각이 보여서 나중에 음악을 들을 때, 더 깊고 큰 상상력을 불어넣어 감상을 돕습니다. 또 <피키 블라인더스(Peaky Blinders)>나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처럼 천 번 정도 본 드라마의 오피셜 북도 좋아하는데, 아무 데서도 쓸 수 없는 지식을 쌓는 묘한 맛이 있습니다. 저는 요런 짓을 ‘자위적 독서’라도 합니다. 고퀄리티의 게임 북도 읽는데,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의 공략집(The Complete Official Guide Expanded Edition) 같은 것은 게임만큼이나 완성도가 높거든요. 나도 야생의 숨결과 같은 대작을 쓴 후에 고퀄리티의 ‘작품 독법집’ 같은 것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고 보니, 문학 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가사도, 드라마도, 게임도, 결국 다 문학이라면 문학이잖아요.
책과 문학을 놓지 않고 꾸준히 읽어주시는 독자들께 한마디 남겨주세요.
독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독자들을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가족, 친구들, 제자들 그리고 독자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독자들을 사랑할 테니, 독자분들은 문학을 더 사랑해주시길.
*강병융 1975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다. 2013년부터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서 살고 있다. 명지대학교와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했다. 현재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교 아시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소설 『손가락이 간질간질』,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나는 빅또르 최다』, 『Y씨의 거세에 관한 잡스러운 기록지』 등을, 에세이 『아내를 닮은 도시』, 『도시를 걷는 문장들』, 『사랑해도 너무 사랑해』 등을 썼다. |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문학이 사라진다니 더 쓰고 싶다
출판사 | 마음의숲

출판사 제공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채널예스>에만 보내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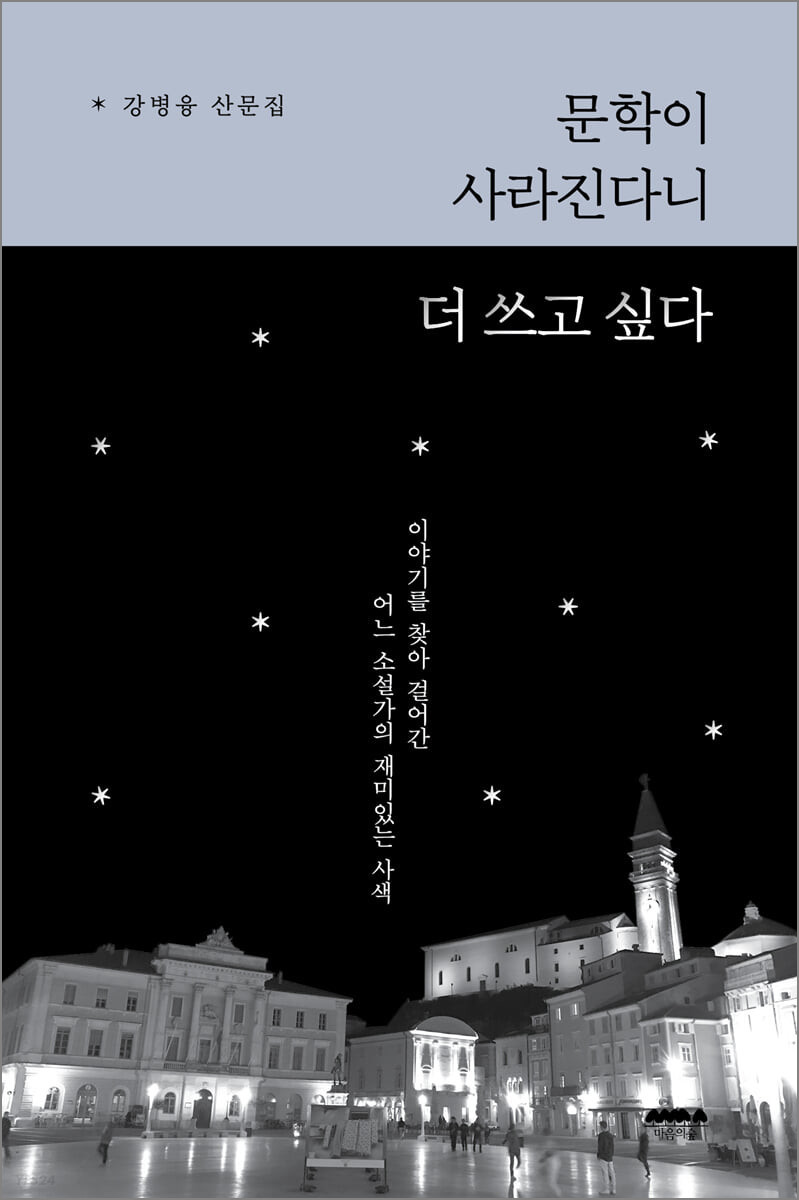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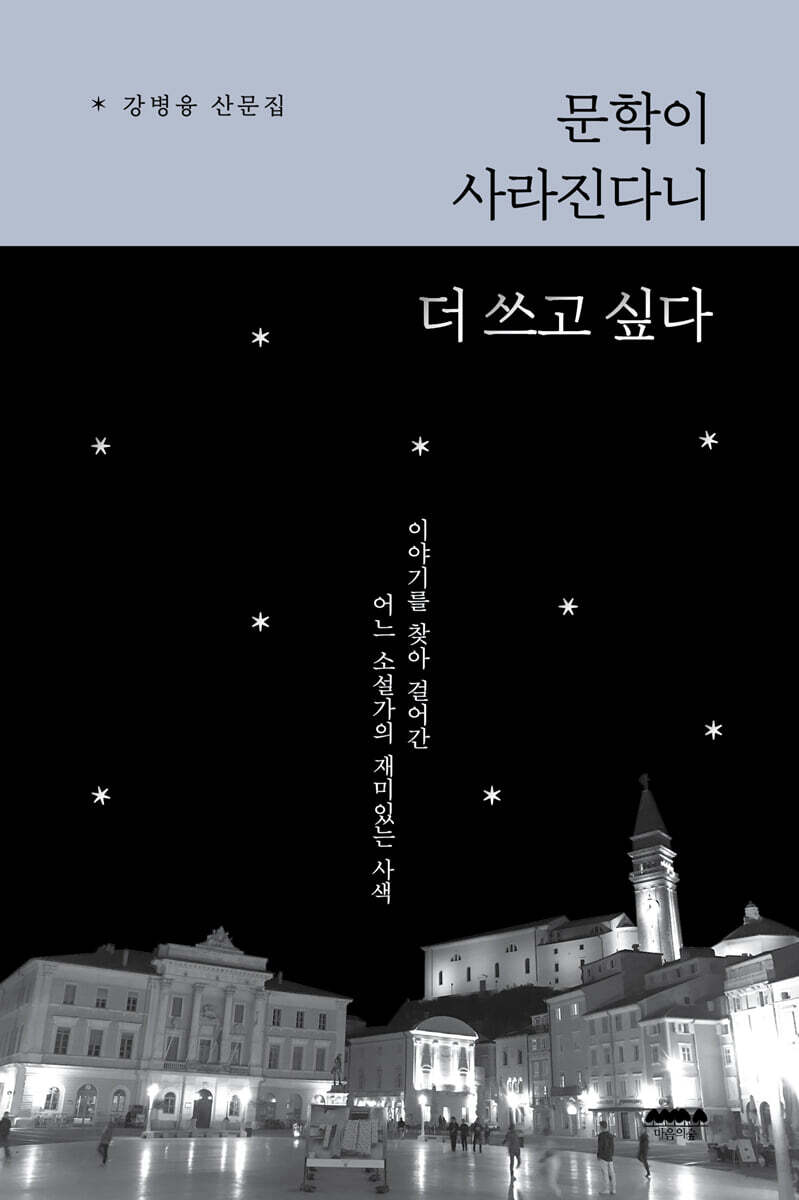




![[취미 발견 프로젝트] 11월이라니 갑작스러운데, 2025년 취소해도 돼?](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30-b2d627fe.jpg)
![[젊은 작가 특집] 장진영 “글을 쓰면 멋진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3a5c6c82.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리뷰] 뻔히 아는 이야기를 기다리는 이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7-cbde7cbc.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