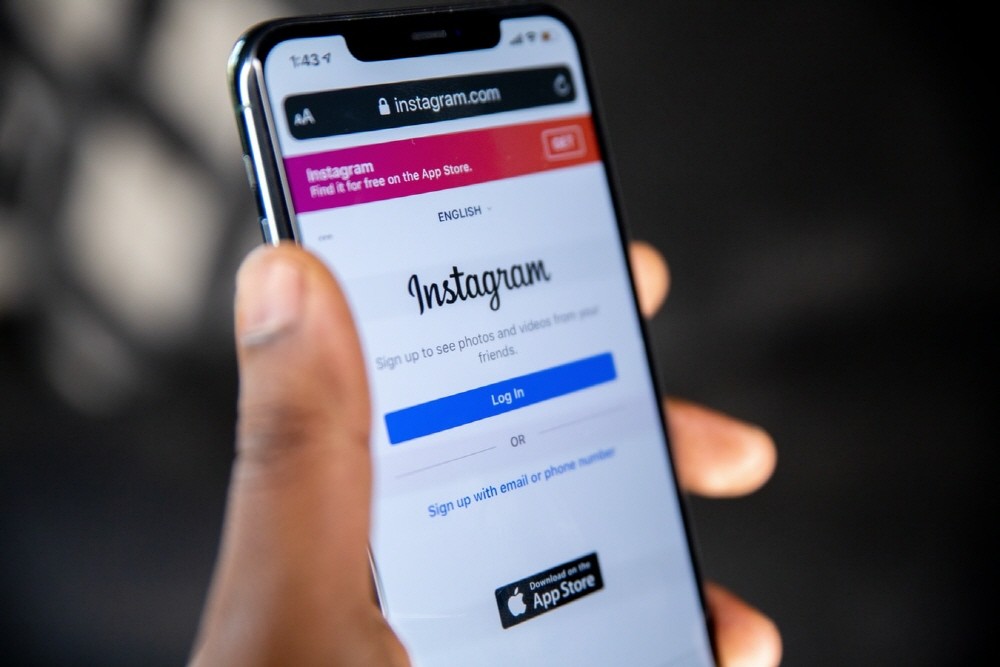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소셜미디어가 재밌으면서도 밉다. 우리를 반짝이게 하면서도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 사진을 올릴 때는 특별한 날이지만, 남 사진을 볼 때는 주로 보통 혹은 보통 이하의 날이다. 내가 가장 별로인 순간에 남들의 빛나는 순간을 구경하는 곳이 바로 소셜미디어라는 공간이다. 그들의 빛과 나의 어둠이 극명한 날이면 잠을 설치기도 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자랑하듯 올려놓은 물건 사진을 볼 때 우리는 쉬이 쪼그라든다.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남은 쉽게 가졌다고 생각할 때, 불안은 극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비슷한 것이나마 찾아내 구매하고 만다. 그럼 빛나 보이던 삶의 작은 조각이 내 것이 된 기분이다.
소셜미디어가 마케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우리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무료로 이용하는 대가로, 우리의 관심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점을 짚어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다. 나는 깊이 공감했다. 그럼 그렇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삶의 단편을 오려내 사진과 영상으로 올리며, 이름 모를 누군가가 찰나의 부러움을 느끼게 한다. 그 얄팍한 시샘은 사진 속 물건이나 옷을 구매하는 것으로 해소된다. 소셜미디어란 거대하고 은밀한 광고 공장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한 쪽만 늘 당하고 있는 건 아니다. 언제라도 누구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랜선 집들이를 예로 들어보자. 근사한 집을 가진 A씨의 사진 다음에는 그보다 더 멋진 집을 가진 B씨의 사진이 있기 마련이다. 누군가 A씨의 사진을 보는 동안, A씨는 B씨의 집을 둘러보며 불안해진다. B씨 역시 C씨네 집을 보며 흔들리겠지.
나도 자유롭지 않다. 은근슬쩍 내가 가진 물건을 자랑하듯 보여주면서도 다른 이의 사진에 현혹된다.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너무 예쁘다!” “완전 부러움!” 사이를 오가다 보면 마음이 어지럽다.
나 역시 랜선 집들이 역시 대단하게 치른 전과가 있다. 신혼집에서 더 넓은 집으로 옮기며 총 두 번에 걸쳐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바닥부터 벽까지 남편과 나의 취향으로 싹 뜯어고쳤다. 노력도 들었고, 시간도 들었고, 돈도 많이 들었다. 마침내 완성한 우리의 집을 사진으로 찍어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어느 밤 화면 너머로 구경하던 그 사람들처럼 나도 멋진 집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속감은 꽤 아늑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언제 어디서나 발견했기 때문이다.
방송국에서도 집을 찾아왔다. 우리 부부는 허리춤에 마이크를 차고, 커다란 카메라를 보며 집을 소개했다. 벽은 왜 하얗게 칠했고, 가구와 선반은 왜 나뭇결이 느껴지는 거로 골랐는지. 부엌 상부장은 왜 설치하지 않았고, 조명은 왜 노란 것으로 골라 달았는지. 전국을 상대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에 나의 멋진 집을 소개했다. 황홀한 기분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우리 집보다 더 나은 집이 연달아 방송됐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져도 지구 어딘가에는 더 좋은 집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내 가방보다 더 좋은 가방, 내 차보다 더 좋은 차는 어디에나 있다. ‘좋은 것’을 찾기 보다는 ‘나의 것'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줄줄이 소시지처럼 엮인 부러움과 불안을 끊어내려면 그래야 했다.
인터뷰 요청은 이내 잠잠해졌다. 역시, 우리 집보다 더 나은 데를 발견해낸 게 틀림없었다. 꽤 오랜 기간 미련을 없이 잊고 살았다. 그러다 최근에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에서도 랜선 집들이 인터뷰 요청이 왔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나의 불안이었다. 남의 집을 둘러보고 나면 기어이 도둑처럼 내 집에 찾아오던 바로 그 불안감. 내 집 자랑 한 번 하겠다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들에게 그런 불안감을 심어줘도 되는 걸까? 끝없는 집들이 리스트에 내 집 한 채를 더 보태면 안 된다는 생각이 까슬까슬 돋았다. 각자 집에 누워 터치 몇 번만으로 서로의 집을 둘러보는 우리들의 밤이 불안하지 않기를 바랐다.
인터뷰를 거절했냐고? 아니, 하기로 했다.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혹여라도 누군가를 따라 사거나, 따라 살지 말자는 제안이자 당부를 하고 싶었다.
‘좋은 집이란 무엇일까요?’라는 마지막 질문에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발언했다. 스스로도 오래 곱씹을 명발언으로 여기에 갈무리해 둔다.
“역시 내 집이 최고다!”라고 외치며 소파에 풀썩 누울 때가 있어요. 가만히 집을 둘러보죠. 나와 가족의 안목, 생활 패턴, 이야기들이 솔직히 담겨 있는 모습을 보며 안심해요.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책이나 TV에서 소개하는 반짝반짝한 집을 봐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나는 우리 집이 참 좋아.’라는 단단한 믿음이 있거든요..”
집으로는 거짓말을 못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옷이나 신발은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잠깐 억지로 입고 있을 수 있지만, 집에선 그럴 수 없다는 뜻이겠죠. 모든 긴장을 다 풀어헤치고 편히 쉬는 곳이니까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좋은 집은, 나를 나답게 해 주는 집이라 생각해요. 멋지고 화려한 인테리어 콘텐츠가 넘쳐나는 요즘, 특히 제가 애쓰는 것도 그거예요. 따라 살지 말기. 우리 가족의 안목과 생활에 꼭 맞는 집에서 살기.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박솔미(작가)
어려서부터 글이 좋았다. 애틋한 마음은 말보다는 글로 전해야 덜 부끄러웠고, 억울한 일도 말보다는 글로 풀어야 더 속 시원했다. 그렇게 글과 친하게 지내다 2006년, 연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2011년, 제일기획에 입사해 카피라이터가 되었다. 에세이 <오후를 찾아요>를 썼다.






![[박솔미 에세이] 불발언 : 이 면접에 붙고 싶지 않습니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a/e/5/8/ae58e5e2eb0fdbf0b9d092df061fda27.jpg)
![[박솔미 에세이] 명발언: 엄마, 이제 보내지 마세요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1/8/2/e/182ef1a237040428b6d6affe1fda34b0.jpg)
![[박솔미 에세이] 명발언: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죠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6/a/1/b6a1c75259fab0b40324ee2927af131c.jpg)


![[젊은 작가 특집] 돌기민 "그때만큼 자유롭게 휘갈기듯 소설을 쓴 적은 없을 겁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53cc095a.png)
![[책의 날] 다중의 서술자](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3-17bf42e1.png)




원더우먼
2022.01.26
부러움에서 그치야지 질투까지 나아가면 자신의 삶의 도움은 안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