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을 하다가, 크리스마스트리를 파는 가게를 보았다. 오래된 꽃집의 허름한 쇼윈도에 별반 화려하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도 반짝이는 전구들을 보니 설레고 말았다. 새삼 겨울이고 새삼 연말이고 새삼 눈을 기다리게 되고 새삼 크리스마스 직전.
나는 크리스마스를 정말 좋아한다. 크리스마스의 거리를 좋아한다. 크리스마스의 거리를 채운 사람들의 표정을 좋아한다.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크리스마스가 싫었던 적이 없다. 잘 우는 사람이고 속이 까만 사람이고 그러니 산타 할아버지를 만날 기회 따윈 없는데도. 그날에 누군가는 슬프고 아프고 가난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크리스마스는 좋은 것이다. 누군가를 떠올리게 해주니까. 그리움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 맘껏 좋은 이를 미운 이를 떠올리고 사랑하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도 좋은 날이 크리스마스. 분명 그렇고말고. 넘치도록 화려한 트리의 장식들과 전구들은 그런 의미를 담아 반짝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서점에 닿자마자 이곳저곳을 뒤적인다. 작년겨울에 산 트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디에도 없다가 책장 위에서 찾아냈다. 기쁨도 잠시. 금방 실망하고 만다. 너무 조그맣잖아. 채 두 뼘도 되지 않을 것 같다. 먼지를 털면서, 작년의 나를 원망한다. 혜화로 건너온 즈음이었다. 책장을 정리하고 이러저러한 비품들을 구매하느라 정신이 없는 중에 인근 문구점에서 급히 구했던 것 같다. 내년에는 더 크고 멋진 것을 살 거야 하고 다짐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생겼구나. 매사 이런 식이야 나는. 시무룩해져서 코드를 콘센트에 꽂아본다. 작고 따듯한 빛들이 떠오른다. 그것들이 서점을 가득 채우는 것만 같다. 그렇게 작은 트리가 커다래진다.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한참 본다. 아마 작년에도 이랬나 보다. 이것도 괜찮네, 충분하네 하면서. 마침 찾아온 독자들이 올라와서 반갑게, 트리네, 한다. 내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닌 모양이다.
독자들이 계산대에 올려놓은 시집을 보며 어떤 기대를 품는다. 혹시 이 시집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아무리 내가 시인이래도 시집서점을 운영하고 있대도 시집이 근사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언젠가 기사로도 본 적이 있다. 제일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책이랬다. 하물며 시집은.

한편으론 겨울밤하고 시집은 잘 어울린다고 우기고 싶다. 크리스마스트리와 그 트리 위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노랗고 파란 불빛들과도. 무언가를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면서 아까워하면서 시를 읽는 시간. 그 시간을 선물하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나는 독자들에게 이 시집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느냐고 묻지 않는다. 아닐까 봐서. 그러니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말 뿐이다.
정작 급한 것은 내 쪽이다. 열흘 정도 남았다. 올해 크리스마스.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사람들을 하나둘 떠올린다. 친구들도 있고 이름은 모르지만 낯이 익은 독자들도 있다. 그들에게 시집을 선물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처지다. 주머니도 가난하니까 소박해져보자. 고민 끝에 사진을 찍어주면 어떨까 싶어졌다. 마침 필름 카메라도 하나 있겠다, 거절하지 않는다면 찍어주고 싶다. 인화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싶다. 짧은 메시지라도 담아서 카드를 곁들여야겠다 싶고. 내친김에 나도 한 장 챙겨야겠다 생각해본다. 어떤 이들하고는 같이 찍어도 좋겠지. 이런 것이 선물이 되려나 싶기도 하지만 시집만큼이나 겨울밤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 한때를 진하고 깊게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까만 겨울밤에.
창문 너머 빛은 사라지고 조금씩 어두워지는 서점의 내부. 덕분에 작은 트리는 점점 더 예뻐지고 있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너무 예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작 산더미 같은 고민에 깔려 있고, 즐길 겨를 따위는 조금도 없지만, 이 멋진 소란이 그저 근사하기만 하다. 잠깐의 착각일지라도 모두가 모두에게 사랑에 빠져 있다 여길 만한 때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겠어. 맘껏 그리워해도 괜찮은 때도 지금이다.

유희경(시인)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다. 2007년 신작희곡페스티벌에 「별을 가두다」가, 200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티셔츠에 목을 넣을 때 생각한다」가 당선되며 극작가와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시집으로 『오늘 아침 단어』,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이 있으며 현재 시집 서점 위트 앤 시니컬을 운영하고 있다. 시 동인 ‘작란’의 한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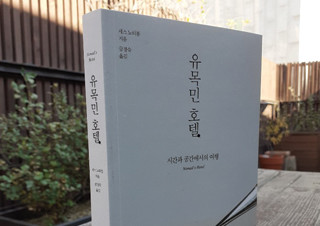


![[큐레이션] 방문을 굳게 잠그고 읽어야 하는 시집](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10-700ed945.jpg)
![[인터뷰] 김민정 시인 “오롯이 시인으로만 한 권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꿈”](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23-d6e91747.jpg)


![[둘이서] 서윤후X최다정 – 내 방 창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05-7f862cf3.png)


찻잎미경
2019.12.31
봄봄봄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