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예스] 어떤책임.jpg](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d/b/3/6/db363c402b25bcf25b93a9b32d2835e0.jpg)
불현듯 : 이번 주제는 불현듯인 제가 내놓은 주제예요.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는 KBS 라디오 <박은영의 FM 대행진>에서 자꾸 저를 “아재아재 바라아재에서 트렌트세터로 돌아온”이라고 소개를 해요.(웃음) 그래서 떠올랐어요. 들고 다니면 있어 보이는 책이 있잖아요. 책도 패션아이템이 될 수 있죠. 또 열정을 뜻하는 패션(passion)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제는 들고 다니면 있어 보이는, ‘있어빌리티’를 만족시키는 책입니다.
캘리 : 1차적으로 떠오르는 책 말고 왠지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싶어서 고르기 어려웠어요.(웃음)
프랑소와엄 : 지난 주제, ‘나를 컬러풀하게 만들어준 책’이 정말 어려웠는데요. 이번 주제도 막상 고르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있어빌리티’의 의미를 따져보면 ‘남들에게 있어 보이게 하는 능력’인데요. 있지는 않지만 있어 ‘보이는’으로 잘못 오해할까 봐도 걱정이 됐어요.
불현듯 :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있어빌리티’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불현듯이 추천하는 책
『끝나지 않는 대화』
이성복 저 | 열화당
 |
 |
기본 표지에 제목은 울림이 있고, 사람들에게 ‘저 단정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직도 저런 책을 펼쳐 읽는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책을 골랐어요. 열화당 출판사에서 이성복 시인의 책 세 권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산문집 『고백의 형식들』 , 시선집 『어둠 속의 시』 , 그리고 오늘 제가 가져온 대담집 『끝나지 않는 대화』 입니다. 표지만 봐도 알겠지만 표지 디자인, 장정 등이 옛날에 나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사롭지 않죠. 서체도 그렇고, 자간과 행간도 계속 보게 돼요. 어쩌면 표지가 심플하기 때문에 글자가 더 돋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은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시는 가장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니까 이 부제와 제목이 함께 책의 내용을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요소가 한 점을 향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는 순간 세 권을 다 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랩핑이 되어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만지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사서 읽었는데 역시나 디자인처럼 단아하고 깊이 있는 책이었어요.
이성복 시인은 1977년 등단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집이 여덟 권밖에 없어요. 그 과작의 이유도 책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2류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이것이 과작의 이유와 연결되는데요. 하나의 세계를 완성하지 않으면 책을 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완벽주의자이신 거죠. 『끝나지 않는 대화』 는 시인 이성복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시를 쓰는지, 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갖고 다닐 때 물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생기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은 보이는 것뿐 아니라 내면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요동하게 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해요. 마지막 뒷표지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고 소개를 마칠게요.
서른 해 동안 이뤄진 이성복과의 대화는 가장 선명하게 그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비밀스러운 창이다. 인간 이성복의 삶, 시인 이성복의 고민, 그 혼곤한 흔적들이 오롯하다. 끊임없이 불화했던 시, 그에게 시는 불편한 것 외에는 다른 진실이 없을 때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근본적인 질문들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오는 숨겨진 진실이었다. 삶에서 사유하고 사유로서 대화하며 대화에서 다시 글쓰기로 나아가는 그의 정신의 촉수들은 결코 잴 수 없는 불가능의 깊이를 향해 꿈틀거린다.
프랑소와엄이 추천하는 책
『미술의 피부』
이건수 저 | 북노마드
 |
 |
산문집을 좋아하는데요. 이 책이 나왔을 때 바로 읽지는 못했어요. 어려울 것 같아서요. 표지가 너무 예뻐서 책상에 고이 간직해뒀다가 이번에 읽어봤어요. 미술 문외한인 내가 읽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펼치고 서문을 읽었죠. 읽는데 우선 글이 너무 좋았고요. 호흡, 강약 같은 것이 느껴지는 글이었어요. 저자 분이 오랫동안 기자로, 편집장으로 잡지 <월간 미술>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평론도 하시는 것 같고요.
책 뒷부분에 편집자 분의 글이 있어요. 이 책을 편집하신 분이 북노마드 출판사의 윤동희 대표님인데요. 이 글을 읽으면 이 책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건수 편집장은 자신이 공들여 번역한 『러시아 미술사』 와 저서 『혼을 구하다』 , 『editorial 에디토리얼』 을 나에게 선물로 줄 때마다 책 앞장에 ‘착한 동희에게’라고 적어주곤 했다. 좋은 눈을 꿈꾸는 착한 멋으로 살고 싶었지만 한 순간도 그렇지 못했기에 그때마다 부끄러웠다. 대학시절, 그의 소개로 탐독했던 영화잡지
글이 정말 좋죠? 이 말은 즉, 이건수 저자님의 글이 ‘심플한 아름다움, 우아한 리듬, 기품 있는 사고의 흔적’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이 책은 미술 산문집이지만 저자님의 시각, 개인으로서 바라보는 미술, 사회 그리고 미술계에 대한 약간의 비판적인 시선 등을 엿볼 수 있고요. 미술 작품이 하나도 안 실린, 시적인 글과 멋스러운 편집을 보는 즐거움이 있는 책입니다. 무엇보다 글이 정말 좋고요. 미술 작품뿐 아니라 미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요. 유행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캘리가 추천하는 책
『10의 제곱수』
필립 모리슨과 필리스 모리슨, 찰스와 레이 임스 연구소 공저 / 박진희 역 | 사이언스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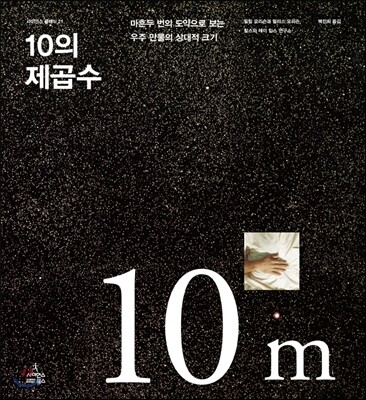 |
 |
이 책의 짝수 페이지는 이미지로만 되어 있고요. 한 장 넘어갈 때마다 10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령 10의 0제곱미터는 1미터죠. 그 크기의 화면이 한 장을 넘기면 10센티미터가 되고요. 다음 장에서 1센티미터가 되고, 0.1센티미터가 되는 식이에요. 흔히 ‘팔 길이만큼의 세계’라는 말을 하죠. 팔 길이가 1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인간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인간 세계의 범위고요. 여기서 점점 거리를 늘리면 우주 바깥까지도 나가게 되겠죠.
첫 번째 이미지는 10의 25제곱미터인데요. 이것은 10억 광년의 범주고요. 보시면 그냥 밤 하늘의 별 같아요. 까만 바탕에 점점이 별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점이 별 하나가 아니고요. 별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은하가 엄청나게 모여 있는(웃음) 은하단이에요. 은하단이 별 한 개 크기 정도로 보이는 크기가 10억 광년인 거죠. 이제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거리가 10배 짧아집니다. 몇 장을 넘겨 10만 광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의 모습, 소용돌이 치는 그 모습을 조금 볼 수 있고요. 다시 몇 장을 넘겨서 1광년이 되면 겨우 태양이 나오죠. 몇 장 더 넘길게요. 아직도 지구는 나오지 않아요.(웃음) 10의 8제곱미터가 되면 드디어, 창백한 푸른 점 지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부터 책장을 넘길수록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 나와요. 대륙이 보이고, 도시가 보이고, 도로가 보이고, 사람들이 보여요. 여기서부터는 아주 깊이 들어가는데요. 1밀리미터는 ‘시각의 끄트머리’라고 하고요. 더 들어가면 ‘현미경 아래에서’라고 해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들어가요. 놀라운 건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우주 같은 이미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1옹스트롬, 10의 -10제곱미터로 들어가면 원자 내부를 볼 수 있는 크기인데요. 까만 배경에 가운데 하나 보이는 것이 원자핵이에요. 우주와 인간 내부가 갑자기 만나는 것 같죠?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바로 이 부분에 굉장히 매료되었어요.
*오디오클립 바로듣기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391/clips/100

신연선
읽고 씁니다. 장편소설 『구름이 겹치면』, 에세이 『하필 책이 좋아서』(공저)를 출간했습니다.

이지원 PD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김미래의 만화 절경] 더께 밑의 우리, 더께 너머의 우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30-d1bcfc30.png)


![[여성의 날] 여성이 여성에게 메아리로 전달하는 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5-9919a514.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