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허스토리>의 한 장면
기자로 일하던 시절, 드라마 제작발표회를 갈 때마다 마주치던 기자가 있었다. 소리 내어 말한 적은 없지만 나는 그 이가 늘 미웠다. 매번 여자 배우들을 상대로 매번 연기나 작품에 대한 질문 대신 피부 관리 노하우나 다이어트 비결, 가을철 코디 팁 같은 것들만 물었기 때문이었다. 아마 3049 기혼여성을 타겟 독자 삼은 여성지라는 매체 특성에서 오는 한계였겠으나, 제한된 시간 동안 다른 기자들과 발언권을 다퉈 질문해야 하는 마당에 그 이를 마주치면 사정을 헤아릴 여유 따윈 사라지곤 했다. 자주 마주쳤기에 그 이를 기억에 담았을 뿐, 그런 기자가 그 이 하나는 아니었다. 물론 한국 사회의 극심한 외모지상주의는 누구 하나 빼놓지 않는 가혹함을 자랑한다. 그러나 남성의 얼굴이 ‘숙성되는 인간’으로서 입체적으로 탐구되는 동안, 여성의 얼굴은 많은 경우 ‘만개했다 시드는 꽃’ 취급을 당하며 평면적으로 감상되고 착취된다.
그래서였을까. <허스토리> 속 문정숙 사장(김희애) 캐릭터는 단비처럼 반가웠다. 성공가도를 달려온 여성 경제인이라는 자긍심으로 살아온 문사장의 얼굴은 화면 위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부터 젊음이나 곱고 섬세한 선 같은 뻔한 요소들은 애초에 배제하고 시작한다. 암반처럼 단단한 긍지로 무장한 문사장의 얼굴은, 16년을 함께 부대껴 온 가정부 배정길 할머니(김해숙)의 과거를 까맣게 모르고 살았다는 자괴감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 일본군 위안부ㆍ정신대 생존자 할머니들을 모시고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며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 온 6년 동안, 문사장의 머리는 조금식 하얗게 새고 피부의 기미도 천천히 는다. 문사장이 할머니들과 함께 울 때, 법정에서 할머니들의 증언을 일어로 옮기며 분노할 때, 피로로 건조해 진 문사장의 미간에는 내 천(川) 자 주름이 깊게 패인다. 그러나 영화는 그 모든 새치와 기미와 주름을 젊음의 부재로 그리는 대신, 살아 숨 쉬는 한 인간이 견결한 투사로 제련되어 간 흔적으로 묘사한다. 성공을 과시하는 화려한 투피스 정장의 압도하는 멋에서부터 희끗해 진 머리가 전달하는 경외감까지, <허스토리> 속 김희애는 여자 또한 꽃이 아닌 인간이라서 그 멋과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기준은 젊음 하나가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선언하듯 상기시킨다.
한국 사회가 김희애의 외모에 찬탄해 온 지난 세월, 방점은 주로 ‘티 없이 투명한 피부’랄지 ‘주름 없이 완벽하게 관리된 목선’ 같은 곳에 찍혀 있었다. 어떤 역할을 맡겨도 신뢰감을 주는 단단한 눈빛이나 발음과 호흡이 에누리 없이 자로 잰 듯 정확하게 끊어져 나오는 단호한 입매 같은 세부적 특성에 앞서, 인간이라면 겪는 게 당연한 ‘세월의 흔적’을 피했다는 사실 먼저 부각되었던 것이다. <허스토리> 속 김희애가 다소 낯설다면 아마 그 때문이리라.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허스토리>를 극장에서 보았으면 한다. 여성을 감상과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소리 치고 연대하여 투쟁하는 인간으로 그린 이 작품에서, 멋지게 나이 먹은 인간의 초상을 발견하시길 바란다.

이승한(TV 칼럼니스트)
TV를 보고 글을 썼습니다. 한때 '땡땡'이란 이름으로 <채널예스>에서 첫 칼럼인 '땡땡의 요주의 인물'을 연재했고, <텐아시아>와 <한겨레>, <시사인> 등에 글을 썼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니 좋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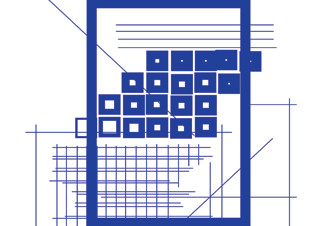

![[작지만 선명한] 희망을 그리는 가망서사의 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02-bf07a0ce.jpg)
![[추천핑] 국경을 넘는 한국 문학](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3-ab42d6ee.png)
![[더뮤지컬] <라흐 헤스트> 홍지희, 마음이 전하는 이야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7-fec6e03d.jpg)
![[리뷰]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22-b3fd5867.png)
![[Do you know? 황석영] 살아있는 한국 현대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4/d/9/8/4d98feddee96d5c0d564cb961340f6b6.jpg)


rhdvlf
201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