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당히 벌고 잘 살기』를 통해 ‘내게 맞는 적당한 삶’을 고민하게 했던 자유 활동가 김진선이 ‘함께 모여 적당히 사는’ 기술을 들려주었다.
우동사는 어떤 곳인가요?
우동사는 ‘우리 동네 사람들’의 줄임말이고요. 청년주거 공동체예요. 인천 검암에서 모여 사는데 지금은 6채 집에서 35명 정도가 같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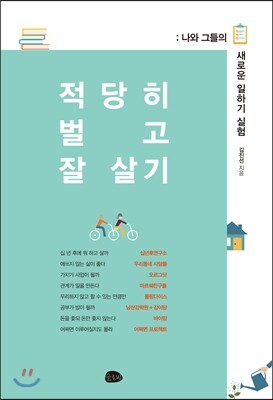 |
 |
2011년에 정토회 불교대학에서 만난 친구 6명이 시작 했어요. 처음엔 귀촌을 준비하기 위해 모였던 거라 농촌 답사도 가고 그랬는데, 지내면서 ‘우리가 꼭 농촌에 살고 싶은 건 아니구나, 여러 친구가 안정된 관계 속에서 살고 싶은 거였구나’ 하는 마음이 모아져서 지금의 형태를 이루게 됐죠. 저는 『적당히 벌고 잘 살기』라는 책을 위해 인터뷰를 하면서 ‘우동사’를 만났는데, 관심이 생겨서 이사를 갔고 지금까지 왔네요.
그럼 귀촌에 대한 꿈은 완전히 접은 건가요?
농사를 짓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 친구들이 강화의 안 쓰는 시골 땅을 얻어서 벼나 콩 농사 같은 것을 해요. 농번기 시즌에는 ‘논데이’라고 회원들을 모집해 같이 일하고 풍물도 하고 막걸리도 마시죠. 농사를 주도하는 친구가 해외에 나가 있는 바람에 올해는 좀 주춤했지만 내년부턴 벼농사를 지어 같이 사는 식구들의 쌀 정도는 수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작목반 같은 걸 꾸려보려고 해요.
지금 집이 6채이면 회원들이 계속 늘어난 거네요?
처음 2채까지는 알음알음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함께했어요. 그러다 ‘가출’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가출은 ‘가볍게 출발해본다’는 의미로 3개월간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사실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문턱도 높고 내가 그 생활에 맞는지 테스트도 필요하잖아요. 3개월간 살아보고 결정하는 거죠. 제가 가출 1기로 들어갔고 지금은 6기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안정된 주거를 위해 집을 매입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들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집 구입 비용의 절반은 출자, 절반은 장기 대출로 마련했는데, 매달 월세를 걷어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고 있죠. 말씀 드린 월세는 주민세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25만 원씩 내요. 그 밖의 생활비는 10만 원씩인데 5명이 모여 사는 집은 한 달에 50만 원으로 공과금이나 식비 등을 충당하죠. 엄마가 가계 운영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 공동생활을 위한 특별한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규칙을 정하면 그걸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되고, 하지 않은 사람을 탓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하지 않는 과정이나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엔 관심을 두지 않고요. 한데 규칙을 없애니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면을 더 살피게 되더라고요. 사실 규칙을 정해도 사람마다 기준이 정말 달라요. 어떤 상태가 깨끗하냐는 기준만 해도 그렇죠. 규칙을 정하지 않아도 각자 자기 안의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갈등으로 드러나곤 하는데, 그런 걸 소재로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 하나의 공부 거리가 되기도 해요.
우동사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공동체와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공동의 어떤 가치로 규정된 것이 없어서 좀 더 자유롭고 유동적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하는 것처럼 우동사 역시 어떤 계기들이 모여 달라지고 변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 시간은 어떻게 갖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리는 밥상 모임이 있어요. 각자 어떻게 지내는지 같이 살면서 스스로 살핀 지점들을 꺼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자리를 통해 저 친구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저 친구는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 어떤 과정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게 돼요.
지금 시대에 우동사와 같은 주거 공동체의 움직임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안정된 주거, 안정된 관계를 지속하려는 욕구 같은 거 아닐까요? 원룸이나 고시촌 같은 곳은 주거 비용은 싸지만 삶을 구가하는 정주의 공간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또 돈을 벌다 보면 안정된 생활이 힘들어지고, 쳇바퀴만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동사는 주거가 안정돼 있고 생활을 위한 비용도 비교적 낮은 편이고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만족감도 생겨서 결핍이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함께하기’가 갖는 힘은 뭘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논리 같은 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 혼자 이렇게 안 살 거야’라며 『월든』처럼 시골에 가서 살면 저 혼자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은 지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정말 유능한 개인도 힘들 것 같아요. 한데 같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작부터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맥락을 봐주며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함께하기’는 꽤 든든한 동력인 것 같아요.
-
적당히 벌고 잘 살기김진선 저 | 슬로비
직장 생활에 회의를 느끼며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안고 끙끙대던 10년 차 직장인이, 탈출구로 딴짓을 시작하고 딴짓거리 중 하나와 진하게 접속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현실의 고리를 끊고 다른 꿈을 꿀 자신을 얻게 된 2년간의 실험 기록이다.
월든
출판사 | 열림원

기낙경
프리랜스 에디터. 결혼과 함께 귀농 했다가 다시 서울로 상경해 빡세게 적응 중이다. 지은 책으로 <서른, 우리가 앉았던 의자들>, <시골은 좀 다를 것 같죠>가 있다.

김잔듸(516studio)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큐레이션] 추천하지 못했던 책들을 고백합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6-fea78c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