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몇 번쯤은 마감 날짜를 지키지 못해 안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도 다르지 않아서 마감일이 지나면 휴대전화가 제일 무섭다. 공연히 이불 속에 파묻기도 하고 차마 전원을 꺼놓지도 못한 채 언제쯤 에디터의 메시지가 오려나 쏘아보기도 한다.
어느 도시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강원도로 작가 몇몇이 함께 떠난 길이었다. 아마 무슨 문학 강연이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좀 쉬어갈 겸 시골의 다방엘 들렀다. 오종종 모여앉아 떠드는 와중에 전성태 소설가 혼자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어, 미안해. 내가 마감을 못해서.”
계간지 마감 날짜가 한참 지난 때였다. 전성태 소설가가 공책을 폈는지 노트북을 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아무튼 그는 저만치 앉아 두 손으로 머리통을 감싸 쥐었다. 강원도 여행 내내 그의 담당 에디터는 전화를 걸어왔다. 전성태 소설가는 하도 미안해 일단 마흔 장을 보내고, 이틀 후 스무 장을 더 보내고, 그 다음날 열 장을 더 보내는 식으로 에디터를 기함하게 만들었다. 그러고도 끝을 맺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사실 마감 때 도망가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 알려줄까?”
아직 더 써야 할 열 장이 남아있는 그가 나에게 팁 따위를 알려줄 형편은 아니었지만 나는 끄덕였다.
“먼저 아주아주 공손하게 사과는 해야지.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일까지는 꼭 주겠다, 그런 다음에 약속한 시간에 메일을 보내는 거야. 늦게 보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마감을 했으니 며칠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게 뭐예요? 원고를 안 썼는데 무슨?”
“첨부파일을 안 보내는 거지.”
나는 까르르 웃어버렸다. 그러니까 마치 실수인 양 첨부파일 없이 메일만 달랑 보낸다는 소리였다.
“그럼 에디터가 막 전화를 할 거 아니야. 첨부파일 없다고. 하지만 나로선 별 수 없잖아. 이미 책상을 떠나 여행을 갔으니 말야.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는 대로 파일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며칠을 더 버는 거야. 끝내주지?”
“그럼 이번에도 그러지 그랬어요?”
그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너무 많이 써먹었어. 이젠 더 못해.”
알고 보니 숱한 작가들이 써먹고 있는 방법이었다. 나도 배운 대로 두어 번 그래 보았다. 전성태 소설가는 유독 더디게 쓰는 작가다. 그의 소설을 기다리는 일은 나 같은 독자에게는 지루한 일이다. 등단한지 20년도 더 넘었지만 그의 소설은 다섯 권뿐이다. 하지만 투정을 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의 소설 한 편 한 편은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여 짠 레이스 같기 때문이다. 정말이다. 그의 소설을 펼치면 아주 가는 바늘을 들고 천천히 한 코씩 늘리고 있는 긴 등의 여인이 떠오를 때가 많다. 레이스는 점점 고와지고 점점 넓어져 어느 새 여인의 무릎을 덮고 나는 그 손놀림을 온종일 쳐다보아도 질릴 것 같지 않은 것이다. 그가 만드는 아련한 세상 속 주인공들은 온통 해맑고 귀엽다. 그리고 슬프고 통렬하다. 그 중에서도 『늑대』는 내 얼굴을 두 번 들여다보게 만드는 소설집이었다.
누군가의 결혼식장에서 전성태 소설가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와 똑같이 생긴, 미니어처 같은 아들이 곁에 있었다. 급한 마음에 지갑을 열어 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아이의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넣어주었다. 며칠 후 그는 책을 보내왔다. ‘고마워. 아이에게 준 돈은 통장을 만들어 입금해두었단다. 꼭 좋은 일을 위해 쓸게.’라는 편지와 함께였다. 그러고 보니 그 책이 『늑대』였나 보다.
-
늑대전성태 저 | 창비
책에 담긴 10편의 이야기 중 6편이 몽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실제 6개월간 몽골에서 생활한 저자는 작품 속에서 그곳의 느낌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들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이야기의 마지막에 다다라서도 끝나지 않는 여운을 남겨 그 의미를 되새겨보게 한다.
늑대
출판사 | 창비

김서령(소설가)
1974년생. 2003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소설집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어디로 갈까요』와 장편소설 『티타티타』, 그리고 산문집 『우리에겐 일요일이 필요해』를 출간했으며 번역한 책으로 『빨강 머리 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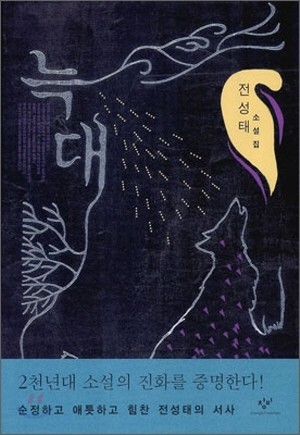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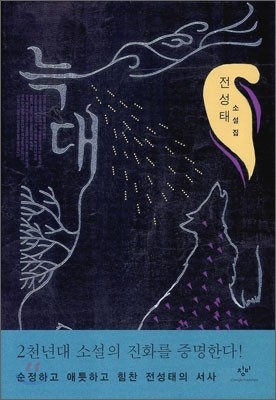




![[리뷰] 업(業)으로 다시 지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시간의 틈』](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23-b21e41b3.jpg)
![[리뷰] 내 머릿속에 코끼리의 뇌가 들어찬다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3-b0c427ea.jpg)

![[예스24 리뷰] ‘미친 매지’에서 연쇄살인마까지, 여성의 괴물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2-fe92630f.jpg)
![[큐레이션] 부모가 먼저 감동할지도 몰라](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9-abd83d47.jpg)



봄봄봄
201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