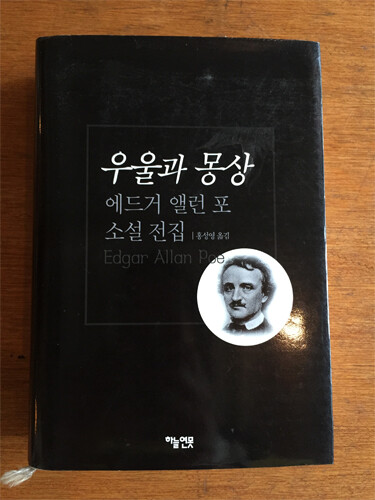
5. 11.
얼마 전에 본 영화 <트럼보>에서 작가 트럼보는 또 다른 작가인 친구에게 말했다.
“투우장에서 죽어가는 소를 보며 눈물을 흘린 소년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어.”
그 때 친구는 굉장히 진지하게 말한다.
“그건 자네가 써보면 알겠지.”
영화를 볼 땐, ‘아니, 어째 이리 무책임할 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사실 지난 6년간 내가 쓴 대부분의 원고는 마감 직전까지 ‘어떻게 끝낼지 알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물론, 큰 이야기의 줄기는 있다. 그러나, 때때로 이야기의 줄기를 오른쪽으로 뻗기로 이미 나 자신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은 야구팀 주류코치처럼 거세게 팔을 흔들며 ‘어서 왼쪽으로 꺾어!’라며 자아에게 외친다.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이야기의 방향을 트는 수밖에 없다. 아니, 그 전에 이미 손가락은 새로운 방향의 이야기를 빠르게 쓰고 있다. 그런 점에서 트럼보의 친구가 들려준 말은 어느 정도의 진실을 담보한다.
‘절도 일기’ 역시 써보기 전에는 도대체 무엇을 쓸지 알지 못한 때가 많다. 그리고 바로 지금, 내가 무얼 쓰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 말이 진실임을 증명한다.
매번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 그렇기에 아침마다 운전대를 잡으며 ‘오늘도 무사히’라고 기도하는 트럭 운전수의 심정이 된다.
차이점이 있다면, 작가에게는 휴일이 없다는 것이다.
5. 13.
이 독서일기는 사실 나를 위해서 쓰는 일기다. 하지만, 온라인 서점 YES24에도 공개가 된다. 그런 점에서 원고료로 생활해야 하는 가족과 읽을거리를 찾는 독자를 위해 쓰는 일기이기도 하다.
지난 일기에 ‘연재물에 댓글이 전혀 없어, 풀이 잔뜩 꺾인 상태다’라고 썼는데, 이를 딱히 여긴 독자들이 댓글을 잔뜩 달아주었다. 이 매체에 3년 넘게 연재를 하며 이런 반응을 겪어본 건 처음이다.
개중에는 역시 기계적인 아내의 댓글을 기계처럼 따라해 ‘다음회가 기대 되네요!’라고 쓴 것이 있었고, ‘여보, 이번 글은 그럭저럭 읽을 만했어요’라며 아내를 사칭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짧은 식견에서 비롯된 속단이다. 1,2초만 더 생각해보니 ‘여보’에는 ‘어른이 자기 또래의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란 뜻도 있단 게 떠올랐다. 이때, 나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더 이상 고전과 동시대의 작품에서 훔칠 게 없다면, 이제는 창의적인 댓글에서 아이디어를 훔치면 된다! 나는 이제 한국 소설가 최초로 댓글을 원고에 적극 활용하는 ‘쌍방향 소통 작가’로 거듭나기로 했다. 내면에 천착했던 과거의 폐쇄적인 고독한 태도와 작별하고, 이제는 외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다 못해, 훔쳐오는 개방적인 태도로 나아가기로 한 것이다.
고로, 절도 일기 역시 ‘쌍방향 소통형 독서일기’가 될 것이다.
 |
 |
가장 시급한 것은 죽어가는 내 창작세포를 소생시켜줄 재미있는 소설들이다. 부디 댓글로 미라가 된 내 창작욕을 벌떡 일으켜줄 작품을 추천해주기 바란다(고마워요, 여러분!).
재미있는 책을 발견하는 것은 친절하면서, 실력 좋고, 값싸게 치료해주는 치과 의사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이다.
마침, 아내가 ‘애드거 앨런 포’의 단편 소설 『검은 고양이』를 추천해줬다.
5. 17.
애드거 앨런 포의 『우울과 몽상』에 실린 단편 소설 「검은 고양이」를 읽었다. 망상과 음주의 그늘에 휩싸인 남편이 고양이를 죽이고, 이를 말리려던 아내까지 죽이고, 그 아내의 시체를 토막 내서 벽 내부에 매장한 뒤 회벽질을 해 시체를 은폐한다는 내용이다.
 |
 |
‘기괴하고, 분위기가 음울해 좋단 말이에요!’
아내가 꿈꾸는 가정은 어떤 것일까. 혼란스럽다.
다른 단편소설 「고자질 하는 심장」에서도 주인공은 노인을 토막 살인했다.
대표작인 「모르그가의 살인」을 읽다가는 ‘아, 이제 눈만 뜨면 그냥 죽어나가는군’ 하는 심드렁한 심정이 되어 졸아버리고 말았다. 실은, 졸은 정도가 아니다. 거대한 형태로 진격해오는 수면의 파도에 휩쓸려 삼십 분쯤 정신을 잃고 수마(睡魔)에 육체를 포획당한 채 잠의 물결 속에서 표류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도저히 못 읽을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서 재미있는 책을 찾기란 여전히 힘겹다.
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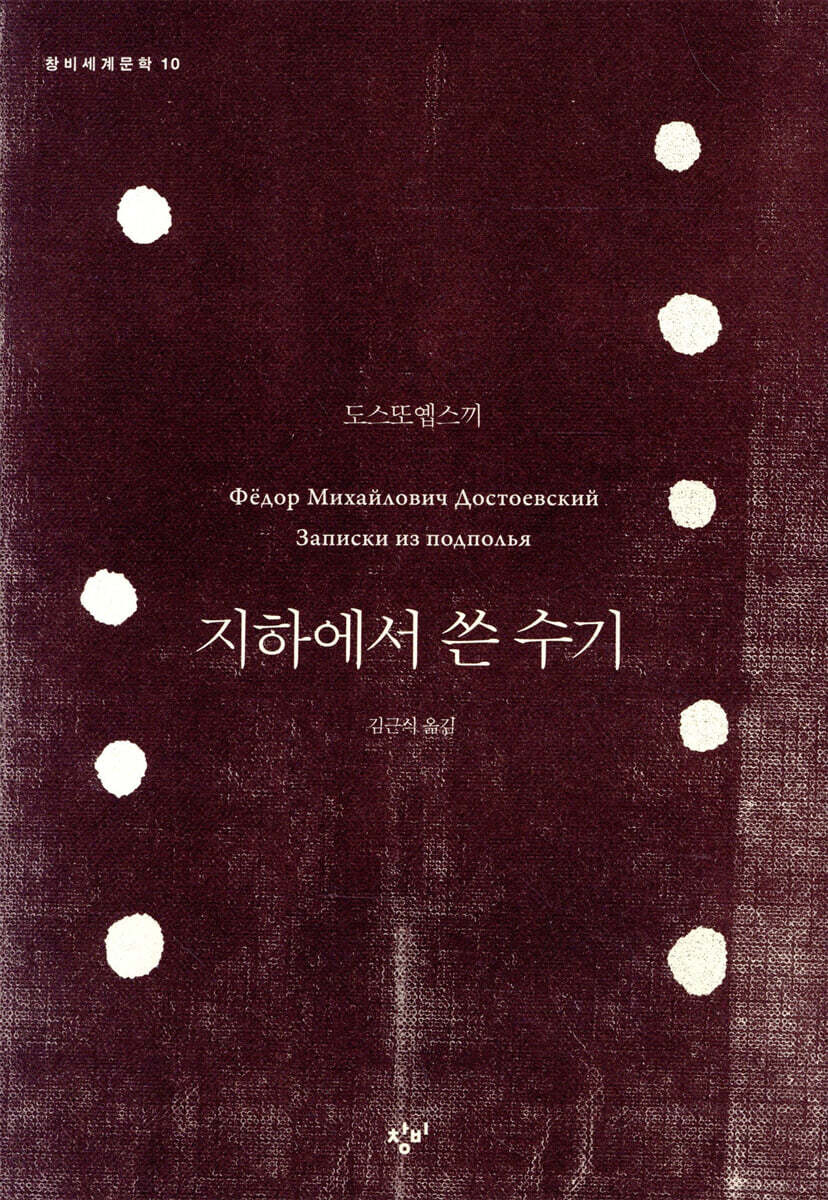 |
 |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에서 쓴 수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병자다…… 나는 못된 인간이다. 나는 매력이라곤 없는 사람이다. 나는 간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나는 나의 병 따위 추호도 관심이 없으니, 나에게 병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모를 수 있다. 나는 치료를 받고 있지도 않고 받은 적도 전혀 없다. 그렇다고 의학과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나는 극단적으로 미신에 빠진 사람이기도 하다.”
요컨대, 이 소설은 강력하고 흡입력 강한 첫 단락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읽어내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지하에서 쓴 수기』를 시도하기 전에는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를 두 번째(아니, 세 번째인가), 젠장 어쨌거나, 몇 번째로 시도했다. 결과는 또 실패였다.
 |
 |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5. 21.
독서를 완결짓지 못하는 이 ‘현상’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깊은 고민 결과, 나는 어쩌면 ‘현대인의 표상’이 된 게 아닐까 싶었다.
그러니까,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바쁜 일상을 감내하고, 휴대 전화로 전 세계와 즉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현대인은 과거 인류가 편지를 보내고 며칠을 기다리고, 뉴스를 보기 위해 마을 회관에 모여 영사기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던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다. 이 생활 리듬이 독서를 마칠 수 있는 능력을 퇴보시킨다. 게다가, ‘고전’이라 칭하는 문학들은 현 시대에 읽어내기에 ‘빛바랜 느낌’이 있다. 이야기의 전개가 느리고, 묘사는 지나치게 많고, 과거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엔 성가신 수고가 따른다. 그러나 그 상황을 이해했다 해서 고전에 대단한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다. 현대인은 이미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 미국의 노예폐지 운동가 헨리 워드 비치가 말하지 않았던가. “한 시대의 철학은 다음 시대에서 평범한 상식에 불과하다”고.
그 결과, 고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인류보편적인 문제’밖에 없다. 하지만, 이 ‘인류보편적인 문제’는 굳이 문학이 아니라도, 어디에서건 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색과 잡담을 통해서도 고민하고 논할 수 있다.
하여, 현대인은 ‘오락적 기능’이 떨어지는 문학을 점차 인내하지 못하는 인간상으로 변하고 있다(여기서 말하는 ‘오락적 기능’이란, 즉각적이며, 상대적인 ‘오락적 기능’이다). 나 역시 그러한 인간이 아닐까 싶다.
문제는, 내가 작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이기에, 다시 한 번, ‘재미있는 글’을 써야 한다고 다짐한다.
주제도, 문학성도, 예술성도, 모든 것이 재미 위에 쌓여야 한다. 단 하나를 택해야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재미’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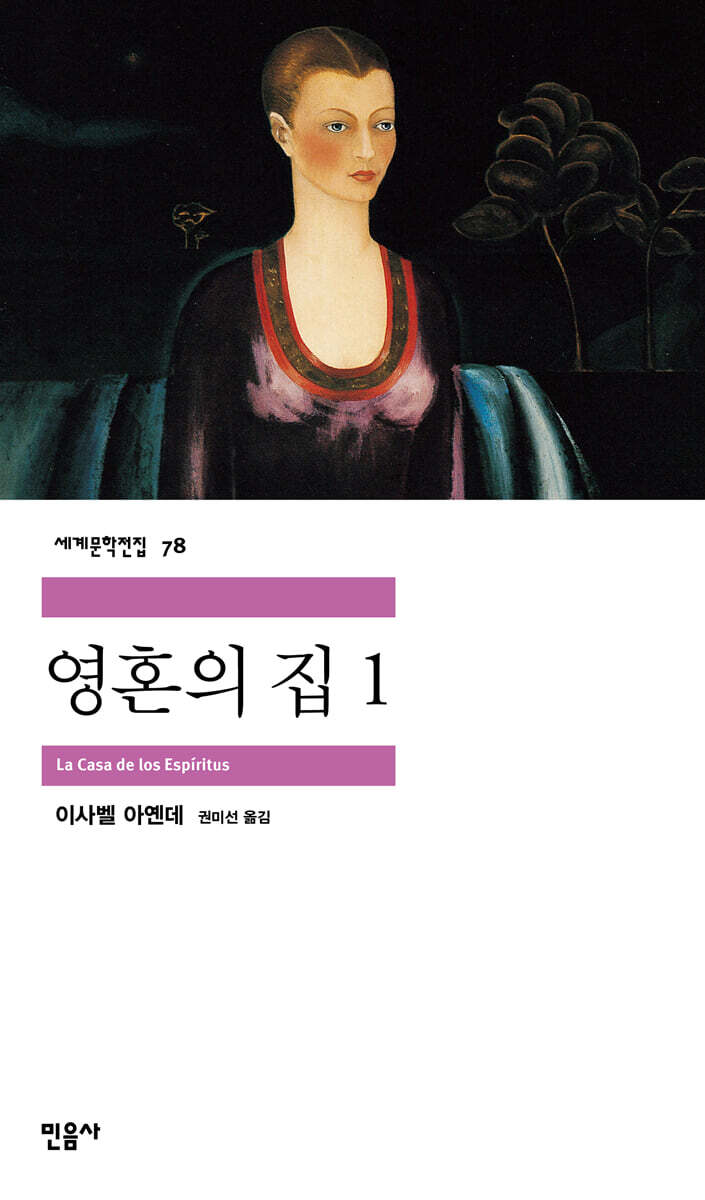 |
 |
이 글을 읽은 독자가 내게 책을 추천해준다면, 기왕이면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줬으면 좋겠다. 재미없는 책과 일ㆍ이주 씩 씨름하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트럼보의 친구 말이 맞았다.
“직접 써보면 알겠지.”
이렇게 망할 줄, 써보기 전에 내가 짐작이나 했겠나?!
칠레 작가 이사벨 아옌데의 『영혼의 집』이 왔다.
『영혼의 집』이 창작 세포를 되살릴 심폐소생술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최민석(소설가)
단편소설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로 제10회 창비신인소설상(2010년)을 받으며 등단했다. 장편소설 <능력자> 제36회 오늘의 작가상(2012년)을 수상했고, 에세이집 <청춘, 방황, 좌절, 그리고 눈물의 대서사시>를 썼다. 60ㆍ70년대 지방캠퍼스 록밴드 ‘시와 바람’에서 보컬로도 활동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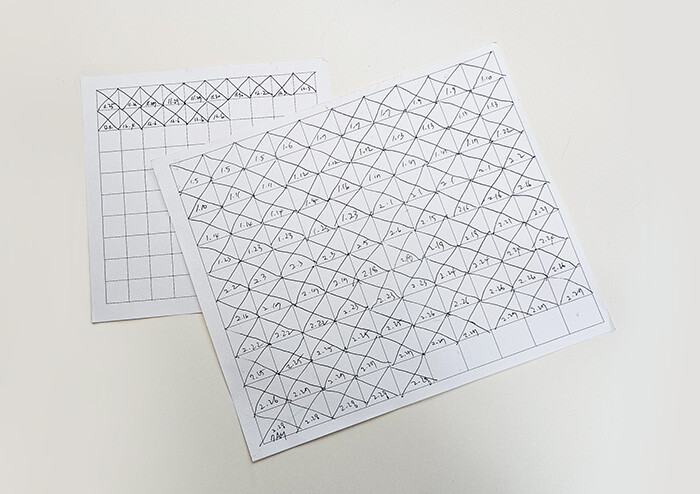
![[에디터의 장바구니] 『파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여자에 관하여』 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07-a24e0ec8.jpg)
![[송섬별 칼럼] · · · - - - · · ·](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4-efbfaa92.png)
![[추천핑] 국경을 넘는 한국 문학](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3-ab42d6ee.png)
![[송섬별 칼럼] 외로움과 추위는 얼씬도 할 수 없기를](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9-d1259feb.png)








tvpeople
2016.11.08
올해 읽은 것 중 재미난 책.
일단 장강명 소설은 재미진 것 같아요. 좀 얄팍하다는 생각은 들지만요. 그의 전작 <한국이 싫어서> <댓글부대>는 재미지게 읽었고 <표백>은 별로, 다른 소설은 이상하게 잘 안 읽히더라고요. 최근 에세이 <5년만에 신혼여행>은 재미졌어요. 장강명이란 작가를 이해하는 데 유용했어요(뭐 지인의 입을 빌자면 넘 찌질이 여행일기라며).
최근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죽여마땅한사람들>도 꽤나 재미졌어요. 도저히 내용이 궁금해 읽지않을수 없었던 소설. 김려령의 <트렁크>는 작년에 읽고 올해 다시 읽었는데 최근에 읽은 책 중 가장 눈에 띄이는 책. 플롯도 특이했지만 스토리도 나름 신선해서. 이기호의 에세이 <웬만해선 아무렇지 않다>도 진짜 낄낄거리며 읽었던 기억이(이젠 가물가물). 소설류는 작가님이 취향이라 하시던 기욤뮈소(그냥 읽어내려가긴 진짜 좋죠), 더글라스 케네디(기욤뮈소보다는 훨씬 묵직한게 전작이 하이틴 로맨스 같다면 이건 그래도 좀 소설같은), 요네스뵈 이런 소설을 재미지게 읽습니다. 그래도 올해 계속 책은 읽었는데 리스트를 훑어보니 재미있다고 할만한 건 별로 없네요.
김승철
2016.06.23
귀를기울이면
2016.06.09
한 편도 못 읽었어요.
오늘은 검은고양이 정도 읽어야겠습니다.
"다음 회가 기대되네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