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속의 뉴욕(2/2)
만일 뉴욕 사람들에게 센트럴파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힘들고 지친 일상은 더욱 심각한 무게로 어깨를 짓누를 것이고,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아끌며 타지로의 여행을 강요했을 것이다.
2008.09.30
센트럴파크(Central Park)
만일 뉴욕 사람들에게 센트럴파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힘들고 지친 일상은 더욱 심각한 무게로 어깨를 짓누를 것이고,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아끌며 타지로의 여행을 강요했을 것이다. 녹음이 우거진 여름날, 맨해튼 한복판에서의 야외 음악 공연 관람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고, 뜀박질에 인생을 건 조깅 마니아들은 매연과 소음을 뚫고 도로를 질주해야만 했을 것이다. 거주자들의 불행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관광객들 역시 심각한 불편과 상실감을 호소하게 될 것이다. 파릇한 잔디 위에서 퉁퉁 부은 다리를 길게 뻗고 누워 누적된 여행의 피로를 해소할 방법이 영영 사라질 테니.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공원. 버스와 지하철역에서 그저 몇 걸음만 걸으면 들어갈 수 있는 ‘방문객 프렌들리(Visitor-Friendly)’ 놀이터. 전체 넓이 3.4제곱킬로미터. 맨해튼 59가에서 110가까지 걸쳐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 1857년, 미국 조경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레드릭 L.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와 영국 건축가 칼베르트 혹스(Calvert Vaux)가 공동 응모한 ‘잔디 계획(Greensward Plan)’이 우승작으로 뽑히면서 센트럴파크 조성이 본격화되었다.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옴스테드는 ‘이 시대에 만들어진 최고의 진정한 공원을 위하여’라는 표현과 함께 드디어 역사에 길이 남을 작업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몇 년에 걸쳐 디자인되고 다듬어지고 또 새롭게 정비되며 21세기까지 온 센트럴파크.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동물원, 조깅 트랙, 야외 공연장, 호수와 저수지, 자전거 길, 야외 카페와 식당 등 일단 그 숲 속으로 들어가면 ‘휴식’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공간과 기구들이 놀랍도록 적절한 장소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봄은 푸릇한 싹이 돋아나며 움츠린 마음을 열어줘서 좋고, 여름에는 셰익스피어 연극 축제와 뉴욕 필하모닉의 야외 공연이 있어 좋고, 가을은 풍성한 색으로 뒤덮인 낙엽을 밟을 수 있어 좋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숲길이 있어 좋다. 센트럴파크의 사계절은 어느 하나 버릴 데 없이 완벽하다. 그 속을 뛰거나 걸을 수도 있지만 마차를 타고 돌아보는 재미, 절대 유치한 일이 아니다.
“이거 너무 진부하잖아. 이걸 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첫 번째 소원인 거야?”
“진부하지 않아요. 정말 재밌잖아요.”
“난 이미 어렸을 때 다 했던 건데. 고등학교 축제날 이걸 타고 공원을 여섯 바퀴는 돌았을 거야.”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42세의 희극 작가와 성숙한 17세의 여고생이 사랑에 빠지면서 한밤중에 마차를 타고 센트럴파크를 돌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세대 차이가 이 대화에서 느껴지지만 센트럴파크가 주는 낭만적인 요소는 (뉴욕에 사는) 40대나 10대 모두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디 앨런의 대표작 중 하나인 흑백영화 <맨해튼(Manhattan), 1979>에서는 다른 영화들이 애용하는 센트럴파크의 싱그러운 숲 대신 검은색 실루엣으로 처리한 나무들과 그 사이로 간간이 보이는 고층빌딩의 희미한 불빛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두 배우의 키스 장면 하나만으로도 센트럴파크의 분위기는 충분히 전달된다. 이 정도로 부족하면 (비록 통속적인 사랑 이야기이지만) <뉴욕의 가을(Autumn in New York), 2000>에서 40대 후반의 리차드 기어와 20대 초반의 위노나 라이더(두 배우는 그 해 영화 속 ‘최악’에게 수여하는 ‘Razzie’상에서 스크린 최악의 커플로 선정되었다)가 걸어가는 가을의 멋들어진 센트럴파크 숲길도 있다. 영화적 가치를 잠깐 뒤로하고 그들의 데이트 장소를 슬쩍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역시, 지상 최고의 공원을 곁에 둔 뉴요커들의 애정과 속 깊은 정서는 텔리 길리엄 감독의 <피셔 킹(Fisher King), 1991>에서 간단히 해결된다. 인생의 절망과 수렁 끝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며 은총과 배려를 베풀려는 두 남자. 연기파 배우 로빈 윌리암스와 제프 브리지스가 벌거벗은 채 벌러덩 누워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던 센트럴파크의 풀밭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자연의 피난처이자 영혼의 안식처였던 것이다.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42세의 희극 작가와 성숙한 17세의 여고생이 사랑에 빠지면서 한밤중에 마차를 타고 센트럴파크를 돌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세대 차이가 이 대화에서 느껴지지만 센트럴파크가 주는 낭만적인 요소는 (뉴욕에 사는) 40대나 10대 모두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디 앨런의 대표작 중 하나인 흑백영화 <맨해튼(Manhattan), 1979>에서는 다른 영화들이 애용하는 센트럴파크의 싱그러운 숲 대신 검은색 실루엣으로 처리한 나무들과 그 사이로 간간이 보이는 고층빌딩의 희미한 불빛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두 배우의 키스 장면 하나만으로도 센트럴파크의 분위기는 충분히 전달된다. 이 정도로 부족하면 (비록 통속적인 사랑 이야기이지만) <뉴욕의 가을(Autumn in New York), 2000>에서 40대 후반의 리차드 기어와 20대 초반의 위노나 라이더(두 배우는 그 해 영화 속 ‘최악’에게 수여하는 ‘Razzie’상에서 스크린 최악의 커플로 선정되었다)가 걸어가는 가을의 멋들어진 센트럴파크 숲길도 있다. 영화적 가치를 잠깐 뒤로하고 그들의 데이트 장소를 슬쩍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역시, 지상 최고의 공원을 곁에 둔 뉴요커들의 애정과 속 깊은 정서는 텔리 길리엄 감독의 <피셔 킹(Fisher King), 1991>에서 간단히 해결된다. 인생의 절망과 수렁 끝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며 은총과 배려를 베풀려는 두 남자. 연기파 배우 로빈 윌리암스와 제프 브리지스가 벌거벗은 채 벌러덩 누워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던 센트럴파크의 풀밭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자연의 피난처이자 영혼의 안식처였던 것이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
월드 트레이드 센터(World Trade Center)
가끔 컴컴한 지하철역에서 빠져나와 지상에 올라섰을 때 어디가 다운타운 쪽이고 어디가 업타운 쪽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비슷비슷한 애비뉴와 스트리트, 뚜렷이 구분하기가 힘든 건물들의 외관은 바둑판 모양의 맨해튼에서 나침반이 필요하도록 만든다. 이런 어려움을 한 뉴욕 거주자에게 호소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뉴욕에 오래 산 나도 그럴 때가 있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멀리에서라도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쌍둥이 빌딩이 보여, ‘아, 그쪽이 다운타운이구나.’ 했었는데. 9.11 테러 이후 맨해튼의 중요한 길잡이 하나가 사라져 버린 거죠. 이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의존해야 하는데, 다른 건물들에 가려 잘 안보이거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이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110층이었다. 1931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크라이슬러 빌딩(77층)을 누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되었으며 그 영광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완성된 1972년에 끝났다. 그러나 반드시 물리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뉴욕의 대표적 별명인 ‘엠파이어(Empire)’를 그대로 이름에 가져온 맨해튼의 얼굴, 간결하고 장식이 적은 아르데코 건물의 전형, 6,500개의 창문과 1,860개의 계단, 미국 건축가 협회가 지정한 ‘미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건물 1위.’ 이런 기록적인 타이틀을 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70년 넘게 맨해튼 한가운데에서 뉴욕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며 역사를 함께 써 온 것이다. 특히, 1년 내내 영롱한 불빛으로 도시를 비추는 뾰족한 탑과, 뉴욕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는 수많은 영화의 단골 메뉴가 됨으로써 스크린 속에서도 그 명성을 날렸다.
 <킹콩>은 지금까지 세 편이 만들어졌는데 1933년과 2005년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976년에는 당시의 새 스타 건물을 겨냥했는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마지막 장면의 하이라이트로 이용했다. 그래도 여전히 ‘킹콩’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떠올릴 정도로 둘 간의 관계는 절대적이었다. 문명 세계로 끌려온 정글의 야수가 인간들을 피해 도시의 가장 꼭대기 건물 위에서 위험한 도피 행각을 벌이다 장렬한 최후를 맞던 모습. 아마도 수 세기 동안 영화사에 남을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지 않았던 1933년작 <킹콩>은 당시 ‘실재’에 가까운 ‘괴물 주인공’을 스톱 모션(Stop Motion)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 선보인 최초의 영화로, 그 이후에 발표된 SF 영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페이 레이, 제시카 랭, 나오미 와츠 등 킹콩에게 연민을 느끼는 일명 ‘킹콩 걸’의 변천사를 지켜보는 것도 이 영화의 재미다.
<킹콩>은 지금까지 세 편이 만들어졌는데 1933년과 2005년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976년에는 당시의 새 스타 건물을 겨냥했는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마지막 장면의 하이라이트로 이용했다. 그래도 여전히 ‘킹콩’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떠올릴 정도로 둘 간의 관계는 절대적이었다. 문명 세계로 끌려온 정글의 야수가 인간들을 피해 도시의 가장 꼭대기 건물 위에서 위험한 도피 행각을 벌이다 장렬한 최후를 맞던 모습. 아마도 수 세기 동안 영화사에 남을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지 않았던 1933년작 <킹콩>은 당시 ‘실재’에 가까운 ‘괴물 주인공’을 스톱 모션(Stop Motion)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 선보인 최초의 영화로, 그 이후에 발표된 SF 영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페이 레이, 제시카 랭, 나오미 와츠 등 킹콩에게 연민을 느끼는 일명 ‘킹콩 걸’의 변천사를 지켜보는 것도 이 영화의 재미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맨해튼의 위아래에서 하늘과 가까이 있던 두 건축물. 그러나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2001년 9월 11일 이후 맨해튼 스카이라인에서 쏙 빠져버렸다. 비록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던 길고 날씬한 건물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뉴욕 여행자들의 주요 방문 목록에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 바로 무너져 내린 그 땅,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다. 매년 9월 11일이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과 함께 가족들이 갖다 놓는 꽃다발과 추모의 글들이 전시되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사진전과 음악회 등이 열린다. 슬픈 일이지만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른 나라와 낯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 반드시 유쾌하고 명랑한 대상에서 그칠 필요는 없다. 세상 곳곳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건 역시 역사의 한 부분이자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해야 할 삶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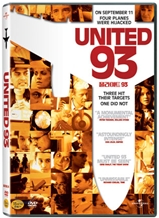 전쟁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정치적 음모론에 관심을 가져온 <플래툰>과
전쟁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정치적 음모론에 관심을 가져온 <플래툰>과
브루클린(Brooklyn)
영화감독이자 작가이며 배우이기도 한 스파이크 리(Spike Lee)는 애틀랜타에서 태어났지만 열 살도 안 되어 부모를 따라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주했다. 후미진 골목 어귀에서 같은 피부색인 흑인 꼬마들과 함께 소화전 물로 장난을 치며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고 여름날이면 친구들과 집 계단에 걸터앉아 온갖 동네 참견에 몰두했을 것이다. 고등학교 때는 낡은 농구대 앞에서 함성을 지르며 공 넣기 시합을 했고 주말이면 여자친구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공원 나들이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스파이크 리의 <똑바로 살아라(Do the Right Thing), 1989>에서는 브루클린의 일상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거창한 폭력이나 대규모의 추격 장면 대신 걸쭉한 뒷골목 욕지거리와 보통 사람들의 분노가 튀어나온다. 그가 자라난 곳. 학교를 다니고 사랑을 하고 영화에 대한 꿈을 키워온 곳. 세계 영화사에 굵직한 이름을 남기며 늘 문제작을 내놓는 스파이크 리 감독이 그토록 집착하는 브루클린의 정서가 뭘까.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자라 살고 있는 38세의 젊은 감독 노아 바움바흐(Noah Baumbach)의 자서전적인 영화 <오징어와 고래(The Squid and the Whale), 2005>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 및 각본상을 거머쥐며 영화 비평가들 사이에서 그해 최고의 수작으로 꼽혔다. 뉴저지에서 태어나 현재 브루클린에서 살고 있는 폴 오스터의 첫 영화 각본작이자 웨인 왕 감독의 대표작인 <스모크(Smoke), 1995>는 브루클린의 한 동네 담배 가게를 둘러싼 소소한 일상을 디테일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독일과 덴마크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등 많은 주목을 끌었다. 또한 폴 오스터는 그의 작품 중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소설로 평가받는 『브루클린 풍자극』에서 죽음을 앞둔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을 브루클린으로 설정했다. 왜일까. 그들은 왜 이렇게 브루클린에서의 삶의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걸까. 우디 앨런은 업타운을 배경으로 한 <애니 홀>에서 “나는 브루클린 출신이야.”라는 대사를 왜 즐겨 넣고 있을까. TV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똑똑한 변호사이자 전형적인 맨해튼 커리어우먼인 미란다가 결혼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곳이 왜 하필 브루클린일까. 맨해튼의 택시 기사들이 기꺼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는 곳.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흑인들의 고향. 낡고 오래된 건물들. 컴컴한 거리. 깨어진 창문과 돌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클린은 당당히 이렇게 불린다. ‘나무의 도시(City of Trees)’ ‘가정의 도시(City of Homes)’ ‘교회의 도시(City of Churches)’로. 그리고 이제는 미국 현대 문단을 이끄는 젊은 기수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컨템퍼러리 문학의 도시’로 자리 잡았다.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자라 살고 있는 38세의 젊은 감독 노아 바움바흐(Noah Baumbach)의 자서전적인 영화 <오징어와 고래(The Squid and the Whale), 2005>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 및 각본상을 거머쥐며 영화 비평가들 사이에서 그해 최고의 수작으로 꼽혔다. 뉴저지에서 태어나 현재 브루클린에서 살고 있는 폴 오스터의 첫 영화 각본작이자 웨인 왕 감독의 대표작인 <스모크(Smoke), 1995>는 브루클린의 한 동네 담배 가게를 둘러싼 소소한 일상을 디테일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독일과 덴마크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등 많은 주목을 끌었다. 또한 폴 오스터는 그의 작품 중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소설로 평가받는 『브루클린 풍자극』에서 죽음을 앞둔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을 브루클린으로 설정했다. 왜일까. 그들은 왜 이렇게 브루클린에서의 삶의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걸까. 우디 앨런은 업타운을 배경으로 한 <애니 홀>에서 “나는 브루클린 출신이야.”라는 대사를 왜 즐겨 넣고 있을까. TV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똑똑한 변호사이자 전형적인 맨해튼 커리어우먼인 미란다가 결혼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곳이 왜 하필 브루클린일까. 맨해튼의 택시 기사들이 기꺼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는 곳.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흑인들의 고향. 낡고 오래된 건물들. 컴컴한 거리. 깨어진 창문과 돌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클린은 당당히 이렇게 불린다. ‘나무의 도시(City of Trees)’ ‘가정의 도시(City of Homes)’ ‘교회의 도시(City of Churches)’로. 그리고 이제는 미국 현대 문단을 이끄는 젊은 기수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컨템퍼러리 문학의 도시’로 자리 잡았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Once Upon a Time in America), 1984>에서 보여준 1920년대의 덤보(DUMBO: 브루클린과 맨해튼 다리 사이에 위치한 지역)는 이제 주말이면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로 가득 찬다. 맨해튼의 브로드웨이나 첼시의 주류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파격성과 독특한 창조성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 연극, 공연, 미술, 음악들이 브루클린 곳곳에서 태동하고 활보한다. 1897년에 문을 연 브루클린 박물관(Brooklyn Museum)은 고대 이집트 걸작들부터 컨템퍼러리 아트까지 백만 점이 넘는 컬렉션을 확보하고 있으며, 1983년부터 ‘뉴 웨이브 페스티벌’을 이끌어온 브루클린 음악 아카데미(Brooklyn Academy of Music: 일명 BAM)는 필립 글라스, 로리 앤더슨 등 당대 최고의 실험적 음악가들의 공연을 개최하면서 진보적 문화 운동을 계속해왔다.
브루클린……. 뉴요커들 사이에서 종종 ‘올드 뉴욕(Old New York)’ ‘리얼 뉴욕(Real New York)’으로 불리며 애틋한 향수를 담은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 있는 곳. 그곳에 살아보지 않은들 그곳의 참된 공기를 진정 들이킬 수는 없겠지만, 맨해튼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등장하는 이 따뜻한 땅이 많은 여행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이십 대에 브루클린으로 이주해 와 지금까지 십여 년째 살고 있는 작가, 라라 밥니아르(Lara Vapnyar)는 제2의 고향이 된 브루클린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만일 그대의 상처를 치유해줄 무엇인가가, 그 절반이라도 실제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의 힘으로 강력히 무장한 브루클린의 공기가 그대의 등을 철썩 때리며 실마리를 열어주는 것일 게다.”
만일 뉴욕 사람들에게 센트럴파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힘들고 지친 일상은 더욱 심각한 무게로 어깨를 짓누를 것이고,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아끌며 타지로의 여행을 강요했을 것이다. 녹음이 우거진 여름날, 맨해튼 한복판에서의 야외 음악 공연 관람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고, 뜀박질에 인생을 건 조깅 마니아들은 매연과 소음을 뚫고 도로를 질주해야만 했을 것이다. 거주자들의 불행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관광객들 역시 심각한 불편과 상실감을 호소하게 될 것이다. 파릇한 잔디 위에서 퉁퉁 부은 다리를 길게 뻗고 누워 누적된 여행의 피로를 해소할 방법이 영영 사라질 테니.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공원. 버스와 지하철역에서 그저 몇 걸음만 걸으면 들어갈 수 있는 ‘방문객 프렌들리(Visitor-Friendly)’ 놀이터. 전체 넓이 3.4제곱킬로미터. 맨해튼 59가에서 110가까지 걸쳐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 1857년, 미국 조경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레드릭 L.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와 영국 건축가 칼베르트 혹스(Calvert Vaux)가 공동 응모한 ‘잔디 계획(Greensward Plan)’이 우승작으로 뽑히면서 센트럴파크 조성이 본격화되었다.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옴스테드는 ‘이 시대에 만들어진 최고의 진정한 공원을 위하여’라는 표현과 함께 드디어 역사에 길이 남을 작업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몇 년에 걸쳐 디자인되고 다듬어지고 또 새롭게 정비되며 21세기까지 온 센트럴파크.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
동물원, 조깅 트랙, 야외 공연장, 호수와 저수지, 자전거 길, 야외 카페와 식당 등 일단 그 숲 속으로 들어가면 ‘휴식’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공간과 기구들이 놀랍도록 적절한 장소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봄은 푸릇한 싹이 돋아나며 움츠린 마음을 열어줘서 좋고, 여름에는 셰익스피어 연극 축제와 뉴욕 필하모닉의 야외 공연이 있어 좋고, 가을은 풍성한 색으로 뒤덮인 낙엽을 밟을 수 있어 좋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숲길이 있어 좋다. 센트럴파크의 사계절은 어느 하나 버릴 데 없이 완벽하다. 그 속을 뛰거나 걸을 수도 있지만 마차를 타고 돌아보는 재미, 절대 유치한 일이 아니다.
“이거 너무 진부하잖아. 이걸 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첫 번째 소원인 거야?”
“진부하지 않아요. 정말 재밌잖아요.”
“난 이미 어렸을 때 다 했던 건데. 고등학교 축제날 이걸 타고 공원을 여섯 바퀴는 돌았을 거야.”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42세의 희극 작가와 성숙한 17세의 여고생이 사랑에 빠지면서 한밤중에 마차를 타고 센트럴파크를 돌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세대 차이가 이 대화에서 느껴지지만 센트럴파크가 주는 낭만적인 요소는 (뉴욕에 사는) 40대나 10대 모두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디 앨런의 대표작 중 하나인 흑백영화 <맨해튼(Manhattan), 1979>에서는 다른 영화들이 애용하는 센트럴파크의 싱그러운 숲 대신 검은색 실루엣으로 처리한 나무들과 그 사이로 간간이 보이는 고층빌딩의 희미한 불빛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두 배우의 키스 장면 하나만으로도 센트럴파크의 분위기는 충분히 전달된다. 이 정도로 부족하면 (비록 통속적인 사랑 이야기이지만) <뉴욕의 가을(Autumn in New York), 2000>에서 40대 후반의 리차드 기어와 20대 초반의 위노나 라이더(두 배우는 그 해 영화 속 ‘최악’에게 수여하는 ‘Razzie’상에서 스크린 최악의 커플로 선정되었다)가 걸어가는 가을의 멋들어진 센트럴파크 숲길도 있다. 영화적 가치를 잠깐 뒤로하고 그들의 데이트 장소를 슬쩍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역시, 지상 최고의 공원을 곁에 둔 뉴요커들의 애정과 속 깊은 정서는 텔리 길리엄 감독의 <피셔 킹(Fisher King), 1991>에서 간단히 해결된다. 인생의 절망과 수렁 끝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며 은총과 배려를 베풀려는 두 남자. 연기파 배우 로빈 윌리암스와 제프 브리지스가 벌거벗은 채 벌러덩 누워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던 센트럴파크의 풀밭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자연의 피난처이자 영혼의 안식처였던 것이다.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42세의 희극 작가와 성숙한 17세의 여고생이 사랑에 빠지면서 한밤중에 마차를 타고 센트럴파크를 돌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세대 차이가 이 대화에서 느껴지지만 센트럴파크가 주는 낭만적인 요소는 (뉴욕에 사는) 40대나 10대 모두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디 앨런의 대표작 중 하나인 흑백영화 <맨해튼(Manhattan), 1979>에서는 다른 영화들이 애용하는 센트럴파크의 싱그러운 숲 대신 검은색 실루엣으로 처리한 나무들과 그 사이로 간간이 보이는 고층빌딩의 희미한 불빛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두 배우의 키스 장면 하나만으로도 센트럴파크의 분위기는 충분히 전달된다. 이 정도로 부족하면 (비록 통속적인 사랑 이야기이지만) <뉴욕의 가을(Autumn in New York), 2000>에서 40대 후반의 리차드 기어와 20대 초반의 위노나 라이더(두 배우는 그 해 영화 속 ‘최악’에게 수여하는 ‘Razzie’상에서 스크린 최악의 커플로 선정되었다)가 걸어가는 가을의 멋들어진 센트럴파크 숲길도 있다. 영화적 가치를 잠깐 뒤로하고 그들의 데이트 장소를 슬쩍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역시, 지상 최고의 공원을 곁에 둔 뉴요커들의 애정과 속 깊은 정서는 텔리 길리엄 감독의 <피셔 킹(Fisher King), 1991>에서 간단히 해결된다. 인생의 절망과 수렁 끝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며 은총과 배려를 베풀려는 두 남자. 연기파 배우 로빈 윌리암스와 제프 브리지스가 벌거벗은 채 벌러덩 누워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던 센트럴파크의 풀밭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자연의 피난처이자 영혼의 안식처였던 것이다.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
월드 트레이드 센터(World Trade Center)
가끔 컴컴한 지하철역에서 빠져나와 지상에 올라섰을 때 어디가 다운타운 쪽이고 어디가 업타운 쪽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비슷비슷한 애비뉴와 스트리트, 뚜렷이 구분하기가 힘든 건물들의 외관은 바둑판 모양의 맨해튼에서 나침반이 필요하도록 만든다. 이런 어려움을 한 뉴욕 거주자에게 호소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뉴욕에 오래 산 나도 그럴 때가 있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멀리에서라도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쌍둥이 빌딩이 보여, ‘아, 그쪽이 다운타운이구나.’ 했었는데. 9.11 테러 이후 맨해튼의 중요한 길잡이 하나가 사라져 버린 거죠. 이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의존해야 하는데, 다른 건물들에 가려 잘 안보이거든요.”
|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이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110층이었다. 1931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크라이슬러 빌딩(77층)을 누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되었으며 그 영광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완성된 1972년에 끝났다. 그러나 반드시 물리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뉴욕의 대표적 별명인 ‘엠파이어(Empire)’를 그대로 이름에 가져온 맨해튼의 얼굴, 간결하고 장식이 적은 아르데코 건물의 전형, 6,500개의 창문과 1,860개의 계단, 미국 건축가 협회가 지정한 ‘미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건물 1위.’ 이런 기록적인 타이틀을 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70년 넘게 맨해튼 한가운데에서 뉴욕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며 역사를 함께 써 온 것이다. 특히, 1년 내내 영롱한 불빛으로 도시를 비추는 뾰족한 탑과, 뉴욕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는 수많은 영화의 단골 메뉴가 됨으로써 스크린 속에서도 그 명성을 날렸다.
 <킹콩>은 지금까지 세 편이 만들어졌는데 1933년과 2005년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976년에는 당시의 새 스타 건물을 겨냥했는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마지막 장면의 하이라이트로 이용했다. 그래도 여전히 ‘킹콩’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떠올릴 정도로 둘 간의 관계는 절대적이었다. 문명 세계로 끌려온 정글의 야수가 인간들을 피해 도시의 가장 꼭대기 건물 위에서 위험한 도피 행각을 벌이다 장렬한 최후를 맞던 모습. 아마도 수 세기 동안 영화사에 남을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지 않았던 1933년작 <킹콩>은 당시 ‘실재’에 가까운 ‘괴물 주인공’을 스톱 모션(Stop Motion)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 선보인 최초의 영화로, 그 이후에 발표된 SF 영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페이 레이, 제시카 랭, 나오미 와츠 등 킹콩에게 연민을 느끼는 일명 ‘킹콩 걸’의 변천사를 지켜보는 것도 이 영화의 재미다.
<킹콩>은 지금까지 세 편이 만들어졌는데 1933년과 2005년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976년에는 당시의 새 스타 건물을 겨냥했는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마지막 장면의 하이라이트로 이용했다. 그래도 여전히 ‘킹콩’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떠올릴 정도로 둘 간의 관계는 절대적이었다. 문명 세계로 끌려온 정글의 야수가 인간들을 피해 도시의 가장 꼭대기 건물 위에서 위험한 도피 행각을 벌이다 장렬한 최후를 맞던 모습. 아마도 수 세기 동안 영화사에 남을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지 않았던 1933년작 <킹콩>은 당시 ‘실재’에 가까운 ‘괴물 주인공’을 스톱 모션(Stop Motion)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 선보인 최초의 영화로, 그 이후에 발표된 SF 영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페이 레이, 제시카 랭, 나오미 와츠 등 킹콩에게 연민을 느끼는 일명 ‘킹콩 걸’의 변천사를 지켜보는 것도 이 영화의 재미다.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맨해튼의 위아래에서 하늘과 가까이 있던 두 건축물. 그러나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2001년 9월 11일 이후 맨해튼 스카이라인에서 쏙 빠져버렸다. 비록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던 길고 날씬한 건물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뉴욕 여행자들의 주요 방문 목록에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 바로 무너져 내린 그 땅,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다. 매년 9월 11일이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과 함께 가족들이 갖다 놓는 꽃다발과 추모의 글들이 전시되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사진전과 음악회 등이 열린다. 슬픈 일이지만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른 나라와 낯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 반드시 유쾌하고 명랑한 대상에서 그칠 필요는 없다. 세상 곳곳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건 역시 역사의 한 부분이자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해야 할 삶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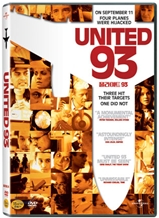 전쟁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정치적 음모론에 관심을 가져온 <플래툰>과
전쟁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정치적 음모론에 관심을 가져온 <플래툰>과 브루클린(Brooklyn)
영화감독이자 작가이며 배우이기도 한 스파이크 리(Spike Lee)는 애틀랜타에서 태어났지만 열 살도 안 되어 부모를 따라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주했다. 후미진 골목 어귀에서 같은 피부색인 흑인 꼬마들과 함께 소화전 물로 장난을 치며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고 여름날이면 친구들과 집 계단에 걸터앉아 온갖 동네 참견에 몰두했을 것이다. 고등학교 때는 낡은 농구대 앞에서 함성을 지르며 공 넣기 시합을 했고 주말이면 여자친구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공원 나들이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스파이크 리의 <똑바로 살아라(Do the Right Thing), 1989>에서는 브루클린의 일상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거창한 폭력이나 대규모의 추격 장면 대신 걸쭉한 뒷골목 욕지거리와 보통 사람들의 분노가 튀어나온다. 그가 자라난 곳. 학교를 다니고 사랑을 하고 영화에 대한 꿈을 키워온 곳. 세계 영화사에 굵직한 이름을 남기며 늘 문제작을 내놓는 스파이크 리 감독이 그토록 집착하는 브루클린의 정서가 뭘까.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자라 살고 있는 38세의 젊은 감독 노아 바움바흐(Noah Baumbach)의 자서전적인 영화 <오징어와 고래(The Squid and the Whale), 2005>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 및 각본상을 거머쥐며 영화 비평가들 사이에서 그해 최고의 수작으로 꼽혔다. 뉴저지에서 태어나 현재 브루클린에서 살고 있는 폴 오스터의 첫 영화 각본작이자 웨인 왕 감독의 대표작인 <스모크(Smoke), 1995>는 브루클린의 한 동네 담배 가게를 둘러싼 소소한 일상을 디테일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독일과 덴마크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등 많은 주목을 끌었다. 또한 폴 오스터는 그의 작품 중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소설로 평가받는 『브루클린 풍자극』에서 죽음을 앞둔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을 브루클린으로 설정했다. 왜일까. 그들은 왜 이렇게 브루클린에서의 삶의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걸까. 우디 앨런은 업타운을 배경으로 한 <애니 홀>에서 “나는 브루클린 출신이야.”라는 대사를 왜 즐겨 넣고 있을까. TV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똑똑한 변호사이자 전형적인 맨해튼 커리어우먼인 미란다가 결혼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곳이 왜 하필 브루클린일까. 맨해튼의 택시 기사들이 기꺼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는 곳.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흑인들의 고향. 낡고 오래된 건물들. 컴컴한 거리. 깨어진 창문과 돌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클린은 당당히 이렇게 불린다. ‘나무의 도시(City of Trees)’ ‘가정의 도시(City of Homes)’ ‘교회의 도시(City of Churches)’로. 그리고 이제는 미국 현대 문단을 이끄는 젊은 기수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컨템퍼러리 문학의 도시’로 자리 잡았다.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자라 살고 있는 38세의 젊은 감독 노아 바움바흐(Noah Baumbach)의 자서전적인 영화 <오징어와 고래(The Squid and the Whale), 2005>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 및 각본상을 거머쥐며 영화 비평가들 사이에서 그해 최고의 수작으로 꼽혔다. 뉴저지에서 태어나 현재 브루클린에서 살고 있는 폴 오스터의 첫 영화 각본작이자 웨인 왕 감독의 대표작인 <스모크(Smoke), 1995>는 브루클린의 한 동네 담배 가게를 둘러싼 소소한 일상을 디테일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독일과 덴마크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등 많은 주목을 끌었다. 또한 폴 오스터는 그의 작품 중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소설로 평가받는 『브루클린 풍자극』에서 죽음을 앞둔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을 브루클린으로 설정했다. 왜일까. 그들은 왜 이렇게 브루클린에서의 삶의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걸까. 우디 앨런은 업타운을 배경으로 한 <애니 홀>에서 “나는 브루클린 출신이야.”라는 대사를 왜 즐겨 넣고 있을까. TV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똑똑한 변호사이자 전형적인 맨해튼 커리어우먼인 미란다가 결혼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곳이 왜 하필 브루클린일까. 맨해튼의 택시 기사들이 기꺼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는 곳.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흑인들의 고향. 낡고 오래된 건물들. 컴컴한 거리. 깨어진 창문과 돌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클린은 당당히 이렇게 불린다. ‘나무의 도시(City of Trees)’ ‘가정의 도시(City of Homes)’ ‘교회의 도시(City of Churches)’로. 그리고 이제는 미국 현대 문단을 이끄는 젊은 기수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컨템퍼러리 문학의 도시’로 자리 잡았다.
|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Once Upon a Time in America), 1984>에서 보여준 1920년대의 덤보(DUMBO: 브루클린과 맨해튼 다리 사이에 위치한 지역)는 이제 주말이면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로 가득 찬다. 맨해튼의 브로드웨이나 첼시의 주류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파격성과 독특한 창조성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 연극, 공연, 미술, 음악들이 브루클린 곳곳에서 태동하고 활보한다. 1897년에 문을 연 브루클린 박물관(Brooklyn Museum)은 고대 이집트 걸작들부터 컨템퍼러리 아트까지 백만 점이 넘는 컬렉션을 확보하고 있으며, 1983년부터 ‘뉴 웨이브 페스티벌’을 이끌어온 브루클린 음악 아카데미(Brooklyn Academy of Music: 일명 BAM)는 필립 글라스, 로리 앤더슨 등 당대 최고의 실험적 음악가들의 공연을 개최하면서 진보적 문화 운동을 계속해왔다.
브루클린……. 뉴요커들 사이에서 종종 ‘올드 뉴욕(Old New York)’ ‘리얼 뉴욕(Real New York)’으로 불리며 애틋한 향수를 담은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 있는 곳. 그곳에 살아보지 않은들 그곳의 참된 공기를 진정 들이킬 수는 없겠지만, 맨해튼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등장하는 이 따뜻한 땅이 많은 여행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이십 대에 브루클린으로 이주해 와 지금까지 십여 년째 살고 있는 작가, 라라 밥니아르(Lara Vapnyar)는 제2의 고향이 된 브루클린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만일 그대의 상처를 치유해줄 무엇인가가, 그 절반이라도 실제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의 힘으로 강력히 무장한 브루클린의 공기가 그대의 등을 철썩 때리며 실마리를 열어주는 것일 게다.”
2개의 댓글
추천 기사
추천 상품
필자

채널예스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서점 직원의 월말정산] 7월의 즐길거리를 소개합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31-ea87383d.jpg)
![[더뮤지컬] 신춘수 프로듀서, 매일 새로운 꿈을 꾸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20-65a28292.jpg)

![[클래식] 조지 거슈윈 ‘랩소디 인 블루’ 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5/1/0/a510c777b8fc069e0b9ba2a591f63f5a.jpg)

















prognose
2012.04.30
서른 넷, 책읽는 여자
200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