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단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이 작가의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을 수는 있지만, 알게 됐다면 한 권으로 끝낼 수는 없다."
필자에겐 '이상헌'이라는 저자의 책이 그렇다.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를 읽은 후 가진 확신이다.
2015년 첫 책을 내고 세 번째 책 『같이 가면 길이 된다』를 썼다. 책을 낼 때마다 출판사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하더라.
국제 우편이 요즘 엉망이라서, 아직 책의 실물을 보지 못했다. 멀리 살다 보니, 남의 일 같다. 그래도 돈 안 되는 책을 내서 출판사가 마음에 걸린다.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내려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그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김훈 선생과 송경동 시인께서 마음을 크게 내어 추천사를 써 주셨고, 무엇보다 인세를 시민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 생각해 보니, 나는 아주 초조하다.
시작하는 글에 "희망이란 싸우는 자만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같이 가면 길이 된다"라는 말에 동의하지만, 이 희망적인 문장이 비현실로 느껴지기도 하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은 무엇인가'의 정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희망의 남용이다. 의지, 공감, 연대가 버무려지지 않은 희망은 푸념이다. 싸우지 않는 희망은 부조리한 언어일 뿐이다. 그리고 세상에 '외로운 싸움'은 있어도 '홀로 싸움'은 없다. 타인의 아픔을 아프게 응시하는 첫걸음 없이는 싸움도 없다. 서둘러 방향을 따지는데, 때로는 그게 길을 막는다. 이 책은 그 첫걸음에 관한 것이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연재했던 칼럼이 초고가 됐다. 그간의 써온 글을 다시 읽으며 자주 한 생각은 무엇인가?
어쭙잖은 얘기지만, 책을 묶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새삼 알게 됐다. 일터의 죽음에 대해 내가 그렇게 많이 쓴지 몰랐다. 사실상 모든 글을 관통하는 주제였다. 젊은 시절 친구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내게 아직 남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글이 조금씩 완고해지는 것도 느꼈다. 꿈쩍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사적인 반발'일 텐데, 표현도 거칠어졌다. '식인의 풍습'이라는 표현을 끝내 버리지 못한 것이 그 증표다.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와 세상(독자)이 원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글감을 선택하나?
내게는 조심스러운 문제다. 나는 '바깥'에 있다 보니, 사실 독자와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다. 페이스북에서 전해 듣는 짧은 소회가 전부다. 이야기의 적절성과 시의성을 알지 못하고 나누는 것이 나의 글이기 때문에, 지금 쓰는 칼럼의 제목도 '바깥길'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안'과 '바깥'이 충동하는 지점에 내 글이 놓여 있지 않나 싶다. 따라서 충돌과 긴장은 내 글의 필수항목이다.
글을 쓸 때 원칙이 있나? 에필로그에 '외교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논란과 오해를 피하면서 비판적으로 글 쓰는 일,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
전형적인 주제라도 '전형적인' 방식으로 쓰지 않으려고 한다. 전형성은 필자의 게으름이고, 글을 훈계조로 만든다. 뻔한 상투적 표현도 피한다. 예상치 않게 시작해서 예상치 않은 곳에서 끝내려고 한다. 글의 긴장과 메세지를 유지하기 위해, 글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전략도 종종 취한다. 거칠게 말하자면, '외교적 중립성'과 '비판성'을 '미학적 완결성'을 통해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이다. 말은 그럴 듯한데, 잘 안 된다. 그게 문제다.
지금 일하고 있는 조직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을 갖고 하루하루 버티는 노동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 또한 어려운 질문이다. 오늘도 젊은 직원이 이 문제로 내 사무실에 와서 불평하고 갔다. 나도 그렇고 그런 조직의 일부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게 대부분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이 게을러서 능력이 부족해서 서툴러서 그런 것이 아니다. 틈만 나면 노동자에게 잘못을 돌리고 쏘아붙이는, 정말 한치도 변하지 않은, 21세기 일터의 '풍습' 때문이다. 그러니, 쫄지 말고 따져도 된다. 물론 혼자서는 힘들다. 뭉치서 같이 가면, 여전히 힘들겠지만 덜 힘들다.
이 책, 어떤 독자들이게 더 각별히 읽히면 좋을까?
특별한 독자층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책을 쓸 때도 독자층을 생각해서 쓰지 않았다. 누구면 어떠랴는 철딱서니 없는 편안함이랄까. 생각해 보니, 나를 전혀 모르고 일터에 첫발 내디딘 사람이나, 그 일터를 훌훌 떠나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 싶다. 노혜경 시인은 내 책의 절반 정도를 읽고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책"이라고 했는데, 나는 문득 내 책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별 생각이 없다.
*이상헌 "이상헌은 나의 아빠다. 늘 내게 큰 영감을 준다. 아빠는 내가 어릴 적부터 거실에 시집, 소설, 자서전, 경제 서적 등 다양한 책이 나열된 도서관을 마련해주었다. 아빠는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컸는데, 그건 큰 사람이 되겠다는 야망보다도 그의 타고난 호기심 때문이었다. 나는 한국의 작은 어촌에서 태어난 아빠가 스위스에서 경제학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매일 직접 지켜봤다. 아빠는 늘 곧고 정직한 것을 추구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보며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한다. 그런 모습에서 나도 많이 배웠다. 아빠는 옳은 것과 정직한 것을 위하고 다른 이를 돕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아빠가 마련해주신 서재의 책들을 읽지 못했고 아빠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려 하지만, 아빠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신중히 고려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_『우린 열한 살에 만났다』 두 저자(이상헌, 옥혜숙)의 아들, 이재원 |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출판사 | 생각의힘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출판사 | 생각의힘

엄지혜
eumji01@naver.com

타별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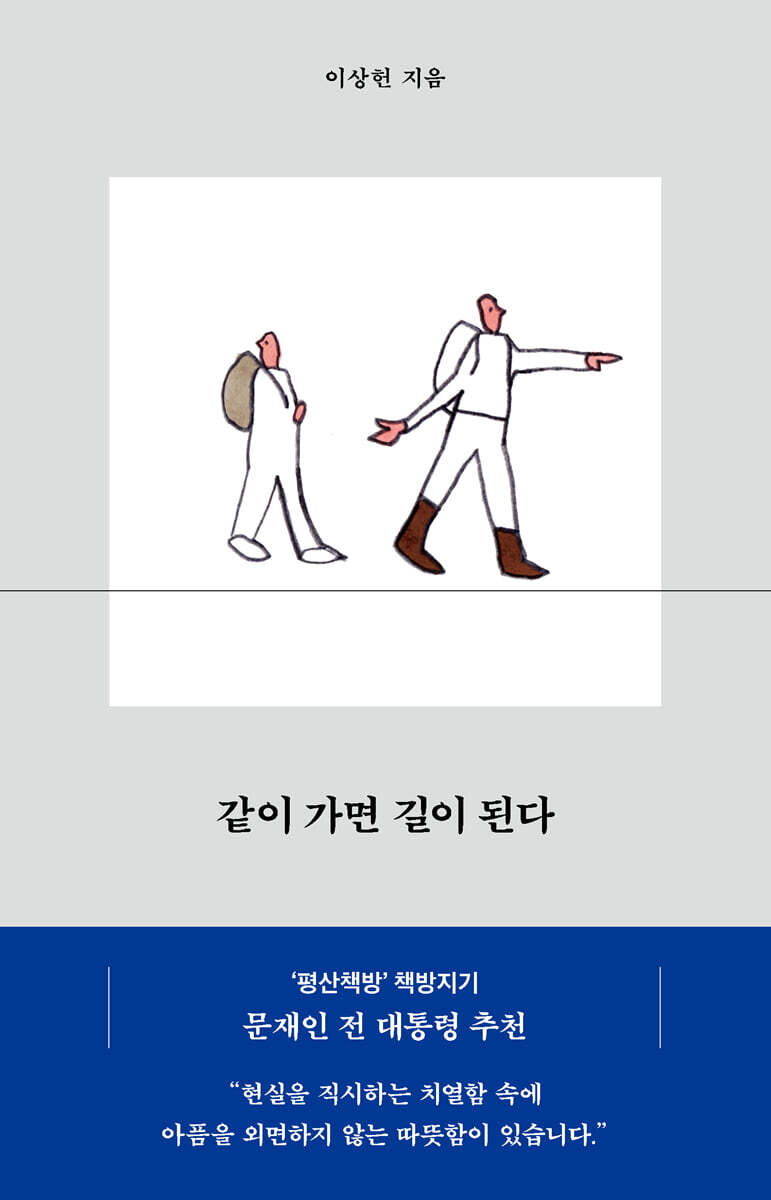
![[짓궂은 인터뷰] 편지는 질척이는 장르 - 오지은 『당신께』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7/1/c/a71c37af6c5dc032905b911ce05708a3.jpg)
![[짓궂은 인터뷰] 다시 태어나도 소설가 - 장강명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3/0/d/6/30d6581d18032ad17c531177a8e656f6.jpg)
![[짓궂은 인터뷰] 나는 당신을 모른다 - 『관계의 말들』 | YES24 채널예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6/4/a/a64ab84b557e3fa7d7b7936a02a88378.jpg)

![[서점 직원의 선택] 서점 매니저가 추천하는 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28-db2868f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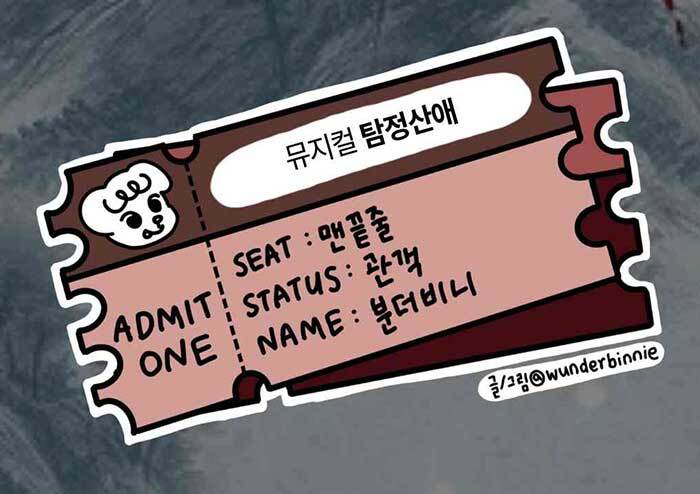
![[더뮤지컬] "어쩌면 내 이야기" 박근형이 선택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6-97203b8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