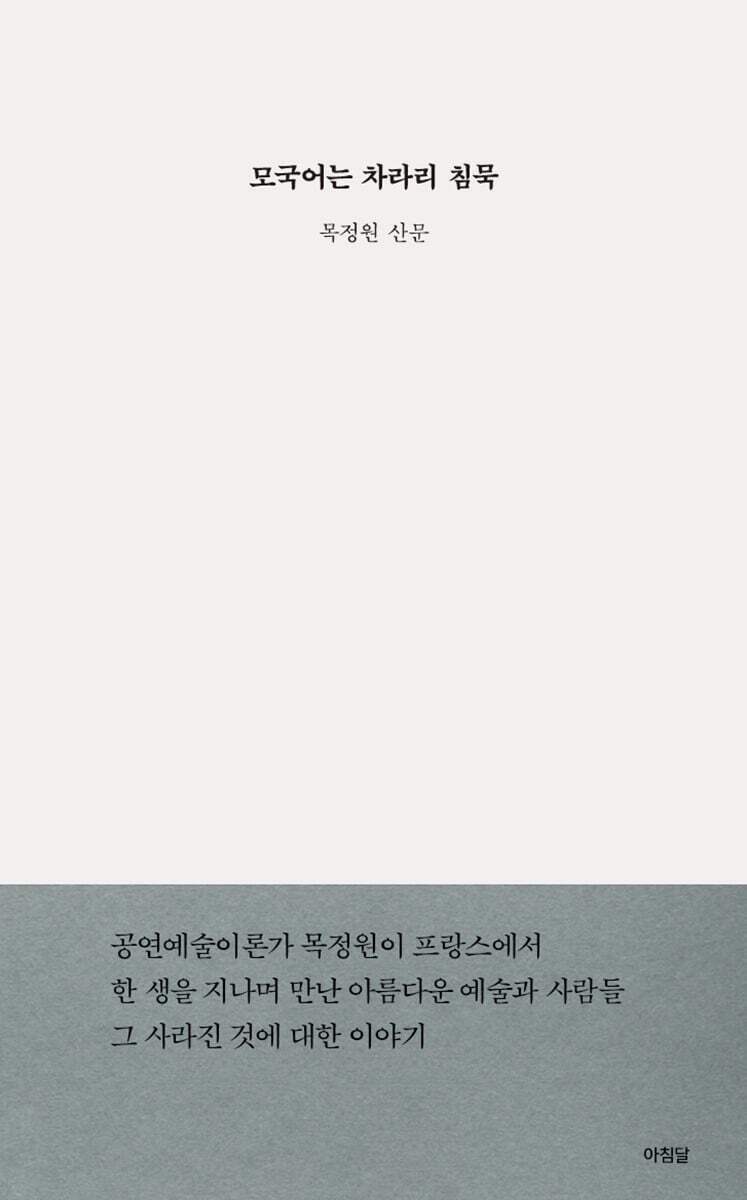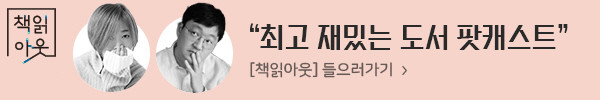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만일 당신이 춤을 춘다면 나는 가만히 앉은 몸으로도 그 춤을 따라 추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_목정원,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155쪽
한동안 공연을 보러 가지 못했다. 학생 시절에는 눈 뜨면 도화지 같은 하루가 펼쳐져 있었으므로,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영화관과 공연장을 찾아다녔다. 소속이 없고 무엇도 되지 못한 나에게 한 자리의 좌석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좋았다. 특히 평일 낮, 사람이 비교적 적은 공연장은 더 큰 충만함을 안겨주고는 했다. 조명 아래 배우들은 어떤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운 듯이 유연하게 움직였다.
목정원 작가의 공연예술 에세이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을 펼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도 몸을 움직인 기억이었다. 단지 물리적으로 내 몸을 움직인 기억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문득 자유로워지던 기억. 내 몸이 일상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공간에 놓여 있을 때의 생생한 감각.
몸을 자유롭게 움직인 때가 언제였을까? 문득 한 학기 동안 준비하여 학교 내 작은 공연장에 연극을 올렸던 기억이 났다. 그 때,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캐릭터가 되어보기 위해서는 몸부터 달라져야 함을 배웠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축축한 연습실에서, 츄리닝을 입고 모여 매주 스트레칭을 하고 대사를 주고받았다. 대부분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발에 닿는 차갑고 삐걱대는 나무바닥의 느낌만은 생생하다.
처음에는 경직된 채로 힘겹게 외운 대사를 우물거렸지만, 점점 내가 맡은 배역을 생각하게 됐고, 무대에 드러나지 않은 그의 삶은 어떨지 상상했다. 어떤 학창시절을 보냈을까, 누구를 사랑했을까, 어떤 결혼생활을 할까,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할까. 진지한 작품 속에 문득 에너지를 불어넣는 희극적인 캐릭터였지만, 그의 삶은 희극적이지 않았다. 거의 연습이 막바지인 어느 날, 문득 내가 연기하는 인물을 떠올리며 눈물이 났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당신도 욕망을 지닌, 무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구나.
막상 무대에 올랐던 순간은 뚜렷이 기억나지 않는다. 단지 장면이 바뀔 때마다 암전된 공간을 비밀스럽게 오가는 느낌과,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무대 위에서 신나게 음악에 맞춰 모두가 춤을 추었다는 기억만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생생함은 사라졌다. 이제 더는 연기하는 감각을 잃어버린 몸으로 책을 읽으며 “시간예술의 근본에는 슬픔이 있다”(84쪽)는 문장에 밑줄을 긋는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두 번 춤을 배우고 있고, 아주 가끔 일하느라 지친 몸과 함께 공연장에 간다. 무대 위에 오르는 내가 아닌, 충실한 한 명의 관객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 삶의 움직임이 언젠가는 유연한 춤이 되기를 꿈꾸면서.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출판사 | 아침달

김윤주
좋은 책, 좋은 사람과 만날 때 가장 즐겁습니다. diotima1016@ye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