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은의 엉뚱한 장면 : 작품의 완성도 혹은 작품 전체에 대한 감상과는 무관하게 특정 장면이 엉뚱하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다. 그 순간은 대개 영화의 큰 줄기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장면이 관람자의 사적인 경험을 건드릴 때 일어나는 것 같다. 영화의 맥락에 구애받지 않은 채, 한 장면에서 시작된 단상을 자유롭게 뻗어가 보려고 한다. |

‘이런 장면만은 끝내 등장하지 않기를.’
어떤 영화들은 그런 주문을 외며 본다. 내 경우에는 동시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려 애쓰는 영화들을 관람할 때 주로 그렇다. 요컨대 허구의 상상력이 작동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야말로 사실만을 강렬하게 되새기게 하는 장면 앞에서는 눈을 가리고 싶다. 작품성의 문제일 때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주문이 통한 영화들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장면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거나 그걸 노골적으로 보여주기보다 색다른 방식으로 우회하거나 대체한다. 물론 그 기대를 무너뜨리는 영화가 더 많다. 안도의 한숨을 쉬거나 괴로움에 몸서리치며 극장을 나서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머리가 복잡해진다.
저 주문이 영화의 윤리와 미학을 향한 그럴듯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 같아도 일차적으로는 내 안에 새겨진 상처와 편견, 영화 밖 현실에서 이미 형성된 사적인 기억과 경험에 근거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영화라는 환상의 막 안에서만큼은 그것들로부터 최대한 보호받고 싶은 욕망이 주문의 본질인지도 모르겠다. 현실을 똑바로 대면하려는 영화의 의지에 감응하는 글들을 숱하게 써 왔지만, 솔직히 말해 요즘의 나는 그 의지를 피력하는 영화들이 좀 피로하다. 심지어 종종 의심스럽기도 하다. 대신 저 퇴행적인 욕망의 유희 한가운데 놓일 기회가 내게 더 자주 찾아와주길 희망한다. 결국 이건 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일까.
하마구치 류스케의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았다. 결말에 이르러 나는 그 세계가 마침내 무대 위에서 맞이한 평온함에 안도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결말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덧붙여진 에필로그 앞에서 불현듯 찬물을 뒤집어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고 말았다. 미사키(미우라 도코)는 웬일인지 히로시마의 도로가 아닌 한국의 마트에 와 있다. 영화는 무대 위 결말과 에필로그 사이의 변화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더하지 않는다. 화면에는 삶과 죽음과 예술을 논하던 일어 대사들 대신, “봉투 드릴까요?”라고 묻는 점원의 지극히 단조롭고 일상적인 한국어가 끼어든다. 무엇보다도 미사키의 얼굴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세상에, 마스크라니!
스크린에서 코로나 예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처음 본 건 아니다. 지난해 몇몇 다큐멘터리에서 본 마스크 쓴 얼굴들은 코로나 시절의 논픽션 영화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이미지로 여겨졌다. 코로나 봉쇄령 속에서 영화 제작하는 과정을 아예 극의 소재로 삼은 어느 작품에서는 실제 감독, 배우, 스태프가 마스크를 쓴 채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연기하기도 했다. 어쩔 도리 없는 물리적인 조건의 한계를 오히려 독창적인 놀이 틀로 전환한 유쾌한 사례였다. 연말에 즐겨본 미국 수사물 최신 시리즈에서는 조연들 일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아했지만, 궁색하게나마 의도를 추측해볼 수는 있었다. 마스크 거부를 권리라며 행패 부리는 자들이 활보하는 국가니, 그런 식으로라도 대중들의 경각심을 고취해야 했을 것이다.
<드라이브 마이 카> 에필로그에서 미사키의 얼굴이 마스크로 반 이상 가려진 모습을 마주한 순간은 앞의 경우들과 분명 달랐다. 너무도 당혹스러웠다. 의학 드라마의 수술 장면이 아닌 이상, 등장인물이 아이돌 설정이 아닌 이상, 은행털이범이 주인공이 아닌 이상, 내가 끝내 극영화에 출현하지 않길 바라는 이미지는 평범한 사람이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린 얼굴이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미사키의 에필로그는 더이상 영화가 아니었다. 그의 마스크는 서사나 스타일의 맥락에 따라 도입된 소품이 아니라 오직 ‘코로나 바이러스’만을 상기시키는 현실 그 자체였다.
하마구치의 다른 작품들처럼 <드라이브 마이 카> 역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사회를 토대로 삼는다. 하지만 그 현실은 한국에 사는 나로부터 분명한 거리를 두고 존재한다. 이 영화에서 죽음 이후를 사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보편성을 띤다 해도 나는 그것을 허구의 세계로 탐구하고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에필로그에 얼룩처럼 묻은 ‘연기하지 않는’ 한국어 목소리와 마스크의 존재감은 영화와 나 사이, 상상력이 뛰어놀 수 있는 지대를 급작스럽게 제거해버린 것만 같다. 이 짧은 장면이 앞서 영화가 견고히 쌓아온 허구의 층위를 현실로 매몰차게 끄집어내 완전히 발가벗기고 만 느낌이라고 할까.
과민한 반응이라는 걸 안다. 금세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 거라 믿었는데, 3년째로 접어든 코로나 일상에 지쳐 나온 심술궂은 한탄일 것이다. 그러나 이 하소연은 정당하다. 마스크가 피부가 되어버린 현실도 답답해 죽겠는데, 스크린마저 마스크 안에서 호흡하는 광경을 보라는 요구는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이 에필로그는 죽음과 재난 이후의 서사적 시간이 아니라, 덧붙일 설명도 해석도 필요 없는 그저 명백한 현재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질긴 현재성을 잠시나마 은폐할 아름답고 강력한 환상의 막, 마크스 없는 유희를 당당히 요청한다. 아무리 고된 세상에서도 영화와 놀 권리를 우리에게 허하라.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남다은(영화평론가, 매거진 필로 편집장)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손희정의 K열19번] 통곡을 노래하는 멜로드라마 - 발디마르 요한손 <램>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b/2/9/bb29367e037c9b50dcd0f1c19fe02fab.jpg)
![[한정현의 영화적인 순간] 더는 기다릴 수 없어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3/a/8/3/3a837351193c4e04e7aa72726eed421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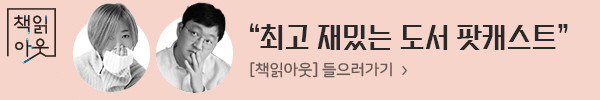
![[서점 직원의 선택] 서점 매니저가 추천하는 책](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28-db2868f9.jpg)
![[김미래의 만화절경] 서울의 공원과 고스트 월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22-2c09f7ab.jpg)

![[송섬별 칼럼] · · · - - - · · ·](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4-efbfaa9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