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스플래쉬
언스플래쉬
지난달에는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 10억 마리의 해양 생물이 떼죽음 당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 기사를 자꾸만 곱씹게 된다. 내가 해안가에 널브러진 해양 생물처럼 떼죽음 당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오랫동안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해오던 인간도 재해 앞에서는 다른 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다. 인간의 순서는 과연 몇 번째일까.
김초엽의 첫 번째 장편소설 『지구 끝의 온실』은 내가 그동안 상상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미래다. 닿기만 해도 치명적인 더스트가 지구를 덮치고 인간과 동식물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이 죽어갔다. 재해가 휩쓸고 간 후엔 생명의 활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고요하고 삭막한 땅만 남았다. 인간도 속수무책으로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린 세상, 멸망의 시대를 건너온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사람들은 더스트를 막아줄 돔을 만들기 시작했고 한정된 자원을 지키기 위해 잔인해져야 했다. 돔시티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조그만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다. 프림 빌리지도 그중 하나이다. 그곳엔 사이보그이자 식물학자인 레이첼이 살고 있는 유리 온실이 있었다. 프림 빌리지는 나름의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고 사람들도 더스트를 잊고 평화에 적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부의 침입자로 인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렇게 프림 빌리지 사람들은 레이첼이 개량한 더스트 대항종인 모스바나 종자를 품고 뿔뿔이 흩어졌다.
『지구 끝의 온실』은 시시각각 망해가는 세상에서도 기어이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흔히 과학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복잡한 수식과 데이터로 이루어진 과학적 접근은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2064년에 시작된 세계 더스트대응협의체의 디스어셈블러 광역 살포를 통해 2070년 5월 완전 종식되었다."
이 건조한 문장에서 목숨을 걸고 모스바나를 세계에 퍼트린 프림 빌리지 사람들의 대책 없는 희망과 서로를 향한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소설은 과학의 영광에 가려졌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애틋하고 소중한 마음들을 발굴해낸다. 때론 과학보다 무모한 믿음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모스바나는 공기중의 특정 분자와 결합하여 푸른빛의 먼지를 만든다. 그 빛은 불필요한 돌연변이지만 소설 속 인물인 지수는 군락지를 수놓은 푸른빛을 보며 말한다.
“그래도 아름답네.”
과학이 연장시킨 지구의 미래는 언젠가 또 다른 종류의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쓸모 없는 아름다움을 보며 감동하고 온기 어린 대화를 나눌 것이다. 무해하고 따스한 눈빛, 누군가를 우려하는 마음, 곁에 있겠다는 말 한마디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가올 종말이 덜 두려워진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김소정(도서MD)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예스24 인문 MD 손민규 추천] 뇌과학으로 현명하게 살기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6/3/3/7/63370d746e39741b23d489de50c71f4c.jpg)
![[예스24 가정살림 MD 김현주] 책으로 만나는 정원, 그리고 자연 이야기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2/4/e/9/24e9cb8f9253b2afcacf5b25b76a9b0c.jpg)
![[MD 리뷰 대전] 예스24 MD가 10월에 고른 책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0/0/1/c/001c560a07bd411e41a981744e0d6bb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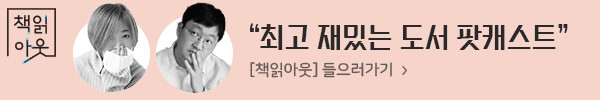
![[에디터의 장바구니] 『과학하는 마음』 『영릉에서』 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22-a6af176f.jpg)

![[리뷰] 미키를 난민으로, 우주선을 보트로 읽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05-ab7602c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