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은 소박하게, 사유는 높게, 도서출판 마티입니다.’ 블로그에 걸린 이 한 줄은 마티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알려준다. 인터뷰가 있던 2020년 12월 8일, 마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20세기 여성 작가들의 삶을 담은 『날카롭게 살겠다, 내 글이 곧 내 이름이 될 때까지』를 발행했다. 뒤표지에는 12명의 여성 작가 이름이 ‘수전’과 ‘한나’를 배제한 채 성(姓)만으로 명기돼 있다. ‘어니스트’ 없이도 ‘헤밍웨이’일 수 있는 권리가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관습에 대한 저자 미셸 딘의 항변을 존중하고 싶었다. 마티의 기치이기도 한 블로그 소개 글은 박정현 편집장의 개인사에서 비롯됐다. “한길사 편집자로 만든 마지막 책이 『대화』예요. 그 문장은 리영희 선생 평생의 모토였어요. 출판사가 지향하기에 더없이 좋은 말이라 빌려 쓰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강을 함께 건널 자기계발서’ 추천에 대한 변도 그가 고른 책들의 면면을 짐작케 한다. “개인적으로는 인문서야말로 검증된 자기계발서라고 생각해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개인과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자는 게 르네상스 인문학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으니까요.” 더욱이 무릇 고전이란 유행보다는 생명력에 방점이 찍히는 존재들이다. 다만 고르고 보니, 네 권 중 세 권이 20세기에 관한 책이다. “어쩌면 10년 후에는 팬데믹이 인류가 겪은 짧은 소동극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지금은 다들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마도 이 감정은 익숙한 것들 - 예를 들어 여행 같은 - 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 왔을 거예요. 이 책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많은 것들이 시작된 시대 어딘가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가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요?” 그중에는 출판사를 옮겨가며 한국에서만 네 번째 판본에 이른 책과 퓰리처상과 전미도서상을 동시에 석권하는 사람의 필력에 꼼짝없이 반하게 만드는 책도 있다.
『1417년, 근대의 탄생: 르네상스와 한 책 사냥꾼 이야기』, 스티븐 그린블랫 지음
무엇보다 재밌다. 퓰리처상과 전미도서상의 논픽션 부문 수상작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단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도 대단히 재밌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포조 브라촐리니가 1417년 필사본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를 700년 지난 지금과 관계를 맺어가며 풀어내는 저자의 솜씨는 경이롭다. 한국어판 제목 때문에 특정한 해를 주제로 삼아 나온 책 중 하나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데, 그런 류와는 거리가 멀다. 원제는 ‘일탈’, ‘방향 전환’ 정도를 뜻하는 ‘The Swerve’다. 르네상스와 근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한다.
『세기말 빈』, 칼 쇼르스케 지음
한 시대를 글로 그려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전범으로 삼을 만한 책이다. 1961년 처음 나온 이래 지금까지 19세기 말 20세기 초 빈에 관한 최고의 책으로 여전히 첫손에 꼽힌다. 정치적, 사회적 위기로 기존 질서가 붕괴하고 현대 예술과 사상이 탄생한 오스트리아 빈의 상황, 이 무대에서 활동한 정치가와 예술가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저자는 날카롭고 매섭게 분석하며 역사적 판단을 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다. 탁월한 학술적 성취가 매혹적인 문장, 세련된 감수성과 만난 드문 예다.
『상상된 공동체』,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상상되었다’고 곧 공상이나 허깨비라는 말은 아니다. 이 책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경우 여기에서 비롯한다. 민족이나 국가가 상상되었다는 건, 민족이나 국가가 가짜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계기, 매체 등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그리게 될까? 그런 일 없이 어떤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피해갈 방법은 없다. 이 책에 대한 많은 반론과 비판을 포함해서 말이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이미 고전이 되었다.
『나머지는 소음이다』, 알렉스 로스 지음
세잔, 피카소, 달리, 뒤샹 등의 미술가, 인상주의, 입체파, 아방가르드, 초현실주의 같은 사조들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은 드물다(물론 잘 아는 이들도 드물지만). 현대미술은 현대인의 기본 소양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같은 시기 음악은 사정이 다르다. 쇤베르크, 베르크, 프로코피예프 등의 이름부터 골치가 아파오거니와, 그들의 음악은 많은 사람에게 음악이긴커녕 두통 유발제일 뿐이다. 『나머지는 소음이다』는 이 간극을 좁혀보려는 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다. 20세기의 음악이 어떤 문화적 토양과 정치 지형에서 생겨났는지를 이보다 더 흥미롭게 들려줄 수 있는 지구인은 없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정다운, 문일완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이혜련,홍경표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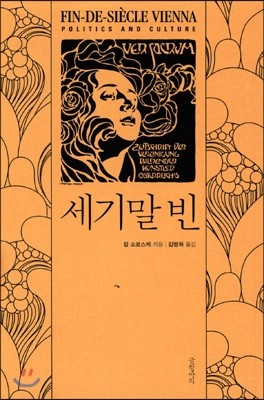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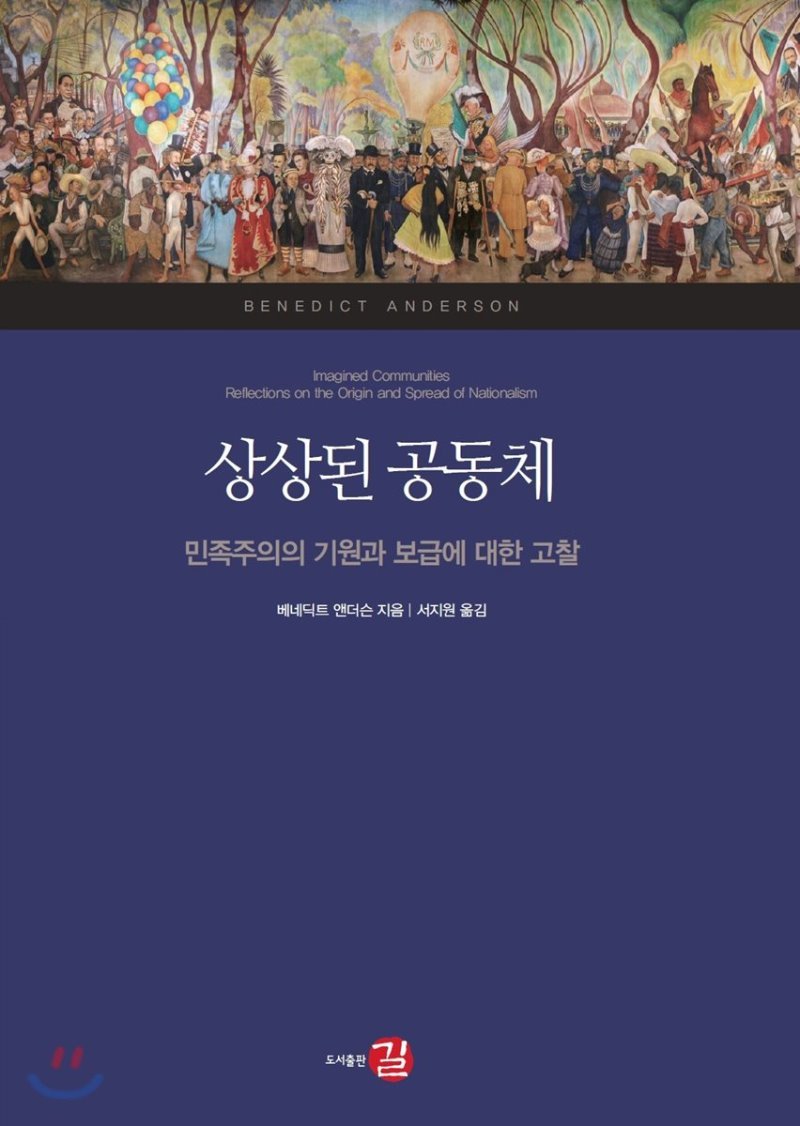

![[고전 특집] 지구와 세상을 위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실천 ? 대기과학자 조천호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c/c/e/6/cce6a7df03d55ba0e0a4a5a925a1b36c.jpg)
![[고전 특집] 2021년의 고전을 묻다 (Feat. 북 도슨트)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a/a/b/c/aabc9b263c9f85886a877d9076d7e8a5.jpg)
![[올해의 시리즈]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할 수 있도록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9/d/e/3/9de36dd34557f2a2bd7dd89ccaa12e33.jpg)

![[인터뷰] 조예은 “소외되거나 경계 밖에 있는 존재들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게 이야기의 의무라고 생각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05-6c7f6d08.jpg)

![[송섬별 칼럼] · · · - - - · · ·](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4-efbfaa92.png)
![[이벤트 종료] 새로워진 채널예스 기대평을 작성해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81642dc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