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사람,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 위치를 알고 그곳에서 더 좋은 길을 택해서 나갈 줄 아는. 누군가에게 멋진 삶으로 불리는 것보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처지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기를. 20살부터 여태껏 쓴 글을 정리하면서 다시금 다짐한 바다.
20대 초입의 내가 쓴 글들은 아프다고 떼 쓰고 티 내기 바빴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가여운 사람이었고, 누군가 내 슬픔의 구렁텅이를 들여다 봐주길 원했다. 내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진짜로 그리 생각한 적은 없지만) 칭하기도 하고, 그러다 곧 ‘멋져 보이는 삶’을 위해 스스로를 치장하곤 했다. 진짜 내 감정이 무언지는 들여다보지 않은 채 ‘글을 쓰는 나’를 위한 감정들을 꾸며내기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글들을 엮어 종이 위에 내보이려 했더니, 자꾸만 부끄러워져서 원고 앞에 진득하게 앉아 있기가 어려웠다. 다시는 스스로 읽지 못할 책을 내보이는 건 아닐는지. 하지만 나부터 이해해야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때의 나는 이렇게 쓸 수 밖에 없던 이유부터 생각하기로 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이므로.

pixabay
무언가를 새로이 깨닫고 나면 이전의 생각들은 모두 유치해 보인다. 깨닫기 전의 나는 숨기고 싶다. 세상을 달리 보는 내 시선이 대견하기도 하고, 이전의 내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지녔던 것인지 와 닿을 때마다 정수리가 저릿하다. 10년이 지난 <그들이 사는 세상>을 1-2년 마다 다시 정주행하는 편인데, 볼 떄마다 정수리가 저릿해지는 느낌이 든다. 대사를 다 알고 보는 드라마는 곱씹을 수 있어 좋다. 곱씹다 보면 ‘아, 이 인물은 지금 보니 또 이렇게 이해가 되네’ 하고 깨닫는 때가 있다. 또 당시에는 ‘기습 키스’로 보이던 장면이 지금에서는 ‘저 정도면 추행 아닌가’ 싶은 장면도 있다. 시대는 늘 변하고 있고, 내 생각도 함께 변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요즘 <캠핑클럽>에서는 이효리의 말에 크게 공감하며 보고 있다. 20대의 치기 어린 생각과 열등감으로 뭉쳤던 자신에 대한 고백부터, 40대가 된 지금의 자신에게는 어떤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고찰하는 면까지. 특히 이전에 멤버들에게 잘 못해주었던 자신을 사과하며 돌아보는 걸 보고,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떠올려봤다.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너무도 많았다. 그때의 나는 나를 사랑할 줄도 몰라서 내 말들이 당신에게 상처가 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고, 지금 와 생각해보니 나는 당신에게 나에게 스스로 해야 할 말을 당신에게 하고 있었노라고. 내가 나를 조금 알게 되어서야 사과해야 할 당신이 생각 난 거라고.
하지만 당분간은 말을 아끼기로 했다. 당신이 날 용서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섣부른 사과는 않기로 한다. 그것마저 내 오만이 될까 두렵기도 하고, 내뱉는 건 내 자유지만 받아들이는 건 당신들이므로 사과를 더 사과답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될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한다. 다만,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아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임을 당신도 헤아릴 만큼 같이 성장하고 있기를. 조금 더 성장한 당신과 내가 훗날 마주 보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서로 미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때 나는 그것이 그 애 자신의 표현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다. 나는 그 사실을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아주 최근에 들어서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난 짧은 머리와 힙합 바지를 자동적으로 남성에 대한 모방이라고 여겼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건들거리며 걷는 인희의 걸음걸이를 보고 남자를 흉내 내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른바 남성적이라고 말해지는 특성들이 당연히 남성들에게 속하는 거라고 여겼던 것이다. 여자들도 짧은 머리를 원할 수 있고, 그것이 - 당연히 - 그녀 자신의 표현일 수 있음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남자처럼 짧은 머리’라는 표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차린 뒤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것이 이 글을 쓰게 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김세희, 『항구의 사랑』 中

pixabay
어른들은 죄다 어른다운 멋이 있는 배울 점으로 가득한 사람들일 거라고 기대했던 게 무너진 지는 오래됐다. 하지만 나이란 별 대수롭지 않은 요소라는 걸 말로는 알면서도, 머리로는 ‘응당 그 나이쯤 되셨다면 이 정도의 생각은 할 줄 아는 사람이겠지’ 하는 생각이 앞서는 걸 보면, 나는 아직 어른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 기대 때문에 내가 알고 지낸 어른들에게 많이 실망하기도 했다. 그저 같은 인간일 뿐인데, 나보다 훨씬 성숙한 사고를 가지길 바랐던 건 내 오만이었던 걸까. 언젠가는 이 어른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한다.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의 마음까지도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사람이 되도록.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걸, 이해해야 할 것 투성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 중이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라는 생각들로 누군가를 쳐다보았던 때가 많았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가 내겐 많다. 다만 이전에 이해가 되지 않던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니, 조금은 내 포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거겠지.
이전에는 ‘도무지 당신을 이해 못 하겠어’를 눈빛으로도 내뿜어서 누군가를 상처받게 했다면, 앞으로는 ‘당장은 이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겠죠, 당신이라면’이라는 눈으로 누군가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그게 내가 원하는 어른의 모습이다.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 자기가 선 자리에 서서 제대로 걸어가는 게 맞는지를 살펴보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도 잘 해내는 사람이고 싶다. 어른이라는 무게를 진 만큼 탄탄한 두 발로 견디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당신도, 나도 서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으면.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밤을 두드린다. 나무 문이 삐걱댔다. 문을 열면 아무도 없다. 가축을 깨무는 이빨을 자판처럼 박으며 나는 쓰고 있었다. 먹고사는 것에 대해 이 장례가 끝나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뼛가루를 빗자루로 쓸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나왔는데 식도에 호스를 꽂지 않아 사람이 죽었는데 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될까. 사람은 껍질이 되었다. 헝겊이 되었다. 연기가 되었다. 비명이 되었다 다시 사람이 되는 비극. 다시 사람이 되는 것. 다시 사람이어도 될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까. 케이크에 초를 꽂아도 될까. 너를 사랑해도 될까. 외로워서 못 살겠다 말하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 안 울어도 될까. 상복을 입고 너의 침대에 엎드려 있을 때 밤을 두드리는 건 내 손톱을 먹고 자란 짐승. 사람이 죽었는데 변기에 앉고 방을 닦으면서 다시 사람이 될까 무서워. 그런 고백을 해도 될까. 사람이 죽었는데 계속 사람이어도 될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묻는 사람이어도 될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나무 문을 두드리는 울음을 모른 척해도 될까.
- 손미, 시집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中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이나영(도서 PD)
가끔 쓰고 가끔 읽는 게으름을 꿈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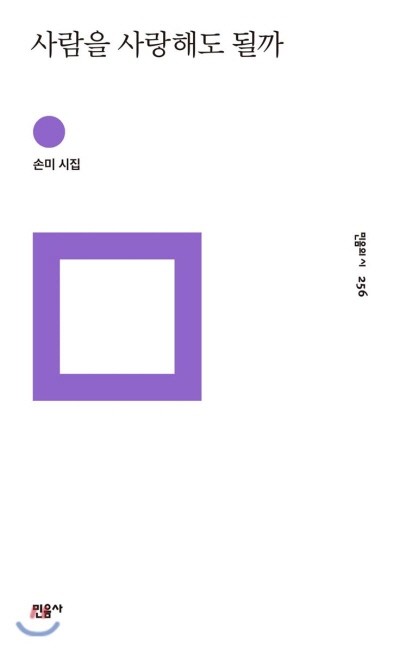




![[최현우 칼럼] 우리의 매직 캐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2/20251209-2b16cf22.jpg)
![[더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 리디아, 어른의 조건을 묻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1/20251121-6158f2c7.jpg)


![[리뷰] “어린이, 안녕하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b5cf6e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