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술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병을 진단받았다. 일명 효녀병. "정연 씨, 효녀병 말기 환자네. 다른 병보다도 고치기 힘든 게 효녀병인데 벌써부터 말기면 어떡해요." 첫 월급의 상당수를 엄마 생활비로 드리고 첫 휴가를 엄마와 함께 여행 다녀온 데 대한 진단이었다. 그 분은 이런 말씀도 덧붙였다. "세상 사람들은 자식이 부모하기 나름이라는데, 저는 부모가 자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신이 부모하기 나름으로 잘 큰 효녀였기 때문. 손해 본 것도 없이 괜히 억울했다.

언스플래시
아니다. 손해도 보긴 보았지. “여성성을 혐오하고 폄하하는 심성은 아버지에 의해 만들어지고 어머니에 의해 계승된다(『여성혐오를 혐오한다』)”는 말대로 엄마는 적극적인 가부장제 수호자였다. 꽤나 큰 미술 학원 원장이었던 엄마는 서른 초반에 나를 낳고 일을 그만두었다. 그때부터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에만 골몰했다고 한다. 교육환경을 고민하면서도 아이가 애교가 없어 미움 받을까 걱정했다. 욕망 당함으로써 살아남는 일. 그것이 엄마가 엄마의 엄마로부터 배운 생존 방식이자 기쁨이었다. 덕분에 나는 자주 나를 부끄러워하며 자랐다. 『나는 착한 딸을 그만두기로 했다』나 『딸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같은 모녀 관계 심리학 책이 꾸준하게 많이 읽히는 걸 보면 이렇게 자라온 사람이 나뿐만은 아닌가 보다.
그럼에도 내가 효녀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어쨌든 덕분에 온전하지는 못했을지언정 안전하고 무사했기 때문이다. 가부장제의 수호자였던 엄마도 물리적 폭력이 개입하면 주저없이 내 앞을 막아섰다. 물론 내가 취직하면서 경제적 독립과 함께 보다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난점이 치고 들어왔다. 엄마를 이해하고 마는 난점.
아빠가 퇴직하고 집안의 주 수입원이 사라지면서 엄마도 용돈 벌이를 넘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였다. 경력 단절 60년대생 주부에게 선택지는 단 두 가지였다. 가사 노동 또는 육아 노동. 엄마는 두 딸을 효녀로 키운 이력을 앞세워 육아 노동을 택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했다. 하루는 엄마가 “내가 애 본다고 하니 누가 이걸 보내주더라. 이게 뭐니?” 하고 문자를 보여주었다. 알아보니 베이비 시터를 구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커뮤니티였다. 스무 번 넘게 배우고 나서야 가까스로 메일에 파일 첨부하는 법을 익힌 엄마였다. 어플리케이션을 자유자재로 이용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터였다.
며칠 후 다시 집에 가니 엄마가 종이 다발을 내밀었다. 한글 프로그램으로 썼을 게 분명한 전단지였다. ‘아이 봅니다. 00대. 000호 거주’ 아파트 관리실에 돈을 내면 동마다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여준다고 했다. 뒤죽박죽으로 정렬된, 크기가 각기 다른 글자 아래에는 큼지막하게 웃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누가 봐도 컴퓨터가 익숙지 않은 사람이 만든 전단지였다. “엄마, 내가 조금 도와줄까?” 내가 묻자 뒤에서 언니가 소근거렸다. “엄마가 처음부터 다 만드신 거야. 우리가 지레 도와드렸다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을 맡게 되어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엄마가 엄마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실 수 있게 지켜봐 드리자.”
허진호 감독의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고 나서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은 한석규와 심은하가함께 비를 맞는 장면도,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도, 심은하가 초원사진관에 돌을 던지는 장면도 아닌 한석규가 아버지 신구에게 TV 리모콘 조작법을 가르쳐주다 짜증을 내고 만 장면이었다.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던 한석규는 아버지가 주무실 때 리모콘 조작법을 종이에 적어놓는다. 일찍이 나는 그런 장면이 가장 아팠다. 자주 오지도 않은 이별의 순간과 보지도 못한 엄마의 노년을 상상했다. 엄마의 생존 방식을 배워오며 어렴풋이 엄마가 금세 도태되리라고 생각했던 것도 같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중 한 장면
사실은 엄마가 일을 구해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힘들었다. 내가 조금 덜 쓰고 아끼면 엄마가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집 가기 전에 백화점 푸드 코트에 들러 맛있다는 디저트를 사가는 기쁨을 알고 나서는 더더욱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부담을 졌다. 어떤 일이든 컴퓨터 같은 기계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하는 탓도 컸다. 요즘 시대의 생존 방식을 엄마는 모른다. 아이는 빠르게 배우지만 엄마는 느리니까 대신 해드려야지. 제발 대신 해주려 하지 말아달라고, 알아도 모른 척 지켜봐달라고 말해왔으면서 정작 내가 부양자와 보호자가 되니 엄마가 내 품에서 벗어나 아플까 다칠까봐 안달이 났다. 언니가 속삭이고 나서야 깨달았다. 엄마의 몫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내가 커가면서 엄마가 깨달았을 사실.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일은 항상 늦다.
어떤 성실함은 때론 슬픔으로 다가온다. (중략) 시간이 훌쩍 지나 이젠 나도 돈을 버는 사람이 되었다. 큰돈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집으로 보내면서 그들에 대한 아주 작은 책임감을 느낀다. 병원비의 일부를 보태거나 제철 과일을 사 가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다만 수입이 많은 편이 아니라 가끔 적은 액수 앞에서도 망설여질 때가 있다. 당장 10만 원조차 빠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생활비를 건너뛰어야 했던 달도 있다. 그럴 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아지는 기분이 들고 종종 그때의 할아버지가 떠오르기도 한다. 온전히 할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보지 못했으니까. 다만 살아가며 짐작의 범위를 넓혀갈 뿐이다.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일은 그래서 항상 늦다.
_ 김달님, 『나의 두 사람』, 76-77쪽
나는 여전히 효녀병 말기이지만, 방식을 조금 바꾸었다. 용돈을 많이 보내드리기 위해 아껴 쓰는 대신 엄마와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를 하나씩 정복하고 있다. 연트럴파크의 유명한 카페에서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유행하는 드라마를 본다. 오늘 SNS에 올린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고 다음에 나와 같이 가자고 말한다. 대신 살아주는 대신 함께 산다.

이정연(도서MD)
대체로 와식인간으로 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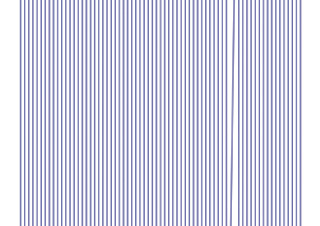
![[비움을 시작합니다] 네가 변해야 모든 게 변한다 ②](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9-3e264992.jpg)
![[더뮤지컬] <리틀잭> 유주연, 순간을 영원처럼](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08-d6e1342c.jpg)
![[더뮤지컬] "소설 속 응축된 정서, 자연스럽게 무대 위로" 뮤지컬 <오세이사> 프레스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04-dd2d77e2.jpg)
![[리뷰]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사랑하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30-e74966d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