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버닝>의 한 장면
(* 영화의 결말을 스포일러 하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헛간을 태우다」를 원작으로 하는 <버닝>은 해미(전종서)를 가운데 두고 종수(유아인)와 벤(연상엽)이 일종의 전선을 형성한다. 북한의 대남방송이 들리는 파주의 시골집에 사는 종수는 전형적인 ‘흙수저’다. 문예창작과 출신으로 글을 쓰고 싶어도 아직 마땅한 아이디어도 없고 생활도 이어가야 하기에 틈 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뛴다. 그와 다르게 벤은 ‘개츠비’다. 서래마을의 고급 빌라에 살고, 포르쉐도 몰고 다닌다. 다만, 무슨 일을 하기에 그렇게 부유한 건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닐까, 헤아려진다.
이 둘 사이에 긴장을 ‘타오르게 burning’ 하는 발화점은 해미다. 나레이터 모델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오는 등 적극성을 지녔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캐릭터의 성격이 설정된 셈인데, 종수를 보자 먼저 말을 건 것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간 것도, 잠자리의 분위기를 리드한 것도 모두 해미다. 종수가 해미의 가슴에 손을 가져가다가 망설이자 그 손을 잡아 가슴에 올리는 것도 그녀다.
종수는 해미와의 섹스가 첫 경험인 것 같다. 해미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종수는 오랫동안 이성 관계에 무지한 채로 남았을 터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포장된 여성이 순진과 무지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남자의 욕망을 깨우는 설정은 여성을 수단으로 삼는 남성적 시선의 전형이다. 벤과 함께 종수의 집을 찾은 해미가 대마초를 한 후 상체를 드러내며 춤을 추는 장면도 이런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종수의 집 하늘을 배경으로 낮과 밤을 가르는 매직아워의 순간에 맞춰 춤을 춘 해미가 이후 극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설정도 신비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해미에게 덧씌운 신비감은 종수의 불안감을 키우는 일종의 스모킹 건이다. 숫기 없어 마음 표현에도 서툰 종수에게 그녀의 ‘실종’은 사랑에 더욱 집착하는 결정적인 계기다. 이때 <버닝>이 종수의 불안을 분노로 전이하는 방법은 위에서 벤과 종수를 구분해 설명한 것처럼 도식적인 데가 있다. 극의 곳곳에 포진한, 이 영화에서 대사로도 등장하는 ‘메타포’가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해도 종수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분노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하는지는 회의적인 쪽이다.

영화 <버닝>의 한 장면
종수는 자본계급을 대표하는 벤의 대척점에 서 있다. ‘극단’은 종수와 벤의 갈등이 이끄는 <버닝>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그래서 돈도 없고, 희망도 품지 못한, 심지어 해미마저도 뺐겼다고 생각하는 종수의 벤을 향한 균형을 잃은 결말의 선택은 예상 가능한 범주의 극단을 넘어서지 못한다. 가끔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는 벤이 이번에는 아주 가까운 곳을 노리고 있다고 한 말은 해미와 같은 여성을 만나 재미를 보다가 죽인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주 좋은 비닐하우스예요. 오랜만에 태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반발해 사적 복수를 가하는 종수의 행위를 일반의 형태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해미의 집에서 글을 쓰는 종수를 비추던 카메라가 창문 밖으로 빠지며 이후 이어지는 살인 장면은 종수의 소설 속 상상일 수도 있다는 모호함을 덧씌우기는 한다. 그렇다고 종수의 계급적 열등감이 폭발하는 분노의 형태가 깊이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해미는 처음 종수를 만나면서 어릴 적에 우물에 빠진 자신을 구해줬다고 말한다. 종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기억이 없다. 해미가 사라진 후 종수는 우물의 실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된다. 아무리 찾아봐도 해미가 말한 우물은 없다. 이는 벤을 만난 이후의 해미 때문에 삶의 깊은 우물에 빠진 종수가 허우적거리는 상태를 은유한 설정일 테다. 그런 상황에서 종수를 걱정하거나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이, 무엇보다 어른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는 폭력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고 오랜만에 아들을 찾아온 엄마는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물 같은 현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하는 종수, 이창동 감독이 <버닝>으로 바라보는 지금 이 시대의 젊음이다.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긴 해도 지금의 젊음이 현실의 우물 깊은 곳에서 무기력하거나 극단적인 반응으로 일관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역사의 도도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체험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오랫동안 남성들의 억압에 시달리고 차별받고 소외당한 여성이 자리한다. 부조리한 현실을 더는 참지 못해 바꿔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의 상당수가 젊은 여성이라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 비춰 젊음을 다룬 이번 영화에서의 이창동 감독의 시각은 동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먼 뒤의 시간에서 멈춰있는 듯하다. <초록 물고기>(1997)와 <박하사탕>(2000)과 <밀양>(2007)과 <시>(2010)를 통해 외면받는 이들의 말 못 할 고통의 사연을 그들의 눈높이에서 응시하며 공감의 정서를 획득하고 예술적 성취까지 이뤄낸 것을 고려하면 <버닝>은 균형의 추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있다.
<버닝>에는 종수가 불에 타 없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집 근처의 비닐하우스를 찾아 헤매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장면에서의 종수가 <버닝>을 다루는 이창동 감독의 처지와 포개진다. 종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종수의 눈을 빌린 이창동 감독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다. 젊음을 있는 그대로 응시하려 해도 ‘어른’, ‘남성’의 시선이 ‘비닐하우스’를 둘러 실루엣만 간신히 보이는 무늬뿐인 젊음. 제대로 살필 수 없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감독의 시선이 모호함으로 포장된 것만 같은 인상이다. <버닝>이 원작으로 한 건 <헛간을 태우다>이지만, 결과적으로 헛’것’을 태우고 말았다.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허남웅(영화평론가)
영화에 대해 글을 쓰고 말을 한다. 요즘에는 동생 허남준이 거기에 대해 그림도 그려준다. 영화를 영화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려고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책] 우정 읽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30-c0b54c6c.jpg)
![[김미래의 만화절경] 울퉁불퉁 과자세트 같은 단편만화집](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28-49b98b62.jpg)
![[젊은 작가 특집] 김지연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5b0f5351.png)
![[젊은 작가 특집] 강보라 “못생긴 감정을 숨기고 사는 인물에게 관심이 있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508d14fb.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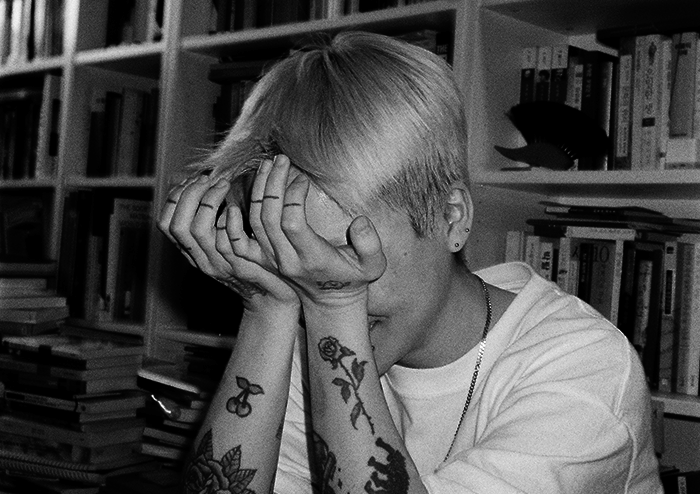


찻잎미경
2018.06.03
yogo999
2018.05.28
시골아낙
2018.05.28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