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회차 <동굴 끝>(2014), 캔버스에 유화, 41*61
그리고 또다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 미술 치료 시간이 돌아왔다. 제발 치료 거부를 해서 넘어가기를 바랐는데, 그날따라 너무 난폭하고 제어가 안 되므로 미술 치료가 오늘 꼭 필요하단다. 젠장. 이런저런 재료를 가지고 C동으로 들어갔다. 이런 것을 해보자 하는 나의 설명에 콧방귀를 끼면서 낄낄거린다. 기숙사 스태프가 “조용히 안 할래! 말 안 들어? 너희들 주말에 안 나가고 싶어?”라고 했지만 그래봤자 소용없다. 행동 점수 같은 거, 주말에 상으로 어디 놀러 가는 거 다 포기한 아이들이다. 워낙 점수가 마이너스다 보니 열심히 노력해 봤자 주말에 놀러 갈 정도로 만회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다 또 원하면 언제든지 도망을 가는 아이들이라 점수, 규율, 허락, 그런 협박 다 소용없다.
그런데 이쯤이면 짐을 싸고 도망을 가던 내가 오늘은 버티고 있으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를 어떻게 할 기세다. 한 놈이 얼굴을 내 코앞에 바싹 대고는 “어떡할 거야, 때리고 싶어? 욕해 보지?” 하면서 빈정거린다. 처음에는 이 애들 이러는 게 그렇게 무섭더니 이제 나도 좀 겪어봤다고, 싸울 수도 도망갈 수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마음이 조용해진다. 째려보는 이 아이의 눈을 보다가 뜬금없는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우리, 눈으로 하는 게임 하나 할래?” 이 질문에 인상 짓고 있던 아이의 표정이 확 바뀐다. “그게 뭔데?” 하고 궁금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묻는다. 이런 놀이를 미국에서도 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에서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자주 했던 눈싸움 놀이를 설명한다. 서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먼저 웃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째려보는 게 특기이니 뚫어지게 노려보는 게 너무나 쉬울 것 같은 이 아이들과 승산이 있을까 싶었는데, 눈싸움 놀이를 시작하자마자 이놈들 몇 초를 못 견디고 웃느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다. 나랑 눈만 닿으면 웃겨죽겠다며 자지러진다. 그런데 웃음소리가 다르다. 비웃고 작당 모의하고 기분 나쁘게 웃어대는 웃음소리가 아니라, 재미있어서 까르륵 까르륵 넘어가는 애들 웃음소리다. 어라? 재밌어하네?
서로가 원수라 말도 안 하는 두 아이를 붙여준다. 그런데 둘 다 너무 웃어대서 누가 이겼는지 알 수가 없다. 조만간 아메리칸 아이돌에 나오리라 예상되는 천사의 목소리의 주인공 제레미아는 구석에서 컴퓨터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가 아이들에게 끌려서 눈싸움 판에 끌려나왔다. 솜처럼 부드러운 천사의 목소리와 더불어 190센티미터의 키에 100킬로그램이 훨씬 넘어 보이는 거구의 몸을 가진 제레미아는 거친 아이들에게 너무 당해서 늘 불쌍해 보이는 청년이다. 아이들이 웃으면서 그의 팔을 잡아당기니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아이들은 웃으면서 제레미아를 내 앞에 앉힌다. 내 특기인 이상한 표정 짓기를 써본다. 코를 실룩실룩거리고 입을 삐죽삐죽거려서 상대방을 웃기는 기법인데, 하도 오랜만에 해봐서 효험이 있으려나 싶었는데 효과가 직방이다. 다들 웃다가 쓰러진다. 결국 나는 완승무패로 이 경기의 챔피언이 된다.
이 사건은 내 짧은 미술 치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치료의 예로 남을 것이다. 붓 하나 연필 하나 없이 해낸 최고의 치료적 개입이지 않은가? 나중에는 서로 얼굴을 보기만 해도 웃음보가 터져서 웃겨죽을 것 같아한다. 한 시간이 훌쩍 지나고 펼쳐만 놓고 쓰지도 않은 미술 도구를 주섬주섬 모으는데 아이들이 이것저것 집어주면서 도와준다. 그러고는 이 동의 리더이자 갱단 두목 같은 녀석이 “은혜, 너 어디 사니?” 하고 묻는다.
“나? 시카고 아베뉴와 웨스턴 아베뉴 근처에 살아.”
“웨스턴? 그러면 웨스트사이드 출신이네!”
목소리가 한 톤쯤 올라간 반가운 목소리이다. 시카고에서 웨스트사이드라고 하면 웨스턴 아베뉴의 서쪽을 가르킨다. 웨스턴 아베뉴 길 하나를 두고 동쪽은 유럽계 백인들이 살고, 서쪽은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산다. 서쪽은 갱의 활동이 활발하고 험한 동네가 많은 곳이며,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웨스트사이드 혹은 흑인들이 많이 사는 사우스사이드 출신이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 웨스턴 아베뉴에서 한 블록 동쪽에 살거든.”
“한 블록? 아냐, 그 정도면 웨스트사이드나 마찬가지야.”
그러고는 이 아이, 뒤로 돌아서서는 다른 녀석들에게 크게 말하기를, “얘들아, 은혜도 우리처럼 웨스트사이드 출신이래!” 한다.
그 아이의 말에서 ‘우리처럼’이란 단어가 쨍 하고 울린다. 우리처럼 은혜도 같은 동네에서 왔다고, 은혜도 우리라고! 상대방을 이기거나 이기지 못하면 친구가 되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 아이들과의 기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했지만 아이들과 친구가 된 듯하다. 이 녀석들이 나를 ‘우리’의 하나로 받아준 것으로 험한 통과 의례는 끝났다.
시간이 흘러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고, 아이들과 스태프들에게 인사를 하러 기숙사동들을 돌아다녔다. C동에 인사를 하러 가니 그때 ‘우리처럼’이라고 나를 불러줬던 그 아이가 내 묶은 머리를 뒤에서 잡아당긴다. “그만두지 못해!”라고 제레미아가 소리를 치는데, 내 머리를 살짝 잡고 놓지를 않는다. 이 녀석, 많이 섭섭한가 보다.
기숙사를 다 돌아다니고 잠시 쉴 겸 가을의 맑은 햇빛을 즐기려 펜스로 둘러싸인 운동장에 나오니 여자아이들 한 무리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그룹에 끼지 않은 애니가 혼자 나무로 만든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다. 애니 옆에 가서 조용히 앉는다. 애니가 나를 슬쩍 쳐다보고는 곧바로 아무 말 없이 하고 있던 일을 계속한다. 볼펜으로 나무 테이블에 하트 모양을 세기고 있는 중이다.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니?” 하고 내가 묻는다. 나를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볼펜을 움직이던 손이 멈춘다. 잠시 머뭇거리는 듯하더니, “미워한 적 없어요”라고 간단히 말한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애니와의 통과 의례도 패스했나 보다. 좋은 날씨다. 쇠창살 펜스에 싸여 있기는 하지만 바람이 통하는 운동장에 앉아서 바람과 햇볕을 느끼며 애니가 볼펜을 꾹꾹 누르면서 그리는 것을 돕는다. 나도 테이블에 하트를 그린다.
[추천 기사]
- 자폐증 아동은 정말 공감을 못 할까
- 나와 너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 프랑스의 문제적 소설가 마리 다리외세크 방한
- 폭력 안에 깃든 두려움

정은혜
미술 치료사이며 화가다. 캐나다에서 회화와 미술사를 공부하고 한국에서 뉴미디어 전문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의 기획자로 일하다, 자신이 바라던 삶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소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를 도울 때 기뻐하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미국으로 건너가 미술 치료 공부를 시작했다. 미국의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미술 치료 석사 학위를 받고 시카고의 정신 병원과 청소년치료센터에서 미술 치료사로 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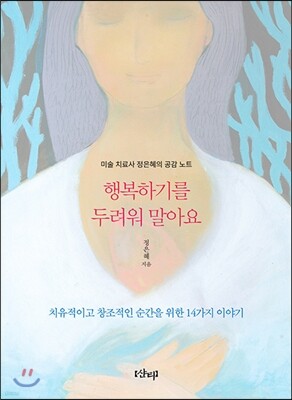


![[리뷰] 심리학의 깊이가 보여주는 인간의 근원](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07-4c64c0b0.jpg)
![[하은빈X안담] 실패하는 몸, 사랑하는 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8-35cd42b2.png)

![[큐레이션] 몸을 다루는 법, 근데 이제 마음가짐을 곁들인](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10-63e14e5e.png)
![[리뷰] 심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그림자 보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06-538b5611.png)



별따라
2015.04.02
아이들의 모습...공부방에서도 만났던 비슷한 풍경인데 공감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