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범의 홍보 문구와는 달리, 이것은 그룹의 전성기를 능가하는 앨범은 결코 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세월에 장사 없다는 말은 속담을 넘어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이니까. 그러나 '전성기에 근접한 앨범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그렇다는 대답이 쉽게 나오는 물건임에는 분명하다. 그룹은 이번 앨범의 이후를 생각지 않겠다는 듯, (어찌 보면 걱정스러울 만큼)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룹은 음반 발표에 앞서 '신보는 팬들에게 헌정하는 성격의 앨범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허언이 아니었다. 신보는 주다스 프리스트 정규 커리어의 연장이기보다는 번외편 격의 앨범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다. 밴드의 전성기 파워를 그리워할 팬들을 위해, 이 역전의 노장들은 다시 한 번 그 때 그 시절의 사운드를 거의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다.
들리는 소리만 놓고 봤을 때, 앨범의 사운드는 < Painkiller >(1990) 시절의 그것과 흡사하다. 케이케이 다우닝(K. K. Downing)은 없지만, 젊은 피인 리치 포크너(Richie Faulkner)가 그 빈자리를 채우며 밴드의 트레이드마크인 트윈기타시스템을 그대로 재현했고, 스캇 트래비스 역시 직선적인 드럼 사운드를 그 때 그 질감 그대로 살려냈다. 물론, 가장 큰 관심거리인 롭 핼포드의 보컬 역시 (레코딩 상으로는) 전성기 시절 못지않은 파워를 들려준다.
 |
 |
사실 이런 노장들이 앨범을 낼 때면 밴드의 현재에 어울리는, 다시 말하면 라이브에서도 소화가 가능하도록 완급조절을 고려해 작곡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축적된 연주력은 드러내고 파워는 아끼는 방향으로 앨범의 방향을 트는 것이 보통의 수순인 것이다. 팬들을 위한 헌정격의 앨범인 만큼, 멤버들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말하자면 주다스 프리스트의 신보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앨범이다.
앨범을 전체적으로 감상했을 때, 속도감이 줄어드는 부분은 단 두 곳('Hell&Back', 'Beginning of the end') 외에는 없다. 「Redeemers of souls」는 밴드가 1970년대에 이미 확립한 고전적 헤비메탈의 매력을 십분 즐길 수 있는 곡이며, 「Halls of Valhalla」는 핼포드의 기선제압에 귀가 얼얼해지는, 페인 킬러 시절의 「Night crawler」의 잔향을 맛볼 수 있는 곡이다. 「March of the damned」에서는 그루비한 팝 메탈과 정통 헤비메탈 사이에서 묘하게 균형을 잡는 젊은 감각도 들려주며, 「Metalizer」에서는 다시 한 번 시원한 샤우팅과 불꽃같은 피킹 -낡아빠진 표현이지만 형님들의 앨범이라면 이런 표현은 써줄 필요가 있다- 으로 건재함을 다시 한 번 과시한다.
모 영화에서, 주인공은 '내일만 보고 사는 놈은 오늘만 보고 사는 놈에게 죽는다'고 했다. 이 대사를 이 앨범에까지 끌어다 쓰면 너무 억지일까. 추억으로 남을 수 없는 형님들이 돌아왔다! 내일을 생각지 않고 오늘에 더 충실한 형님들의 매력을 마음껏 즐겨보기를. 분명 멋지다는 생각이 들 거다.
글/ 여인협(lunarianih@naver.com)
[관련 기사]
- 스케일이 다른 사운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 아시안체어샷 “음악은 멤버들 간의 화학작용”
-핫펠트 예은, 싱어송라이터로 인정받을까?
-아시안체어샷, 인디 음악계의 새로운 바람
-제이슨 므라즈,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랑

이즘
이즘(www.izm.co.kr)은 음악 평론가 임진모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중음악 웹진이다. 2001년 8월에 오픈한 이래로 매주 가요, 팝, 영화음악에 대한 리뷰를 게재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올뮤직가이드’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썼으나 지금은 인터뷰와 리뷰 중심의 웹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풍부한 자료가 구비된 음악 라이브러리와 필자 개개인의 관점이 살아 있는 비평 사이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더뮤지컬] "숨통 트이는 공간" 뮤지컬 무대 돌아온 황정민…<미세스 다웃파이어> 제작발표회](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10-bdb9df69.jpg)
![[예스24] 미대생 졸업 작품 중 최종 선정된 작품들의 무대 ‘2025 대학미술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14-16d7a53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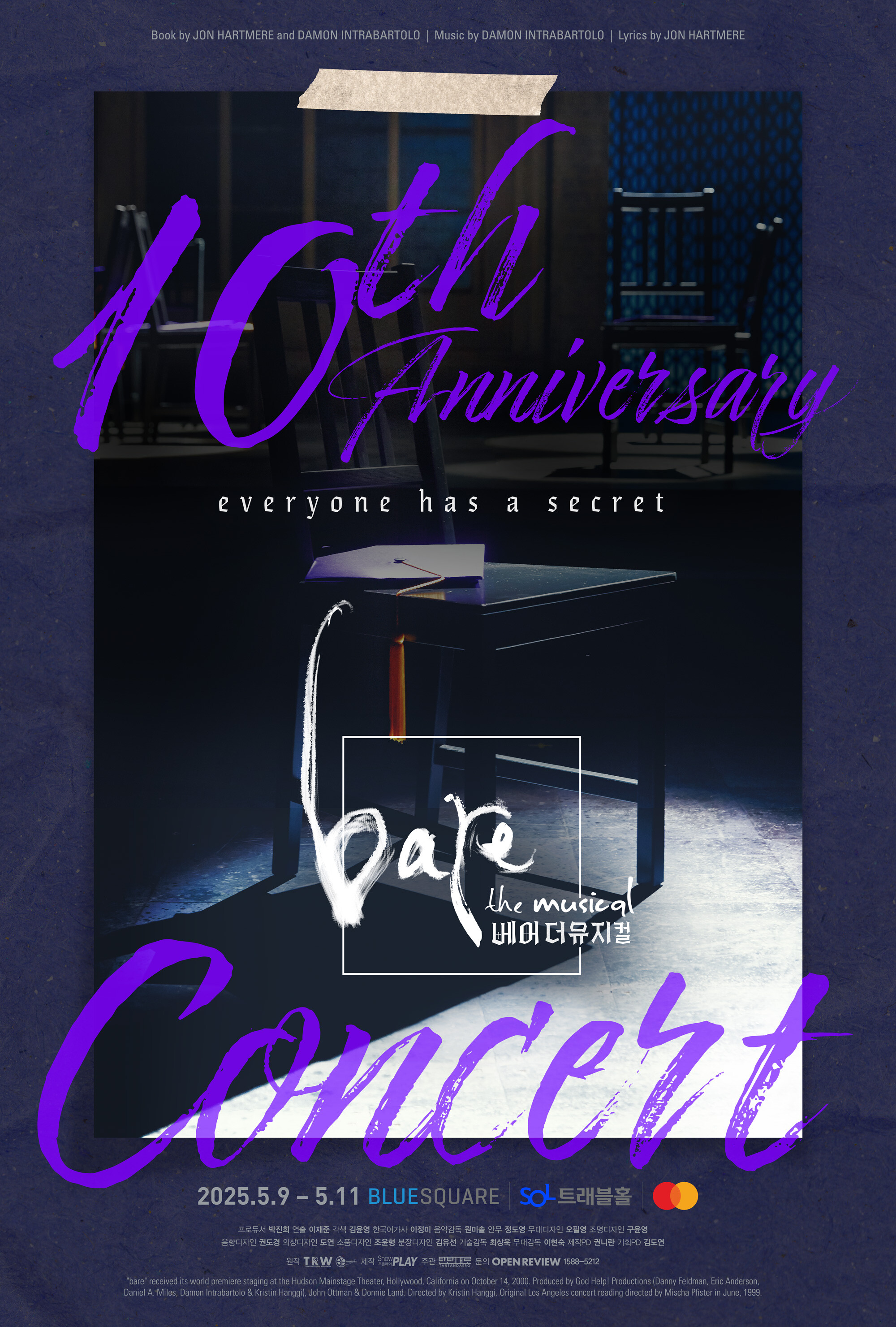
![[예스24] 프리즈 LA 2025 : 화마를 딛고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03-a225b87d.png)
![[번역 후기] 다와다 요코 Hiruko 3부작 완결을 축하하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3/20250328-73be649d.png)








myung988
2014.08.17
메롱
201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