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뽕짝’ 대한민국, 조용한 곳 어디 없나요?
서울에서 나고 40년 넘게 살아온 내가 요즘 들어 가장 참기 힘든 소음은 각종 상점에서 뿜어대는 음악 소리다. 휴대폰ㆍ전자제품ㆍ의류 상점 등에서 스피커를 거리로 향한 채 틀어대는 강한 비트의 빠른 댄스곡들 말이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봐도 이런 곳은 없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이 있는 세종로 사거리에서 낙원 상가가 있는 종로 2가까지 한 번 걸어 보시라. 지금 한창 뜨고 있는 핫 뮤직, 특히 댄스곡들을 전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2012.06.27
『검은 고양이(The Black Cat)』로 유명한 미국 작가 에드거 앨런 포(Adgar Allan Poeㆍ1809~1849)의 대표작 중에 『어셔가(家)의 몰락(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ㆍ1839)』이 있다. 정신이상(異常)을 겁내는 작가의 불안한 심리가 엿보이는 산문시풍의 단편 소설로 세계문학사에 길이 남을 걸작이다. 불길한 예감과 공포로 가득한 가운데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믿기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외국 문학의 고전들이 그러하듯 번역서로 읽어서는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줄거리만 놓고 보면 영락없는 서양판 ‘전설의 고향’이다. 유서 깊은 가문의 후예인 로더릭 어셔의 긴급한 편지로 초대된 친구 ‘나’는 잔뜩 흐린 가을날에 그 저택을 찾는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어셔는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어셔의 쌍둥이 누이동생 매더린이 죽어 장례를 치렀는데 폭풍우 치는 어느 밤 죽은 줄 알았던 누이가 책을 읽고 있던 오빠에게 와서 쓰러지고 남매는 둘 다 숨진다. 이 무서운 사건을 목격한 나는 겁에 질려 밖으로 달아나고 저택은 두 동강이 나며 음울한 늪 속으로 침몰한다.
주인공 로더릭 어셔는 ‘감각의 병적 과민성(a morbid acuteness of the senses)’으로 인해 대단히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는 음식이 아니면 견딜 수 없고, 의복도 일정한 소재로 된 것만 입을 수 있었다. 모든 꽃 향기가 감각을 압박하고, 아무리 약한 광선에도 눈이 시렸으며, 특정한 소리, 바로 현악기의 음향만이 그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이 구절은 현대에 들어서야 병명이 붙여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ㆍ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을 연상시킨다. 우리나라에도 2만여명이 앓고 있다는 이 병은 살짝 몸이 스치거나 심지어 바람만 불어도 작열통(灼熱痛), 즉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최악의 질병이다. 작열통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고통 순위 2위는 손가락 혹은 발가락의 절단, 3위는 출산이라고 한다)
불에 타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지는 2001년 9ㆍ11 테러 때 자료 화면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 화염에 휩싸여 있을 때 시시각각 다가오는 불길에 갇혀 고통 받던 사람들이 고층 창문에서 차라리 수백 미터 아래로 몸을 던지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중세 마녀 사냥 때 사람의 명줄을 끊는 수백 가지 방법 중 굳이 불에 태워 죽인 것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를 중세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작열통까지는 아니어도 로더릭 어셔는 ‘소리’에 큰 고통을 받았다. “특정한 소리, 바로 현악기의 음향만이 그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there were but peculiar sounds, and these from stringed instruments, which did not inspire him with horror).” 그런 어셔가 만약 21세기 한국 서울의 종로 거리를 걷는다면, 그는 단 5분 만에 미쳐버리거나 고통으로 혼절했을 것이 틀림없다.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 동안 청계천 고가(高架) 등 주요 고가도로들을 철거한 것이 도시 소음(city noise)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도시 녹지(urban green) 공간이 태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뉴욕시 61% (‘Environment News Service’ 2012.2.23), 도쿄 40%에 비해 서울은 25% 가량이 녹지이다.
주지하다시피 현대사회에서 소음은 ‘공해(noise pollution)’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수질오염과 달리 소음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스스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각 공해’라고도 한다. ‘공장 소음’이나 ‘항공기 소음’은 공장지대ㆍ공항 주변지역을 벗어나면 되지만, 대도시의 주요 소음원인 자동차ㆍ전철ㆍ기차에서 초래되는 ‘교통 소음’은 도시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한 피할 도리가 없는 소음이다.
문제는 확성기, 건설공사장, 유흥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 소음’이다. 환경부가 얼마 전 서울ㆍ부산을 비롯한 전국 44개 도시 소음진동 측정 결과 75%인 33개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에서 밤시간대 소음진동이 환경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서울(2011년)은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데시벨(dB) 기준으로 도로변 주거지역 평균 소음도가 낮시간대 68dB, 밤시간대 65dB로 환경기준 65dB(낮), 55dB(밤)를 모두 훌쩍 뛰어 넘고 있다. ‘고요한 밤(silent night)’은 커녕 낮과 밤의 차이도 별로 없을 정도다.
국제적으로 보통 밤의 소음은 40dB 안팎, 조용한 지역의 일반주택가 낮 소음은 50~55dB, 시내 번화가 교통소음은 70~80dB 정도로 본다. 80dB 이상의 소음을 오랜 기간 계속 들으면 평생 청각장애가 될 수 있다.

서울에서 나고 40년 넘게 살아온 내가 요즘 들어 가장 참기 힘든 소음은 각종 상점에서 뿜어대는 음악 소리다. 휴대폰ㆍ전자제품ㆍ의류 상점 등에서 스피커를 거리로 향한 채 틀어대는 강한 비트의 빠른 댄스곡들 말이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봐도 이런 곳은 없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이 있는 세종로 사거리에서 낙원 상가가 있는 종로 2가까지 한 번 걸어 보시라. 지금 한창 뜨고 있는 핫 뮤직, 특히 댄스곡들을 전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점포 안에서야 테크노 댄스 뮤직을 틀든, 헤비 메탈을 볼륨 최대치로 올려놓든 점주의 자유다. 시끄러워 못 견디겠는 손님은 그곳을 나오면 그뿐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대체 무슨 권리로 점포 밖 거리를 향해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온갖 소음을 쏟아내고 있는가. 관할 구청 등 행정관청은 어째서 이런 무뢰한(無賴漢)들을 마냥 내버려두고 있는 건가. 명동, 홍대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예외가 없다. 날씨라도 후텁지근할 땐 정말 스피커를 부시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시끄럽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버스나 택시도 마찬가지다. 나는 버스를 탈 때마다 뒷자리로 향하는 오랜 버릇이 있는데 순전히 라디오 소리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다. 광역버스가 도입되기 전 경기 용인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ㆍ퇴근하며 하루 3~4시간을 버스 속에서 보내야 했던 시절엔 방약무인(傍若無人)격으로 라디오 볼륨을 키워놓은 기사에 대해 여러 차례 살의(殺意)마저 느껴야 했다. 피곤에 절어 불편한 버스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는 승객들로 가득한 버스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라디오 방송을 아무렇지 않게 틀어놓는 운전기사라니. 안하무인(眼下無人)도 유만부득(類萬不得)이다.
택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나마 라디오 방송이면 양반이다. 쿵짝쿵짝 관광버스용 싸구려 음반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목사 설교 CD까지 정말 갖가지다. 도저히 참지 못해 소리 좀 줄여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면,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듯 마지못해 쪼끔 줄이는 기사도 적지 않다. “내 택시에 탔으니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건지, 상대방이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교통 서비스를 받는 손님이라는 생각 같은 건 이들에게 없다. 광주ㆍ부산 등 지방으로 당일 출장을 다녀와야 할 땐 고속버스 타기 전에 ‘부디 상식으로 충만한 기사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매번 기도를 올리는 게 일이었다.
미국ㆍ유럽ㆍ일본에서 버스기사가 라디오 방송을 튼다는 건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사적(私的ㆍprivate) 공간이 아닌 공공(公共ㆍpublic)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선, 칼이나 총을 들고 있어도 어울리겠다 싶게 생긴 택시 기사도 손님이 타면 라디오나 오디오는 물론이고 통화하던 전화기도 즉시 끈다. 그게 정상이고 상식이다. 말 그대로 대중교통(public transportation)이 아니던가.
20년 전 혼자 전남 신안 홍도(紅島)를 찾은 적이 있다. 실마리 없이 꼬인 현실, 불안한 미래 등 복잡한 머릿속에 신선한 바람도 채우고, 더불어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도 느껴보자는 의도였다. 과연 쪽빛 바다와 탁 트인 하늘이 어우러진 풍광과 자연이 빚어낸 기기묘묘(奇奇妙妙)한 바윗돌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런데…. 1시간 남짓한 홍도 코스 내내 유람선을 쩌렁쩌렁 울리던 그 뽕짝들!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스치고(‘처녀 뱃사공’)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견새(‘소양강 처녀’)를 거쳐 비내리는 호남선(‘남행열차’)까지. 살을 엘 듯 짱짱한 햇빛과 처연한 갈매기 울음 소리를 고대하던 나는 그 끝도 없이 바다를 채우던 거대한 굉음(轟音) 덩어리에 짓눌려 헉헉거려야 했다. 과연 지금이라고 달라졌을까?
6월 초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1박 2일 캠핑을 다녀왔다. 장소는 강원 춘천 중도(中島) 오토 캠핑장으로, 한 아웃도어 용품 회사의 기획행사에 참여한 것이었다. 집을 떠나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처음 자보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던 모습에 애비로서도 보람된 하루였다.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밤의 소음들이었다.
인근 텐트에 단체로 놀러 온 한 팀이 모두가 잠자리에 든 밤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것이었다. 급기야 노래까지 부르며 지X을 떨기에 참지 못하고 가서 한마디 했다. 무식하긴 해도 그나마 양심들은 있었는지 더 이상 노래는 부르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강 건너편 어디선가 들려오는 엄청난 음악소리였다. 아마도 한 회사가 야영시설을 빌려 단합대회라도 하는 모양이었는데, 최대 한도로 볼륨을 높인 고성능 스피커로 틀어대는 라이브 밴드에 맞춰 2시간 넘게 70ㆍ80 노래들을 부르는 거였다. 초대 가수인지 누군지 찢어지는 목소리에 중간중간 “으쌰라 으쌰” 하는 함성 소리까지 섞여 강을 넘어 왔다. 큰 맘 먹고 집 떠나와 한밤중에 ‘나 어떡해’서부터 ‘구름과 나’, ‘해변으로 가요’ 등을 귀가 쩡쩡 울리도록 듣고 누웠자니 잠이 안 오는 건 물론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나마 아이들은 잠이 들어 다행이었다.
‘해도 너무 한다’ 싶어 112를 통해 몇 군데 전화를 돌리고 나서야 춘천에 있는 모 단체가 그날 저녁 중도 캠핑장 건너편 춘천 MBC 인근 춘천어린이회관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극심한 소음을 호소를 했더니 해당 지역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방금 행사가 끝났으니 괜찮아질 것”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그게 밤 12시 20분이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좋은 일 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단체가 무슨 베트남 참전 군인들 위문 공연 쯤에서나 나올 법한 환성과 노래, 라이브 연주 등의 굉음을, 한낮도 저녁 8시도 아닌 한밤중에 2~3 시간 내리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배출한단 말인가.
인간은 보기 싫으면 눈을 감으면 되고, 냄새 맡기 싫으면 잠시 숨을 멈추면 되지만,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신체구조를 갖고 있다. 모든 동물이 그러한데 바로 생존을 위해서다. 듣지 못하면, 듣기를 멈추면 천적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위험을 알리는 클랙슨 소리, 자지러지는 아이의 울음 소리, 직장에서 상관이 호출하는 소리, 한밤중 평소와 다른 거실 인기척 소리 등을 듣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래서 모든 동물의 귀는 꺼풀이나 덮개, 뚜껑이 없이 항상 열려 있다.
들어야 할 때 놓치지 않고 정확히 듣기 위해서도 우리의 청신경은 제때 충분히 쉬어줘야 한다. 지속적인 소음은 스트레스와 불쾌감 등 심리적 악영향은 물론 수태율ㆍ출산율 저하와 사산율ㆍ기형발생률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자율신경 실조증(自律神經 失調症ㆍautonomic imbalance)’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율신경 기능의 부조화에 따라 일어나는 이상증세로, 지속적인 두통ㆍ현기증ㆍ실신, 온도감각의 이상, 타액ㆍ위액ㆍ눈물의 분비이상, 발한ㆍ두드러기, 심장부의 압박감, 맥박ㆍ혈압의 동요, 수족의 떨림 등이 수반된다. ‘감각의 병적 과민성’을 천형(天刑)으로 타고난 로더릭 어셔가 아닌 평범한 우리도 끊임없는 소음에 얼마든지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어셔가의 몰락』은 이렇게 시작한다. “During the whole of a dull, dark, and soundless day in the autumn of the year, when the clouds hung oppressively low in the heavens, I had been passing alone, on horseback, through a singularly dreary tract of country~.” (음산하고 어둡고 고요한 그해 가을 어느 날, 구름이 답답할 정도로 낮게 하늘에 걸려 있던 그날 나는 하루 종일 혼자서 말을 달려 유난히도 쓸쓸한 시골 길을 지나~)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19세기 어셔 남매는 소리 없는(soundless) 쓸쓸한 시골에서 미쳐갔지만, 21세기 서울 시민은 소음이 흘러넘치는 음울한(dreary) 도시에서 서서히 미쳐가고 있다고.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총 활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에너지 방출도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죽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선 평생 한순간도 귀를 닫을 수 없는 우리는, 특히 서울 시민은 ‘인간 노이즈 메이커(noise maker)’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줄여나갈 지혜와 용기를 갖춰야 한다. 밤에도 낮 못지않은 소음으로 꽉 차고 길거리ㆍ시내버스ㆍ고속버스ㆍ유람선ㆍ택시, 심지어 야영장에서까지 온갖 잡음(雜音)에 시달리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마침내 돌아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 ||||||||||
줄거리만 놓고 보면 영락없는 서양판 ‘전설의 고향’이다. 유서 깊은 가문의 후예인 로더릭 어셔의 긴급한 편지로 초대된 친구 ‘나’는 잔뜩 흐린 가을날에 그 저택을 찾는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어셔는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어셔의 쌍둥이 누이동생 매더린이 죽어 장례를 치렀는데 폭풍우 치는 어느 밤 죽은 줄 알았던 누이가 책을 읽고 있던 오빠에게 와서 쓰러지고 남매는 둘 다 숨진다. 이 무서운 사건을 목격한 나는 겁에 질려 밖으로 달아나고 저택은 두 동강이 나며 음울한 늪 속으로 침몰한다.
주인공 로더릭 어셔는 ‘감각의 병적 과민성(a morbid acuteness of the senses)’으로 인해 대단히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는 음식이 아니면 견딜 수 없고, 의복도 일정한 소재로 된 것만 입을 수 있었다. 모든 꽃 향기가 감각을 압박하고, 아무리 약한 광선에도 눈이 시렸으며, 특정한 소리, 바로 현악기의 음향만이 그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이 구절은 현대에 들어서야 병명이 붙여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ㆍ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을 연상시킨다. 우리나라에도 2만여명이 앓고 있다는 이 병은 살짝 몸이 스치거나 심지어 바람만 불어도 작열통(灼熱痛), 즉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최악의 질병이다. 작열통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고통 순위 2위는 손가락 혹은 발가락의 절단, 3위는 출산이라고 한다)
불에 타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지는 2001년 9ㆍ11 테러 때 자료 화면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 화염에 휩싸여 있을 때 시시각각 다가오는 불길에 갇혀 고통 받던 사람들이 고층 창문에서 차라리 수백 미터 아래로 몸을 던지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중세 마녀 사냥 때 사람의 명줄을 끊는 수백 가지 방법 중 굳이 불에 태워 죽인 것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를 중세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작열통까지는 아니어도 로더릭 어셔는 ‘소리’에 큰 고통을 받았다. “특정한 소리, 바로 현악기의 음향만이 그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there were but peculiar sounds, and these from stringed instruments, which did not inspire him with horror).” 그런 어셔가 만약 21세기 한국 서울의 종로 거리를 걷는다면, 그는 단 5분 만에 미쳐버리거나 고통으로 혼절했을 것이 틀림없다.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 동안 청계천 고가(高架) 등 주요 고가도로들을 철거한 것이 도시 소음(city noise)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도시 녹지(urban green) 공간이 태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뉴욕시 61% (‘Environment News Service’ 2012.2.23), 도쿄 40%에 비해 서울은 25% 가량이 녹지이다.
주지하다시피 현대사회에서 소음은 ‘공해(noise pollution)’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수질오염과 달리 소음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스스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각 공해’라고도 한다. ‘공장 소음’이나 ‘항공기 소음’은 공장지대ㆍ공항 주변지역을 벗어나면 되지만, 대도시의 주요 소음원인 자동차ㆍ전철ㆍ기차에서 초래되는 ‘교통 소음’은 도시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한 피할 도리가 없는 소음이다.
문제는 확성기, 건설공사장, 유흥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 소음’이다. 환경부가 얼마 전 서울ㆍ부산을 비롯한 전국 44개 도시 소음진동 측정 결과 75%인 33개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에서 밤시간대 소음진동이 환경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서울(2011년)은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데시벨(dB) 기준으로 도로변 주거지역 평균 소음도가 낮시간대 68dB, 밤시간대 65dB로 환경기준 65dB(낮), 55dB(밤)를 모두 훌쩍 뛰어 넘고 있다. ‘고요한 밤(silent night)’은 커녕 낮과 밤의 차이도 별로 없을 정도다.
국제적으로 보통 밤의 소음은 40dB 안팎, 조용한 지역의 일반주택가 낮 소음은 50~55dB, 시내 번화가 교통소음은 70~80dB 정도로 본다. 80dB 이상의 소음을 오랜 기간 계속 들으면 평생 청각장애가 될 수 있다.

서울에서 나고 40년 넘게 살아온 내가 요즘 들어 가장 참기 힘든 소음은 각종 상점에서 뿜어대는 음악 소리다. 휴대폰ㆍ전자제품ㆍ의류 상점 등에서 스피커를 거리로 향한 채 틀어대는 강한 비트의 빠른 댄스곡들 말이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봐도 이런 곳은 없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이 있는 세종로 사거리에서 낙원 상가가 있는 종로 2가까지 한 번 걸어 보시라. 지금 한창 뜨고 있는 핫 뮤직, 특히 댄스곡들을 전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점포 안에서야 테크노 댄스 뮤직을 틀든, 헤비 메탈을 볼륨 최대치로 올려놓든 점주의 자유다. 시끄러워 못 견디겠는 손님은 그곳을 나오면 그뿐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대체 무슨 권리로 점포 밖 거리를 향해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온갖 소음을 쏟아내고 있는가. 관할 구청 등 행정관청은 어째서 이런 무뢰한(無賴漢)들을 마냥 내버려두고 있는 건가. 명동, 홍대앞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예외가 없다. 날씨라도 후텁지근할 땐 정말 스피커를 부시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시끄럽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버스나 택시도 마찬가지다. 나는 버스를 탈 때마다 뒷자리로 향하는 오랜 버릇이 있는데 순전히 라디오 소리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다. 광역버스가 도입되기 전 경기 용인에서 서울 도심으로 출ㆍ퇴근하며 하루 3~4시간을 버스 속에서 보내야 했던 시절엔 방약무인(傍若無人)격으로 라디오 볼륨을 키워놓은 기사에 대해 여러 차례 살의(殺意)마저 느껴야 했다. 피곤에 절어 불편한 버스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는 승객들로 가득한 버스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라디오 방송을 아무렇지 않게 틀어놓는 운전기사라니. 안하무인(眼下無人)도 유만부득(類萬不得)이다.
택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나마 라디오 방송이면 양반이다. 쿵짝쿵짝 관광버스용 싸구려 음반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목사 설교 CD까지 정말 갖가지다. 도저히 참지 못해 소리 좀 줄여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면,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듯 마지못해 쪼끔 줄이는 기사도 적지 않다. “내 택시에 탔으니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건지, 상대방이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교통 서비스를 받는 손님이라는 생각 같은 건 이들에게 없다. 광주ㆍ부산 등 지방으로 당일 출장을 다녀와야 할 땐 고속버스 타기 전에 ‘부디 상식으로 충만한 기사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매번 기도를 올리는 게 일이었다.
미국ㆍ유럽ㆍ일본에서 버스기사가 라디오 방송을 튼다는 건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사적(私的ㆍprivate) 공간이 아닌 공공(公共ㆍpublic)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선, 칼이나 총을 들고 있어도 어울리겠다 싶게 생긴 택시 기사도 손님이 타면 라디오나 오디오는 물론이고 통화하던 전화기도 즉시 끈다. 그게 정상이고 상식이다. 말 그대로 대중교통(public transportation)이 아니던가.
20년 전 혼자 전남 신안 홍도(紅島)를 찾은 적이 있다. 실마리 없이 꼬인 현실, 불안한 미래 등 복잡한 머릿속에 신선한 바람도 채우고, 더불어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도 느껴보자는 의도였다. 과연 쪽빛 바다와 탁 트인 하늘이 어우러진 풍광과 자연이 빚어낸 기기묘묘(奇奇妙妙)한 바윗돌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런데…. 1시간 남짓한 홍도 코스 내내 유람선을 쩌렁쩌렁 울리던 그 뽕짝들!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스치고(‘처녀 뱃사공’)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견새(‘소양강 처녀’)를 거쳐 비내리는 호남선(‘남행열차’)까지. 살을 엘 듯 짱짱한 햇빛과 처연한 갈매기 울음 소리를 고대하던 나는 그 끝도 없이 바다를 채우던 거대한 굉음(轟音) 덩어리에 짓눌려 헉헉거려야 했다. 과연 지금이라고 달라졌을까?
6월 초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1박 2일 캠핑을 다녀왔다. 장소는 강원 춘천 중도(中島) 오토 캠핑장으로, 한 아웃도어 용품 회사의 기획행사에 참여한 것이었다. 집을 떠나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처음 자보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던 모습에 애비로서도 보람된 하루였다.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밤의 소음들이었다.
인근 텐트에 단체로 놀러 온 한 팀이 모두가 잠자리에 든 밤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것이었다. 급기야 노래까지 부르며 지X을 떨기에 참지 못하고 가서 한마디 했다. 무식하긴 해도 그나마 양심들은 있었는지 더 이상 노래는 부르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강 건너편 어디선가 들려오는 엄청난 음악소리였다. 아마도 한 회사가 야영시설을 빌려 단합대회라도 하는 모양이었는데, 최대 한도로 볼륨을 높인 고성능 스피커로 틀어대는 라이브 밴드에 맞춰 2시간 넘게 70ㆍ80 노래들을 부르는 거였다. 초대 가수인지 누군지 찢어지는 목소리에 중간중간 “으쌰라 으쌰” 하는 함성 소리까지 섞여 강을 넘어 왔다. 큰 맘 먹고 집 떠나와 한밤중에 ‘나 어떡해’서부터 ‘구름과 나’, ‘해변으로 가요’ 등을 귀가 쩡쩡 울리도록 듣고 누웠자니 잠이 안 오는 건 물론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나마 아이들은 잠이 들어 다행이었다.
‘해도 너무 한다’ 싶어 112를 통해 몇 군데 전화를 돌리고 나서야 춘천에 있는 모 단체가 그날 저녁 중도 캠핑장 건너편 춘천 MBC 인근 춘천어린이회관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극심한 소음을 호소를 했더니 해당 지역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방금 행사가 끝났으니 괜찮아질 것”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그게 밤 12시 20분이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좋은 일 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단체가 무슨 베트남 참전 군인들 위문 공연 쯤에서나 나올 법한 환성과 노래, 라이브 연주 등의 굉음을, 한낮도 저녁 8시도 아닌 한밤중에 2~3 시간 내리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배출한단 말인가.
인간은 보기 싫으면 눈을 감으면 되고, 냄새 맡기 싫으면 잠시 숨을 멈추면 되지만,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신체구조를 갖고 있다. 모든 동물이 그러한데 바로 생존을 위해서다. 듣지 못하면, 듣기를 멈추면 천적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위험을 알리는 클랙슨 소리, 자지러지는 아이의 울음 소리, 직장에서 상관이 호출하는 소리, 한밤중 평소와 다른 거실 인기척 소리 등을 듣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래서 모든 동물의 귀는 꺼풀이나 덮개, 뚜껑이 없이 항상 열려 있다.
들어야 할 때 놓치지 않고 정확히 듣기 위해서도 우리의 청신경은 제때 충분히 쉬어줘야 한다. 지속적인 소음은 스트레스와 불쾌감 등 심리적 악영향은 물론 수태율ㆍ출산율 저하와 사산율ㆍ기형발생률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자율신경 실조증(自律神經 失調症ㆍautonomic imbalance)’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율신경 기능의 부조화에 따라 일어나는 이상증세로, 지속적인 두통ㆍ현기증ㆍ실신, 온도감각의 이상, 타액ㆍ위액ㆍ눈물의 분비이상, 발한ㆍ두드러기, 심장부의 압박감, 맥박ㆍ혈압의 동요, 수족의 떨림 등이 수반된다. ‘감각의 병적 과민성’을 천형(天刑)으로 타고난 로더릭 어셔가 아닌 평범한 우리도 끊임없는 소음에 얼마든지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어셔가의 몰락』은 이렇게 시작한다. “During the whole of a dull, dark, and soundless day in the autumn of the year, when the clouds hung oppressively low in the heavens, I had been passing alone, on horseback, through a singularly dreary tract of country~.” (음산하고 어둡고 고요한 그해 가을 어느 날, 구름이 답답할 정도로 낮게 하늘에 걸려 있던 그날 나는 하루 종일 혼자서 말을 달려 유난히도 쓸쓸한 시골 길을 지나~)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19세기 어셔 남매는 소리 없는(soundless) 쓸쓸한 시골에서 미쳐갔지만, 21세기 서울 시민은 소음이 흘러넘치는 음울한(dreary) 도시에서 서서히 미쳐가고 있다고.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총 활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에너지 방출도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죽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선 평생 한순간도 귀를 닫을 수 없는 우리는, 특히 서울 시민은 ‘인간 노이즈 메이커(noise maker)’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줄여나갈 지혜와 용기를 갖춰야 한다. 밤에도 낮 못지않은 소음으로 꽉 차고 길거리ㆍ시내버스ㆍ고속버스ㆍ유람선ㆍ택시, 심지어 야영장에서까지 온갖 잡음(雜音)에 시달리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마침내 돌아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5개의 댓글
추천 기사
추천 상품
포우 단편 베스트 걸작선
출판사 | 동해출판
어셔가의 몰락
출판사 | 미디어포럼
필자

이이후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거리를 걸으며
우리가 무심결에 범하는 오류와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인습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때의 세상이 좀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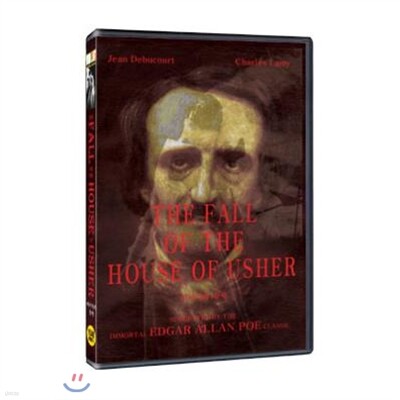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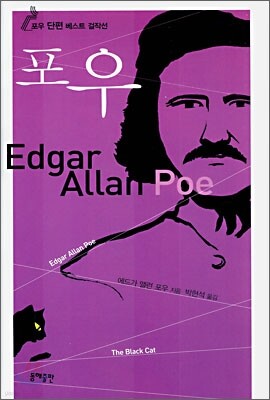
![[구구X리타] 야쿠자의 심장을 가진 여자 - 존엄을 위해 싸우는 마음에 대하여](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27-ab0fd518.png)
![[송섬별 칼럼] · · · - - - · · ·](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4-efbfaa92.png)

![[리뷰] ‘다음’을 기약하는 ‘지금’ 그리고 ‘다행’이 이기는 삶](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26-1b193bdf.jpg)
![[리뷰] 심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그림자 보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06-538b5611.png)




빛나는 열정
2012.08.01
jehovah511
2012.07.02
가호
2012.06.30
이미 포기했는데요. 시골에 가면 가장 좋은 이유가 바로 소음이 없기 때문인 듯 합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