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빌보드는 미국과 영국 중심의 차트입니다. 간혹 유럽권 출신, 혹은 호주의 음악가들이 차트에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례적인 현상이지요. 그런데 그 이례적인 현상이 최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고티에(Gotye), 호주출신으로 현재 빌보드 싱글차트 1위, 앨범차트 7위를 기록 중인 신인입니다. 호평을 거두고 있는 음반 < Making Mirrors >를 소개합니다. 라이센스가 되지 않아 접할 수 없었던 백인 블루스 록의 선두주자 더 블랙 키스(The Black Keys)의 신보 소식과 플럭서스 소속의 인디밴드 안녕 바다의 컴백 앨범도 소개합니다.
고티에(Gotye) < Making Mirrors > (2011)
전 세계 대중음악을 리드한다는 미국과 영국은 늦었다. 2011년 여름에 발표되어 지난해 가을과 겨울에 오세아니아와 유럽을 포함한 11개국에서 정상을 차지한 「Somebody that I used to know」는 뒤늦게 영국과 미 대륙에서 그 인기를 감지하며 현재 영국과 미국에서 3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팅(Sting)의 잔향이 깊은 이 곡은 고티에의 경력에 가장 진하게 프린트될 것이다.
1980년, 벨기에에서 태어난 바우터 데 바커(Wouter De Backer)라는 본명으로 태어난 고티에는 두 살 때 호주로 이주하며 영어권 문화에 동화됐다. < Making Mirrors >는 바로 그 영어권 노래들이 고티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음을 알린다. 그의 음악에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중음악의 역사가 부식되지 않고 살아있다.
 |
 |
1960년대를 떠올리는 퍼즈 톤의 기타와 벡(Beck)처럼 건조한 보컬의 개러지 록 넘버 「Easy way out」과 1980년대 뉴웨이브와 영국 모던 록의 대모(代母) 케이트 부시(kate Bush)의 「Running up that hill」의 드럼 사운드를 머금은 「Eyes wide open」, 스테판 스틸스(Stephen Stills)의 「Love the one you're with」의 낭랑한 기타와 1980년대의 신스 팝과 뉴웨이브를 자유롭게 주무른 「In your light」도 고티에의 음악이 30년 이전으로 향하지만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작용한다. 그만큼 고티에의 음악은 기반이 탄탄하다.
레게 리듬이 지배하는 「State of the art」는 폴리스(Police)의 초기 곡들을 떠올리며 아방가르드와 개러지, 월드뮤직으로 낯선 신선함을 추구한 「Smoke and mirrors」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그룹의 가장 대중적인 곡 같은 「Giving me a chance」는 시각적인 이미지도 추출한다.
고티에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전자음원을 전진배치 했지만 이 소리들을 풀어낸 방식은 자연스러운 아날로그 스타일이다. 고티에의 세 번째 앨범 < Making Mirrors >는 그가 얼마나 방대한 음악들을 섭렵하고 자기화 했는지를 드러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렉트로닉 팝은 사람들을 양분화 시키고 그 쏠림 현상은 기성세대를 소외시킨다. 고티에의 < Making Mirrors >나 아델(Adele)의 < 21 > 그리고 최근 발표되어 빌보드 앨범차트 2위를 기록한 라이오넬 리치(Lionel Richie)의 신보 < Tuskegee >가 입증한 것은 바로 ‘어른들의 음악도 살아있다’이다. 신시사이저와 드럼 머신이 적절히 사용된 고티에의 < Making Mirrors >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독특하고 멋진 음반이다.
더 블랙 키스(The Black Keys) < El Camino > (2011)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모든 음악들이 과거로부터의 유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그런 ‘동기’들이 항상 전면에 부각되는 밴드라면 어떨까. 이런 경우라면 아무리 음악이 객관적으로 좋은 평을 추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젊고 쿨한 감각으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블랙 키스의 경우가 그렇다. 어느새 거물이 되어버린 이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비판의 화살은 늘 조준되어 있었다. 절대 다수의 평단, 그리고 많은 수의 대중이 아무리 이들의 감각에 손을 뻗었다 해도, 예리한 눈썰미를 자랑하는 골수 음악 팬들은 앨범마다 보이는 강한 모티브들을 그냥 용납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혐의를 가진 곡들은 항상 있었다. 단적인 예로, 빌보드 앨범 차트 3위라는 반응을 거둔 전작 < Brothers >의 첫 트랙인 「Everlasting light」에서는 ‘글램 록의 거두’ 티 렉스(T. Rex)의 「Mambo sun」의 냄새가 진했고, 동 앨범의 「She's long gone」에서는 ‘블루스의 거장’ 머디 워터스(Muddy Waters)가 불렀던 「She's alright」의 향취가 짙게 배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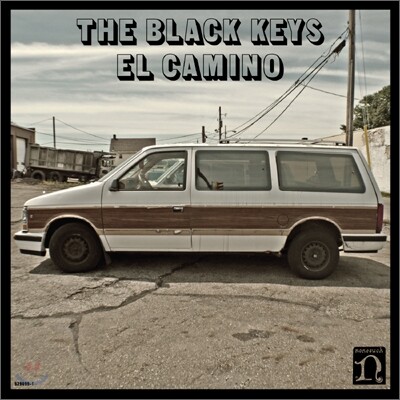 |
 |
뿐만 아니라, 「Hell of a season」의 초반부는 동 앨범에 수록된 「Lonely boy」의 다른 버전처럼 들리기도 한다. 정도로 보아 자기복제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스펙트럼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보여준 셈이다.
< El Camino >가 ‘살짝 덜어낸 블루스의 감성과 댄서블한 록이 섞여 멋진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앨범이라는 중론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실제로도 그렇게 와 닿는 썩 훌륭한 앨범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꾸준한 갑론을박들과, 이들이 10년간 정규앨범 일곱 장을 낸 경력을 갖고 있는 중견그룹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쉬운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블랙 키스는 이미 블루스 록 신의 선두에 위치한 그룹이다. 이런 팀에게 전통주의의 ‘모티브 이어받기’ 이상의 총기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가혹한 일일까. 밴드 이름의 ‘열쇠’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 ‘핵심’일 터, 그 핵심이 뜻하는 바가 100% 과거의 유산일 뿐이라 훗날 정작 본인들은 기억되지 않는다면 억울할 일 아닌가.
안녕 바다 < Pink Revolution > (2012)
“듣기에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빠져들 만큼 빼어나지도 않다.” - 데뷔 때부터 안녕 바다에게 채워졌던 족쇄다. 물론 그룹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노력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신보에서 역시 그 족쇄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더 아쉬운 부분이리라.
첫 미니앨범인 < Boy's Universe >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규 데뷔 앨범인 < City Complex >는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신고식이었다. 매력적인 곡들이 모두 미니앨범에서 들려줬던 곡들(「별빛이 내린다」, 「내 맘이 말을 해」)이었다는 점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그들만의 개성’이라고 할 만한 지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은 그들에게 ‘good’ 이상의 코멘트를 허락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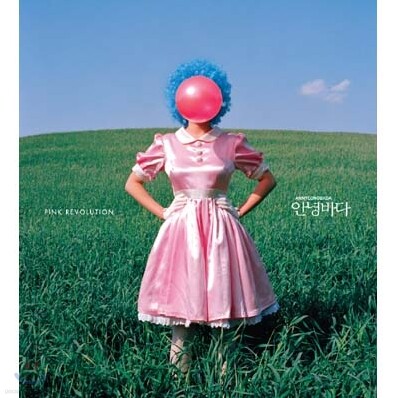 |
 |
꼭 멜로디가 아니더라도 분명 다른 방향으로 타개책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멤버들 개개인의 추억에 의거한 별의 이야기를 써낸다던지, ‘소년’의 이미지를 가진 다른 매개체를 찾는다던지 하는 것으로 콘셉트를 구체화시키는 작업 말이다. 콘셉트의 다각화를 꾀하지 못했다는 점은 자칫 아이디어의 부재로 읽힐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한다.
다행스러운 일은 방향에 대한 고민과 개선의 의지는 분명히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원색에 대한 탐닉이 느껴지는 부클릿, 그리고 타이틀로 ‘분홍빛 혁명’이라는 제목을 쓴 점은 밴드의 음악을 색으로 형상화하려는 야심이다.
「야광별」은 「별 빛이 내린다」와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와 같은 소년적 감수성의 우주적 이미지, 다시 말해 그룹이 구축한 나름의 고정적인 이미지를 잇고 있지만, 국내 1세대 펑크 밴드 삐삐롱스타킹의 원곡을 재해석한 「바보버스」와 김광석의 「변해가네」에 대한 접근은 퀄리티를 떠나 이들의 음악적 고심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분명 장르적인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시도였으리라.
미니앨범에서 받았던 신선함을 상기해본다면, 이번에도 ‘성장’이라는 수식어를 떠올리기는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모색 -비록 그것이 실패로 단정된다 할지라도- 이 보인다는 점이야말로 안녕 바다의 디스코그래피에서 이 앨범이 가지는 의미가 아닐까. 비록 ‘한 방’에 대한 기대는 다음을 기약해야겠지만, 그 자체로도 의의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즘
이즘(www.izm.co.kr)은 음악 평론가 임진모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중음악 웹진이다. 2001년 8월에 오픈한 이래로 매주 가요, 팝, 영화음악에 대한 리뷰를 게재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올뮤직가이드’를 목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썼으나 지금은 인터뷰와 리뷰 중심의 웹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풍부한 자료가 구비된 음악 라이브러리와 필자 개개인의 관점이 살아 있는 비평 사이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추천핑] 어쩔 수 없이 밀려남에 고하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9/20250919-727bd620.jpg)
![[비움을 시작합니다] 네가 변해야 모든 게 변한다 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1-ebeed89d.jpg)
![[큐레이션] 여름 기억 레시피](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29-cc89be0e.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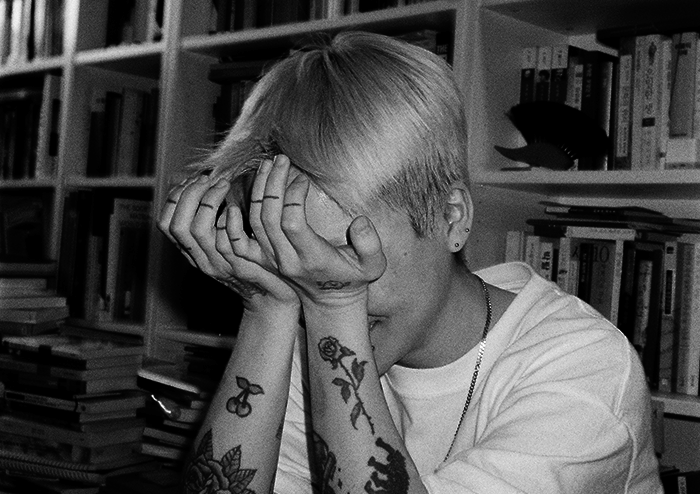










천사
2012.05.30
피히테
2012.05.04
처음에는 잔잔하게 가다가 이후에 확 변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