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고흐는 알면서 한국 화가는 왜 모를까? - 치과의사 박세당의 그림 읽기
그림을 읽는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필자는 섣불리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 삼청동 골목을 지나 출판사 북성재로 직접 확인에 나섰다.
2010.11.12
그림을 읽는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필자는 섣불리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 삼청동 골목을 지나 출판사 북성재로 직접 확인에 나섰다. 길을 잘 못 찾는 바람에 한참을헤맸던 기억이 난다.
박세당 작가님께 물어봤습니다.
책 잘 읽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는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쉽게 한국 현대 미술에 대해 접근 할 수 있게 해준 계기를 이 책이 마련한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림 읽어주는 남자와 33인의 화가』를 출판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림을 해설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우연이 조금 심각해졌어요. 갤러리를 좋아해서 다니다가, 그림을 한 점씩 사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들과 친하게 되었죠.
인문하고 문사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림을 보는데 나름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화가들이 좋아했어요. 평론보다는 그림 해설이라는 장르를 만드는게 어떠냐는 주변 권유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해설하는 게 좋았는 데 그림이라는 도구가 제게 생긴 것이죠.
기존의 책을 쓴 경험으로 미루어 책을 만드는게 두렵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화가들이 자신의 일상을 소소하게 담하내고, 삶의 의미를 꺼내는 것을 그들의 ‘작품 만들기’라고 봐요. 저는 그림을 통해 그것을 유추하고 싶었습니다.”
작가님의 책 중에, 장용길 화백의 궁핍한 화가를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전시장에서 보았을 때 턱하니 다가선 느낌은 ‘깊은 절망’ 그 한마디였다. 복싱에서 카운터 펀치를 맞는 것보다 잔 펀치가 누적되어 생긴 그로기 상태는 다운된 선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싸우겠다는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킨다.”(p.189)
이런식의 표현들이 책 곳곳에서 보입니다. 미술 평론가들의 세련된 언어가 아니라, 우리네 동네의 질펀한 싸움같이, 또는 속되게 말해 시장판의 아우성 같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투박하고 정감어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결국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인생살이를 겪었습니다. 가령 「궁핍한 화가」같은 경우에도 얼굴과 표정, 이런게 비분강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의 표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난하지만 뚫고 일어날 수 있어.’ 이런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맞은 잔펀치에 의해서 몇 번이나 일어나려고 하다가 좌절을 해서 체념을 한 그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뒤의 꽁지머리를 묶는 인물을 통해 화가의 겉 멋을 알 수 있죠.”
화가만의 특유한 겉 멋이요?
“네. 겉 멋. 사실은 깨끗하게 잘라야 할 판인데 이렇게 머리를 묶어 내렸잖아요. 자신이 화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만 없었다면 화가라는 뜻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머리에 비해 가는 목, 좁은 어깨로 인물의 구도가 잡혔습니다. 인물을 보면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영양도 결핍된 모습입니다.
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깊게 가라 앉아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배경 자체가 콘크리트라던지 자갈 같은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씩 따져보면 제게는 이런 것이 총론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분위기가 먼저 오고, 그러다보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의 세세한 것들이 보입니다.
화가가 조형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사람은 훌륭한 화가가 아닙니다. 굉장한 연습과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 나올 때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이 「궁핍한 화가」라고 표현했는데, 백퍼센트는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 이 그림은 화가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삶 없이는 작품이 탄생 할 수 없는 법이죠.”
다르게 보면 인생의 질곡을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항목이 문사철입니다. 잔퍼치라 함은 어떤 미학적 접근 보다는, 화가의 잠재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호의 어떤 그림을 볼 때, 그 사람의 가난하고 처절했던 삶에 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의 작품이 감동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어렵게 살았던 부분에 나름의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림을 보고, 그림에서 관객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는 말로 정리 되는데요.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은 사실상 재미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훌륭합니다. 시(詩)도 배설이 아니잖습니까. 시인 자신이 아무리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그대로 배출하는 것은 작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궁핍한 화가」에서는 바로 그러한 점이 보였습니다. 박수근의 그림에서 한 발짝 더 깊어진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인물이 배경에 녹아들어가서 박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입체감이 없으면서도 관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이 작품에는 있습니다.”
이 책을 살펴보면, 어떤 전문성을 요구한다기 보다, 일반 대중이 현대 한국 미술에 관하여 친숙하게 다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헤매지 않고 지도만 보고서도 한국 화가들에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작가님께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교양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 가령 클림트, 앤디워홀 등 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화가가 있고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정작 잘 모릅니다. 다르게 보면 무관심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했을 때 한국 화가나 그들의 작품과 대중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화가들이 대중들과 친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들과 대중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시회를 한 번 하는데 몇 천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매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년에 많은 사람이 두 세번 정도에 그칩니다. 대부분의 화가는 일년에 한번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과 자주 만날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 이랄게, 인터넷 등을 활용한 소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대중들은 고흐, 클림트, 에곤 실레 등은 쉽게 말합니다. 한 가지 권하고 싶은 말은 그들을 배우고 아는 지식만큼 우리 화가들에 대한 지식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림 읽어주는 남자 박세당은……
“제가 치과 의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화가들을 만나면 그들의 치아를 먼저 봅니다. 대체로 그들의 치아는 좋지 못합니다. 그림으로 사용하는 물감이 황 성분이고, 화가들의 습관 중에 그림을 그리다가 붓을 입에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곧잘 그들의 작품과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썩 잘한 일이다. 이번 책을 통해 일회성에 그치는 한국 화가의 그림 읽기가 아니라, 2권, 3권을 계속해서 집필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 9월 30일, 삼청동 골목을 지나 출판사 북성재로 직접 확인에 나섰다. 길을 잘 못 찾는 바람에 한참을헤맸던 기억이 난다.
박세당 작가님께 물어봤습니다.
|
책 잘 읽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는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쉽게 한국 현대 미술에 대해 접근 할 수 있게 해준 계기를 이 책이 마련한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림 읽어주는 남자와 33인의 화가』를 출판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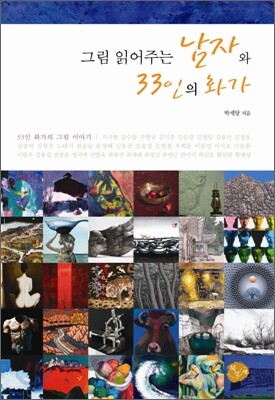 |
 |
인문하고 문사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림을 보는데 나름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화가들이 좋아했어요. 평론보다는 그림 해설이라는 장르를 만드는게 어떠냐는 주변 권유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해설하는 게 좋았는 데 그림이라는 도구가 제게 생긴 것이죠.
기존의 책을 쓴 경험으로 미루어 책을 만드는게 두렵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화가들이 자신의 일상을 소소하게 담하내고, 삶의 의미를 꺼내는 것을 그들의 ‘작품 만들기’라고 봐요. 저는 그림을 통해 그것을 유추하고 싶었습니다.”
작가님의 책 중에, 장용길 화백의 궁핍한 화가를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전시장에서 보았을 때 턱하니 다가선 느낌은 ‘깊은 절망’ 그 한마디였다. 복싱에서 카운터 펀치를 맞는 것보다 잔 펀치가 누적되어 생긴 그로기 상태는 다운된 선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싸우겠다는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킨다.”(p.189)
이런식의 표현들이 책 곳곳에서 보입니다. 미술 평론가들의 세련된 언어가 아니라, 우리네 동네의 질펀한 싸움같이, 또는 속되게 말해 시장판의 아우성 같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투박하고 정감어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결국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치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인생살이를 겪었습니다. 가령 「궁핍한 화가」같은 경우에도 얼굴과 표정, 이런게 비분강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의 표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난하지만 뚫고 일어날 수 있어.’ 이런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맞은 잔펀치에 의해서 몇 번이나 일어나려고 하다가 좌절을 해서 체념을 한 그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뒤의 꽁지머리를 묶는 인물을 통해 화가의 겉 멋을 알 수 있죠.”
화가만의 특유한 겉 멋이요?
“네. 겉 멋. 사실은 깨끗하게 잘라야 할 판인데 이렇게 머리를 묶어 내렸잖아요. 자신이 화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만 없었다면 화가라는 뜻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머리에 비해 가는 목, 좁은 어깨로 인물의 구도가 잡혔습니다. 인물을 보면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영양도 결핍된 모습입니다.
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깊게 가라 앉아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배경 자체가 콘크리트라던지 자갈 같은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씩 따져보면 제게는 이런 것이 총론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분위기가 먼저 오고, 그러다보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의 세세한 것들이 보입니다.
화가가 조형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사람은 훌륭한 화가가 아닙니다. 굉장한 연습과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 나올 때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이 「궁핍한 화가」라고 표현했는데, 백퍼센트는 아니지만 어느 시점에 이 그림은 화가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삶 없이는 작품이 탄생 할 수 없는 법이죠.”
다르게 보면 인생의 질곡을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항목이 문사철입니다. 잔퍼치라 함은 어떤 미학적 접근 보다는, 화가의 잠재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호의 어떤 그림을 볼 때, 그 사람의 가난하고 처절했던 삶에 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의 작품이 감동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어렵게 살았던 부분에 나름의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림을 보고, 그림에서 관객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는 말로 정리 되는데요.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은 사실상 재미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훌륭합니다. 시(詩)도 배설이 아니잖습니까. 시인 자신이 아무리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그대로 배출하는 것은 작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궁핍한 화가」에서는 바로 그러한 점이 보였습니다. 박수근의 그림에서 한 발짝 더 깊어진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인물이 배경에 녹아들어가서 박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입체감이 없으면서도 관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이 작품에는 있습니다.”
이 책을 살펴보면, 어떤 전문성을 요구한다기 보다, 일반 대중이 현대 한국 미술에 관하여 친숙하게 다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헤매지 않고 지도만 보고서도 한국 화가들에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작가님께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교양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 가령 클림트, 앤디워홀 등 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화가가 있고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정작 잘 모릅니다. 다르게 보면 무관심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했을 때 한국 화가나 그들의 작품과 대중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화가들이 대중들과 친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들과 대중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시회를 한 번 하는데 몇 천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매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년에 많은 사람이 두 세번 정도에 그칩니다. 대부분의 화가는 일년에 한번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과 자주 만날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 이랄게, 인터넷 등을 활용한 소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대중들은 고흐, 클림트, 에곤 실레 등은 쉽게 말합니다. 한 가지 권하고 싶은 말은 그들을 배우고 아는 지식만큼 우리 화가들에 대한 지식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림 읽어주는 남자 박세당은……
|
한국 화가와 그들의 작품에
“깊은 연민과 미안함으로 가득(p.193)”한 사람일지도
“폭풍우라도 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함(p.158)”
을 너무나도 멀리 서 있는 한국 관객에게
“고향의 그것과 같은 따뜻하고 아스라한 기억의 세계로(p.72)”안내하는 그리움이자
“파란색의 순수한 아우라가 퍼져(p.254)”나올 것 같은 우리 색을 말하는 이름일 지도 모른다.
“제가 치과 의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화가들을 만나면 그들의 치아를 먼저 봅니다. 대체로 그들의 치아는 좋지 못합니다. 그림으로 사용하는 물감이 황 성분이고, 화가들의 습관 중에 그림을 그리다가 붓을 입에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곧잘 그들의 작품과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썩 잘한 일이다. 이번 책을 통해 일회성에 그치는 한국 화가의 그림 읽기가 아니라, 2권, 3권을 계속해서 집필할 생각이에요.”
|
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인사동을 거쳐 삼청동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내가 헤매었던 길은 북성재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잃어버린 주관과 그에 따른 해석이었다.
이 땅에 발목의 근육을 지탱하고 서 있다는 것
그건 어떤 식의 주의가 아니다.
남이 기억하지 않는 내 것을 찾는 작업이었다.
내리막길에 페달을 굴리는 것도 가끔은 신이난다.
오르막길에 더 쉽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4개의 댓글
추천 기사
추천 상품
필자

김성훈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jpg)


![[더뮤지컬] <르 마스크>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씨](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14-acf395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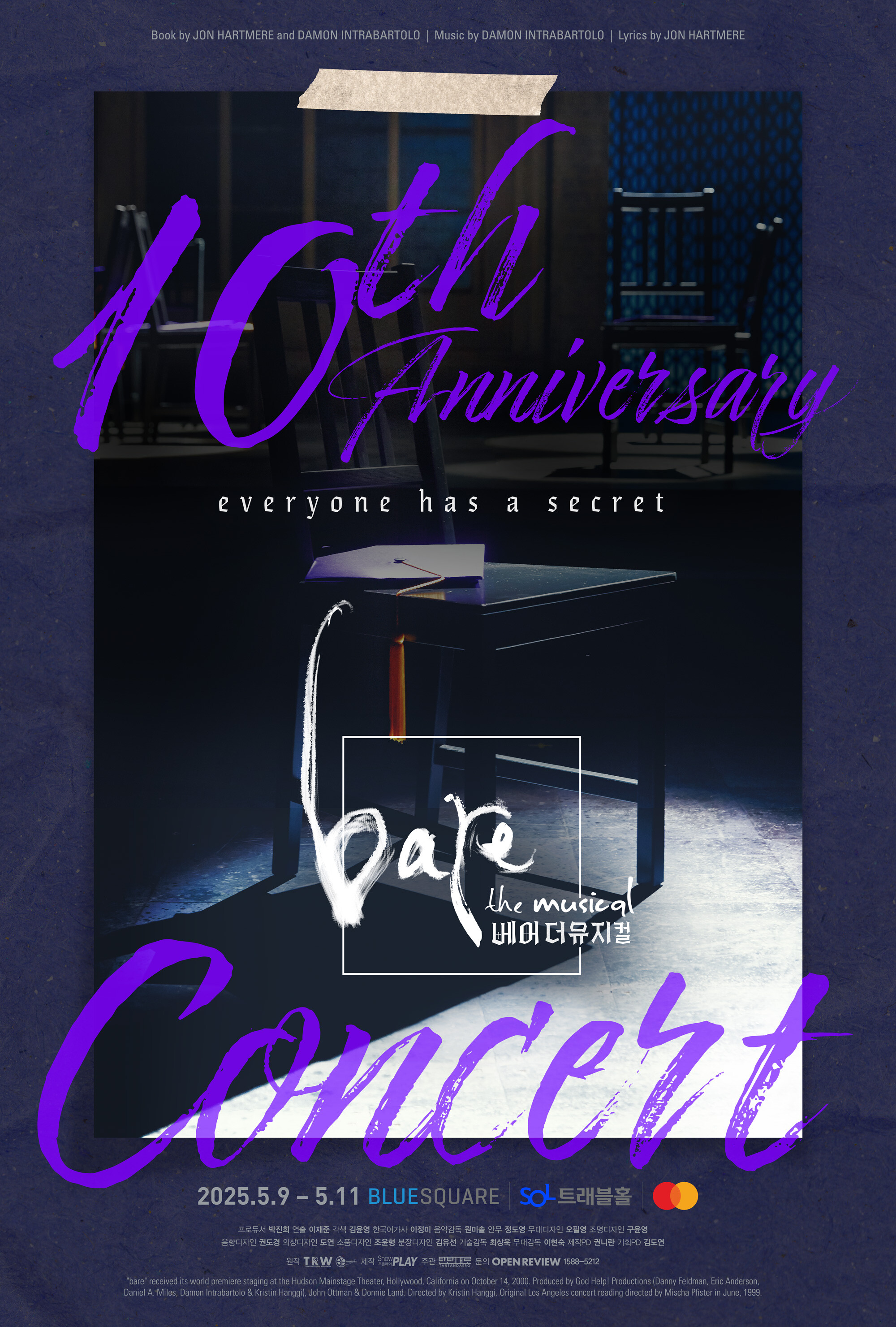


![[더뮤지컬] 두려움이 우리 앞을 막아설 때…뮤지컬 <틱틱붐>이 선물하는 위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2/20241210-777f86a7.jpg)



prognose
2012.09.17
채널예스
2010.11.19
香格里拉
2010.11.19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