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본문에 앞서 머리말과 후기 같은 곁 텍스트를 먼저 읽곤 하지만, 조너선 캐럴의 장편소설 『웃음의 나라(The Land of Laughs)』(최내현 옮김, 북스피어, 2006)는 그리 하지 않았다. 「옮기고 나서」 도입부의 ‘경고’를 존중한 까닭이다. 번역자의 경고문은 소설 내용의 사전 누설과 관련 있다.
“※이 후기에는 엄청난 스포일러가 있음. ※절대 옮긴이 후기부터 읽지 말 것. 400% 후회할 것임.” 번역자의 조언을 따라 본문부터 읽어나가는 게 적절하지만, 그렇다고 역자 후기에 엄청난 스포일러가 있는 건 아니다. 「옮기고 나서」를 먼저 읽은 독자가 느낄 후회의 정도는 저마다 다르리라. 그래도 400%는 좀 지나치다. 작품 속 일부 숫자도 뻥튀기되었다.
옮긴이의 체험담은 스포일러와 무관하다. “옮긴이에게 『웃음의 나라』는 유머와 위트의 끝에 공포가 남는, 묘한 경험을 하게 해준 책이었다. 이 책을 읽다가 잠든 밤, 낯선 이들 틈에 홀로 둘러싸여 불안해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텍스트 자체의 분위기가 전혀 공포스럽지 않았기에, 역자로서도 의외의 경험이었다. 사실 조너선 캐럴의 책들은 대부분 그렇다.”
나는 이 소설의 화자(話者)처럼 “공포 영화, 호러 소설, 악몽, 어둡고 무서운 존재들은 무조건 싫어한다.” 『웃음의 나라』는 그런 내가 무난하게 읽은 이야기다. 반신반의하긴 하지만 “힘들고 지칠 때야말로 좋아하는 책이 최고의 위안처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소설”(소설가 닐 게이먼, 뒤표지)이기도 하다. 화자가 말하는 좋은 책에 가까운 건 사실이다.
“책을 읽는다는 건, 적어도 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과 비슷해요. 좋은 책이라면 기분이 편안해지면서 다음에 무얼 만나게 될지, 저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싶어지죠. 하지만 별 볼일 없는 책은 뉴저지 주 시커쿠스에 가는 거랑 비슷해요. 냄새도 지독하고 이쪽에 온 게 후회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얼른 차 창문을 올리고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죠.”
나도 스포일러가 되고 싶진 않다. 소설의 복선이나 내용 전개를 암시하는 대목의 전달은 피하고, 대신 소설에 나오는 낯선 것(과 표현) 몇 가지를 풀어본다. ‘에스컷(ascot)’은 넥타이의 한 종류다. 세인트루이스 ‘사리넨(Saarinen) 아치’는 세인트루이스의 랜드 마크인 게이트웨이 아치를 말한다. 프랑스어 ‘마리오네트(marionnette)’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인형극에 쓰이는 인형 또는 그 인형극”과 “괴뢰(傀儡)”다.
『웃음의 치유력』(노먼 커즌스 지음, 양억관?이선아 옮김, 스마트비즈니스, 2007)의 원제목은 ‘질병의 해부(Anatomy of an Illness)’다. 웃음을 내세운 한국어판 제목이 전혀 난데없는 건 아니지만 책을 전체적으로 대변하기엔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한국어판 편집자가 모를 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웃음에 치우친 편집 방향은 부자연스럽다.
4장 「고통은 적이 아니다」의 표지 구실을 하는 면에 이런 문구가 있다.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오래 살려면 웃어라. 10분 동안 웃으면 2시간 동안 고통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정작 4장엔 그런 내용이 없다. 6장 「인간의 자기치유력」 표지면의 “모든 인간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존재한다. 웃음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깊숙한 마사지이다” 역시 마찬가지다.
외려 이런 식의 ‘웃음 예고’가 없는 5장에선 웃음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나는 단순히 누워 있는 사람의 내장을 요동치게 하는 운동에 그치지 않고, 모든 긍정적 정서에 작용하는 무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웃음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해주었다. 간단히 말해 웃음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웃으면 젊어지고 화내면 늙는다(一笑一少 一怒一老)’와 유사한 르네 뒤보의 ‘추천의 글’ 제목 「웃으면 세상이 함께 웃고, 울면 질병이 따라 웃는다」는 한국어판에서 새로 붙인 게 아닌가 싶다. “이 책의 주된 테마는 자신의 병이나 신체장애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나아가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고 싶다면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르네 뒤보)
결합조직이상 질환이라고도 하는 중증 콜라젠(collagen, 膠原質) 질환에 걸린 노먼 커즌스에게 웃음은 “몸속의 화학작용을 증진하는 방법의 한 요소로써 긍정적인 정서의 완벽한 개진을” 돕는 조역 가운데 하나다. 난치병을 치유하는 주역은 “회복할 수 있다는 신념”과 “삶의 의욕”이다. 34쪽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데 쓰인 숫자들은 0이 하나씩 빠진 것도 같다.
“왜 우리는 나이 들면서 웃음을 잃어 가는가? 아이는 하루 평균 300번 이상 웃는다는데, 어른은 고작 6번에 불과하다.”(『웃음의 치유력』 뒤표지 커버) 웃음은 아이들의 전유물이라 그럴까? ‘성숙한’ 웃음 관련서 또한 드물다.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웃음에 대한 철학자들의 의견 개진은 단편적이었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큰 소리로 웃는 것은 “가장 중요한 육체의 대사를 촉진하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장과 횡경막을 움직이는 정감, 즉 우리가 느끼는 만족의 내용물이라 할 수 있는 건강한 느낌을 낳고, 우리는 그것으로 정신을 통하여 육체에 이르며, 정신을 육체의 의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웃음의 치유력』 97쪽에서 재인용).
프란시스 베이컨은 기쁨의 생리학적 특질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파스칼은 『팡세』의 사람의 허영심을 분석한 대목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 “서로 닮은 두 얼굴이 특별히 웃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은 없으면서도 함께 있으면 그 유사함으로 인해 우리를 웃게 만든다.”(『웃음』 35쪽에서 재인용)
앙리 베르그송의 『웃음-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정연복 옮김, 세계사, 1992) 번역자는 「역자 후기」를 통해 저자가 주제를 심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그 자신도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두꺼운 책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 속에서 이 책을 엮었다고 하는 말에서 웃음의 문제를 간단히 보려는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그의 이론이 웃음의 성격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존의 웃음에 관한 이론을 비교적 적절하게 절충, 보완한 그의 시각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 웃음에의 이해에 귀중한 보탬이 되리라 여겨진다.” 번역자는 비판적 독서를 주문하지만, 그의 말대로 이만한 ‘웃음론’을 찾기도 어렵다.
희극성 일반에 관하여 베르그송이 주의를 환기하는 사항 혹은 예비고찰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적인’ 것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희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치가 아름답거나, 단아하거나, 장엄하거나, 평범하거나 보기 흉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결코 우스꽝스러울 수는 없으리라.”
두 번째는 웃음에 수반되는 ‘무감동’이다. “희극적인 것은 아주 평온하고, 잘 조화된 영혼의 표면에 떨어질 때에만 그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듯하다. 무관심은 희극성을 감지할 수 있는 천연의 장소이다. 웃음에 있어서 감정보다 더 큰 적은 없다.”
세 번째는 집단성이다.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희극적인 것을 향유하지 못하리라. 웃음은 반향을 필요로 하는 듯이 보인다. (중략) 우리의 웃음은 언제나 한 집단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사람들은 웃음이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웃음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든, 혹은 상상적으로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합의, 즉 일종의 공범 의식 같은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희극성의 원천을 들여다보자.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태도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에 의도하지 않은 바가 있다는 것,” 그건 다름 아닌 ‘실수’다.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 즉 소재와 형식, 원인과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사람 자신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을 ‘웃을 줄 아는 동물’이라 정의하기도 한다.
“웃음이라는 순수하게 생리적인 행위는 인간에게만 있지만, 놀이라는 의미 있는 기능은 사람과 동물에게 다 같이 공통된다고 하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웃는 동물(animal ridens)’이라는 개념이 ‘생각하는 인간(homo sapiens)’이라는 개념보다 인간을 동물로부터 더욱 더 완전히 구분시켜 준다.”(J. 호이징하, 『호모 루덴스』, 김윤수 옮김, 까치, 1981, 17쪽)
베르그송의 웃음에 관한 단상 몇 가지를 옮겨 적는다. “기계적 동작, 경직성, 몸에 배어 있어 간직하고 있는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웃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웃음의 효과는 우리가 이러한 외관의 특질들을 보다 깊은 원인, 다시 말해 마치 한 사람의 정신이 단순한 행동의 물질성에 홀리거나 도취된 것과 같은 ‘완전한 방심 상태’에 결부시킬 수 있을 때 더욱 강렬해진다.”
“웃음이란 천성적으로, 거의 같은 말이지만 사회생활의 뿌리 깊은 습관으로 인해 우리가 갖추게 된 하나의 기계 장치에서 비롯되는 단순한 결과인 것이다. 그것은 순전히 혼자서 튀어 올라서는 다른 응수에 재빨리 반응해 나간다. 그러므로 매번 웃음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를 볼 여유도 가지고 있지 않다.”
“웃음이 절대적으로 공평한 것은 아니다. 반복하건대 분명 선한 것도 아니다. 웃음의 기능이란 모욕을 줌으로써 상대방을 위압하려는 것이다. 만일 자연이 이러한 효과를 위해 가장 선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아주 미미한 정도이나마 심술궂음이나 최소한 놀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도 남겨놓지 않았다면 웃음은 그러한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최성일
채널예스는 예스24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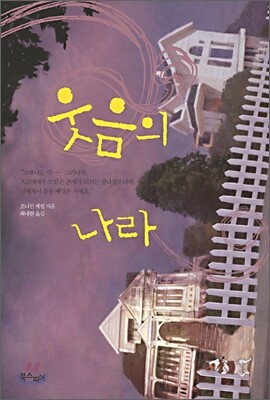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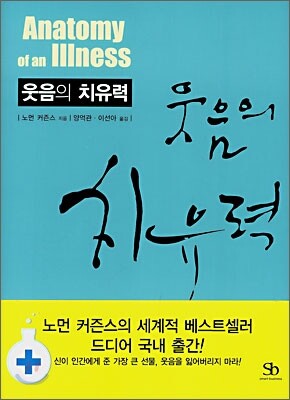


![[이벤트] 2025 채널예스 콘텐츠 연말 결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2/20251204-1aba9759.jpg)
![[이길보라 칼럼] 아기와 산모를 둘러싸고](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28-7260d538.jpg)
![[김미래의 만화절경] 어제 뭐 먹었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0/20251027-5031a641.png)
![[김미래의 만화절경] 몸과 몸뚱이와 몸짓](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8/20250825-17ec346e.jpg)
![[인터뷰] 성해나, 삶을 속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보는 마음](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5/20250513-3aaa098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