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한 권이 될 분량의 시를 묶어내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리는 듯합니다. 그러니 시인의 시에도 사계절이 고루 들어갈 터인데, 참 이상하지요. 어떤 시인이나 시집을 떠올리면 특정한 계절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시집은 제가 ‘겨울의 시인’ 이라고 멋대로 생각하는 시인들의 책입니다. ‘겨울의 시인’ 이라니, 냉정하고 싸늘한 사람들일 것 같나요? 하지만 추울수록 사람은 더욱 온기를 원하고 구하게 되니까요. 이들은 따뜻한 복장을 하고 추운 겨울의 거리로 기꺼이 나서는 시인들입니다. 겨울의 복판에서 겨울의 시집을 읽어 보세요. 겨울에도 시집은 제철입니다.
『별일 없습니다 이따금 눈이 내리고요』
강성은 저 | 현대문학
찬비가 내리면
목이 긴 새처럼
침묵하는 사람들
그리고 쓸쓸한 겨울이 온다
보자기를 쓴 늙은 여인이 광장을 백 년째 돌고 있다
교회 꼭대기의 다락방
하느님은 거기 계신가
(「겨울이 온다」, 『별일 없습니다 이따금 눈이 내리고요』, 48-49쪽)
강성은 시인의 시를 읽을 때면 어딘가 이상한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몇 줄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순식간에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요. 좋은 시가 부리는 마법입니다. 어쩌면 이런 순간을 위해 시를 읽고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집에서 강성은 시인이 우리를 데려가는 세계는 쓸쓸한 겨울 정경 속입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세계, 깨고 나면 사라질 꿈속 장면일까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의 목소리는 대부분 침착하고 차분하거든요.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집이 무너지고 폭설이 쏟아지고 태풍이 몰려오고 혜성이 지구로 돌진하고 있다”는 방송을 보면서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끓였다 일요일 오후였다(「재난 방송」)”고 말하네요. 어조가 인상적이지요. 그야말로 “별일 없습니다”라는 투입니다. ‘나’를 세계의 중심에 놓지 않고 일부로써 취급하는 듯한 차분한 거리감이 묘한 안도감을 줍니다. 저런 목소리로 무한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지는, 하지만 책을 덮으면 금방 따뜻한 커피를 끓이려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짧고 아름다운 시집입니다.
『두부를 구우면 겨울이 온다』
한여진 저 | 문학동네
표제작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나 감탄한 기억이 납니다. 하얗고 포동포동하고 말랑말랑하고 고소하고 네모난 두부. 두부는 잘 부서지기도 해서, 여러 면이 고루 익도록 뒤집어 주기도 하자면 구울 때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달걀프라이처럼 단번에 휙휙 지져낼 수는 없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차근차근, 따뜻하게. 겨울의 따뜻한 실내에서 두부를 굽습니다. 밖에는 “고개를 들면 온통 하얀 창밖과 / 하얗게 뒤덮인 사람들이 오고가는 풍경”이 있고요.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진 구멍은 “검고 아득”합니다. 굳이 메우려고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바라보기로 합니다. 두부 굽듯 천천히, 공들여서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을 맞이하듯 자연스러운 자세로요.
나는 순간 황홀해진다
눈밭 속에
홀로 절이 서 있다
하얀 문과 검은 지붕
검은 지붕 위 쌓여가는
하얀 눈
정지한 세상
고요하고 무궁하게
(「검은 절 하얀 꿈」, 『두부를 구우면 겨울이 온다』, 72쪽)
한여진 시인이 보여주는 모노톤의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그러고보니, 겨울에 산사에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눈 덮인 절의 풍경은 늘 사진이나 그림으로만 봐온 것 같아요. 저도 시의 화자처럼 “텅 빈 방”에서 눈을 감아볼까요. 역시 나가기엔 너무 춥습니다.
『이다음 봄에 우리는』
유희경 저 | 아침달
유희경 시인에 대해서라면 막연히, 눈물이 많을 것 같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유쾌하고 잘 웃는 분이었습니다. 그건 시에서 슬픔을 잘 해결하고 돌아왔다는 증명일까요. 또 시인에 대해 떠오르는 것은 밤(夜), 나무와 겨울 이미지입니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에서 나온 『겨울밤 토끼 걱정』이라는, 아주 제격인 시집이 있지만 언젠가 분명 소개할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다음 봄에 우리는』은 표지부터 스웨터 패턴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 시집에서 귀여운 토끼를 찾아볼까요.
벼린다는 말
버린다는 말
닳아 사라지는 말
눈이 녹는 말
세계가 달라붙는 말
좋지 않나요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듣고 싶은 것도 아니고
눈이 녹는 숲
숲속 작은 굴
하얀 토끼의 앞발처럼
조용합니다
조용한 것이
떨고 있네요
(「벼린다는 말」, 『이다음 봄에 우리는』, 97-98쪽)
행갈이의 호흡 속에서 시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구구절절 한탄 아닌, 파토스 넘치는 웅변 아닌, 건조하게 속삭이는 리듬감으로. 그러고보면 유희경 시인의 겨울에서는 특히 바삭바삭 메마른 공기의 속성이 잘 나타나는 듯 합니다. 시인은 깡깡 마른 플라타너스나 겨울밤 대로변처럼 도시적인 풍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름밤 공기처럼 끈적거리는 시를 쓰는 시인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건조하고 단정한 문장은 한 행, 한 행 조밀하게 쌓여 기어코 시가 육박해오도록 합니다. 차가운 도시의 겨울밤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면서
불 밝힌 분식집을 지나칠 때
우리는 언제 다정해지는가
(「돌아오는 길」, 『이다음 봄에 우리는』, 30쪽)
『죽은 사람과 사랑하는 겨울』
임주아 저 | 걷는사람
임주아 시인의 첫 시집입니다. 이 시집엔 “죽은”, “사람”, “사랑”, “겨울” 이 모두 들어가 있지만 그중 으뜸은 “사랑”이라고 해볼까요. 뒤표지의 안미옥 시인 추천사에도 이런 말이 있네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다. 곁에 있던 사랑을 본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겨울에 태어나 겨울에 죽었다. 그래서 겨울이 좋다. 입을 다물 수 있어서. 죽은 사람은 죽은 뒤에 말을 꺼내고 등으로 벽을 치며 입술을 문다. 겨울은 웃지 않는 사람들의 것. 그런 사람들이 자주 뒤돌아보는 곳.
(표제작, 『죽은 사람과 사랑하는 겨울』, 45쪽)
“입을 다물 수 있어서” “겨울이 좋다”는 첫 연에서 목이 메고 말았습니다. 시인이 그려내는 사랑과 상실은 피처럼 흐르는 와중입니다. 고통은 늘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것입니다. 이 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끝나는데요. 나중엔 괜찮아질 것이라는 위로 따위가 전혀 무용한 고통의 순간이 생생해 가슴이 아픕니다. 이 고통마저 사랑이라니, 살기가 참 힘듭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용기를 갖게 된다
뚜렷한 것이 없어도
나는 살아 있고
솔직하지 못한 삶에도
일정한 소리가 난다
(…)
세탁기 초인종 울리면 주인 목소리를 알아챈 강아지처럼 한달음에 달려가 베란다에 솟아오른 꽃향기를 들이마시곤 했다
그런 날에는 침묵하던 큰 옷들도 팔을 끌어당기며 엉켜 있다가 별 뭉치처럼 쏟아져 나와 울었다
(「세탁기 소리 듣는 밤」, 위 시집)
삶의 접촉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의 섬세한 반짝임이 고아합니다. 고통을 드러내는 것도, 사랑을 드러내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시를 읽으며 생각해보니 용기와 눈물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면서도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용감한 울보도 있겠지요. 눈물을 흘리며, 꽃향기를 맡으며, 멀리 걸어갑시다.
*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별일 없습니다 이따금 눈이 내리고요
출판사 | 현대문학
두부를 구우면 겨울이 온다
출판사 | 문학동네
이다음 봄에 우리는
출판사 | 아침달
죽은 사람과 사랑하는 겨울
출판사 | 걷는사람
겨울밤 토끼 걱정
출판사 | 현대문학

임유영 (시인)
2020년 문학동네신인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오믈렛』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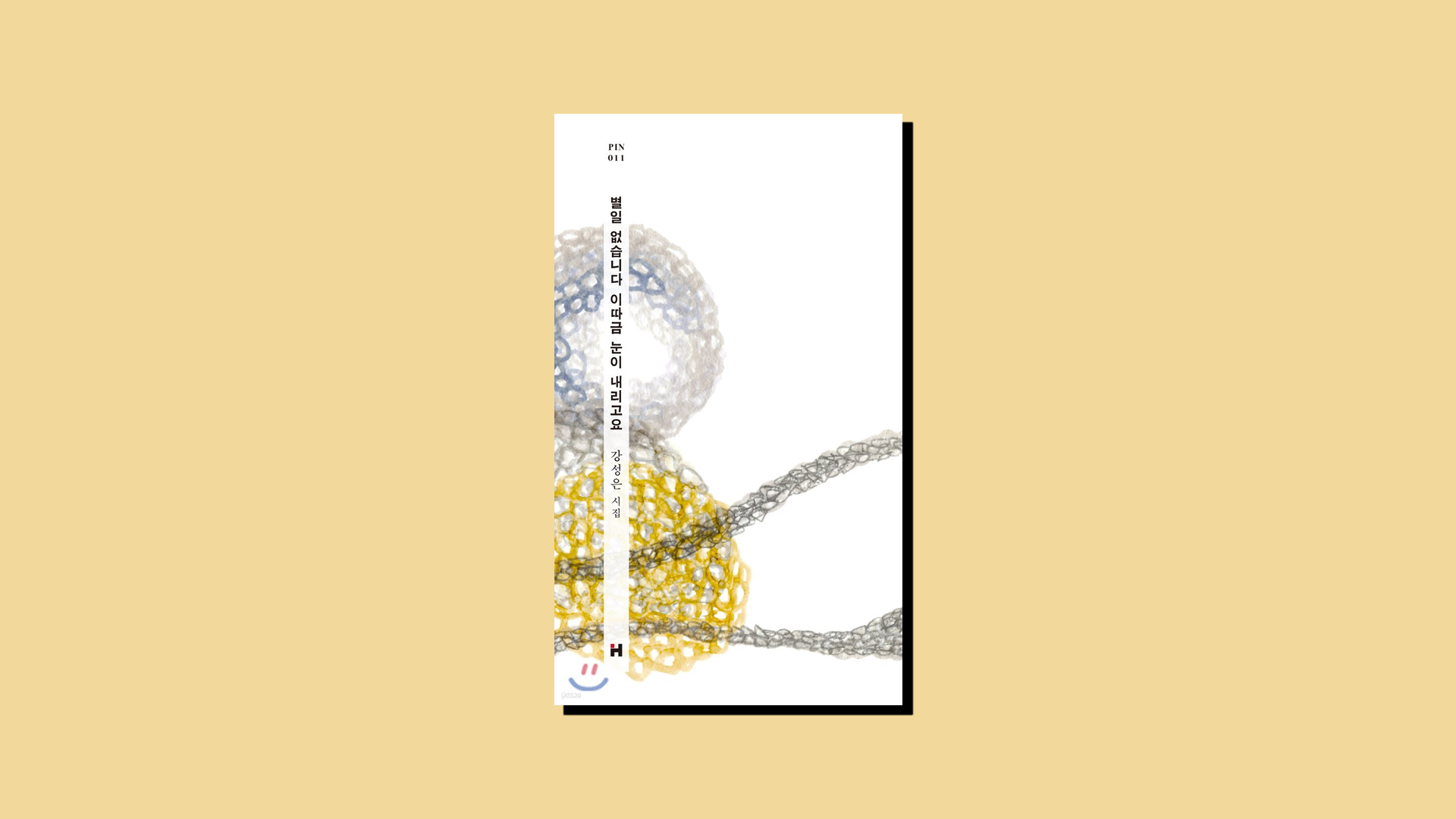




![[김승일의 시 수업] 에필로그로서의 시](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30-218f8487.png)
![[큐레이션] 혼술하며 읽는 시집](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5cb76b90.jpg)
![[큐레이션] 가을에 읽기 좋은 시집 세 권](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8/8/e/8/88e87067c27da3ff1583410478624d9c.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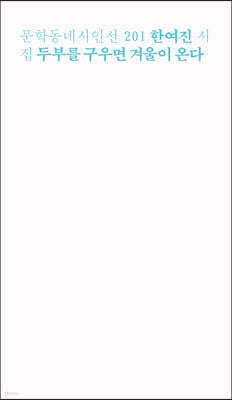




.jpg)




가루라왕레이가
2025.01.23
봄봄봄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