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이자 번역가인 황유원 작가에게 번역은 곧 '혼자서 추는 춤'입니다. 번역을 통해, 세계 곳곳을 누비고 먼바다를 항해합니다. 번역가의 충실한 가이드를 따라 다채로운 세계 문학 이야기에 빠져 보세요. |
적어도 나에게 『노인과 바다』는 무엇보다도 식욕을 자극하는 소설이다.
뭐라고?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어.
같은 묵직하고 엄숙한 독백이 등장하는 작품을 번역까지 하고선 고작 한다는 말이 식욕 타령이냐고? 그렇다. 아닌 게 아니라, 아주 그렇다.
사실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노인 '산티아고'는 식욕을 잃은 지 오래. 소설 초반에도 나오듯, 점심도 싸 가지 않고서 빈속을 커피로 채우는 게 전부. 하긴 늙은 홀아비 신세에 고기까지 통 잡히지 않는데 무슨 입맛이 있겠나? 그래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 '커피와 물'이 전부라니.
그럼에도 나는 『노인과 바다』를 옮기는 내내 식욕이 당겼다. 원래 번역을 하다가 작품에서 멋진 음식 묘사가 나오면 갑자기 식욕이 솟구친다. 메뉴판에 그려진 음식 이미지나 영화에서 음식이 나오는 장면을 볼 때보다 더. 아마도 그게 문장과 상상력의 힘이리라. 그런데 『노인과 바다』는 유독 그 정도가 더 심했다.
입맛이 없다던 사람이 맞나? 노인은 연일 선상에서 갓 잡은 생선을 날로 먹는다. 다랑어를 시작으로 만새기, 날치, 작은 새우, 급기야 상어들이 뜯어 먹고 남은 청새치까지. 심지어 과거에 먹었던 음식도 회상하는데, 그게 무려 바다거북의 흰 알과 상어간유다. 소설 초반부에 소년이 노인을 위해 가져다준 튀긴 바나나, 스튜까지 생각하면... 아, 이렇게 단어들을 나열하는것만으로도 다시 배가 고파 오는구나. 『노인과 바다』는 먹는 걸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노인이 어쩔 수 없이 펼치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것치고는 너무나도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의 향연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라임과 레몬, 그리고 소금에 대한 이야기다.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날것으로 먹어야 하는 노인은 소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무려 세 번이나 하더니 결국 이런 말까지 한다.
"다음부터는 소금이나 라임 없이는 절대 배에 오르지 않을 거야."
식욕을 잃었다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다니? 하여 번역을 끝내기도 전에 광어회를 시켜서 소금과 라임을 뿌려 먹을 수밖에 없었다.
좀 어처구니없기도 하다. 『노인과 바다』를 처음 원서로 읽었던 대학생 때는 이런 식으로 읽지 못했으니까. 금욕적인 작품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했으니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헤밍웨이가 누구던가. '마초'이기 이전에 '식도락가' 아니었던가!('그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표지만으로도 치즈버거와 버번을 먹게 만드는 크레이그 보어스의 『헤밍웨이의 요리책』을 꼭 읽어보세요) 식도락가인 헤밍웨이는 입맛을 잃은 주인공을 만들어놓고도 자신의 본색을 끝내 숨기지 못한다. 노인이 한 손으로 잡은 낚싯줄을 놓지 않은 채 다른 손으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손질해 먹는 장면들이야말로 『노인과 바다』에서 가장 눈물겹고 눈부신 순간이라고 느끼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 확신했다. 헤밍웨이가 노인이 청새치와 이틀 밤낮 넘게 사투를 벌이게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인에게 커피 대신 밥을 먹이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내가 전에는 이런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먹는 데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른 살 초반까지만 해도 내게 저녁 메뉴란 곧 '안주'를 의미했다. 뭘 마실지에 의해 뭘 먹을지가 결정됐었다. 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렇지 않다. 브리야 사바랭이 그랬던가.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 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 주겠다"라고. 이제 나는 읽은 것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기에 이르렀다.
내일은 오래간만에 멀리까지 외출한다. 세비체를 먹으러. '번역가의 마감식' 같은 거랄까. 노인이 그토록 원하던 소금과 라임과 레몬을 더한 날생선을 먹을 것이다. 마감식은 때로 주인공이 먹지 못한 것을 대신 먹는 일이기도 하니까. 어느 식당에서도 만새기를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쉬운데,(우리나라에서도 만새기가 잡히긴 하지만 잡혀도 그냥 버린다고 한다) 그런 아쉬움은 '만새기 인형'을 장만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청새치 인형'은 잠깐 고민하다 금방 포기해 버렸는데, 전체적으로 어쩐지 유치해 보였고, 무엇보다도 창 부분이 흐물흐물해서 매력이 반감되었기 때문이다.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 청새치를 청새치라고 할 수 있을까? 어쨌든 만새기는 지금 바다를 건너 내게 오는 중이고, 얼마 후면 도착해서 한동안 내 책상 위에 머물며 고독한 내 곁을 지켜줄 것이다. 노인은 야속하게도 날치와 청새치가 속한 자신의 친구 리스트에서 만새기를 쏙 뺐다. 만새기를 먹고도 힘을 냈으면서 이건 좀 너무하잖아. 나는 그런 만새기가 좀 불쌍하고 바보 같아서 어쩐지 더 마음에 들었다. 만새기는 나의 친구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황유원
시인, 번역가. 김수영문학상,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초자연적 3D 프린팅』, 『세상의 모든 최대화』, 옮긴 책으로 『모비 딕』, 『바닷가에서』, 『폭풍의 언덕』, 『밤의 해변에서 혼자』, 『짧은 이야기들』, 『유리, 아이러니 그리고 신』, 『시인 X』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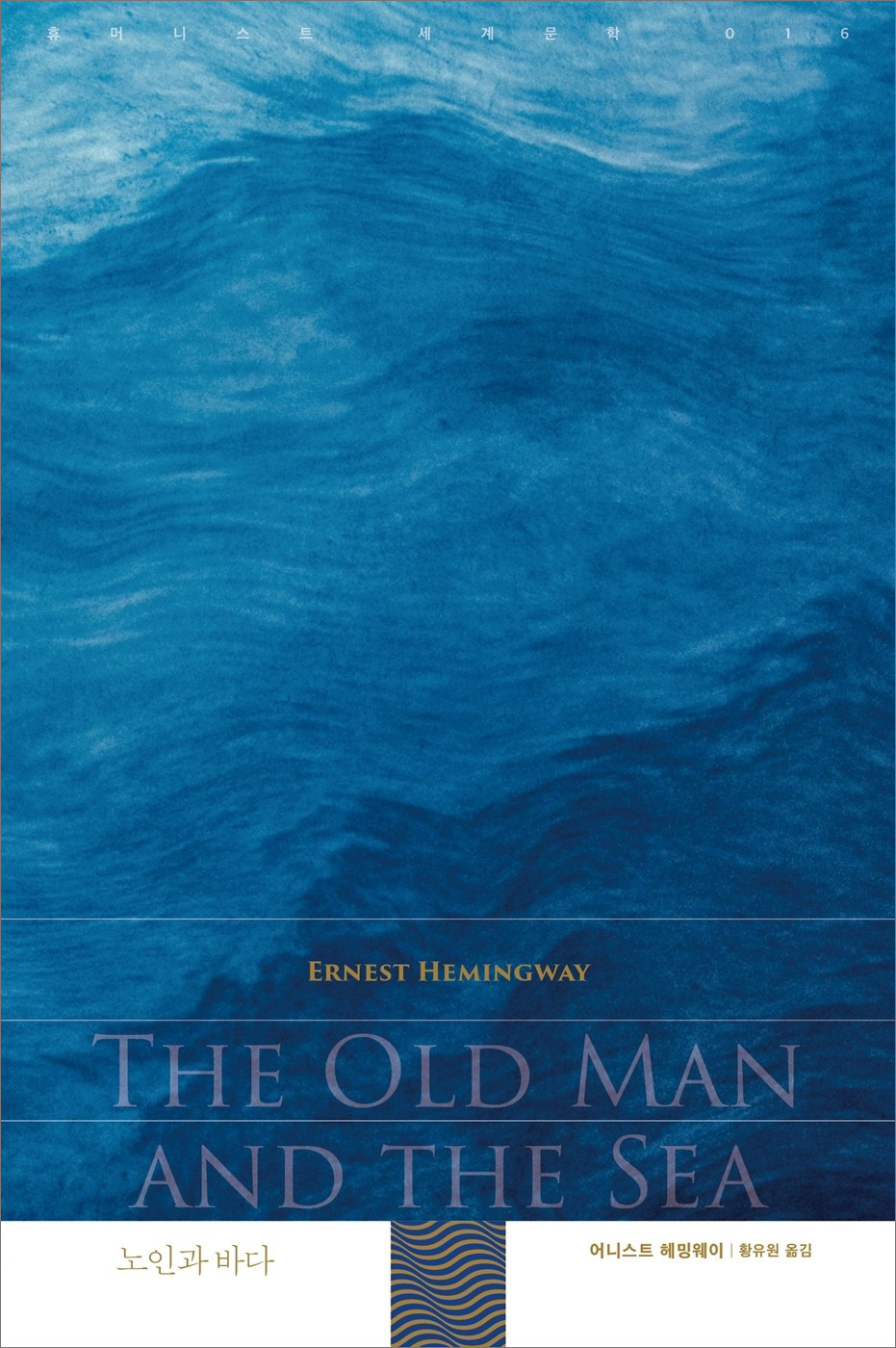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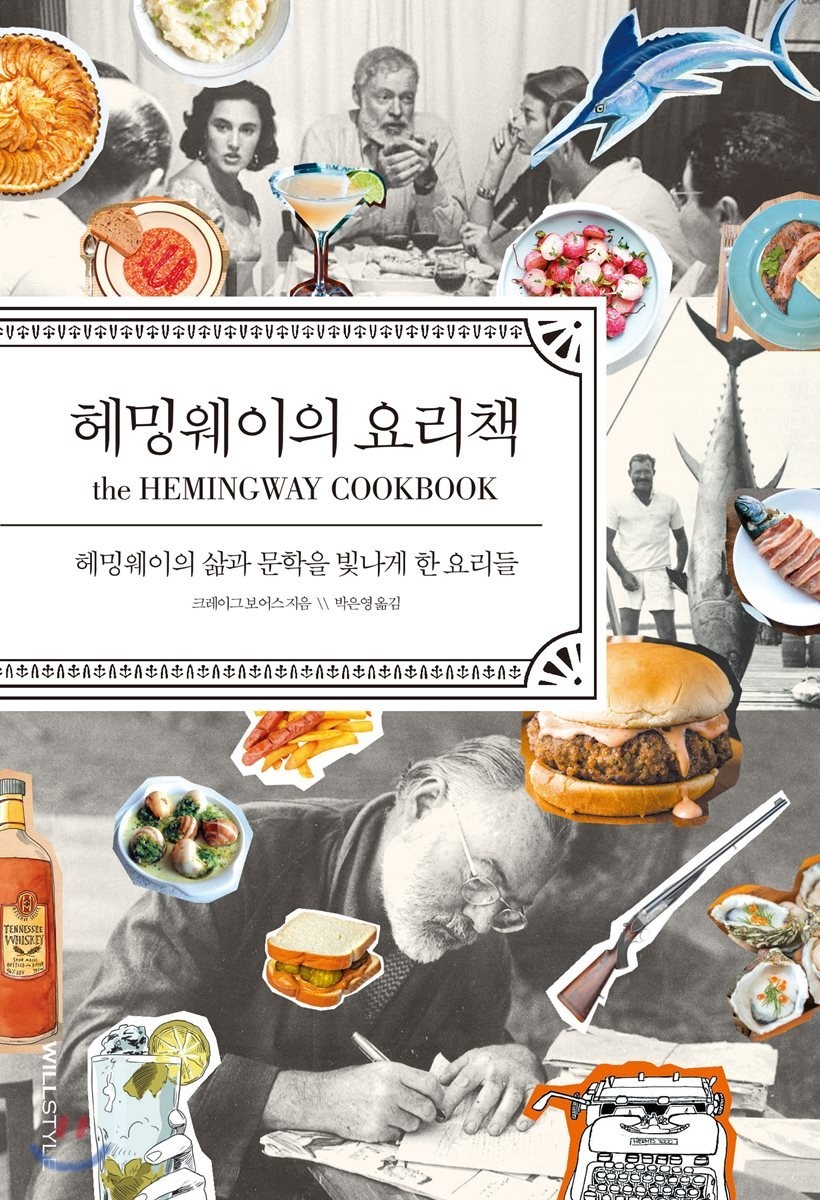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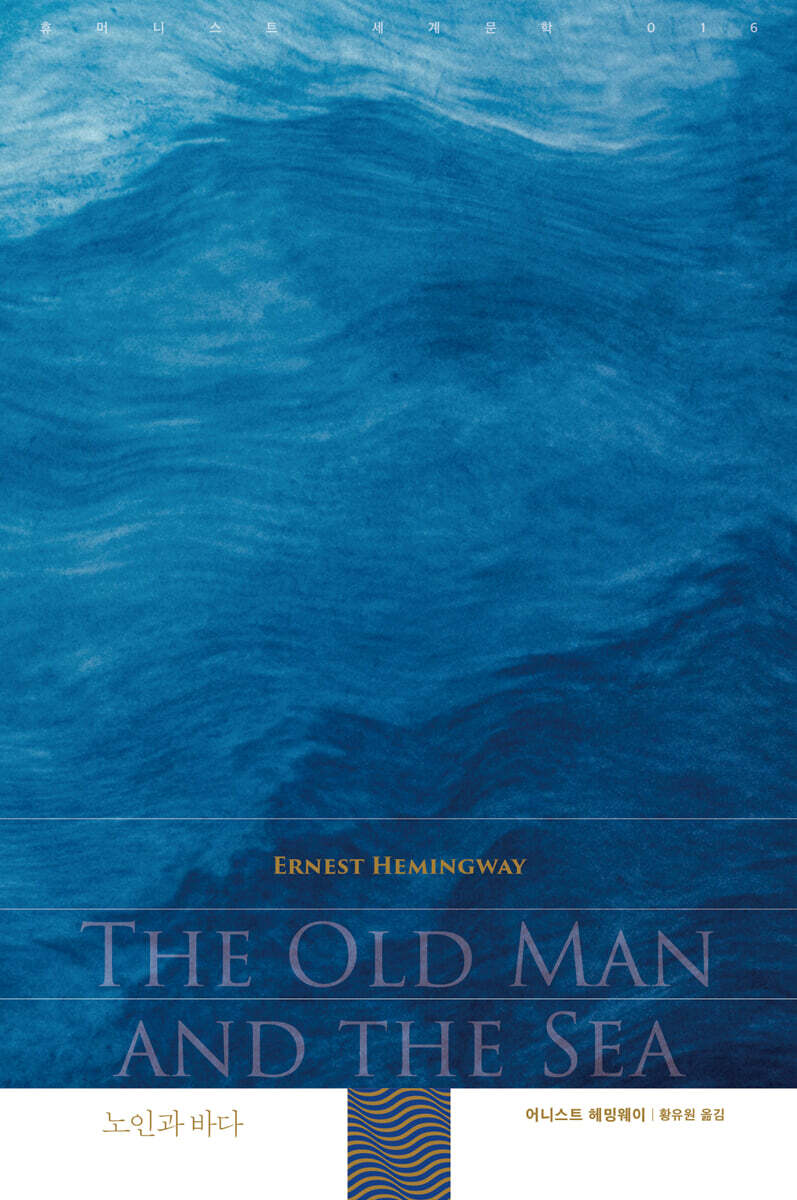
![[황유원의 혼자서 추는 춤] 폭풍의 언덕 후폭풍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3/c/b/7/3cb78187c29642e6caaccd5606575c3d.jpg)
![[황유원의 혼자서 추는 춤] 나는 어쩌다 '바다 사나이'가 되었나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3/2/2/b322df9239c4503f8c15d8ddac883358.jpg)
![[정이현의 어린 개가 왔다] 나무가 되는 꿈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5/1/f/7/51f7bf07f847c3d328a20da897e821cf.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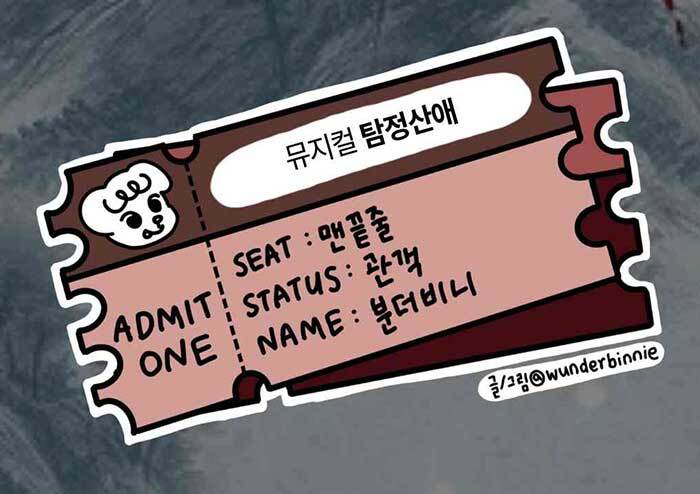



![[케이팝] 부석순 : 이것이 한국의 청춘이라면](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1/20250121-e22cb3e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