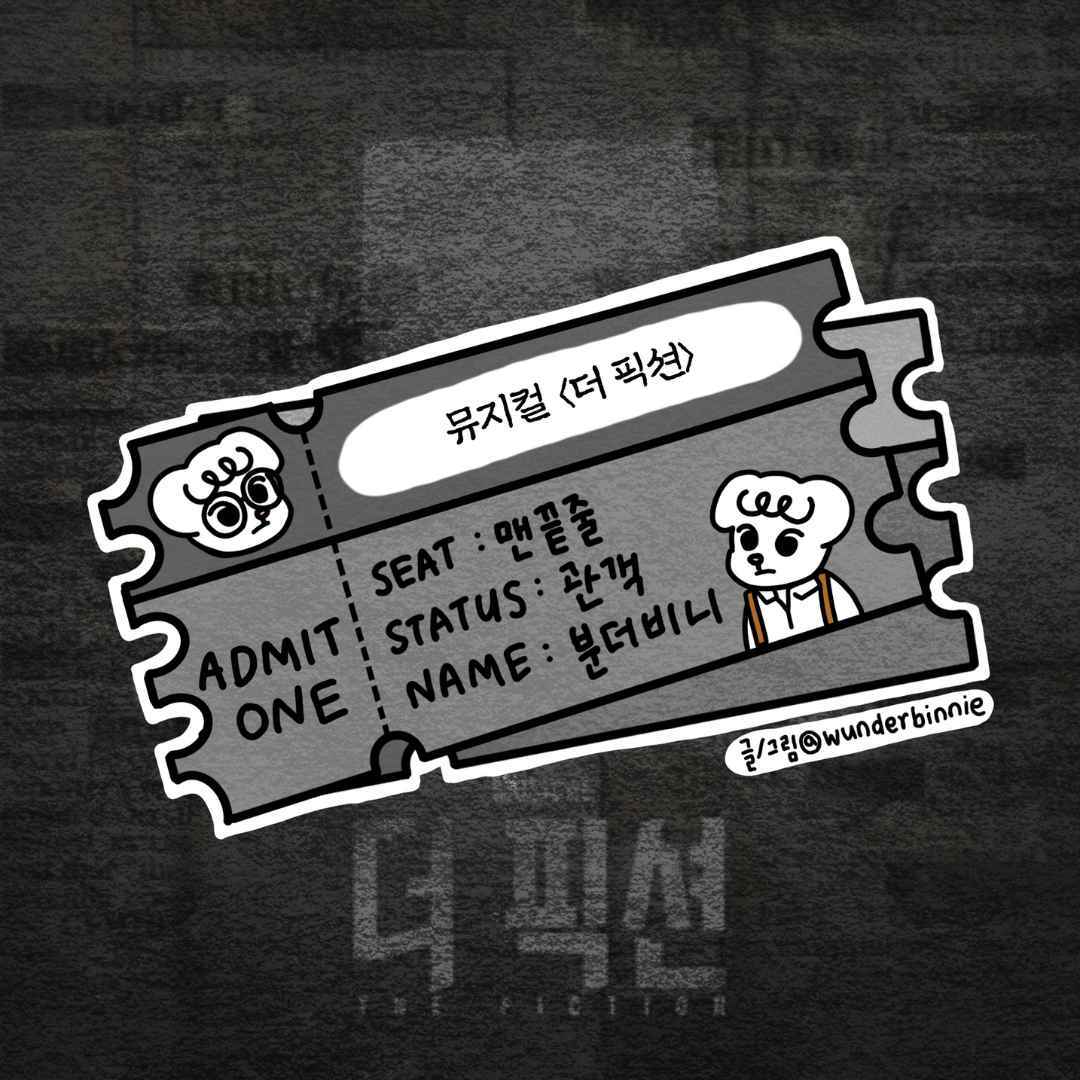이재경 저자
이재경 저자
『설레는 오브제』는 텍스트의 바다에서 헤매던 한 전업 번역가가 지면에서 마주친, 마음을 사로잡고 설레게 한 사물들을 수집한 기록이다. 10여 년간 출판 번역가로 일하며 50권이 넘는 책을 옮긴 저자 이재경은 번역하는 틈틈이 마주치는 사물들의 사연을 탐색하고 거기에 자신의 일상을 접붙이는 글을 썼다. 그 글들은 베테랑 번역가가 미처 지면에 다 옮기지 못한 “여러 편의 긴 역자 주석”인 동시에, 아주 사적인 취향으로 엄선한 독특한 수집품 컬렉션이기도 하다.
수집이라고 하면 보통은 소유를 전제로 하지만, 이 책에 담긴 수집품들은 다르다. 저자는 사물의 물성 대신 감성을 수집한다. 그 감성을 이루는 이야기는 두 가지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 사물이 존재한 시간 동안 인간 세상과 맺은 관계, 그리고 그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맺은 저자와의 관계. 그래서 『설레는 오브제』는 사물 뒤편에 쌓인 맥락을 탐구하는 인문 에세이이자, 저자만의 내밀한 취향과 감성을 고백하는 일상 에세이이면서, 숙련된 번역가의 언어에 대한 고민과 관점을 엿볼 수 있는 번역 에세이이기도 하다.
첫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줄곧 번역가로 활동해오셔서 선생님의 성함이 익숙한 분들도, 또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급쟁이의 삶을 전전하다 지금은 10년 넘게 전업 번역가로 일하는 이재경입니다. 텍스트가 좋고, 책이 좋고, 언어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짜릿함이 있었기에 이 일에 들어섰습니다. 번역으로 부자가 되거나 문명(文名)을 떨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시작했고, 실제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꾸준히 번역하는 수많은 생계형 번역가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번역가들의 전형과 평균을 점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대부분이 그렇듯 번역에도 ‘전공 불문’의 룰이 먹힌다는 것을 증명하며 삽니다.
번역가가 아닌 저자로서 처음 책을 내게 되신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번역가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표지에 저자와 번역가의 이름이 나란히 찍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랑도 되고 부담도 됩니다. 번역하다가 책을 내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내 이름만 올라간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게 다른 저자들과 다른 점이랄까요. 기쁘면서도 어쩐지 단독 범행의 으스스한 기분이 듭니다.
『설레는 오브제』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사물이 주인공인 오브제 로맨스 30편을 담았습니다. 로맨스(romance)가 원래 모험담이란 뜻입니다. 사물이 좌충우돌 구르면서 끈끈이처럼 생각들을 모으는 이야기입니다. 사물이 연상의 시작점이 되어서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고 문학, 언어, 역사, 심리, 미술 등 인문의 다양한 분야가 소소하게 소환됩니다. 너무 거창했나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물에 대한 감상에 기대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시대에 대한 제 생각을 들먹여보고 싶었습니다.
머리말에서 “번역 텍스트에서 처음 통성명한 사물을 기념품처럼 하나둘 챙기기 시작”하면서 사물의 물성이 아닌 감성을 수집했다는 말씀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어떻게 사물의 감성을 모아보겠다는 생각을 떠올리셨나요?
사물의 감성을 수집한다는 것을 다양하게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물에 얽힌 경험이나 추억을 떠올리는 일, 사물이 만드는 심상이나 분위기를 기억해두는 일, 내게 한 가지의 기분(mood)을 주는 여러 가지를 모으는 일 등. 모두 사물의 감성을 수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경우 사물의 감성을 수집하는 것은 사물에 얽힌 맥락을 찾아보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세계사적, 인문학적 배경지식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사물에 얽힌 사연을 접하면 개인적인 감상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 안팎에서 그런 사물을 모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 기원하지 않은 것들에서 느껴지는 묘한 생소함이 수집의 끈이 됐습니다.
책에서는 30개의 사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책을 너무 몰입해서 읽었는지 그렇게 많은 사물을 다루신 줄 몰랐어요. 그중에는 스콘처럼 일반적으로 오브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법한 것들도 ‘설레는 오브제’로 다루셨는데요. 30개의 오브제는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출간 제의를 받았을 때도 받은 질문인데 늘 어려운 질문입니다. 30개의 오브제 중에는 제게 실제로 연이 닿았던 것도 있고, 텍스트나 미디어로만 접했던 것도 있고,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사연이 있을 법한 것들이었고, 실제로 파봤을 때 사연이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 사물이 세상에 수없이 많겠지만, 그중에서 제 사적인 연상으로 제 나름의 해석을 해낼 수 있었던 것들만 글이 됐습니다. 사물 하나와 인문학적 주제 하나를 연결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사물의 이름에 문학사적, 언어학적 배경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하루아침에 모인 사물들도 아니고, 범주화하기 어려운 사물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수집이 됐습니다.

맺음말에서 “끝내 꿰지 못한 구슬”로 남은 사물들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선생님의 마음에 수집해두었지만, 아쉽게도 『설레는 오브제』에서는 미처 소개하지 못한 사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놀이공원에 있는 대회전차를 영어로 페리스 휠(Ferris wheel)이라고 해요. 처음 고안한 사람의 이름을 딴 거라는데, 감성 사진에 유난히 많이 등장해요. 소설에도 나오고, 요즘은 도시의 랜드마크로 경쟁적으로 크게 세우기도 하고요. 공중에 거대하게 떠서 돌아가는 원에 홀리듯 모여드는 사람들. 페리스 휠은 사람들에게 어떤 최면 효과를, 또는 각성효과를 낼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팔레트(palette)요. 사람마다 장소마다 떠오르는 색과 색 조합이 있잖아요. 생활과 인생의 장면들에도 나름의 팔레트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는 부지불식간에 어떤 색들을 모아들이고 있을까요? 김초엽 작가의 단편소설에 나오는 색채를 언어로 삼는 외계 종족 이야기도 떠오르네요.
독자님들에게 『설레는 오브제』가 어떤 책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시나요?
읽고 나서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도 친구와 재미있는 대화를 했다는 느낌을 주는 책이었으면 해요. 누구나 부담 없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커피 한잔하면서 잠시 생활의 근심을 내려놓고 조금 엉뚱한 생각에 빠지는 경험을 드리고 싶어요. 나도 몰래 설렜던 순간들을, 잘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을 담은 책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재경 “매일 언어의 국경에서 텍스트가 건널 다리를 짓고 그림자처럼 참호 속에 숨습니다.” 서강대학교 불어불문과를 졸업했다. 경영컨설턴트와 출판 편집자를 거친 월급쟁이 생활을 뒤로하고, 2010년 전업 번역가가 됐다. 번역가는 생각한 만큼, 겪은 만큼, 느낀 만큼 번역한다. 자기객관화와 감정이입에 동시에 능해야 한다. 그간의 내 이력이 밑천이요, 비전공자로 산 세월이 저력이었다. 어느덧 번역이 가장 오래 몸담은 직업이 됐다. 밑천이 바닥날까봐 번역가의 참호 안팎에서 틈틈이 소소한 모험을 추구한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거기서 얻은 발상과 연상을 기록한다. 산문집 『젤다』, 시집 『고양이』, 고전명언집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해』를 엮고 옮겼고, 『편견의 이유』, 『쓴다면 재미있게』, 『깨어난 장미 인형들』, 『민주주의는 없다』, 『바이 디자인』, 『소고기를 위한 변론』, 『가치관의 탄생』, 『셜로키언』, 『뮬, 마약 운반 이야기』 등 50권 넘는 책을 번역했다. |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설레는 오브제
출판사 | 갈매나무

출판사 제공
출판사에서 제공한 자료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채널예스>에만 보내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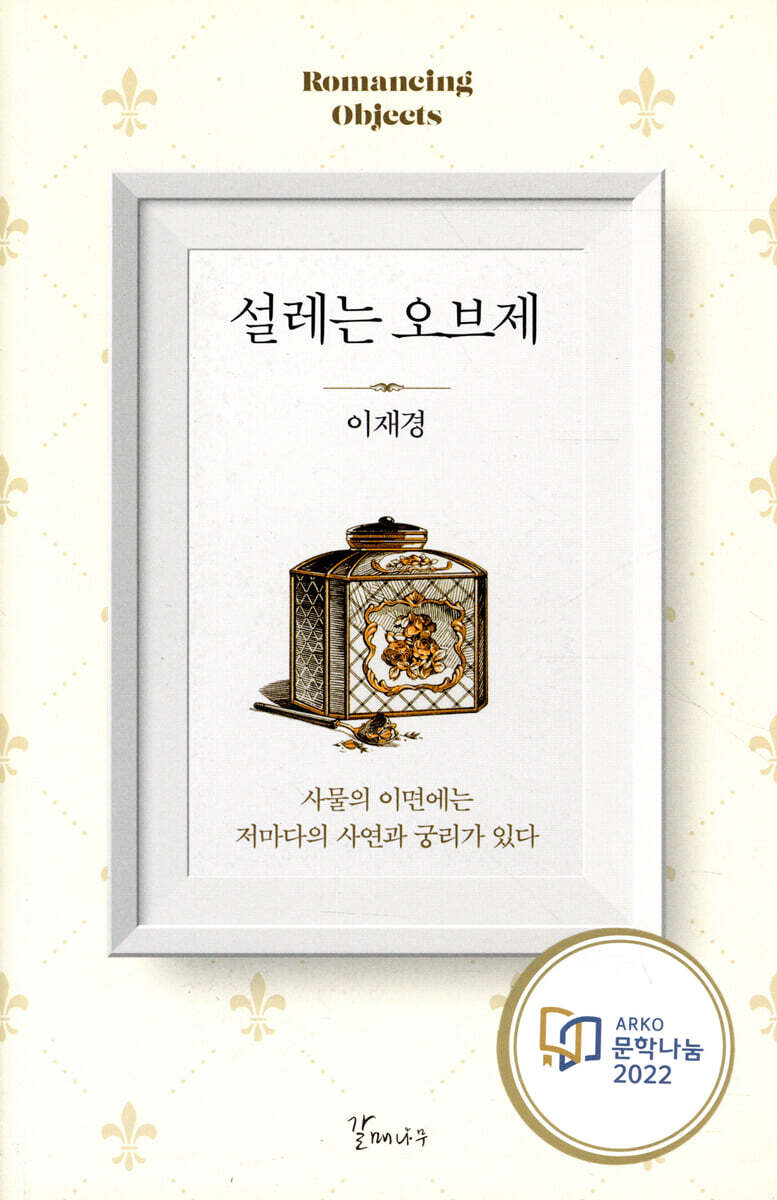




![[이벤트] 2025 채널예스 콘텐츠 연말 결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12/20251204-1aba975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