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_양다솔
사진_양다솔
정신 차리고 보니 크리스마스였다. 생애 가장 바쁜 두 달을 보낸 참이었다. 일주일에 기본 네다섯 개의 굵직한 책 홍보 일정이 있었다. 서울, 인천, 경기부터 대전, 부산, 전주, 창원,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그 와중에 〈격일간 다솔〉 원고도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써내고 있었다. 살면서 밥 챙겨 먹을 시간이 없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었다. 황홀한 나날이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는 최고로 영양실조적인 날들이었다. 그 시기에 자정이 되면 한 여자가 편의점에 등장하여 컵라면 세 개를 연달아 선 채로 해치운 뒤 홀연히 떠났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편의점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나는 저녁에 행사를 마치고 나면 쓰라릴 정도로 배가 고팠다. 행사 전에는 잔뜩 긴장된 상태로 장소로 이동하느라 먹을 겨를이 없었다. 긴 행사를 마치고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정리를 마친 뒤 행사장을 나오면 캄캄한 밤이 되어 있었다. 그 시각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곳은 편의점이었다. 즉석식품을 좋아하지 않는 데다 비건을 지향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음식도 없어 고역이 따로 없었다. 좁은 바의 테이블에 서서 불청객이라도 된 듯 음식을 꾸역꾸역 밀어 넣었다. 실내 취식은 금지라고 말하는 곳도 있어 영하의 날씨인 새벽에 실외 테이블에서 먹은 일도 있었다. 컵라면이 먼저 식는지 내 몸이 먼저 식는지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피곤함에 절어 눈을 뜬 시간은 오후 1시였다. 나는 집에 덩그러니 혼자였으며 할 일은 전무했다. 전혀 몰랐다. 오늘의 해야 할 일에서 내일 해야 할 일로 헤엄쳐가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세상일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다. 전력으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선 것 같았다. 왜 아무도 나에게 크리스마스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지. 그러나 크리스마스고 나발이고 나에겐 그저 빨간 날일 뿐이었다. 바깥은 영하 15도를 웃돌았고,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다. 이런 날은 집 밖에 안 나가는 게 상책이었다.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차려 먹고 보일러를 왕창 튼 뒤 해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곯아떨어졌다.
그렇게 26일 아침, 언제나처럼 찻물을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니, 하려 했다. 그런데 간밤에 산타가 다녀간 걸까. 물이 나오지 않았다. 평소처럼 수도를 틀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 나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 아침 우리 집 수도가 동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보아하니 요즘은 자기 전에 물을 조금씩 틀어놓아야 한다는 걸 나만 또 몰랐던 모양이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다음 날 아침 나의 첫 번째 일과는 수도관을 녹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났다. 결론을 말하자면 수도관은 전혀 녹지 않았고, 내 몸이 얼었다. 스코어가 0:2인 셈이다. 주변 철물점과 수도 배관 전문가들도 사정을 듣고 모두 “날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그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였다. 차를 마실 수 없었다. 요리도 할 수 없었다. 물도 마실 수 없었고 청소도 할 수 없었다. 씻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쌀 수가 없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였다.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치달았다. 일기 예보는 다음 주까지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우리 집 고양이 두 마리가 나를 보며 야옹거리고 있었다. 나는 글쓰기 소상공인이기 이전에, 양다솔이기 이전에 고양이 집사였다. 내가 9년째 모시고 있는 두 분이 명실공히 이 집의 가장 큰 지분을 갖고 계셨다. 완벽히 건식으로 생활하시는 두 분께서 날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에미야, 나는 뭣이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이틀이 되더니 어느덧 일주일이 되고 있었다. 툭하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겨울에 보일러나 수도가 동파될 걱정 없이 살 수 있느냐며 한탄했다. 내가 있는 곳은 너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라고. 너희가 상상하고 바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라고. 그야말로 환상적이라고. 마치 먼 나라에 여행을 가 있는 사람처럼 말했다. 친구들, 여기는 윈터 원더랜드, 더 워터리스 월드야.
하느님께 감사할 일은, 우리 집 바로 옆에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문화재 옆에는 작지만 번듯한 공중화장실이 딸려 있었다. 화장실은 딱 한 칸으로 소담했지만 따듯한 바람이 나오는 라디에이터도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문제는 평생을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삶을 살았던 나의 안일한 방광이었다. 그것은 10이 한계라고 할 때 늘 9.5쯤에 신호를 보내오곤 했다. 나는 다섯 걸음 안에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방광을 움켜쥐고 겉옷에 팔 한쪽만 넣은 채 집 밖으로 달렸다.
어느 날은 아침부터 화장실로 향했는데 웬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의자에 앉아 게임 삼매에 빠진 것이 아닌가. 협소한 화장실 공간에 대해 다시 강조하자면 그녀가 앉아 있는 자리 바로 앞에 화장실 칸막이가 있었고 그것이 유일하게 일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왜 여기서 게임을 하고 계실까요?” 아줌마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 여기 청소하는 사람인데.” 그 순간 뒤늦게 내 행색을 되돌아봤다. 누가 봐도 문화재를 보러 온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야말로 침대에서 방금 뛰쳐나온 사람의 모습이었다.
당장이라도 폴더 폰처럼 몸을 접으며 ‘매번 신세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같은 말을 할 뻔했다. 바쁜 그녀에게 당장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나는 조용히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클래식의 리듬에 맞춰 최대한 자연스럽게 일을 해결하고 나왔다. 그리고 그녀에게 깊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까딱였다. 나는 한층 가뿐한 몸으로 그곳을 나섰다. 그날 오후 물이 녹았고, 그녀를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다. 물이 있는 세상은 아름다웠다.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양다솔(작가)
글쓰기 소상공인. 에세이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의 저자.






![[양다솔의 적당한 실례] 제물 바치기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e/b/f/d/ebfd88ada307f3ebd47c54d16d8a9cf6.jpg)
![[양다솔의 적당한 실례] 글과 이름들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5/d/9/b5d90b29720afedee9dacc1ad6190aba.jpg)
![[예스24 인문 MD 손민규 추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 읽는 책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b/9/d/d/b9dd54475ac6b3e179ca6de1f854e10c.jpg)

![[서점 직원의 월말정산] 7월의 즐길거리를 소개합니다](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31-ea87383d.jpg)

![[취미 발견 프로젝트] 독서하고 싶은 공간 만들기](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2/20250226-346177ac.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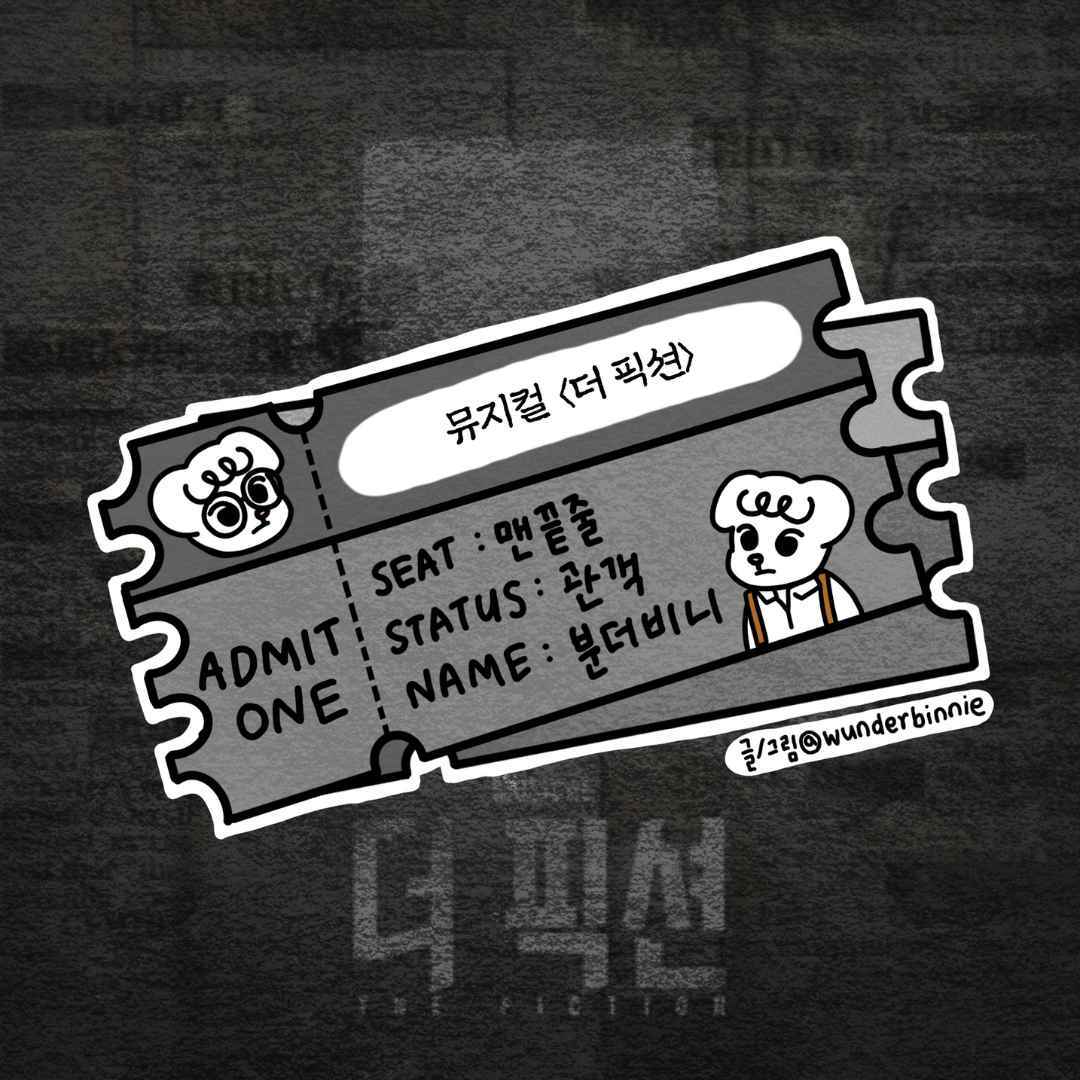



나라아나라
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