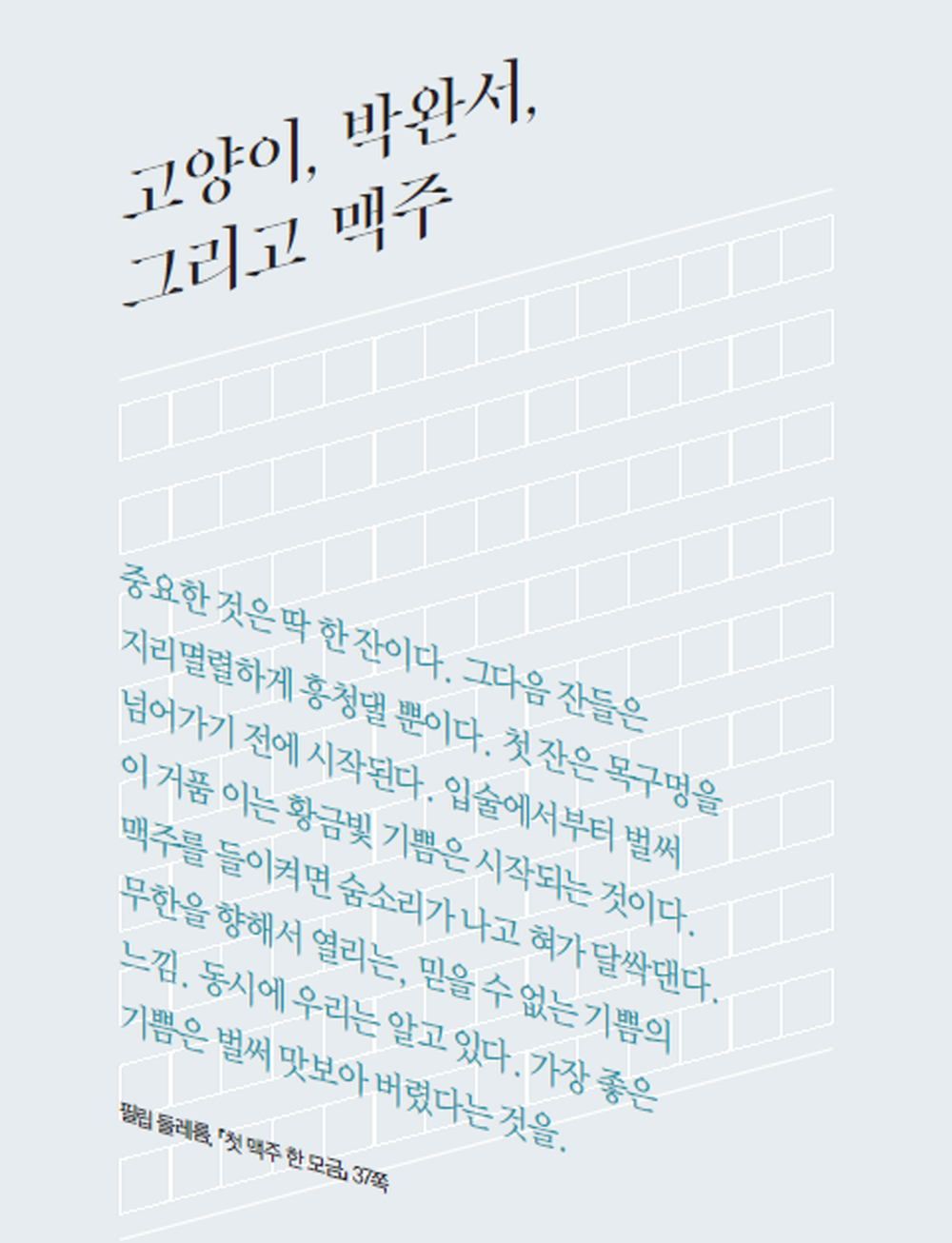
“중요한 것은 딱 한 잔이다. 그 다음 잔들은 지리멸렬하게 흥청댈 뿐이다. 첫 잔은 목구멍을 넘어가기 전에 시작된다. 입술에서부터 벌써 이 거품 이는 황금빛 기쁨은 시작되는 것이다. 맥주를 들이켜면 숨소리가 나고 혀가 달싹댄다. 무한을 향해서 열리는, 믿을 수 없는 기쁨의 느낌.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다. 가장 좋은 기쁨은 벌써 맛보아 버렸다는 것을.”
필립 들레름 『첫 맥주 한 모금 』37쪽
내가 최근에 개발한 놀이 하나를 소개하겠다. 미리 실토하건대 유치하고 사소한 것이니 일과 인생의 중대한 비밀을 엄중한 시선으로 찾으시는 분이라면 이하 읽기를 생략하시라 권하고 싶다. 자, 그럼 유치하고 사소한 놀이의 소개로 들어가 보자. 가령 누군가와 같이 뉴스를 보고 있다. 아니 저걸 저렇게 처리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뉴스 화면에 대고 옆사람이 버럭 한다. 그것은 기자와의 논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화는 더더욱 아니며 딱히 혼잣말로 치부해 버리기도 애매한 상황. 무엇보다 당신은 바로 그 옆사람과 저걸 저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사회적 논의가 바람직한지를 의논하고자 뉴스를 보고 있던 게 결코 아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잠시나마 만끽하려 했거나 다음 주말 로맨틱한 나들이 계획을 세워보려는 참이었을 수도 있겠다.
바로 그럴 때 이 놀이는 적절하다.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라고 리액션하는 것. 당신은 이 정도에 화를 낼 사람이 아니잖아, 의 뉘앙스를 잔뜩 담은 표정과 함께 진심 놀란 듯 최대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눈이 작은 나로서는 이 부분이 항상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렇게 화가 났어?를 가벼운 랩처럼 빠르게 처리하는 게 포인트라 하겠다. 당신의 그 또는 그녀가 운전을 하다가 흔하고 불쾌한 상황에 직면해서 굳은 얼굴로 무어라 토로할 때도 조수석의 당신이 눈을 맞추며 이렇게 물어주는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상대는 필시, 화가 난 건 아니구 하며 웃을 것이다. 순간 딱딱해졌던 공기가 부드럽게 이완되고 다시 사랑과 낭만의 세계로 복귀하게 되는 마법의 놀이랄까.
화를 내는 건 일에서든 생활에서든 자연스런 감정의 문제라고들 한다.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하지만 생각해보면 화를 내는 것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을 뿐더러 오히려 감정을 다치게 해서 관계마저 나빠지기 일쑤 아닌가. 화를 내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다. 마음먹기에 따라선 화를 내는 걸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나는 마스다니 후미오의 책에서 읽었던 어느 지혜로운 자의 사례를 알고 있다. 자신의 면전에서 격렬하게 화를 내는 이에게 그 현자는 엉뚱하게 물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가 찾아오면 음식 대접을 하느냐고. 어리둥절한 채 그렇다고 하자 다시 물었다. 만일 당신이 대접한 그 음식을 당신의 친구가 받지 않으면 그때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고. 화를 화로 받지 않는 지혜에 대한 멋진 비유 아닌가.
일을 왜 잘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행복하기 위해서라 답하겠다. 워라밸이라지만 라이프의 시간 중에 일의 시간이 너무나 크지 않나? 워라밸의 추구라는 것이 수능에서 수학을 포기하듯 라이프에서 워크를 포기해서 얻고자 하는 밸런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 때로는 업계의 평판이나 고객사로부터의 평가가 나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주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그것은 눈치를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며 눈치를 본다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지금 회사를 때려치우고 프리랜서가 되거나 유투버가 된다 한들 평가와 인정의 문제가 극복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동료들의 예스가 많아지고 엄지 척이 늘어갈수록 일하는 나의 행복지수도 동반 상승한다.
그런데 그것은 기나긴 부침의 과정이라서, 벽에 부닥치거나 길을 잘못 잡았을 때 도와줄 구체적이고 사소한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오래 견디며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 앞서 예를 든,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놀이처럼 말이다. 뭔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동료를 믿고 의지해서 전략과 아이디어를 같이 의논해보려는데 당신의 그 또는 그녀가 퉁명스런 얼굴로 당신에게 툴툴거린다면 한번 해보시라.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십중팔구는 마주 보며 멋쩍게 웃게 된다. (물론 연기력에 따라 상황은 예상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으니 편한 술자리나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 우선 검증해 보시기를 추천)
일을 매번 잘할 수야 있겠나. 하지만 매번 잘할 수는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잘하려고 매번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매순간 현명할 수 없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매순간, 지혜롭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야 어쩌다 한번이나마 잘할 확률이 생기고, 그래도 한두 번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 그러려면 잘 안될 때 이내 평상심을 회복해서 내일은, 다음 프로젝트는, 새로운 팀에선, 어쩐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새로운 힘을 찾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소한 것들 속에 다시 힘을 낼 위대한 격려가 깃들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고양이 네 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는 사소하지만 위대한 도움 또한 만만치 않다. 알렌은 소심쟁이, 물루는 관심쟁이, 찰리는 수다쟁이, 머루는 나홀로쟁이, 성격도 모습도 다 다르지만 말랑말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의 한결같은 태평스러움이라니. 세상 맛있게 물을 마시고 중력 따윈 상관없다는 듯 폴짝 내 무릎 위로 뛰어 올라와 기껏 한다는 일이 잠을 청하는 것일 때, 나는 고요히 듣게 된다. 세상에 별 거 없다, 세상 일 다 별 일 아니다, 한잠 잘 자고나면 지금 안 보이는 게 보일지도 몰라, 그런.
자신의 한계나 능력 탓에 난관에 봉착한 경우라면 아침 공복에 박완서를 복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의 주인공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다. 그녀가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집안에 굴러 다니던 소년과학잡지의 한 부분을 주문처럼 외우지 않나.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빛으로 약 오백 초,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을 도는 명왕성은 태양에서 빛으로 약 다섯 시간 반... 우주라는 무한은 무한히 팽창하고 있는 중. 광년은 빛이 일 년 동안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의 단위, 구조사천육백칠십 킬로미터.”나는 소설 속 이 주문을 A4지에 타이핑해서 파티션 벽에 붙여둔 적도 있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집채 만했던 일의 구체적 고민과 초초함이 모래 한 알보다 작아진다. 그게 해결은 아니지 않냐고? 박완서 선생의 도움을 받아 다시 힘을 내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 내가 해결해야 나의 성취 아니겠는가?
사소한 위대함의 리스트 마지막엔 맥주가 있다. 술로 인해 벌어진 부끄러운 흑역사는 차고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과의 술자리에서 배우고 새로 알게 되고 느꼈던 것들의 크기가 훨씬 크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서 배운다는 것의 확인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필립 들레름의 저 문장들을 보라. 사람 없이도 맥주 첫 잔이 주는 사소한 위대함이 느껴지지 않나. 숱하게 맥주를 마시면서 매번 느꼈던 감각, 나는 고작 캬! 소리나 내며 마시기만 했던 첫 모금의 느낌을 어쩌면 저렇게 명료하게 쓰나 경탄하며 필립 들레름 선생께 리스펙트를 바침으로써, 나는 또 나의 일을 더 잘해보려는 힘을 내는 것이다. 불끈!
추천기사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이원흥(작가)
<남의 마음을 흔드는 건 다 카피다>를 쓴 카피라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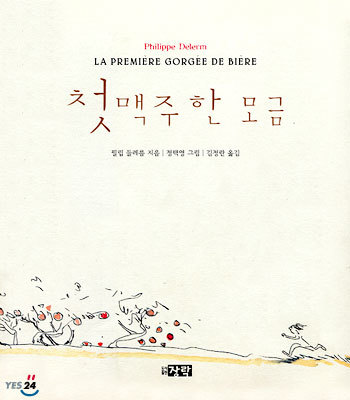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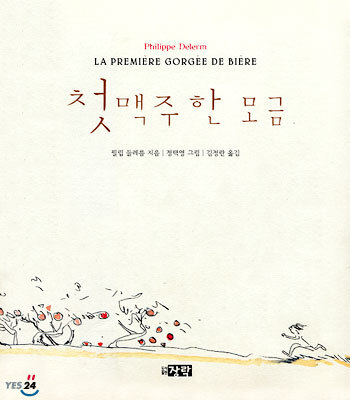
![[이원흥의 카피라이터와 문장] 신입사원이 된 딸에게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d/c/5/3/dc534210104bdfce4f07c105c3a75be0.jpg)
![[이원흥의 카피라이터와 문장] 걱정하는 자와 민주주의자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2/2/2/5/2225f23e2d4c588107bdc986121256e4.jpg)
![[이원흥의 카피라이터와 문장] 일인분과 사표 | YES24 채널예스](http://image.yes24.com/images/chyes24/0/d/0/6/0d06dbbdfa5e65702915de4196cf2366.jpg)

![[송섬별 칼럼] 살아 있는 채로, 기쁨.](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7/20250716-8c669f3f.jpg)
![[젊은 작가 특집] 강보라 “못생긴 감정을 숨기고 사는 인물에게 관심이 있어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6/20250617-508d14fb.png)
![[송섬별 칼럼] · · · - - - · · ·](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5/04/20250424-efbfaa92.png)
![[이벤트 종료] 새로워진 채널예스 기대평을 작성해주세요!](https://image.yes24.com/images/chyes24/article/cover/2024/11/20241126-81642dcc.jpg)




bucssy
2021.06.04